웹3 산업 초창기의 ‘비전만으로도 투자 유치’가 통하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 타이거리서치가 발행한 리포트를 바탕으로 한 토큰포스트 팟캐스트에 따르면, 오늘날 웹3 프로젝트의 99%는 한 푼의 실질 수익도 내지 못한 채 버티고 있는 ‘좀비 프로젝트’ 상태에 가깝다. 그럼에도 이들은 매달 수억 원에 달하는 마케팅과 이벤트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 생존’은 어떻게 가능할까?
문제의 본질은 수익 모델 부족이다. Token Terminal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수만 개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 단 200곳만이 최근 30일간 단 0.1달러라도 수익을 올렸다. 나머지 대부분은 사용자 확보도, 수수료 수익도 없이 팀 보유 토큰과 초기 투자금으로만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비는 매달 나가는 고정지출이고, 팀이 보유한 자산은 유한하다. 결국 이런 프로젝트는 일정 시점을 넘기면 조용히 사라지는 종착점을 맞는다.
이 같은 구조는 ‘과도한 초기 밸류’와 ‘조기 상장(TGE)’ 문화에서 비롯된다. 전통 산업에서는 제품 출시 후 성과에 따라 기업가치를 평가받지만, 웹3에서는 NFT 발행이나 토큰 상장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비전만으로 억 달러 단위의 밸류를 적용받는다. 이후 팬심과 기대감에 따라 자금은 몰리지만, 시간이 지나도 실질적인 수익을 증명하지 못한 프로젝트는 투자자의 외면을 받는다. 이 상황에서 많은 팀은 제품 개발보다 마케팅에 집중하게 되며, 이는 다시 자금 고갈과 실패로 이어진다.
한편,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상위 1% 프로젝트는 어떨까. 리서치는 이들 주요 프로젝트의 PER(주가수익비율)이 1~17배로, S&P 500 평균보다 낮음을 언급했다. 이는 이들이 수익 대비 저평가되어 있으며, 고밸류에도 정당한 매출을 수반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실적이 없는 나머지 프로젝트들이 현재 받고 있는 기업가치는 오히려 허구일 수 있음을 방증한다.
더 나아가 웹3 프로젝트의 파운더 구조 자체가 이상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리포트는 두 명의 개발자 사례를 대비시켰다. ‘라이언’은 게임이 출시되기도 전 NFT 발행과 토큰 상장으로 자금을 유치하고, 초기 물량을 판매해 수익을 실현했다. 반면 ‘제이’는 제품 완성에 집중했으나 자금난으로 팀을 해산했다. 결국 시장에는 제품 없이 돈을 번 파운더와 제품을 꿈꾸다 빚만 남기고 사라진 개발자만이 존재하게 됐다.
웹3 프로젝트의 대다수가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도 생존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투자자의 희생과 높은 기대감을 빠르게 자본화하는 시장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진짜 수익 없이도 살아남는 방법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공동체가 떠안는 리스크를 기반으로 한 불안정한 기초 위에 선 생존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웹3는 과연 지속 가능한 산업 모델로 성장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제품 없는 수익 회수 경쟁에서 끝없이 좀비 프로젝트만 확산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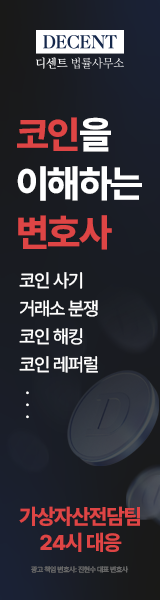








 5
5











![[기획연재⑤] 2026 크립토 시장 대전망: 금융의 온체인화, RWA](https://f1.tokenpost.kr/2026/01/m51rmjzja2.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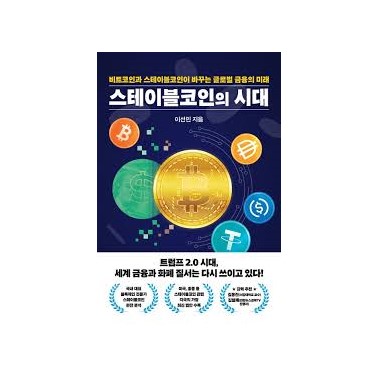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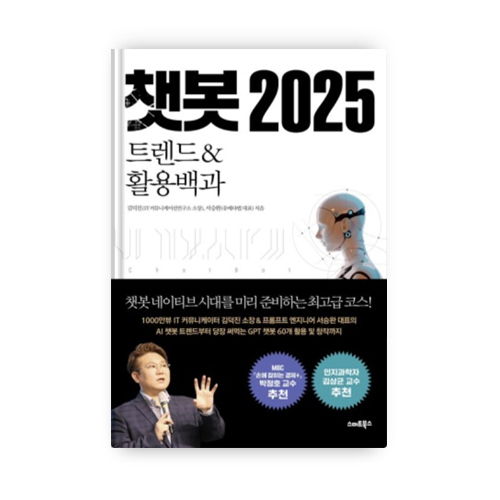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08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gw1dm61ji8.pn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07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xrxh0prwmk.jpe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06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6vamcvu8s9.jpe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05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b50rzae1cm.jpg)
![[오늘의 주목 코인] 체인바운티(BOUNTY), 탐욕지수 99 기록…거래대금 급증](https://f1.tokenpost.kr/2026/01/s76zhnfihw.png)
![[코인 동향분석] 멘틀·비트코인 캐시 매수 비중 상위… 멀린 체인(MERL) RSI 2.09%](https://f1.tokenpost.kr/2025/07/7j8sdx0u9x.jpg)
![[리서치 브리핑] 웹3 '실행의 시대' 개막…수익성·신원·인프라 혁신이 생존 가른다](https://f1.tokenpost.kr/2025/07/4ctp2ze15q.jpg)

![[사장분석] 운명의 금요일: 미 대법원 관세 판결 임박, 시나리오별 시장 대응 전략](https://f1.tokenpost.kr/2026/01/lqqni70v8n.webp)

![[토큰분석] 비트코인 ‘진바닥’의 신호… 90%가 손실 중일 때 벌어지는 일](https://f1.tokenpost.kr/2025/10/9kwnsvr28u.jpg)
![[기획연재②] 2026 크립토 시장 대전망: 비트코인, 사이클을 넘어선 자산](https://f1.tokenpost.kr/2026/01/2ye3a96t8f.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