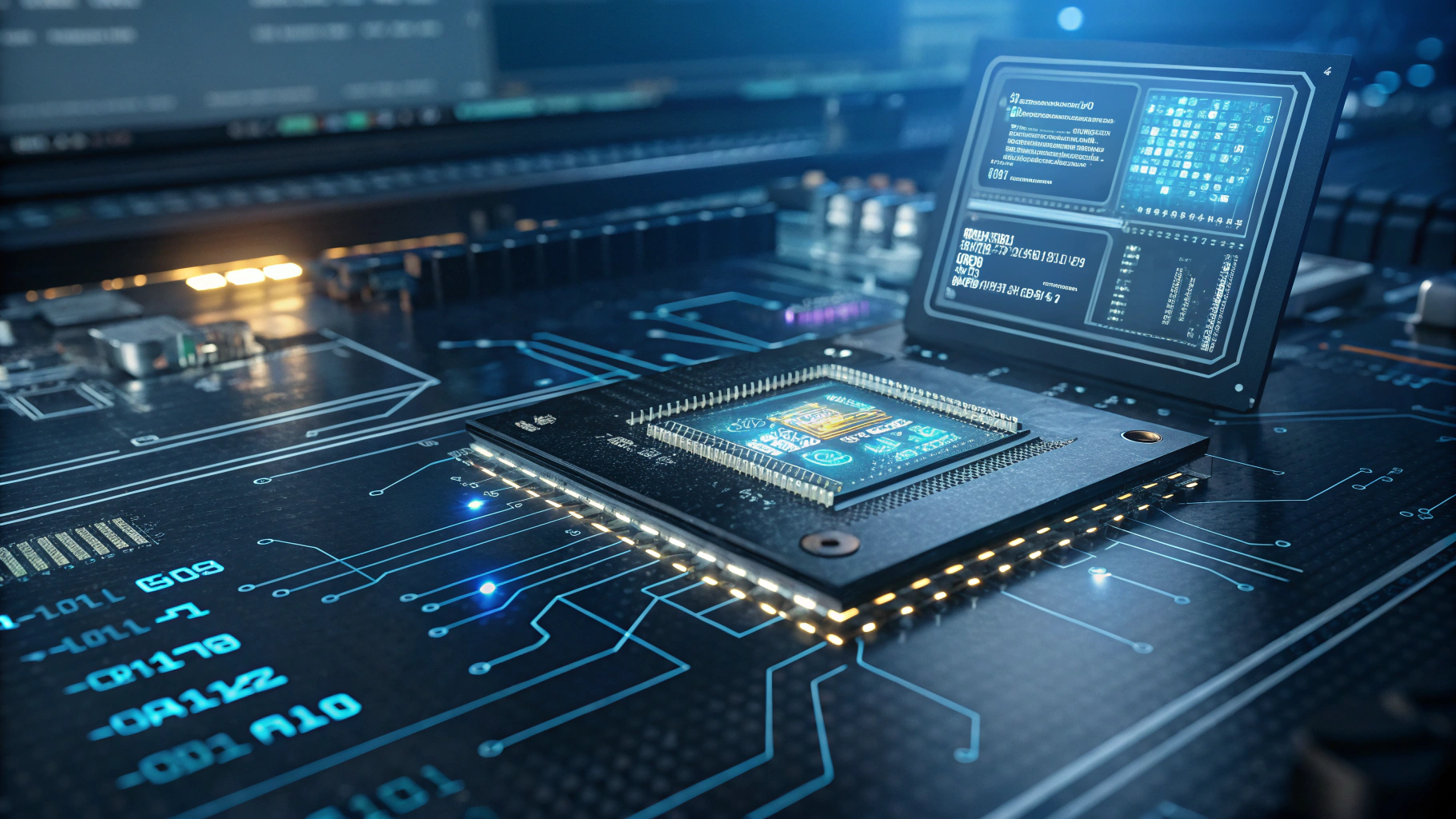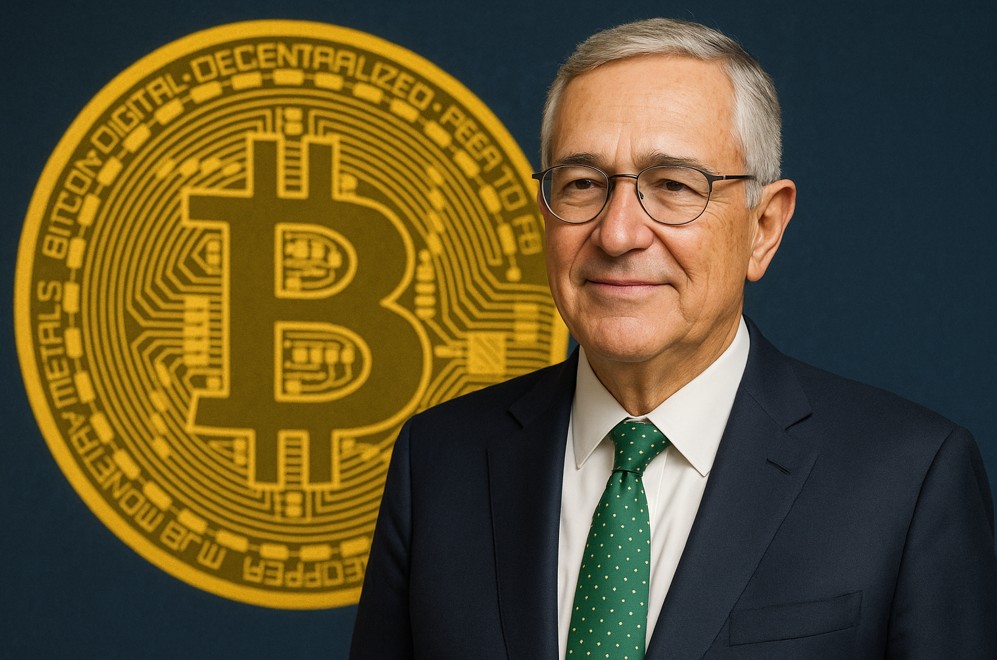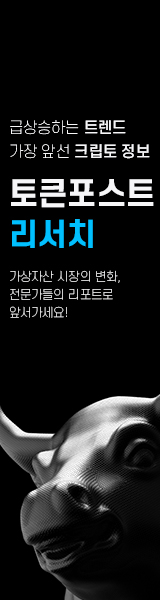기업들이 지난 10년간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인프라에 수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경영진이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믿을 만한 통찰을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은 여전하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제품 관점’의 부재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데이터가 넘쳐나지만, 동일한 지표를 두고 부서마다 다른 수치를 제시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논리에 기반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데이터 신뢰’의 문제로,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제품적 실패다. 데이터가 정확히 수집되고 처리되어도, 최종 사용자에게 이해 가능하고 뜻이 통하는 정보로 전달되지 않으면 조직 전체가 의사결정을 미루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위험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역할로 ‘데이터 제품 관리자(DPM)’가 부상하고 있다. 이들은 데이터셋을 구축하거나 대시보드를 제공하는 기술자들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설계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단순히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고, 실제 업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한다.
데이터 제품 관리자는 사용자를 관찰하고, 데이터가 실제로 쓰이는 맥락을 이해하고, 중요한 핵심 지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또한 각 팀이 동일한 용어와 정의 아래 일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메트릭을 API처럼 관리하며, 조직 전체가 일관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는 데이터를 팀별로 제각각 해석하던 문제를 겪고 나서야 메트릭 플랫폼을 공식화하고, 이를 제품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동일한 ‘활성 사용자’ 지표조차 각 팀마다 조건이 달랐던 과거의 혼란은, 공통 메트릭을 관리하는 DPM의 출현 후 해소되었다.
이처럼 데이터 제품 관리자는 단순한 분석이 아닌 ‘디지털 의사결정 인터페이스’의 설계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이 없다면, 실무자들은 여전히 모순된 대시보드 속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의심하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또한 DPM의 역할은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포레스터에 따르면 AI 프로젝트의 80%는 여전히 데이터 준비 단계에 비용과 시간이 집중된다. 데이터의 품질과 문맥이 설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AI를 도입하면, 그 결과물 역시 신뢰할 수 없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유럽의 AI법이나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은 내부 데이터 시스템을 ‘제품’처럼 관리해야 할 의무가 명확해지고 있다.
결국, 데이터를 통해 전략적인 판단을 내리기를 원하는 조직이라면, 더 많은 대시보드가 아닌, 통찰력 있는 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제품 관리자가 절실하다. 예산 편성과 신제품 출시 등 비즈니스의 중대사항이 ‘데이터 기반 결정’에 좌우되는 시대, 그 데이터의 맥락과 신뢰성을 담당하는 이들이야말로 조직의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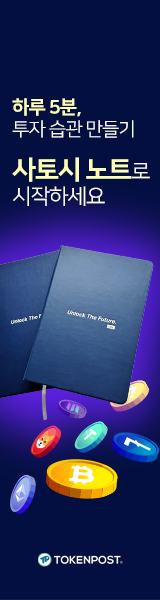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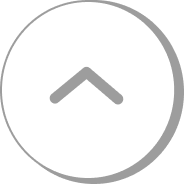



 1
1



![[분석] “이젠 주식도 온체인 시대” 로빈후드, 증권의 경계를 허물다](https://f1.tokenpost.kr/2025/07/879dcisiy5.jpg)




![[김프 리포트] 해외-국내 차익 거래 기회 급증…CTC·H·VIRTUAL 상위 포트폴리오 분석](https://f1.tokenpost.kr/2025/07/9f39qv4q7c.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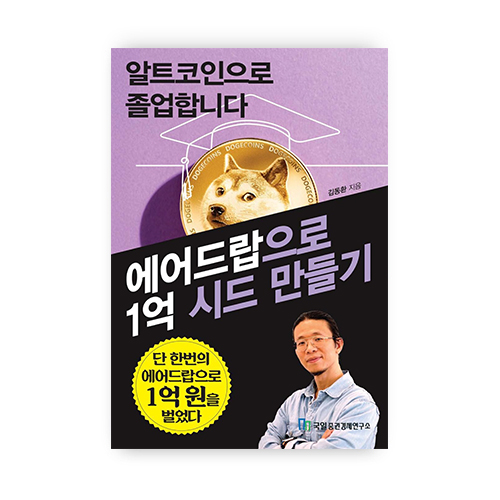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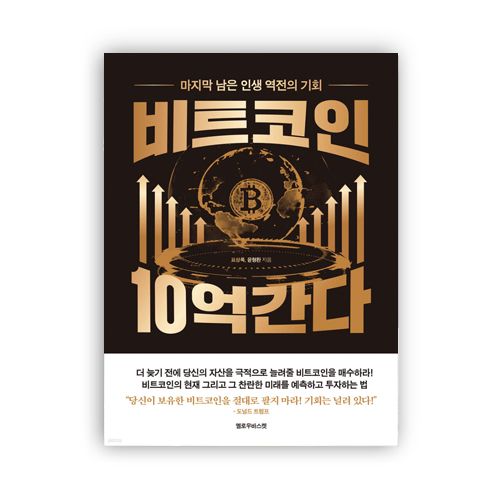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366회차](https://f1.tokenpost.kr/2025/07/9omc0gwnag.pn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365회차](https://f1.tokenpost.kr/2025/07/379dvx2hr1.pn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364회차](https://f1.tokenpost.kr/2025/07/pprq3mndp6.pn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363회차](https://f1.tokenpost.kr/2025/07/ibl5phlavp.png)



![[김프 리포트] 프리미엄 78%까지! 암호화폐 차익거래 기회 TOP 5 분석](https://f1.tokenpost.kr/2025/07/jhmjti55z2.jpg)

![[분석] 14년간 잠든 비트코인 8.6조 원어치 이동… 매도는 아니지만 시장은 긴장](https://f1.tokenpost.kr/2025/07/tn9nqhow5b.webp)


![[코인 갱신 일지] HOSICO·IKUN 신고점 경신, Vyvo·MGO 등 신저점](https://f1.tokenpost.kr/2025/04/wrox1kv02c.jpg)
![[주간 팟캐스트] 기술을 넘어서 실사용으로… 웹3, 이제는 ‘증명의 시대’](https://f1.tokenpost.kr/2025/07/3j14h8zere.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