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일단 우린 스테이블 코인들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세대별 스테이블 코인으로 나누자고 한다면...
1세대 스테이블 코인
: 입금한 만큼 발행. 법정화폐 1달러를 해당 계좌에 보내면 그만큼 테더를 발행해줌.(USDT, USDC 등) 1:1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USDT의 가치는 1USD가치를 유지할 수 있음.
2세대 스테이블 코인
: 담보시킨만큼 발행. 메이커에 플랫폼에 담보로 지원하는 자산을 입금하면, 해당 자산의 일부 가치만큼 DAI로 대출 받을수 있음. 이 DAI의 가치는 오라클을 통해 외부에서 정보를 받아와 1USD 가치를 유지함.
3세대 스테이블 코인
: AMPL, 중앙 허가제와 오라클서비스에 의존하는 1,2세대 스테이블과는 다르게 자체적으로 1달러를 유지.
이제 여기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한다. 4세대라고 칭해야하냐고? 아니, 3세대에서 진화한 코인이다. 3.5세대라고 보면 될 것.
3세대 스테이블 코인의 문제점은 하나다. 바로 AMPL에 따른 반사성 문제인데, 이 반사성 문제가 무엇이냐고 하냐면...
1달러 이상에서 이론적으로는 시장의 주체들이 토큰을 팔아야하는데, 시장분위기에 따라 안판다는것. 가격상승 + 토큰물량 추가 둘다 이득을 볼수 있기 때문인데. 반대 예시로는 1달러 이하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시장주체들이 토큰을 덜팔아야하는데... 1달러 이하에서 토큰 물량이 점차 줄어듦을 알고 더 많이 팜. 즉, 시장 분위기에 큰 영향을 받는 단점이 있음. 이는 스테이블 코인의 설립과 반대되는 판단.
그리고 이제 이걸 해결하고자 Bond라는 시스템을 들여오는데 이게 3.5세대. 그리고 알고리즘 스테이블. BASIS, ESD, MIC, KAI라는 코인들이 있음.
Bond의 메커니즘은 간단함.
-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가격이 정해진 범위의 가치 이상/이하가 되면, 유통물량을 조정하여 1달러로 맞추는건 동일한데. 3.5세대 스테이블은 스테이블코인의 가격안정을 도와줄 하나의 부채풀이 더 생겼다고 이해하면 비슷함.
- 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 이하가 되면, 부채풀에 스테이블 코인을 프리미엄 가격으로 넣어놓고, 나중에 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 이상이 되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시 전환하는 시스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종류
1. Ampleforth
최초로 이 시스템을 들여왔다 해도 무방한 코인
최초 리베이스 모델을 적용한 프로젝트, 타겟가격(주로 $1)로 토큰 수량 조절
2. BASE
: 리베이스의 변형 모델
3. BASIS
: 스테이블($1)을 지향하는 Basis 토큰에, 본드토큰과 쉐어토큰 (Share token) 개념 도입하여 3가지 토큰 운용
4. KAI
: 3번과 마찬가지로 스테이블을 지향하는 KAI 토큰에 sKAI 토큰과 vKAI 토큰을 도입하여 3가지 토큰을 운용, 최근 합성자산 서비스도 운용, Terra나 비욘드 파이낸스와 같음.
내용 정리가 잘 안되네요. 공부하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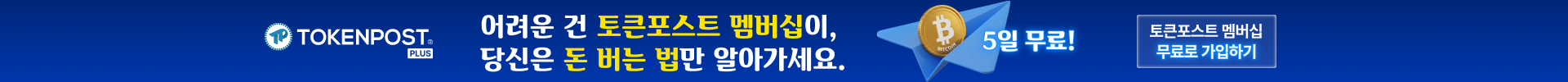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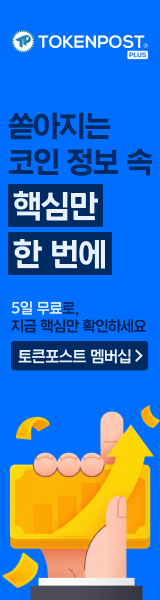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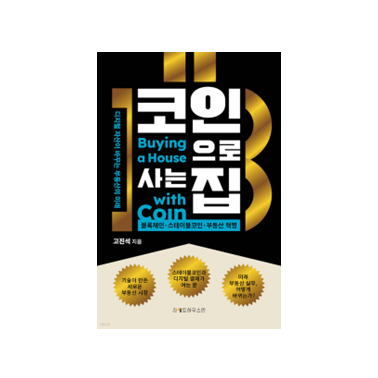










2021.11.05 16:2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