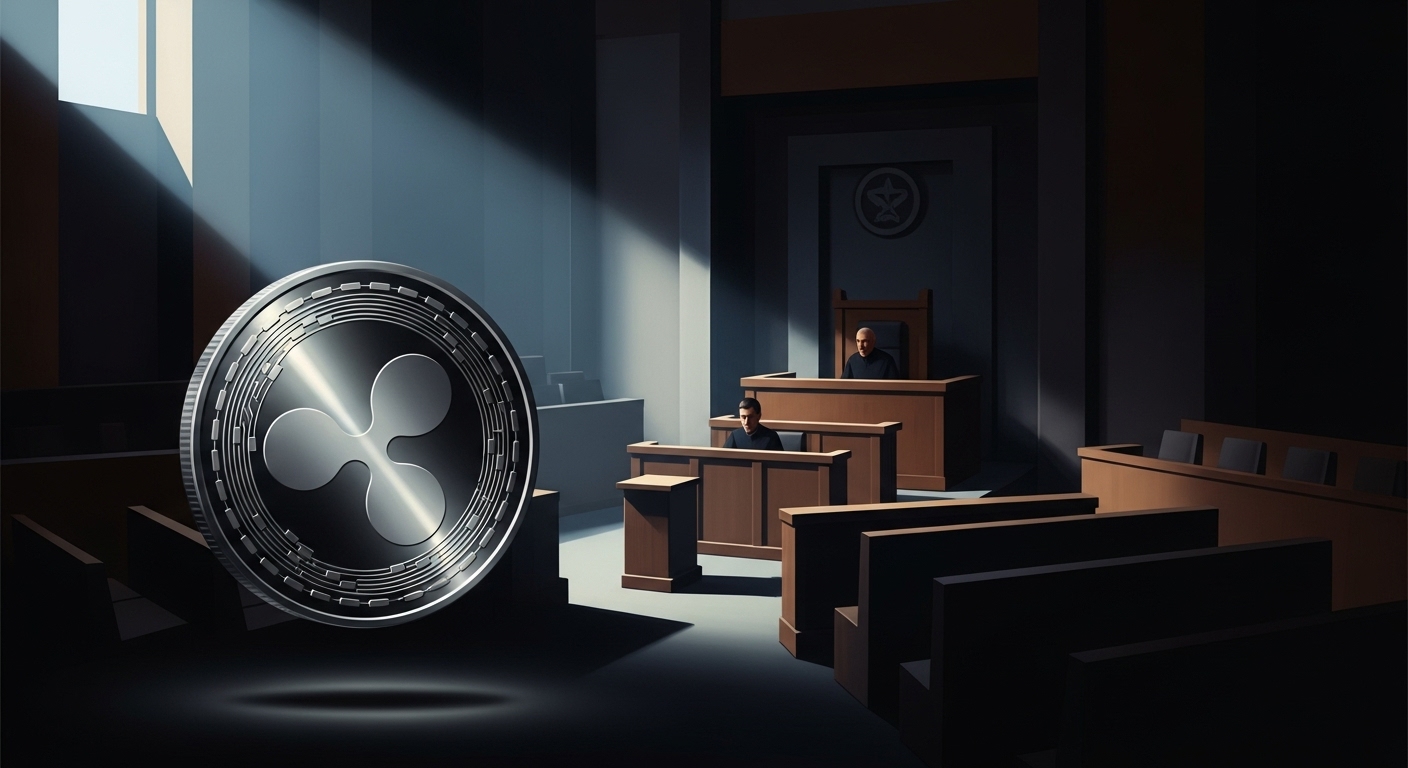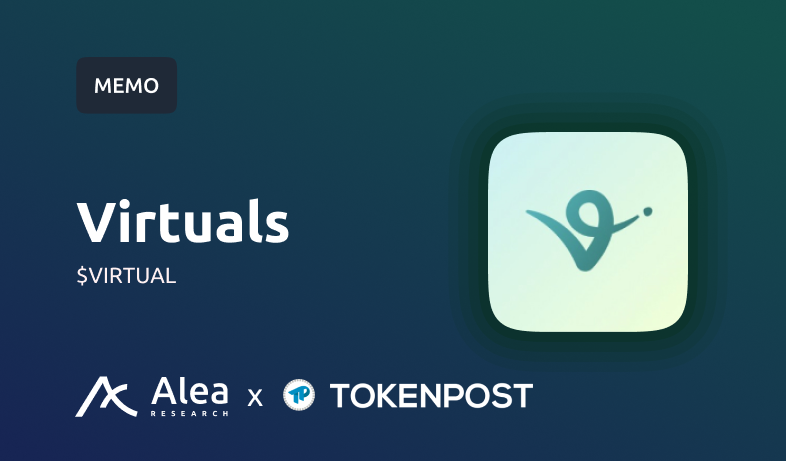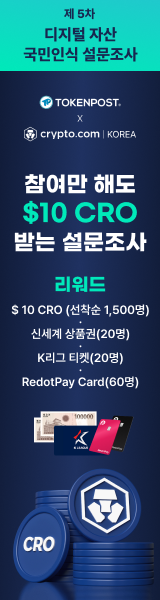뉴욕의 가을은 뜨거웠다. 월가 인근에서는 블록체인과 금융 혁신을 주제로 한 각종 행사가 이어졌고, 연준이 주최한 ‘Payments Innovation Conference’에는 중앙은행과 민간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를 이야기했다. 겉으로는 혁신의 언어였지만, 실상은 통제와 제도 편입의 논리였다.
비트코인은 원래 금융 권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탄생했다. 중앙은행의 개입 없이 개인이 직접 거래하는 시스템이 그 핵심이었다. 그러나 뉴욕에서 본 현실은 달랐다. 이제 비트코인은 혁명적 기술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새로운 상품으로 취급되고 있다. ETF로 자금이 몰리자 월가의 자본은 비트코인을 관리 가능한 자산으로 포장했고, 연준은 결제 혁신의 이름으로 중앙화된 구조를 다시 짜고 있다. 비트코인의 자유는 제도화의 틀 속에서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 흐름이 미국 안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월가가 정한 규칙은 곧 글로벌 표준이 되고, 연준이 만든 틀은 각국의 정책 기준이 된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국내 거래 규모는 세계 상위권이지만, 규제는 여전히 ‘따라가기식’에 머물러 있다. 미국이 ETF를 열면 도입을 검토하고, 연준이 결제 규정을 바꾸면 그 틀을 참고한다. 이런 구조로는 한국이 스스로의 시장 질서를 만들 수 없다.
한국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 대상이나 새로운 금융상품으로만 취급한다면, 그 주도권은 영원히 외국의 손에 머물 것이다. 한국은 ‘규제의 수입국’이 아니라 ‘정책의 설계국’이 되어야 한다. 단속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 탈중앙 신원(DID) 인증, 국가 단위의 블록체인 감사 체계 같은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기술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문제다.
또한 금융당국은 ‘기관 중심 제도화’가 아니라 ‘생태계 중심 제도화’로 전환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시장을 독점하면 혁신은 사라진다. 국내 개발자와 스타트업이 자율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넓히고, 민간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비트코인의 정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제도권의 신뢰를 얻는 길이다.
뉴욕 출장에서 확인한 건 분명하다. 비트코인의 다음 싸움은 기술이 아니라 설계의 싸움이다. 누가 네트워크의 규칙을 정하고, 누가 그 질서를 주도할 것인가의 문제다. 월가와 연준이 그 틀을 만들어가는 지금,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델로 응답하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자유의 화폐다. 그러나 그 자유를 지키는 일은 더 이상 기술자의 몫만이 아니다. 이제는 국가의 전략과 사회의 철학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뉴욕이 질문을 던졌다. 한국은 이제 답해야 한다.

















 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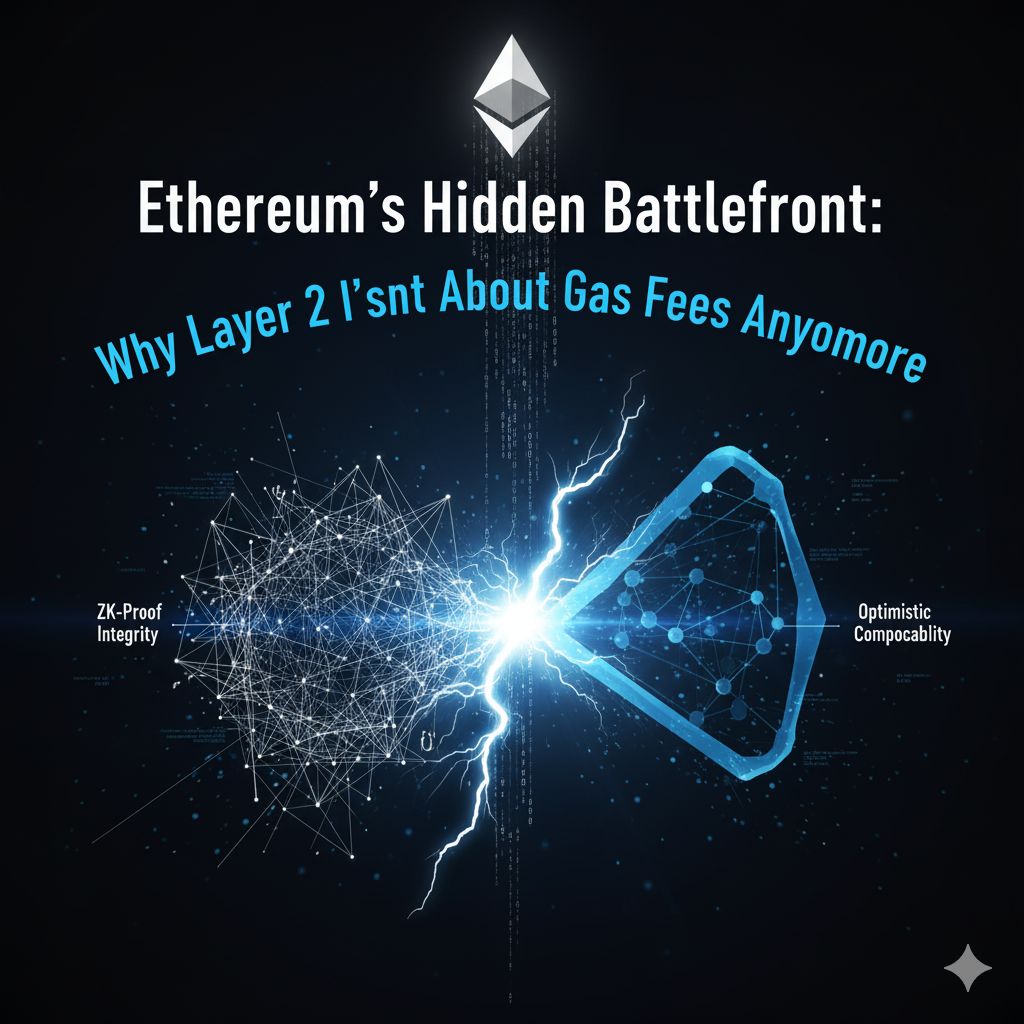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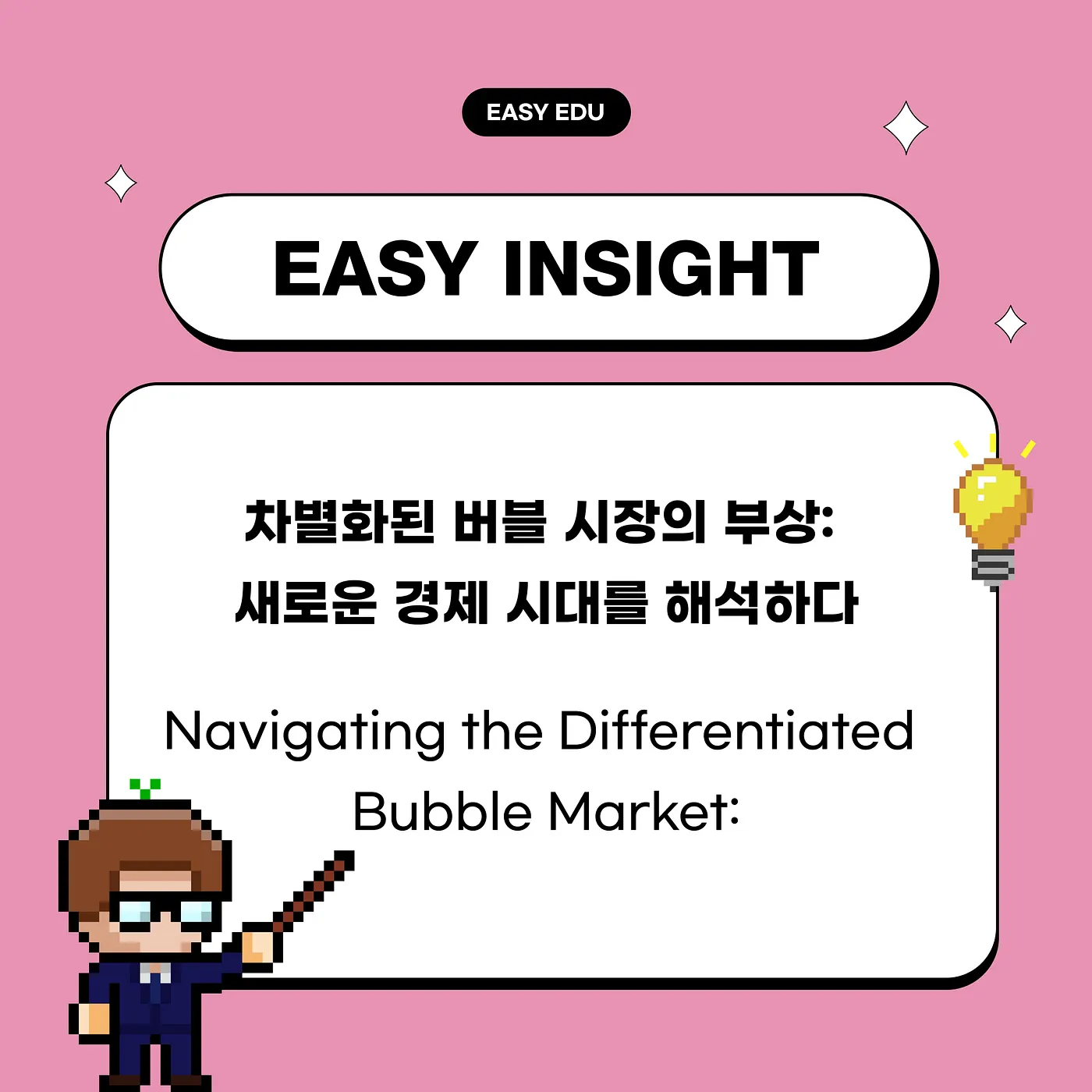

![[토큰포스트 북클럽] '코인으로 사는 집' 저자 고진석 텐스페이스 대표 인터뷰](https://f1.tokenpost.kr/2025/10/wza2btty1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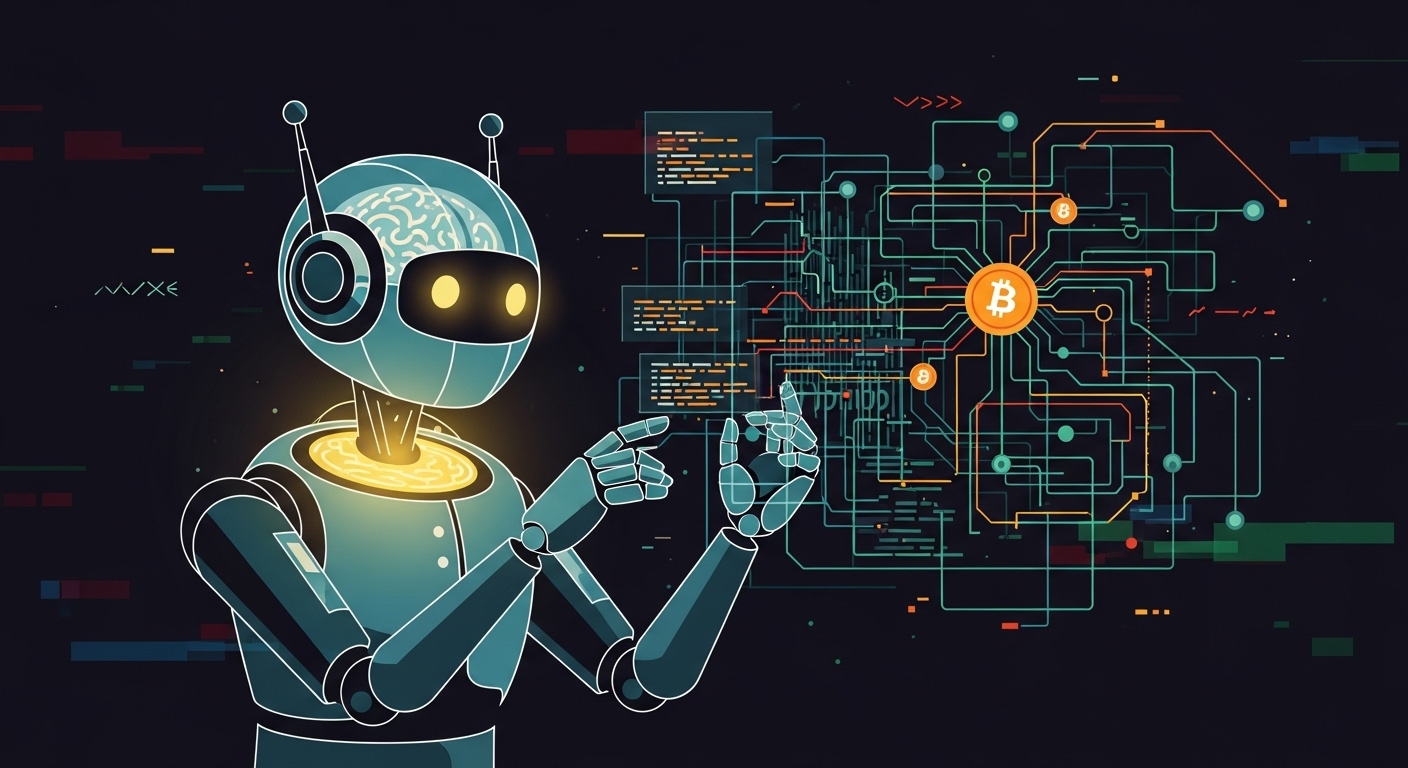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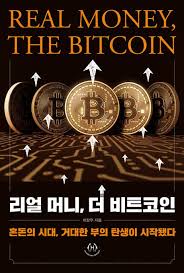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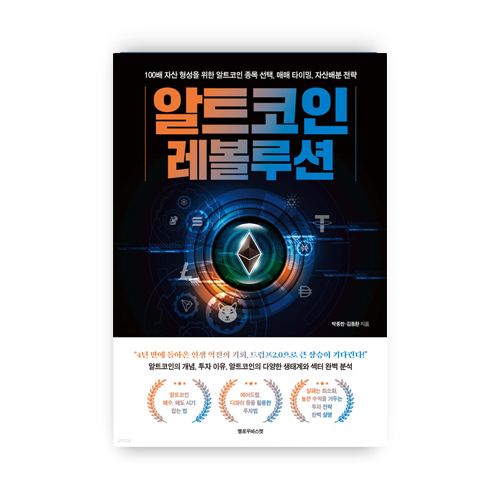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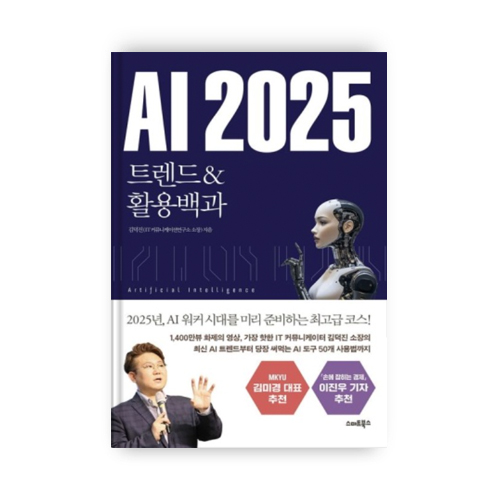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457회차](https://f1.tokenpost.kr/2025/10/be9glv267n.webp)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456회차](https://f1.tokenpost.kr/2025/10/oqg1yonszx.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455회차](https://f1.tokenpost.kr/2025/10/63l5tsjcw2.pn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454회차](https://f1.tokenpost.kr/2025/10/pjrj7npay9.jpg)
![[사설] 미국 연준이 금융의 미래를 그렸다 — 이제 한국이 깨어날 때다](https://f1.tokenpost.kr/2025/10/u0h6mxk0wx.png)
![[사설] 'AI 강대국 도약'의 샴페인, 가려진 1조 달러의 그림자](https://f1.tokenpost.kr/2025/10/vwn5tros3m.png)
![[사설] DAT 버블의 종말? 아니, 'DAT 2.0'가 시작됐다](https://f1.tokenpost.kr/2025/10/tgl0tc0cu3.png)
![[사설] 바이낸스의 귀환, 한국이 마주한 두 개의 시계](https://f1.tokenpost.kr/2025/10/9yp4t08jsv.png)
![[사설] 청산은 없지만 자금은 빠져나간다 — 암호화폐 시장의 ‘한국형 위험’](https://f1.tokenpost.kr/2025/10/pdzeup0ljj.png)
![[사설] 중앙은행 없는 암호화폐 시장, 누가 시스템을 지킬 것인가](https://f1.tokenpost.kr/2025/10/wtjwkp9fsm.jpg)
![[사설] 블랙스완이 덮친 코인 시장… 레버리지의 탐욕이 초래한 자멸](https://f1.tokenpost.kr/2025/10/v6fy42ovpq.jpg)
![[사설] 스테이블코인 전쟁, 달러는 진화하고 위안은 갇혔다](https://f1.tokenpost.kr/2025/10/p2mi5t1fvt.jpg)
![[사설] 리테일은 잠들었고, 자본은 깨어났다](https://f1.tokenpost.kr/2025/10/xjndtw2dy2.jpg)

![[스테이킹 위클리] 일주일 새 신규 예치 70%↑…출금 급증으로 순유출 마감](https://f1.tokenpost.kr/2025/09/o7yp4mtd6k.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