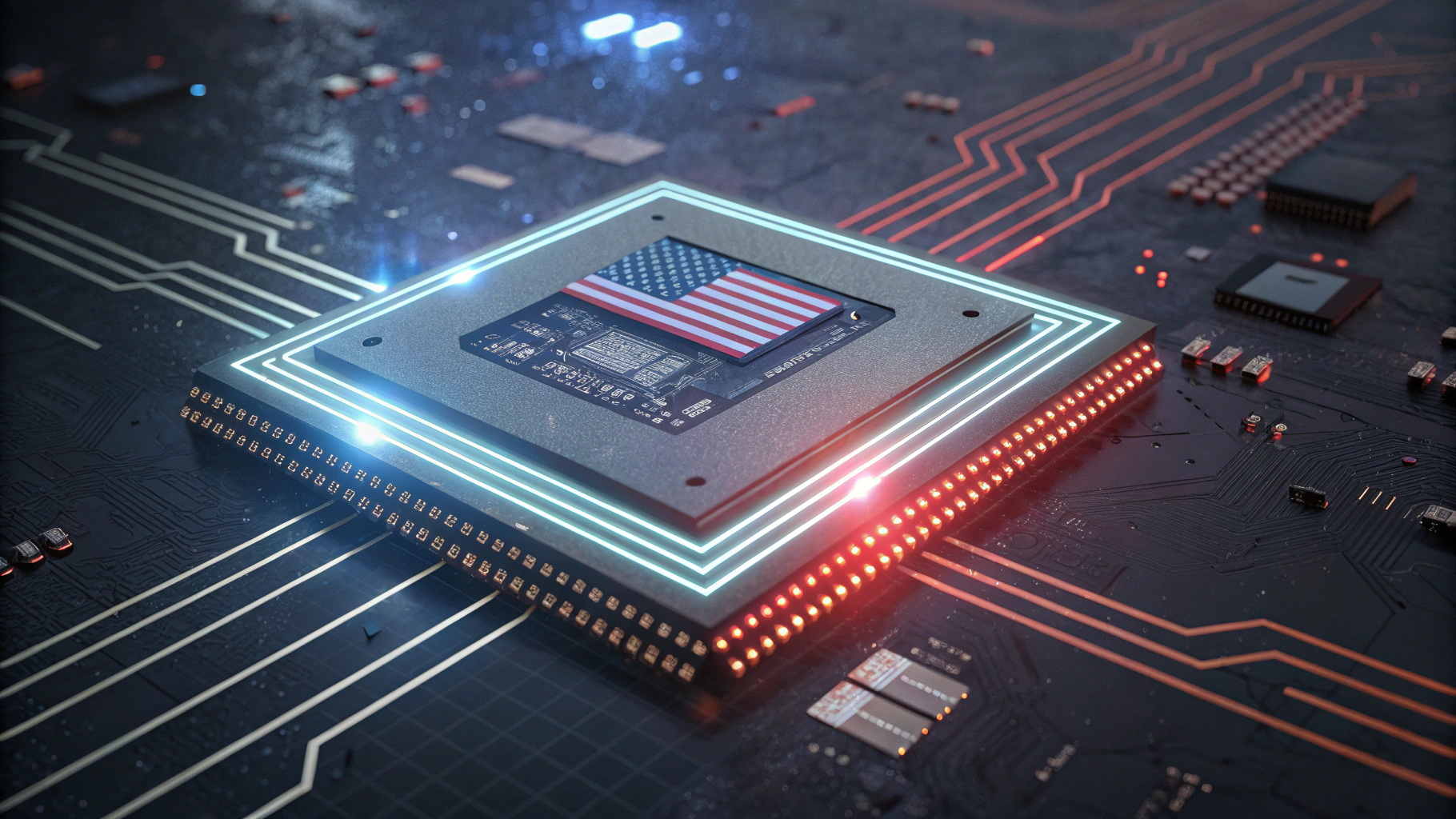원화 약세는 왜 반복되는가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근접하며 외환시장이 다시 긴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과거와는 달리, 미국 달러 인덱스(DXY)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원화는 나홀로 약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일부 신흥국 통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원화만 유독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은 단순한 시장 반응을 넘어, 구조적인 리스크가 작동 중이라는 신호로 읽힌다.
글로벌 지표와 분리된 원화
달러 인덱스는 최근 97선으로 떨어졌으며, 이는 2021년 이후 최저 수준에 가깝다. 달러가 글로벌 시장에서 약세를 보일 경우, 상대 통화가 강세로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원화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물론 달러 인덱스는 원화를 직접 포함하지 않고, 유로·엔 등 주요 통화를 대상으로 구성된 지수다. 하지만 이런 시장 전반의 방향성과 동떨어진 원화 움직임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 경제와 통화 시스템에 대한 별도의 리스크 평가’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이탈 현상은 비단 달러만이 아니다. 원화는 과거 위안화와 높은 연동성을 보여 왔으나, 최근엔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원화는 약세 흐름을 유지하며 방향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2025년 6월 이후부터 이 괴리는 뚜렷해졌으며, 이는 한국 통화가 기존 아시아 통화군의 흐름과도 분리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원화는 단순한 신흥국 통화가 아니라, 개별적 리스크 요인에 노출된 고유의 약세 통화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 정책 신뢰의 약화
시장 신뢰를 흔드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기조다. 2025년 중앙정부 총지출은 673조 원에 달하며, 사회복지 예산만 229조 원으로 전체의 34%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확정되며, 정부의 유동성 공급은 한층 가속화됐다. 이번 정책은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며, 총 예산은 약 13조9,000억 원 규모다. 신청은 9월 22일부터 시작됐다.
이처럼 대규모 현금성 지출이 반복되면 단기 소비에는 도움이 되지만,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저하와 통화가치 하락 우려를 반영하게 된다. 특히 한국은행이 물가와의 균형을 고려해 금리 인상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유동성 확대는 원화 신뢰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자본 흐름을 바꾸는 글로벌 구조
글로벌 자본의 방향도 변하고 있다. 미국은 고율 관세와 자국 산업 보호 기조를 강화하면서 해외 자본을 자국으로 유인하고 있다. 이는 단지 무역 정책에 그치지 않고, 생산과 투자의 중심지를 미국으로 이동시키는 흐름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국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게 이는 부정적인 구조 변화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미국 시장으로 이동 중이며, 원화에는 지속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 외환시장은 단순한 단기 정책이나 이벤트보다, 정책 신뢰, 재정 지속 가능성, 시장 유인력이라는 구조적 요소를 통해 통화를 평가하고 있다. 반복되는 재정 확대와 경제 성장 둔화가 결합되면서, 원화는 단기 반등보다는 장기적 약세 흐름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현재 원화 약세는 단순히 수급의 결과가 아니다. 글로벌 지표와의 괴리, 통화 연동성의 이탈, 정책 신뢰 약화, 자본 이동의 변화까지 복합적으로 맞물리며 원화는 ‘약한 통화’로 구조화되고 있다. 일시적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시장이 보는 것은 방향보다 구조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원화의 위치는 회복이 아니라 하락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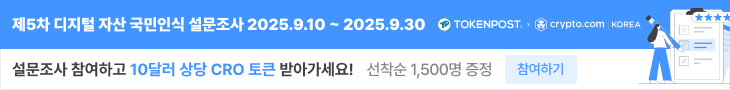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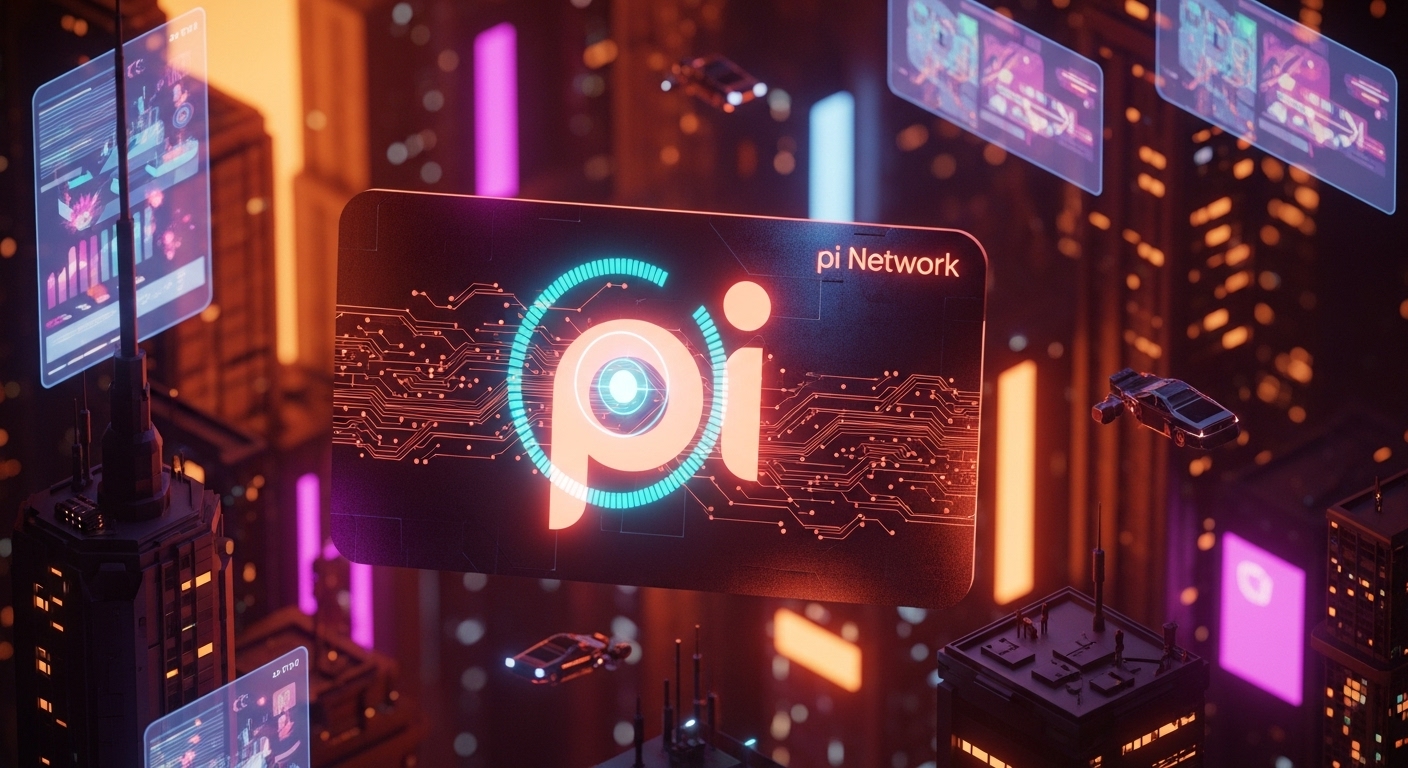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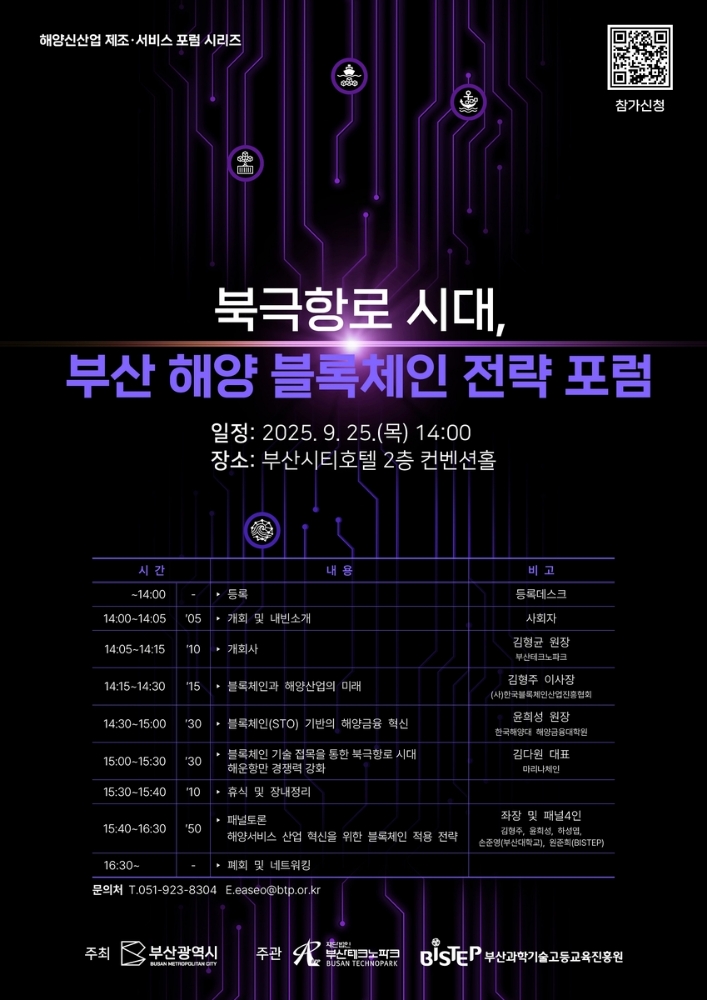




![[오후 뉴스브리핑] 비트코인·이더리움 ETF 2거래일 연속 대규모 순유입 外](https://f1.tokenpost.kr/2025/09/0cr87xzcor.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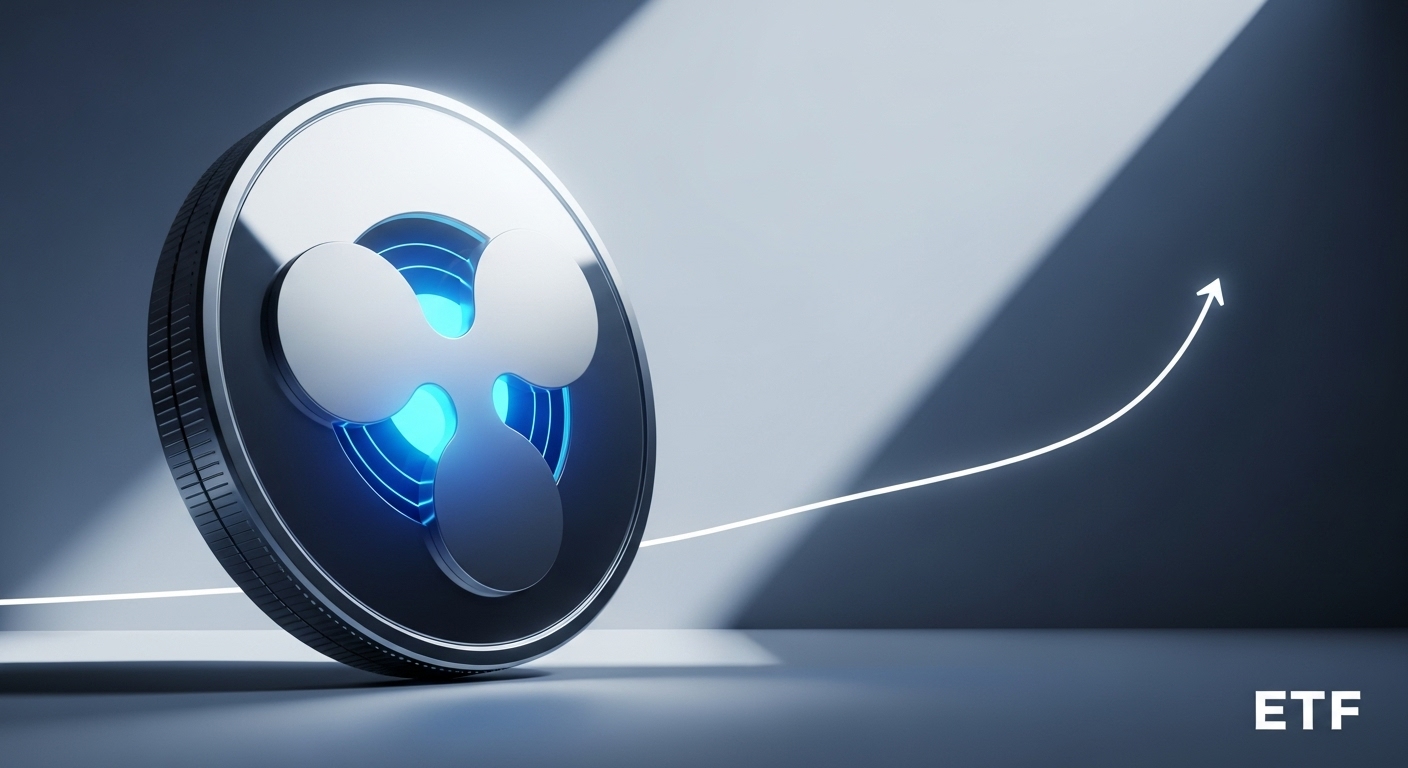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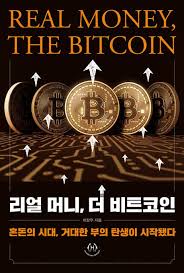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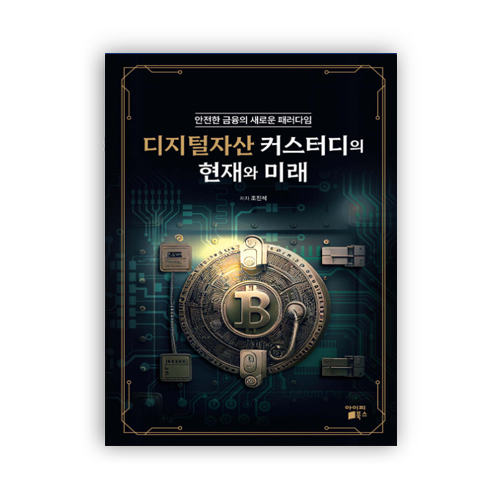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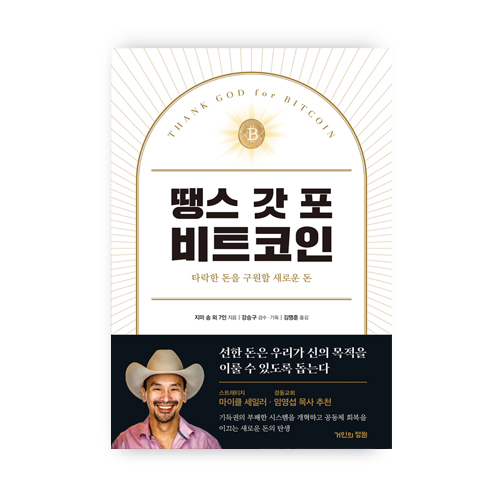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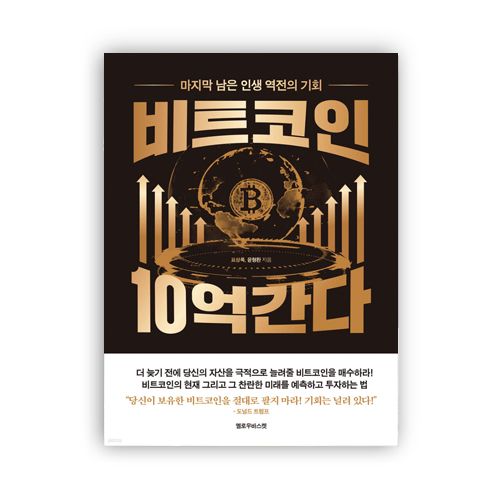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417회차](https://f1.tokenpost.kr/2025/09/hochzxmc6b.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416회](https://f1.tokenpost.kr/2025/09/gl5l6fwv25.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415회차](https://f1.tokenpost.kr/2025/09/p7psird7hb.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414회차](https://f1.tokenpost.kr/2025/09/y487pa686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