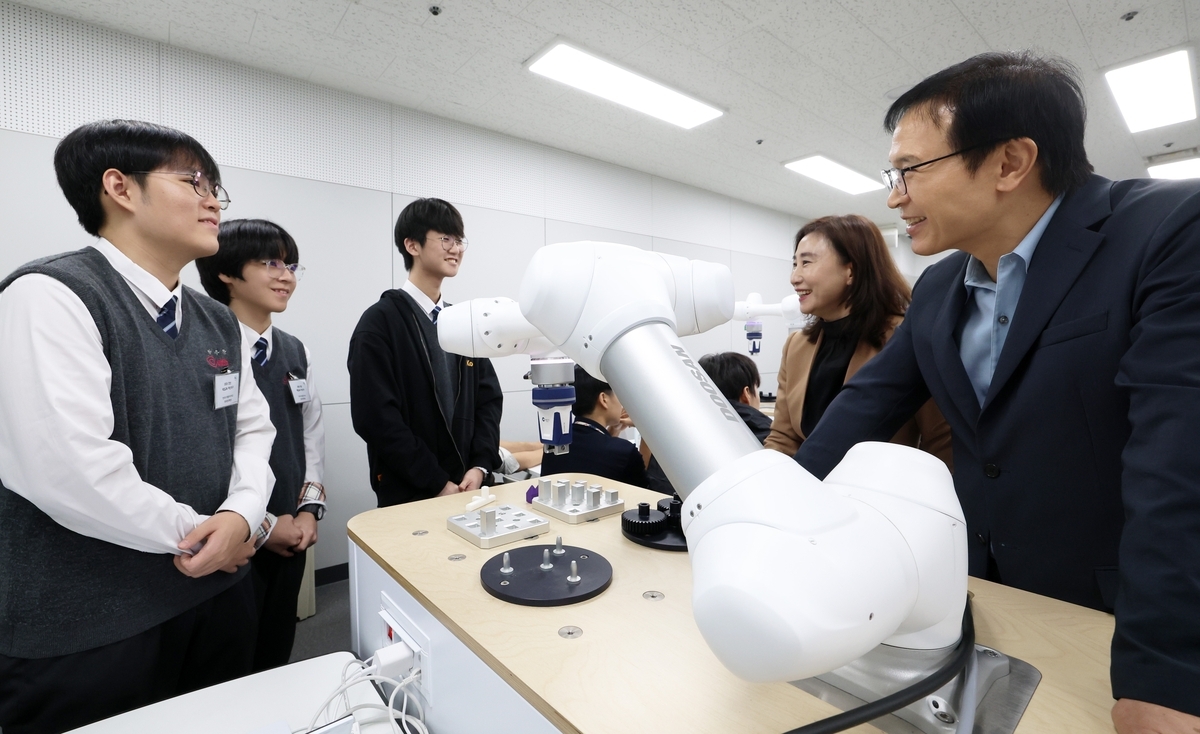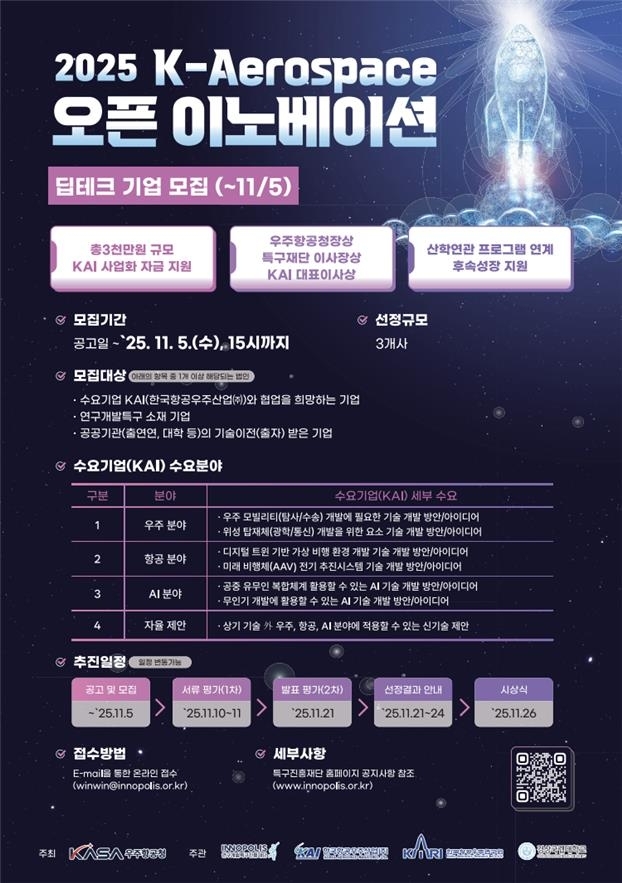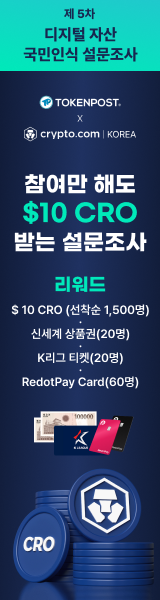네이버가 자사의 인공지능(AI) 학습에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언론단체들이 수백억 원 규모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 산업의 발전과 창작자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를 두고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번 사안의 중심에는 네이버가 개발한 초대규모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가 있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이 모델의 학습에 사용된 전체 데이터 중 뉴스 콘텐츠가 약 13.1%를 차지하며, 그 과정에서 개별 언론사의 동의 없이 뉴스가 활용됐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실제로 방송협회는 총 6억 원(지상파 3사에 각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이미 제기했으며, 향후 수백억 원대로 피해 추산액이 확장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신문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신문협회 역시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네이버를 신고하며 갈등에 불을 지폈다. 협회는 네이버가 시장 내 지배력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뉴스 데이터를 AI 개발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 기반의 검색 서비스인 '큐:'와 'AI 브리핑'을 통해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요약·재구성하여 제공하고 있음에도 사전 협의 없이 이를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AI와 저작권 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어 정책적 대응의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AI 산업과 창작자 권리 보호 사이에 균형 잡힌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대책이나 법제화 논의는 미흡한 상태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AI 개발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해 면책 요건을 일부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제시하며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요 해외 사례를 보면 유럽연합은 연구 목적의 데이터 활용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상업적 목적의 AI 데이터 활용까지 저작권법 개선을 통해 허용하고 있다. 미국 역시 ‘공정 이용’ 원칙에 따라 상업적 목적이어도 공익성이 인정되면 무단 사용을 허용한다. 이런 글로벌 흐름에 비춰볼 때, 한국 정부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AI 기술의 상업화가 가속화되는 미래에 저작권 갈등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공익과 권리 보호의 균형’이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보상 체계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산업계와 언론계 간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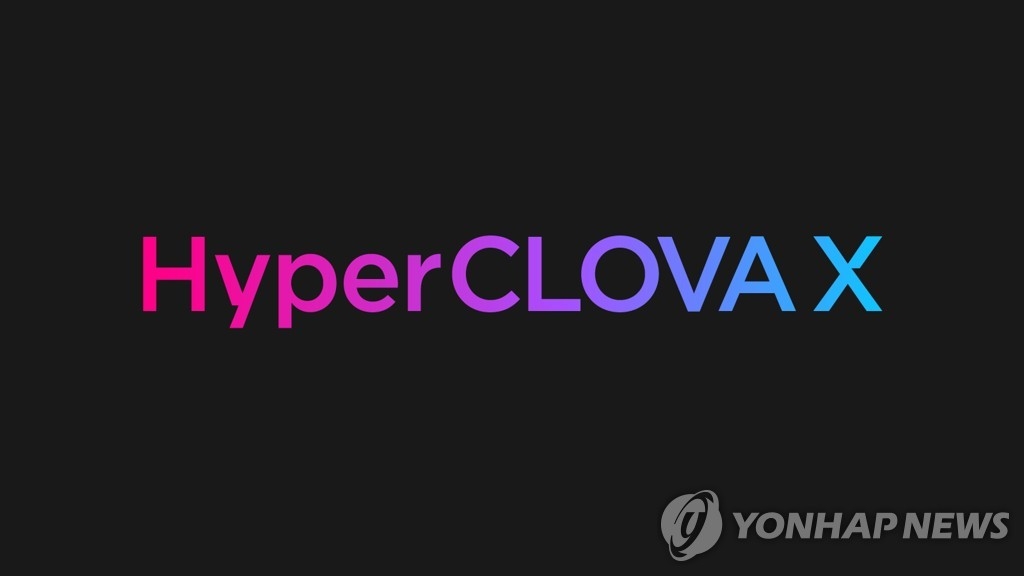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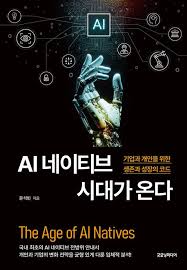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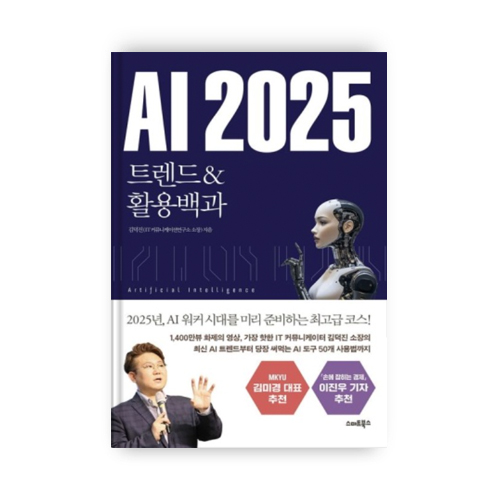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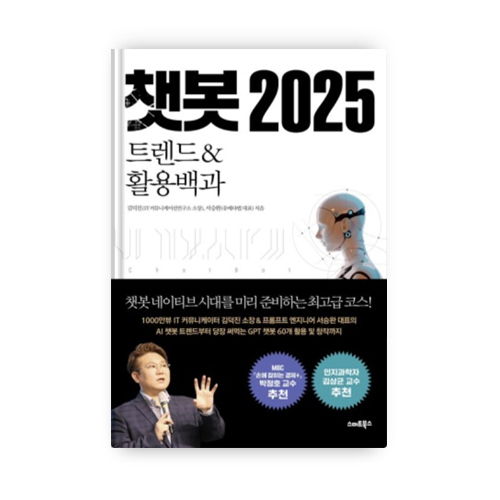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447회차](https://f1.tokenpost.kr/2025/10/vm6olup3qm.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446회차](https://f1.tokenpost.kr/2025/10/4w8ulkysr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445회차](https://f1.tokenpost.kr/2025/10/03v1zplc9h.pn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444회차](https://f1.tokenpost.kr/2025/09/15lhy5nex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