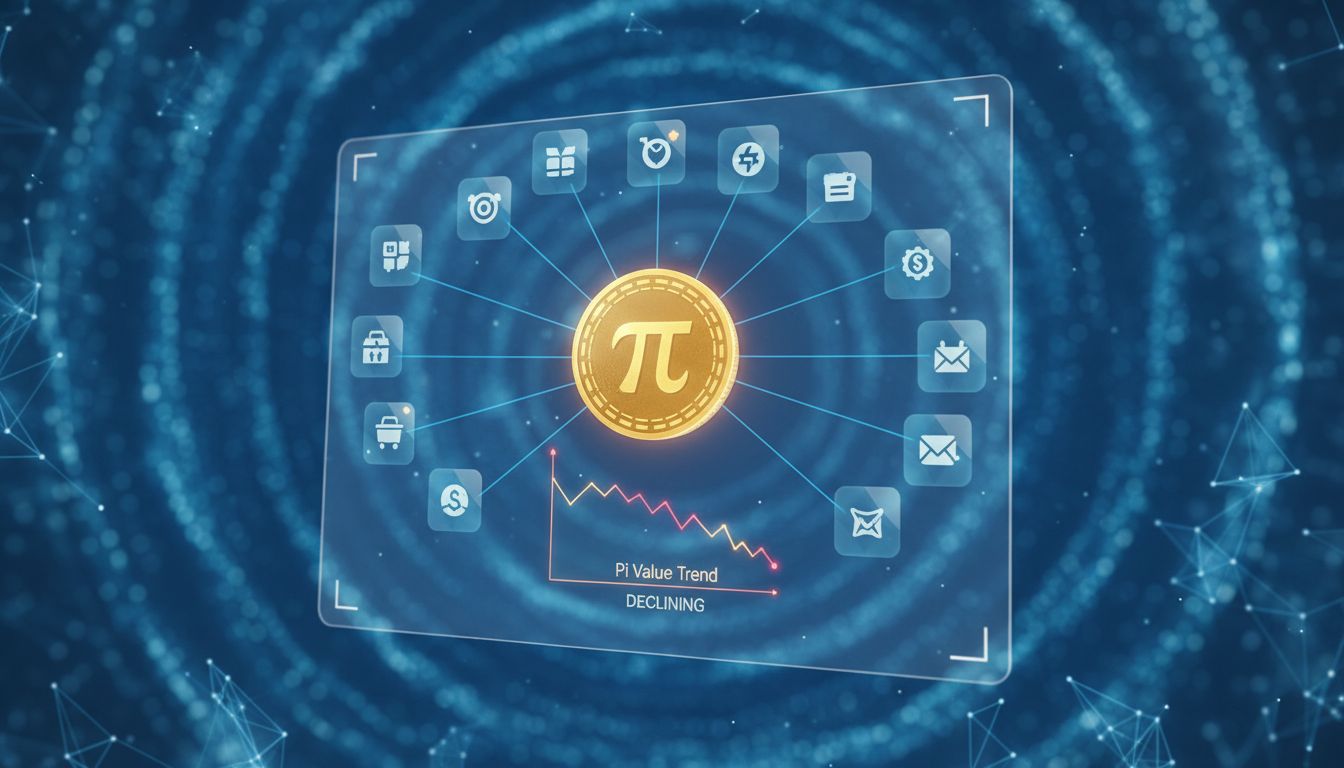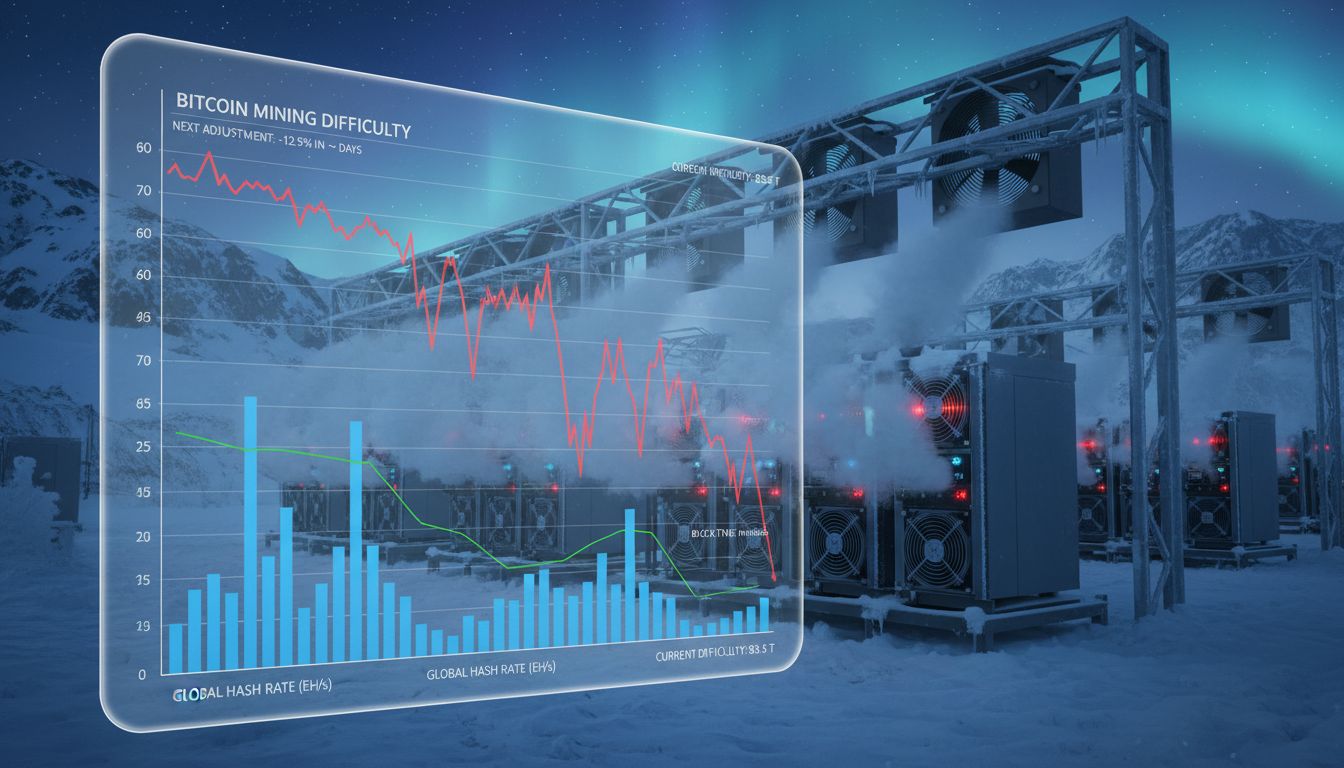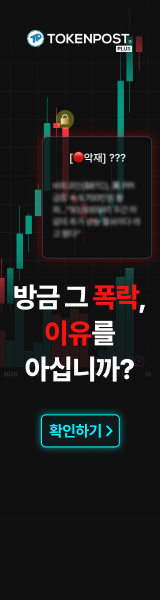최근 미국 의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논의가 또다시 표류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 친화적 기조가 예상됐던 정치 환경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를 둘러싼 전통 금융과 크립토 업계의 이해 충돌이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았다. 특히 주요 거래소와 금융기관의 입장 변화가 변수로 작용하면서, 디지털 자산 질서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이 정책 영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 간 경쟁이 더 이상 시장 내부의 문제가 아님을 시사한다.
본지는 지난 1월 4일자 사설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혁신을 가장한 통제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불과 보름 사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는 또 하나의 구조적 변화가 가시화됐다. 이번에는 규제 당국이 아니라, 월가를 중심으로 한 전통 금융이 블록체인 무대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는 ‘토큰화’다. 국내에서 논의되는 토큰 증권(STO)은 이 거대한 흐름의 일부에 불과하다. 해외에서는 국채, 회사채, 펀드 등 대규모 전통 자산을 블록체인 위로 이전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신상품 개발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 자체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에 가깝다.
이 변화를 디지털 자산의 실패로 해석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오히려 전통 금융이 블록체인을 채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해당 기술이 더 이상 주변부 실험이 아니라, 실질적 효용을 갖춘 단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진입 여부가 아니라, 누가 규칙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가치가 남는가다.
디지털 자산 업계가 지난 10여 년간 탈중앙화를 내세우며 구축해온 블록체인 인프라 위에 가장 먼저 올라탄 주체는 블랙록이나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월가의 대형 금융사들이다. 이들은 비트코인이 상징해온 저항의 철학이나 금융 주권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 퍼블릭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효율성, 투명성, 비용 절감이라는 기술적 이점만을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 토큰화는 웹3의 이상을 확장하는 도구라기보다, 전통 금융의 백엔드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허가 없는 혁신이라는 초기 정신은 희미해지고, 규제에 최적화된 채택과 기관 중심 구조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다수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 역시 개인의 금융 자율성 확대보다는 기관 투자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이 흐름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제도권 편입이 진행될수록 시장의 변동성은 줄고 규칙은 명확해진다. 고위험·고수익의 투기 국면은 약화되지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자리 잡을 가능성도 커진다. 관건은 이 변화 속에서 개인과 산업이 어떤 위치를 선택하느냐다.
독자에게 중요한 것은 탈중앙화냐 아니냐라는 이념적 구분이 아니다. 어떤 자산이 어떤 규제 체계 아래에서, 누구에 의해 운용되는지를 읽어내는 구조적 시각이다. 디지털 자산은 더 이상 주변부의 투기 대상이 아니라, 금융 질서 변화의 한 축으로 이동하고 있다.
월가의 진입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종말이 아니라 분기점이다. 이 변화를 도덕적 논쟁이나 진영 논리로만 소비한다면,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의 손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디지털 자산이 전통 금융의 전산실로만 남을지, 새로운 금융 질서의 토대가 될지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판은 이미 깔렸다.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위에서 규칙을 정하고, 누가 단순한 인프라 제공자로 남게 될 것인가다.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미래 금융의 주도권을 논할 자격도 얻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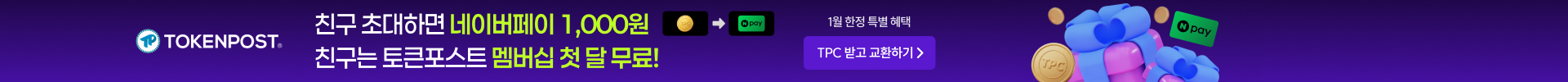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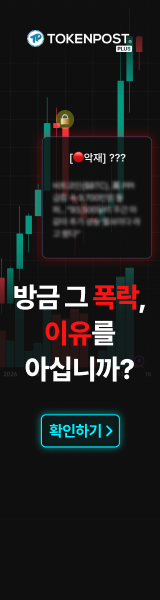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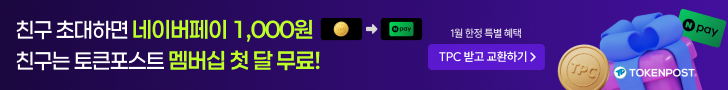








 11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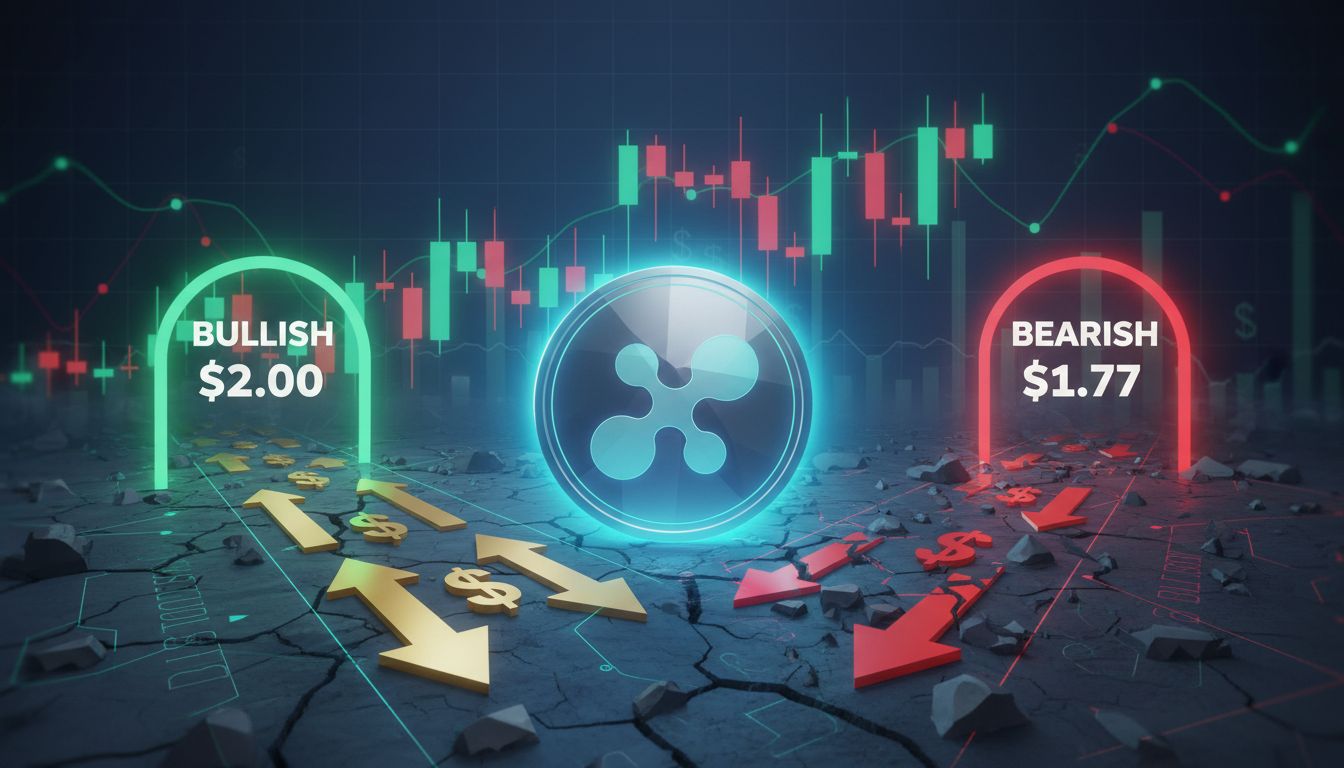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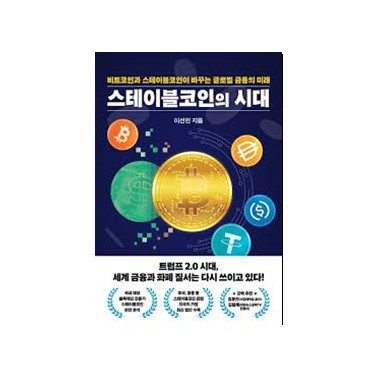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18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ex810ikkv9.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17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w4ws4u3wna.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16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kdyt9nueaz.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15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xgxcvpw0z7.png)
![[사설] 스테이블코인은 '트로이 목마'인가](https://f1.tokenpost.kr/2026/01/kuvomfslt0.png)
![[사설] 암호화폐의 ‘리눅스 모멘트’, 이념의 종말과 실용의 승리](https://f1.tokenpost.kr/2025/12/pisq8clbsl.jpg)
![[사설] 2026 스테이블코인 전쟁, ‘스마트 컨트랙트 만능주의’를 경계하라](https://f1.tokenpost.kr/2026/01/7dgrayhzp6.png)
![[사설] 크립토, '수익률' 논쟁을 넘어 '신용'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https://f1.tokenpost.kr/2026/01/b3mzwgd9he.png)
![[사설] 은행 이자 장사 보호하려 코인 혁신 가로막는 한·미 금융 당국](https://f1.tokenpost.kr/2026/01/1qjzhsu1fz.jpg)
![[사설] '은행 연합' 원화 스테이블코인... 둑 막는다고 물길 멈추나](https://f1.tokenpost.kr/2026/01/y6l8k6lvxv.jpg)
![[사설] '트럼프 쇼크' 딛고 바닥 다진 비트코인, 2026년 대세 상승장 다시 오나](https://f1.tokenpost.kr/2026/01/9glc7ppq57.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