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의 확산이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반면, 자산 격차는 오히려 확대시킬 수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이 나왔다. 이는 생산성 향상과 함께 사회 전반의 부의 분배 구조가 더욱 양극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산 불평등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IMF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영국 가계 데이터를 토대로 AI 도입이 임금과 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AI 도입이 노동을 대체해 임금을 낮추는 한편, 생산성과 자본 수익률을 높이면서 임금 불평등은 줄이되 부의 불평등은 더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기존 자동화 기술은 저소득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하며 이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줬지만, AI는 오히려 고소득 직종 종사자의 업무를 대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실제로 소득 상위 10% 노동자의 약 60%가 AI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하위 10%에서는 이 비중이 15%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AI가 고소득층의 노동 소득에 타격을 주지만, 동시에 AI를 활용한 고위험·고수익 투자 기회에 접근할 여력이 있는 고소득 가계는 자본소득이 급격히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임금 격차는 일부 해소됐지만, 전체적인 부의 격차는 확대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AI 도입은 임금 불평등 지수를 1.73포인트 낮추는 반면, 자산 불평등 지수는 7.18포인트나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노동소득의 감소폭보다 자본소득의 증가폭이 훨씬 크다는 의미로, AI가 상층 가계의 자산 증식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IMF는 이 같은 구조가 정책 당국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준다고 지적했다. 자본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자산 격차를 줄이려 할 경우, 오히려 AI 도입의 유인을 약화시켜 생산성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AI로 인한 자산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15%의 자본세를 부과할 경우, 성장 잠재력이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자동화 기술 도입 시보다 경제적 기회비용이 크다는 뜻이다.
이러한 IMF의 분석은 AI 기술을 핵심 성장축으로 삼고 있는 한국 정부에도 깊은 고민거리를 던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득 불균형보다도 자산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 지니계수는 2022년 0.324로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낮아졌으나, 순자산 기준 지니계수는 5년 연속 증가하며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은 향후 AI가 본격적으로 산업 전반에 확산되면서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AI 기술 도입과 함께 소외 받을 수 있는 계층에 대한 재배치 전략과 사회안전망 보강이 함께 추진되지 않으면, 생산성 향상과 함께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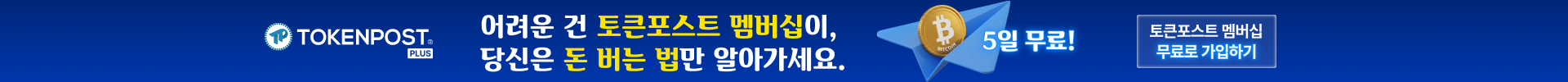


















 3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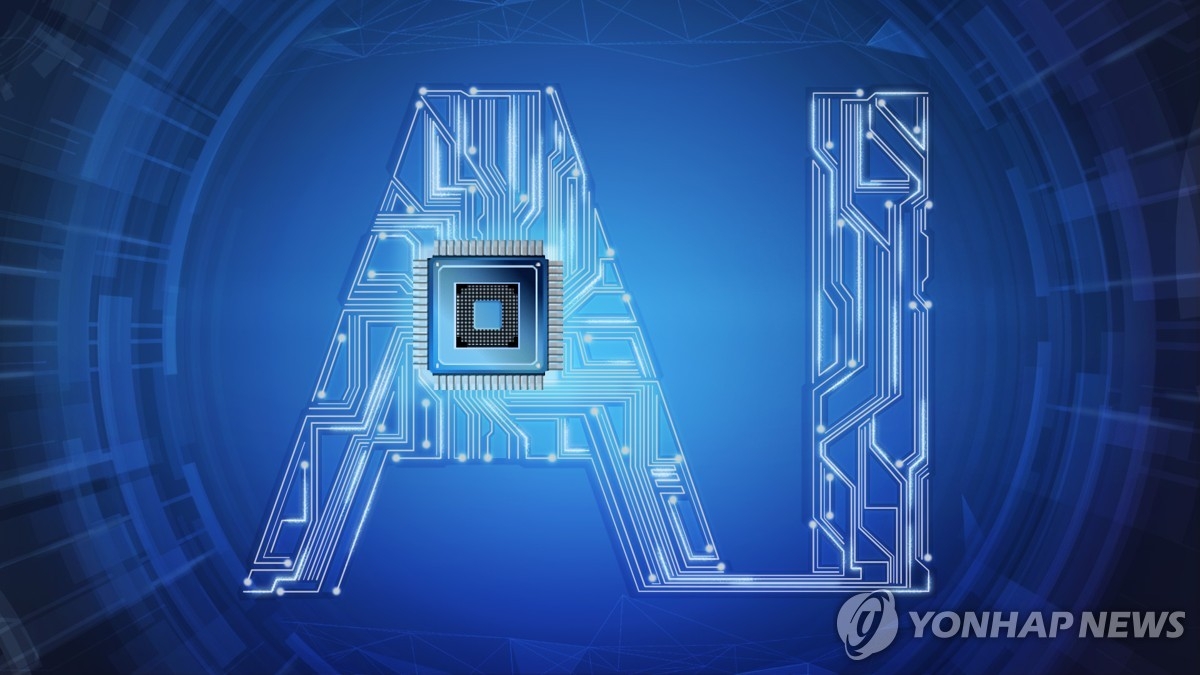


![[사장분석] 미 정부 셧다운 시한 임박… 시장은 왜 이렇게 태평한가](https://f1.tokenpost.kr/2026/02/j89t8rmwy3.jpg)
![[마켓분석] 비트코인 바닥, 가격만 보면 놓친다... 고수들이 기다리는 결정적 '변수'는?](https://f1.tokenpost.kr/2026/02/3f0krn151k.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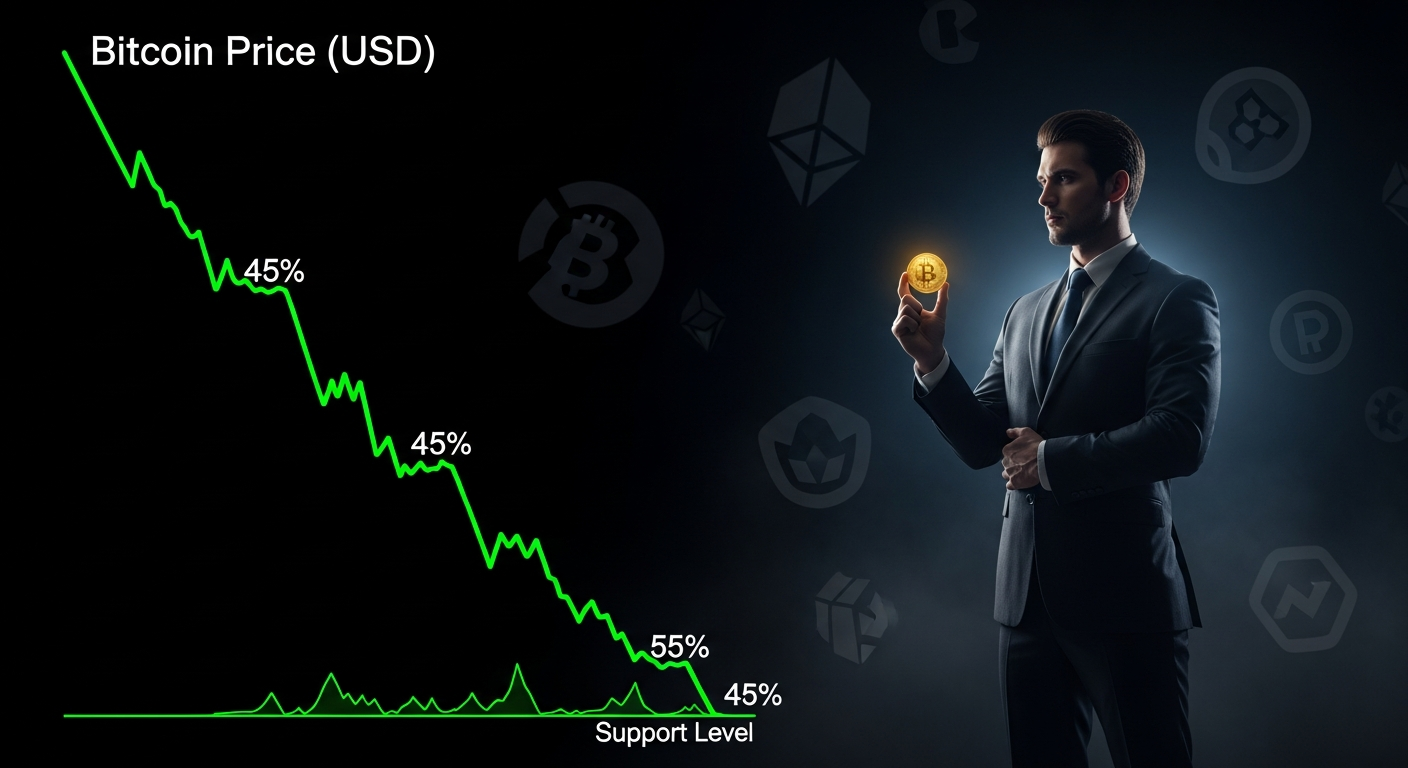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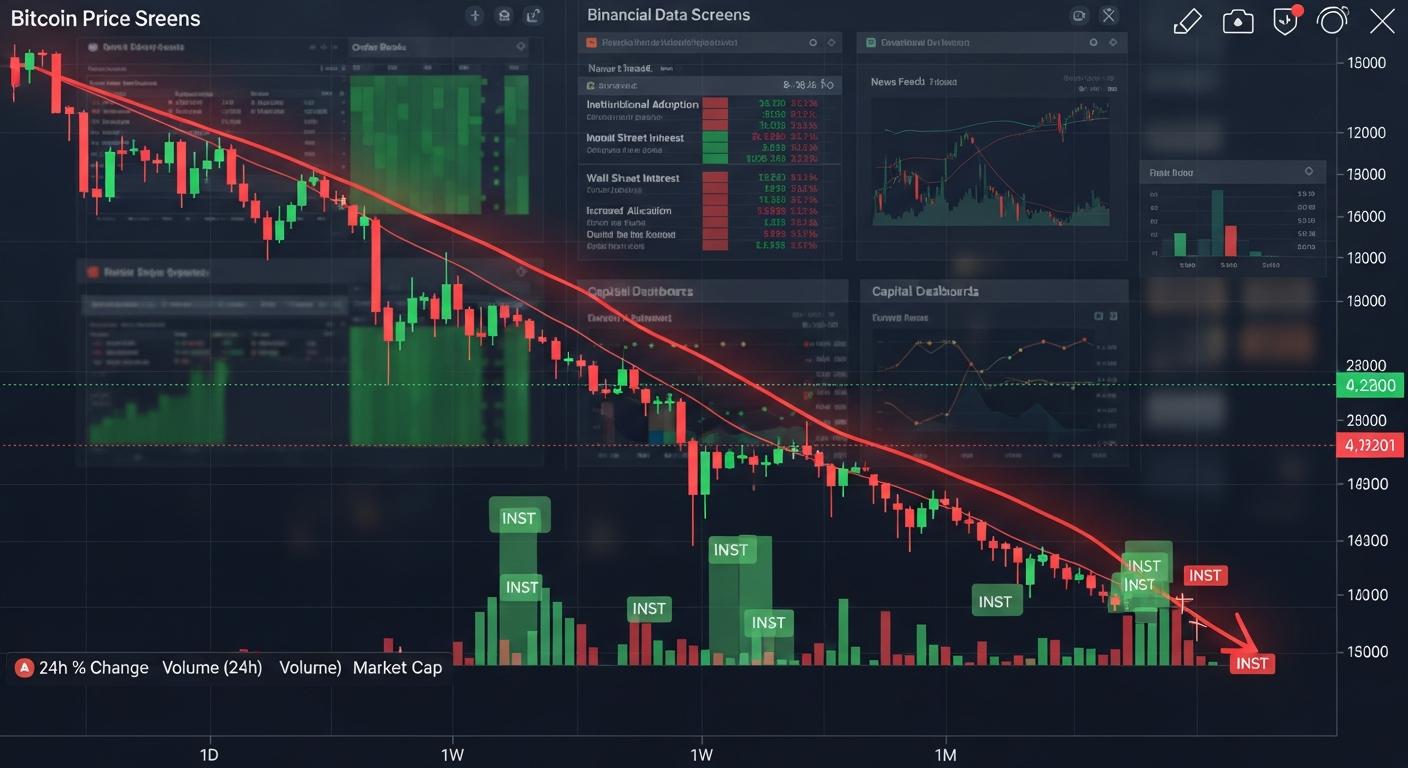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8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0l6qk9c4ub.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7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6ndj5dyz0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6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qhaxcpku8t.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5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rx65p108a9.jpeg)

![[마켓분석] 비트코인 7만 달러 돌파의 이면... '유기적 상승' 아닌 '의도적 펌핑'인가?](https://f1.tokenpost.kr/2026/02/i0a4r15nhm.jpg)
![[마켓분석] 비트코인은 '공격'이고 금은 '방어'다: 자산 배분의 새로운 문법](https://f1.tokenpost.kr/2026/02/evjc6xeeqw.png)
![[마켓분석] 2조 달러의 질문: 소프트웨어 섹터, '떨어지는 칼날'인가 '튀어 오르는 용수철'인가?](https://f1.tokenpost.kr/2026/02/6m5vuilwal.jpg)







![[크립토 인사이트 #8]](https://f1.tokenpost.kr/2026/02/9ac52cv0nv.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