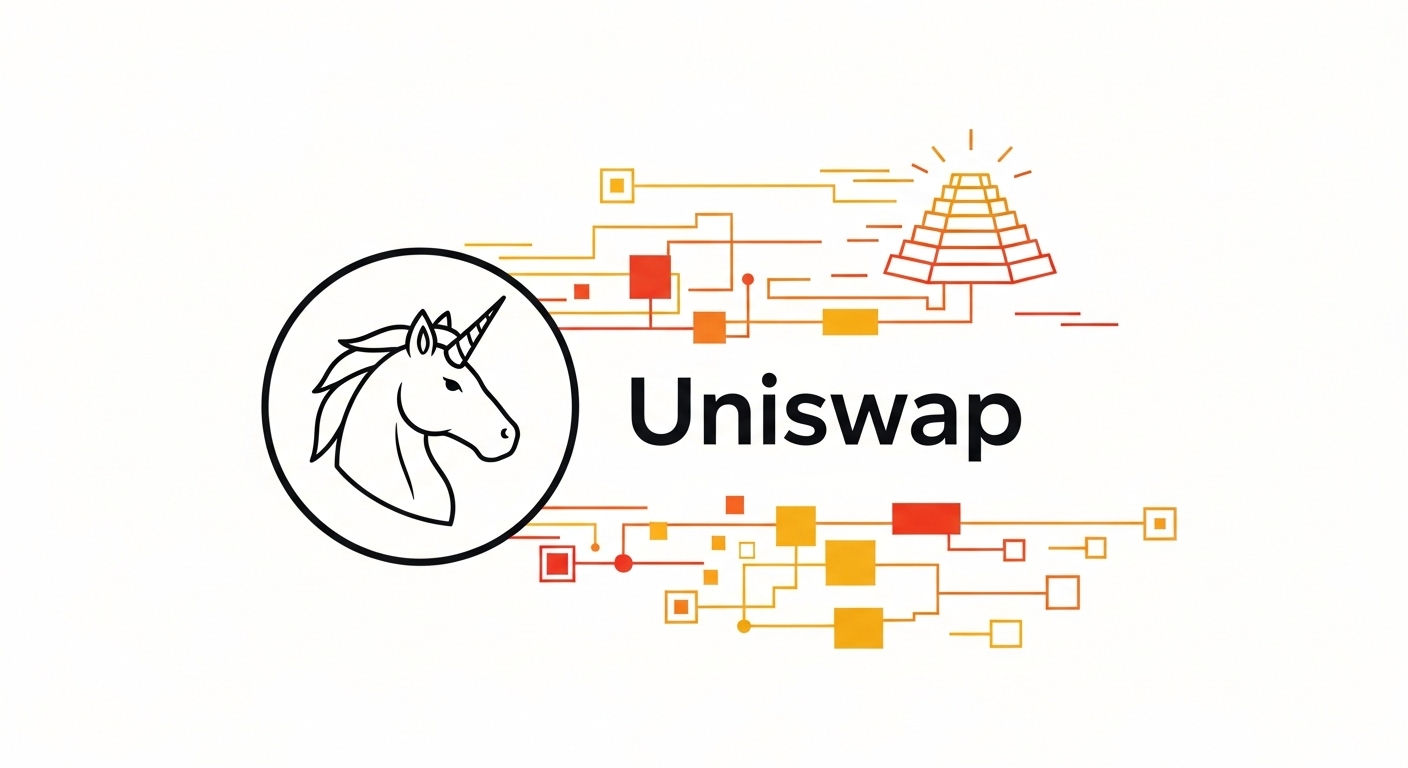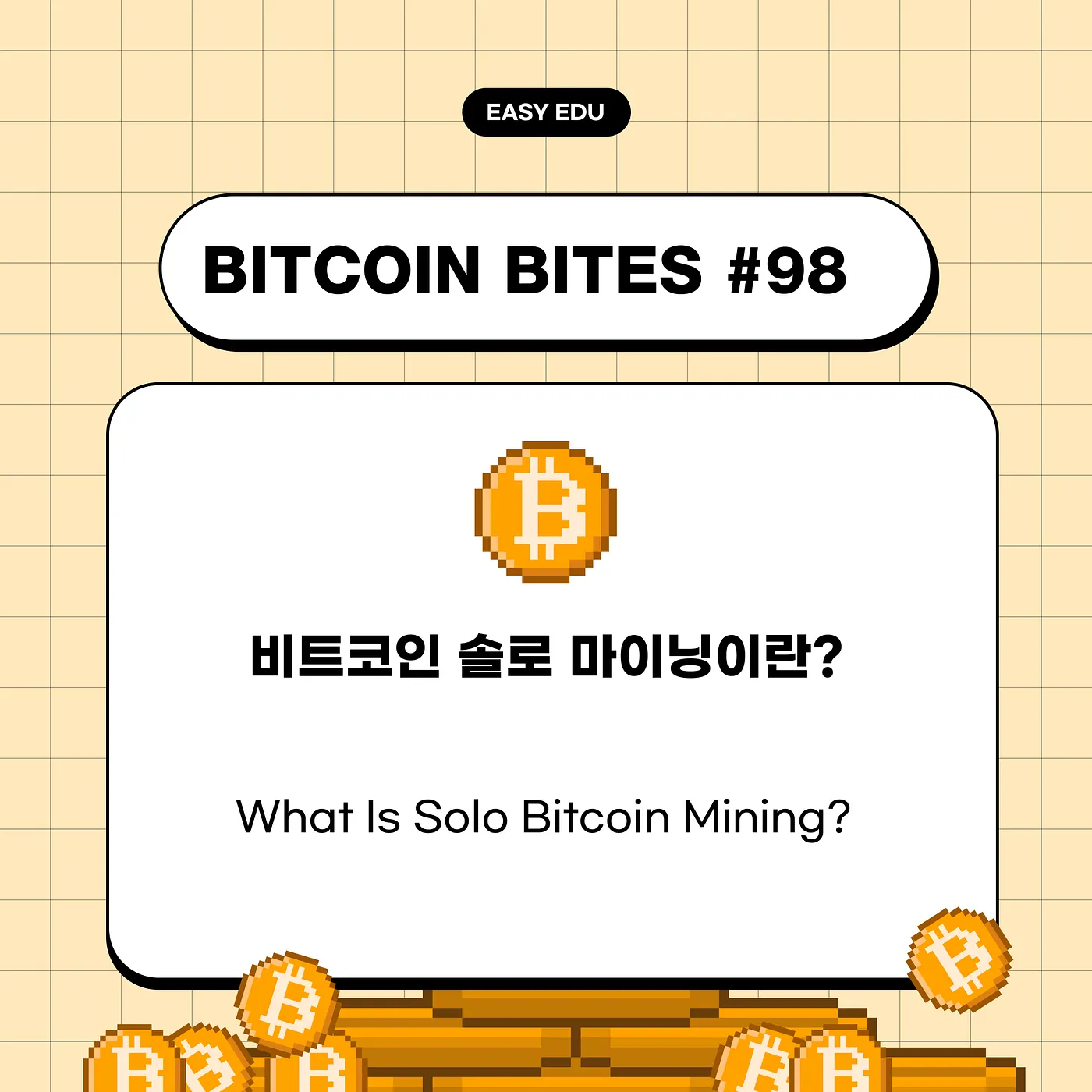최근 디파이(DeFi) 생태계 전반에 걸쳐 연쇄 붕괴가 발생하며 업계 전반을 뒤흔든 가운데, 타이거리서치(Tiger Research)는 최신 보고서를 통해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한 프로토콜의 실패를 넘어 시스템 구조 전반에 내재된 리스크와 책임 회피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문제의 시작은 스트림 파이낸스(Stream Finance)의 스테이블코인 xUSD 붕괴였으며, 이는 MEV Capital, 엘릭서(Elixir), 컴파운드(Compound) 등 주요 디파이 프로젝트와 프로토콜에 연쇄적인 타격을 입히는 방식으로 확산됐다.
스트림 파이낸스는 탈중앙화된 투자 운용을 표방하며 고수익 상품을 제공했으나, xUSD를 담보로 순환 대출 구조를 설계한 끝에 부실 자산 구조가 정체를 드러냈다. 타이거리서치에 따르면, 이 방식은 형식상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금융 구조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레버리지를 감추는 수단이었다. 외부 펀드 운용 실패로 9,300만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고, 이는 블록체인 상의 뱅크런을 유도하며 프로젝트 자체가 붕괴됐다.
이후 여파는 엘릭서의 deUSD, Yei Finance의 sfastUSD, 그리고 컴파운드의 랜딩 마켓 등으로 확산됐다. 특히 오라클 시스템의 지연과 수동 설정이 가격 괴리를 심화시켜 추가적인 부실 채권을 야기했다. DeFi 프로젝트들이 공유 인프라 내에서 상호 얽혀 있는 구조적 특성상, 한 프로토콜의 실패가 다른 프로젝트의 외부 계약 및 담보 가치까지 훼손시키는 연쇄 효과를 낳은 것이다.
보고서는 이번 사태의 실질적인 책임이 투자자가 아닌 리스크 큐레이터, 비허가형(퍼미션리스) 프로토콜, 그리고 위기 경고를 소홀히 한 리서치 기관들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큐레이터들은 명확한 리스크 분석 없이 고수익 구조만 추구했으며, 프로토콜 플랫폼들은 위험한 전략에 대해 검증 없이 거래를 중개했다. 타이거리서치는 자사 또한 리서치 기관으로서 구조 위험을 조기에 알리지 못한 데 깊은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계기로 디파이 내부에서는 통합된 운용 풀(AAVE 구조) 대 독립 운용 볼트(Morpho, Euler 구조)에 대한 논쟁이 다시 촉발됐다. AAVE 창립자인 스타니 쿠레초프(Stani Kulechov)는 독립 볼트 구조가 과도한 리스크 추구를 조장한다고 지적하며 기존 일원화된 시스템의 리스크 관리 장점을 강조한 반면, Morpho의 폴 프람보(Paul Frambot)는 다양한 전략과 실험을 허용하는 개방형 구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구조적 우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책임 구조다. 현재 디파이는 금융 당국의 감독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이로 인해 신뢰할 수 있는 리스크 평가 기준이 부재한 상태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독립적인 신용 평가 시스템과 큐레이터 슬래싱 구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신용 등급 체계와 리스크 대시보드 기반의 정량적 분석, 그리고 운영자가 일정 자금을 담보로 책임을 지는 구조가 도입돼야만 투자자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타이거리서치는 DeFi가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참여 주체 각자의 역할 명확화와 의무 기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큐레이터는 합리적인 수익률과 사용자 보호에 집중하고, 프로토콜은 기술 혁신보다 시스템 안정성을 우선해야 하며, 리서치 기관은 유행보다는 경고와 분석을 중심으로 책임 있는 관점을 제시해야 한다.
결국 이번 스트림 파이낸스 사태는 단일 사건이 아닌 디파이 산업 전반에 경종을 울리는 매커니즘 붕괴로 해석된다. 수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입은 지금, 산업은 외면했던 리스크 관리 프레임을 재정립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 흐름을 근본적인 변화로 전환하지 못한다면, 다음 붕괴는 그리 멀지 않아 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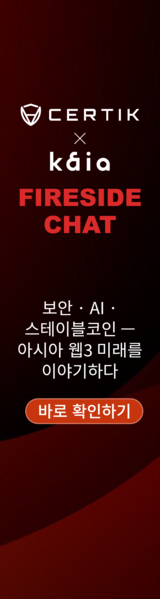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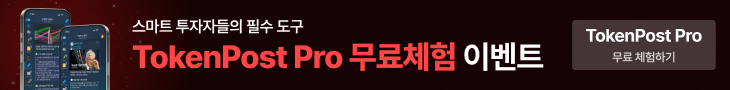







 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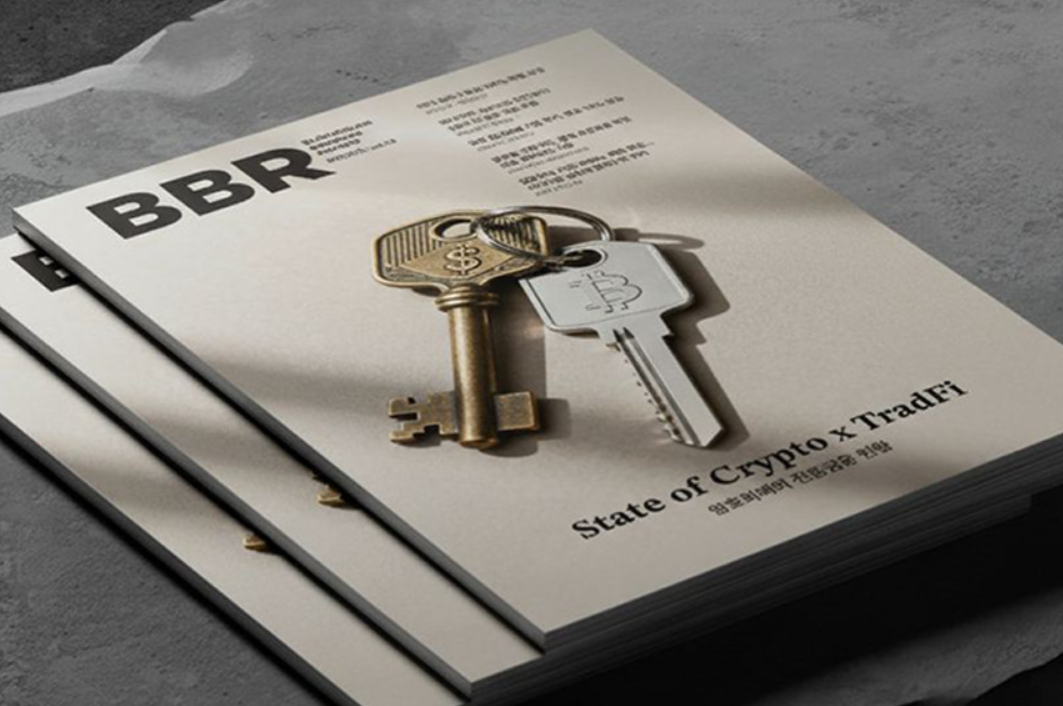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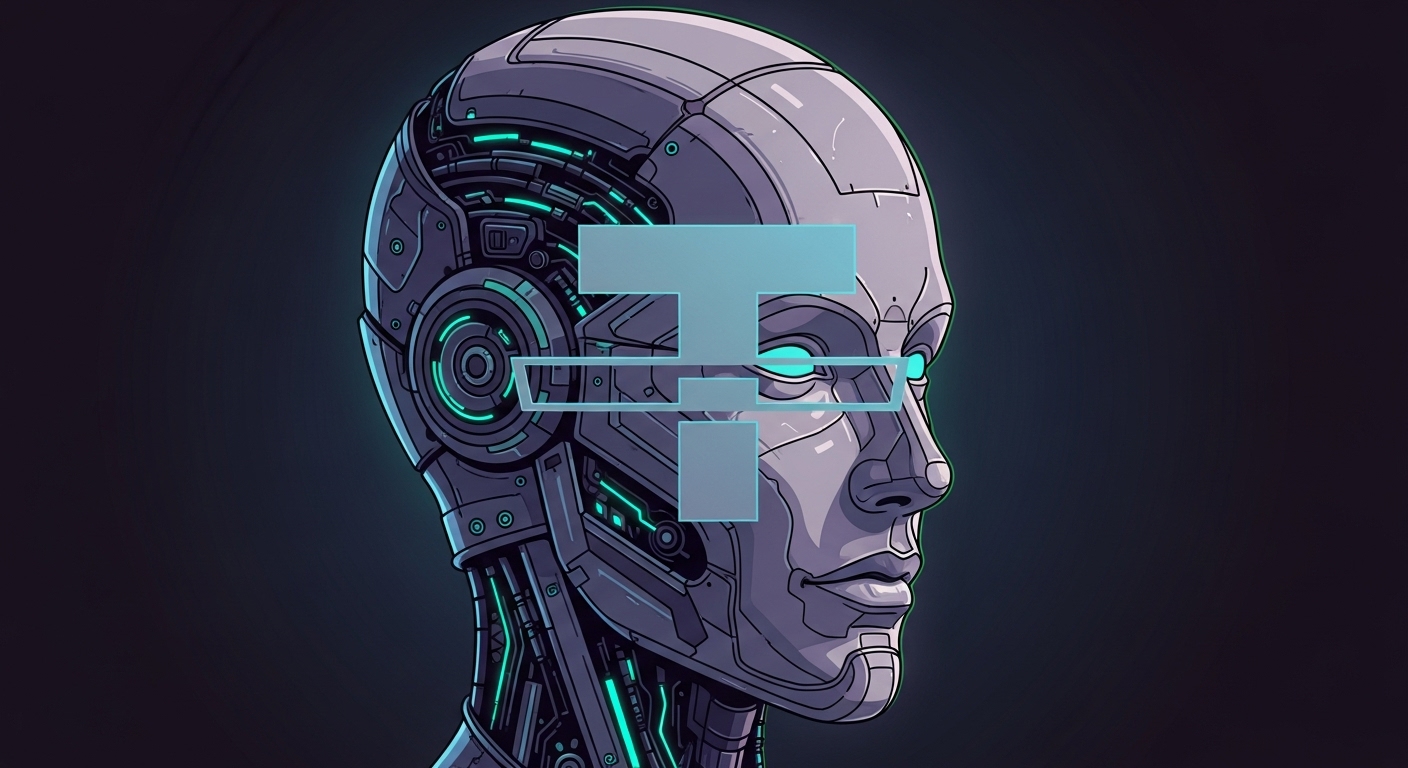

![[오늘의 주목 코인] 월렛커넥트(WCT), 탐욕지수 84로 1위…거래량 급등 속 12% 상승](https://f1.tokenpost.kr/2025/11/d5v16lyvva.png)

![[코인 동향분석] 오피셜 트럼프·이더리움클래식 순매수 상위… 오일러(EUL) RSI 4.89%로 최저 구간](https://f1.tokenpost.kr/2025/11/sy0g08bemy.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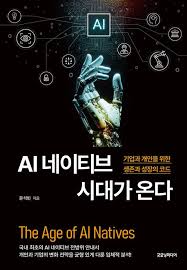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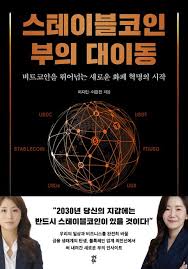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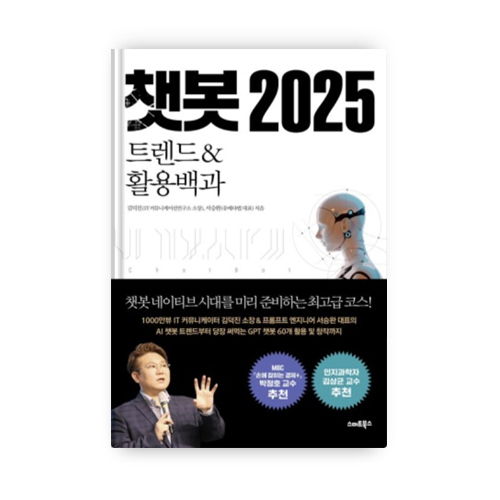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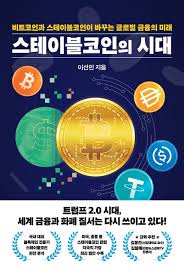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471회차](https://f1.tokenpost.kr/2025/11/fum2h90w74.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470회차](https://f1.tokenpost.kr/2025/11/tou7eitn4h.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469회차](https://f1.tokenpost.kr/2025/11/vtq0dwxqr6.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468회차](https://f1.tokenpost.kr/2025/11/bol0wqnomg.jpg)

![[저녁 뉴스브리핑] 밸런서 해커, 토네이도캐시로 탈취 ETH 이체 시작 外](https://f1.tokenpost.kr/2025/11/64kgg6kv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