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의 급진적인 도입은 기업 환경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기술이 만들어낸 생산성의 새로운 지평은 한편으론 인간 노동이 설 자리를 좁히고 있으며, 조직의 문화적 기반까지 흔들고 있다.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점점 더 적은 인원 구성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하고 있는 오늘날, '효율적인 것'과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 사이의 간극은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마크 힘멜스바흐와 레미 핀슨은 AI 기반 크리에이티브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영자들로, 이 같은 변화의 최전선에서 그 복잡성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다. 최근 이들이 겪은 고객사 계약 해지와 그에 따른 인력 감축 결정은 단순한 운영 판단 그 이상이었다. 이는 테크놀로지가 사람보다 우선시되는 현대 리더십의 딜레마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투자자 네이벌 라비칸트가 주장했듯, AI는 자본이나 코드, 미디어와 함께 현대 사회 노동의 대체수단이 되고 있으며, 샘 올트먼은 이를 더 나아가 ‘1인 유니콘’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했다. 러버블, 커서, 머커 같은 극소 규모의 AI 기반 팀들이 만들어내는 막대한 생산성과 자본 유치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생산성과 자동화 이면엔 간과된 부분이 있다. AI가 주도하는 작업환경은 소수의 인재만 필요로 하며, 점차 더 많은 사람이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조직의 핵심에서 밀려날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언제든 '사람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유혹에 직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조직 문화는 AI와 공존하기 위해 다시 정의돼야 할 시점에 와 있다. AI 기술이 사람 대신 판단하고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현실에서, 진정한 경쟁력은 기술 자체보다 인간과 기술이 어떻게 협력하는지, 그 기반이 되는 조직 문화가 어떻게 유지되고 발전하는지에 달려 있다. 과거 최고의 기업들이 훌륭한 문화를 기반으로 성장했듯, AI 시대 역시 그 기조는 변함없어야 한다.
아직 인간과 AI 간 협업을 위한 규범과 관행은 미정의 상태다. 지금은 ‘효율성’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몰입하기보단, 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기반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효율’만 추구한 기업보다, ‘사람’과 ‘문화’를 함께 고려한 조직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게 AI 시대를 선도할 것이다.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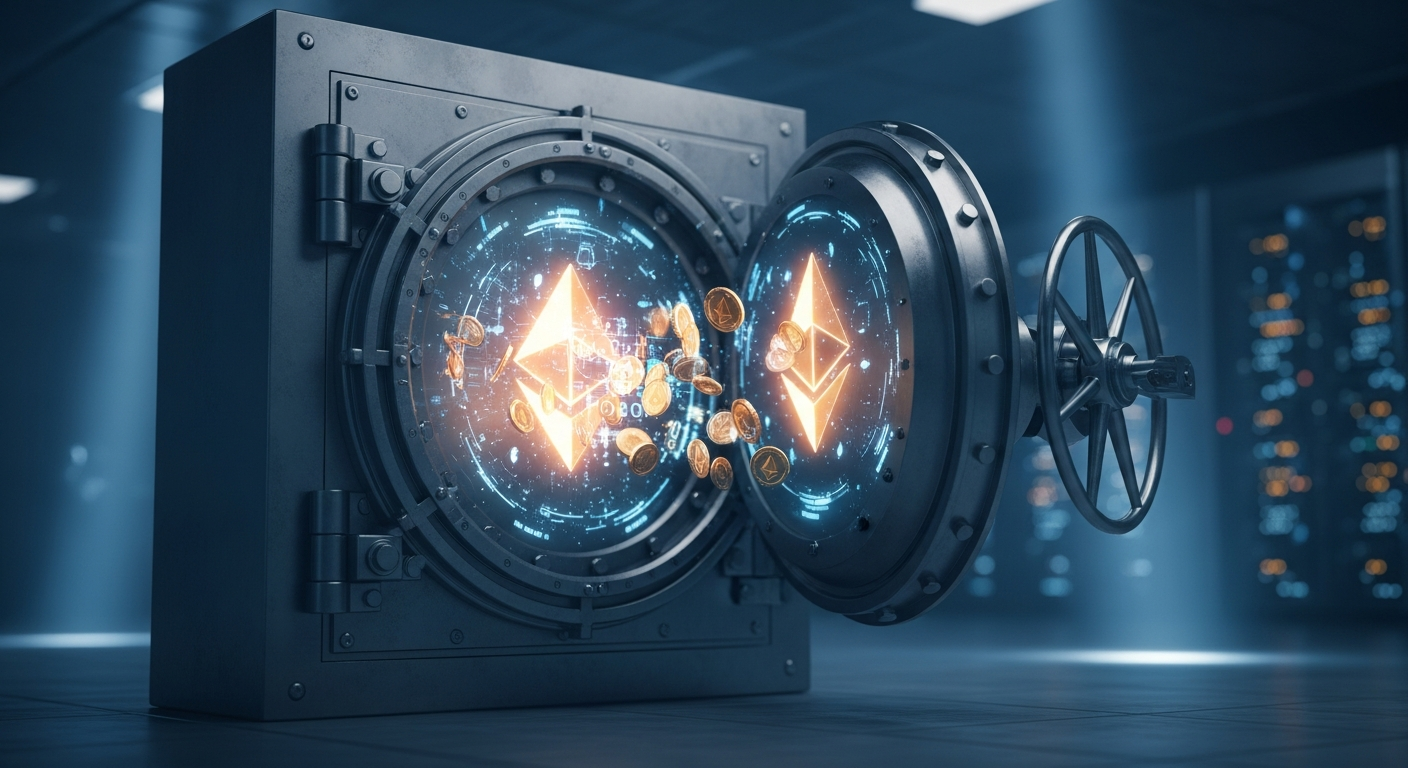


![[크립토 인사이트 EP.29] 공포지수 14·유조선 폭발·WTI 91달러…그런데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돈이 움직인다](https://f1.tokenpost.kr/2026/03/wn9wqvi5hz.jpg)
![[토큰캠프 현장]](https://f1.tokenpost.kr/2026/03/hfrj1j1fdz.jpg)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52회차](https://f1.tokenpost.kr/2026/03/j7ggotbpdp.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51회차](https://f1.tokenpost.kr/2026/03/n8epwegfrl.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50회차](https://f1.tokenpost.kr/2026/03/52roledcjh.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49회차](https://f1.tokenpost.kr/2026/03/6j5ydfkdjn.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