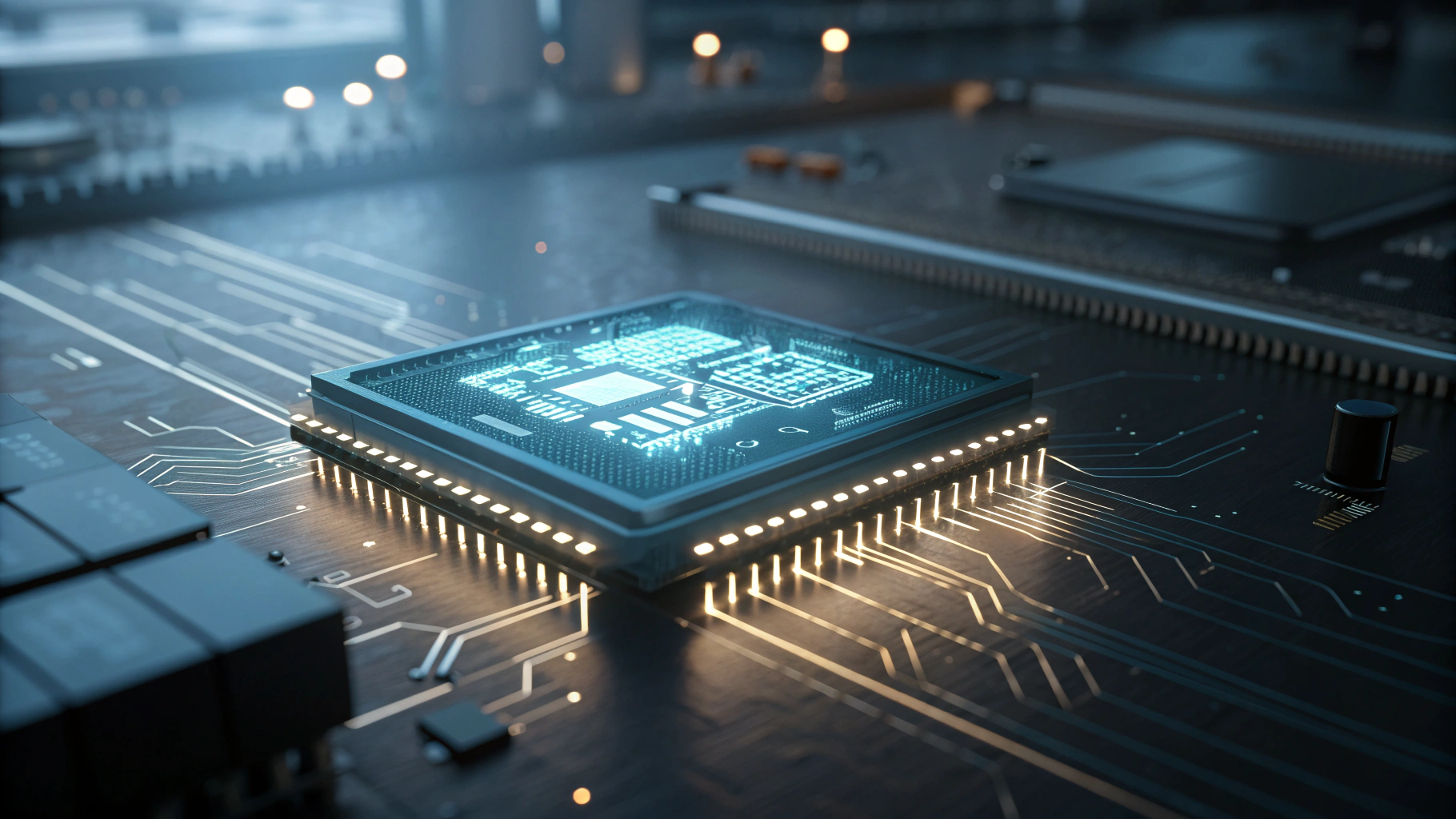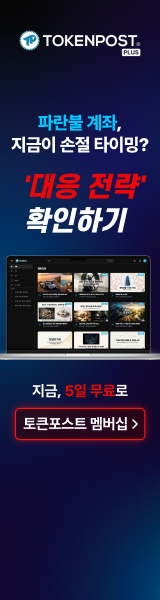암호화폐 시장은 단 하루도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은 쉴 수밖에 없다. 24시간 유동성 관리, 수익 최적화, 자동 거래에 나설 수 있는 AI 에이전트는 이제 탈중앙금융(DeFi)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에이전트를 담을 인프라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기존 지갑 시스템은 필요할 때마다 수동으로 승인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으며, 에이전트가 요구하는 자동화 환경을 뒷받침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계정 추상화나 스마트 계약 기반 지갑 기술의 진전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대다수 DeFi 플랫폼은 외부 소유 계정(EOA)에 의존하고 있다. 일부 프로그래머블 지갑들이 초기 단계에 도달했으나 고비용, 파편화 문제, 낮은 채택률이라는 현실적 벽에 가로막혀 있다. AI가 기존 사용자 대신 자산을 운용하는 시대를 준비하려면 보안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표준화된 자동화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동화 시대에는 ‘추측’이 아닌 ‘안전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 AI 에이전트는 손을 대지 않아도 수익 전략을 실행하거나 실시간 포트폴리오 조정, 크로스체인 차익거래까지 구현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 권한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래밍 없이 자산 운용을 AI에 전적으로 맡기는 건 큰 위험을 수반한다. 악의적 봇부터 오류를 일으키는 알고리즘까지, 한 번의 자동화 실패는 지갑을 통째로 비우고 나서야 인지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텔레그램 기반 거래 봇 바나나건(Banana Gun) 해킹 사고는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 2024년 9월, 오라클 취약점을 노린 공격으로 사용자들은 563 ETH(약 27억 2,000만 원)를 잃었다. 최근에는 AI 기반 트레이딩 플랫폼 Aixbt가 공격당해 55.5 ETH(약 8,100만 원) 상당의 자금이 탈취됐다. 이러한 사례는 개별 실패가 아닌, 자동화 인프라의 구조적 취약성을 경고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기존 지갑 아키텍처의 한계다. 현재 대부분의 지갑은 단순히 트랜잭션을 서명하고 전송하는 역할에 머무르며 ‘의도’까지 인식하거나, 시간·자산·전략 기반으로 자동 거래를 제한하는 기능조차 부족하다. 이는 사용자에게 수동 통제와 완전 위임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이분법적 딜레마를 강요한다. 본격적인 AI 거래 시대를 맞이해 DeFi가 안정적으로 확장되려면 프로그래머블하고 복합적인 검증이 가능한 지갑 인프라가 필수다.
스마트 계약이 프로토콜 자체의 규칙을 코딩하듯, 지갑도 사용자 제어 권한을 논리 구조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세션 기반 접근 권한, 에이전트 행동의 암호학적 검증, 실시간 접근 제어 해제가 가능한 지갑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전체 자산 통제를 포기하지 않고도 AI가 거래, 리밸런싱, 전략 실행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는 위험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적 장벽을 허무는 역할을 하며 보다 많은 사용자가 DeFi에 진입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프로그래머블 지갑 인프라는 DeFi의 확장성 기반이다. 네트워크와 프로토콜 간 단절은 그간 자동화 전략이 확산되는 데 걸림돌이었다. 범용 키스토어 프로토콜을 통해 네트워크 간 권한을 동기화하면, 체인 경계를 넘는 자동화와 에이전트 생태계가 실현 가능해진다. 현재 DeFi에 관심을 보이는 기관 투자자들도 자동화 보안 없이는 본격적인 진입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프라이버시와 규정을 위한 영지식증명(ZKP)이 표준이 된 것처럼, 프로그래머블 권한은 AI 기반 보안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자율성을 지닌 AI가 금융 영역에 도입되는 것 자체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낸다. 그러나 전통 금융 역시 알고리즘 트레이딩과 블랙박스 운영을 이미 일상화했다. DeFi 역시 피할 수 없는 흐름 앞에 서 있다. 문제는 대비 부족이다. 사용자 주권과 투명성을 유지하려면 기술 인프라가 먼저 진화해야 한다. AI 에이전트가 사용자 이익을 수호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 가드레일을 갖춘 새 지갑 아키텍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DeFi는 지금 자동화 혁신의 문턱에 서 있다. 문제는 에이전트의 도입 여부가 아니라, 그들이 사용자를 위한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돼 있는가 하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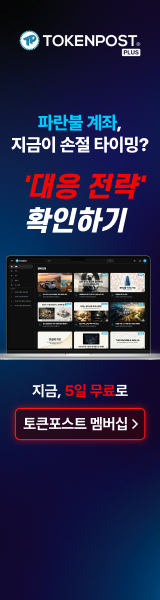










 0
0








![[크립토 인사이트 #10] 거래소로 120억 달러 ‘실탄’ 입금… 고래들은 매수 대신 ‘이것’ 노린다](https://f1.tokenpost.kr/2026/02/afofibaigz.jpg)
![[사설] 암호화폐 시장의 집단 환상: 우리는 진짜 현실을 보고 있는가?](https://f1.tokenpost.kr/2026/02/x0mzrj6zcg.jpg)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30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wzoyk1y2ly.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9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jnnmwwttwl.jpe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8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0l6qk9c4ub.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7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6ndj5dyz0f.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