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역량뿐 아니라, 유사한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 간의 국제적 연대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기술 경쟁이 과학·산업의 영역을 넘어 안보·외교로까지 확장되는 가운데, 중견국들의 전략적 협력이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6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STEPI 인텔리전스 다이얼로그’에서 영국 앨런튜링연구소의 아르디 얀예바 선임연구원은 중견국 간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 주권은 어느 한 나라가 수직적으로 독자 구축하기 어려운 분야라며, 한국과 영국처럼 상호 보완적 역량이 있는 국가들이 힘을 모을 때 현실적인 주권 구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해외 주요 싱크탱크들과 공동 연구한 AI 전략과 관련 국가 간 협력안이 공유됐다.
특히 ‘피지컬 AI’ 시대에 대응한 한국과 영국의 전략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피지컬 AI란 실제 기계장치나 로봇 등에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해 물리적 활동을 수행하는 분야를 말한다. 한국의 제조업 기반과 하드웨어 역량, 영국의 AI 소프트웨어와 윤리·규제 체계가 결합할 경우, 경쟁력 있는 기술 연합 구성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STEPI 측은 완전한 기술 자립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전략 파트너십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일본·대만·캐나다 등과 진행한 첨단 기술 분야 협력 가능성도 발표됐다. 일본과는 양자 기술—특히 센싱, 통신, 컴퓨팅 등 3개 세부 분야에서의 협력 모델이 제시됐고, 대만과는 우주 반도체·망원경·바이오 프로젝트에서의 공동연구 가능성을 점쳤다. 대만은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 한국은 국가 주도의 우주 개발 투자 등에서 서로 보완 가능하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다.
같은 날 공개된 다른 연구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 주요국 대학·싱크탱크 간 연합이 참여한 전략 분석 결과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STEPI는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과 함께 인공지능 기반의 산업 간 경제효과에 대한 공동 보고서를 발표했다. 여러 국가의 민간·공공 연구기관이 함께한 이번 협력은 경쟁과 협력이 혼재된 기술 환경에서 긴장 완화와 실질적 정책 실행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견국 간 다자 협의체 형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AI, 반도체, 우주기술 등 국가 전략 자산의 공동 활용을 통해 외부 의존도를 낮추고, 각국 기술 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새로운 협력 틀로 발전할 여지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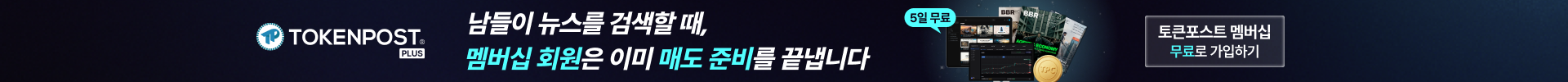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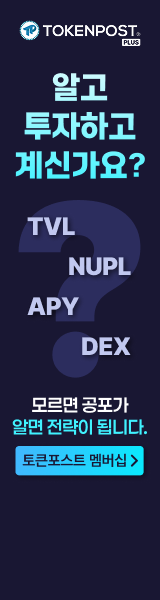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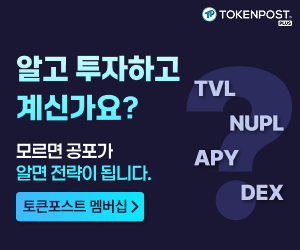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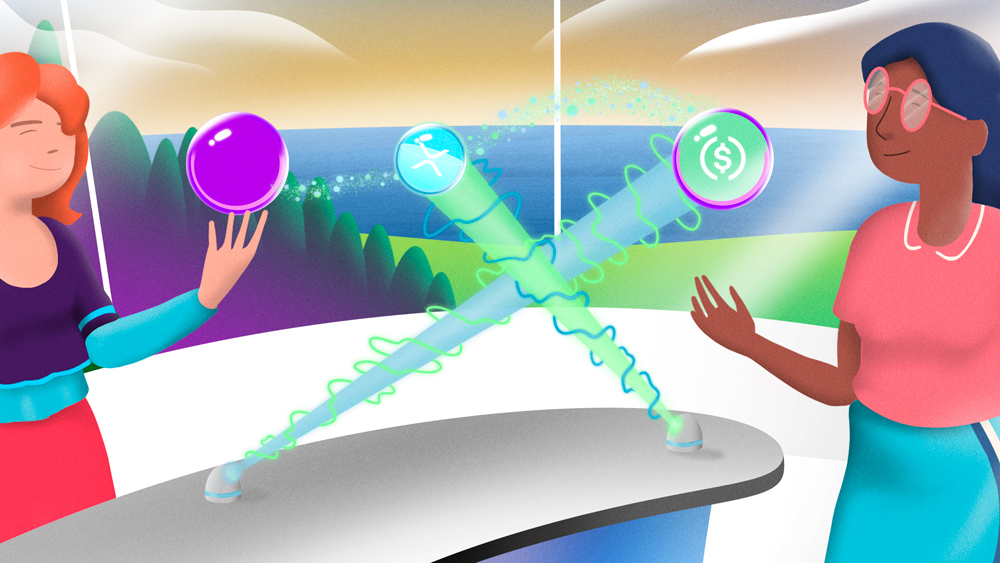
![[크립토 인사이트 #14]](https://f1.tokenpost.kr/2026/02/9vi2id7zwv.jpg)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35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h11k1htgnt.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34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qetvwueue8.webp)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33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yxki8fbsgk.webp)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32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geibni8f8j.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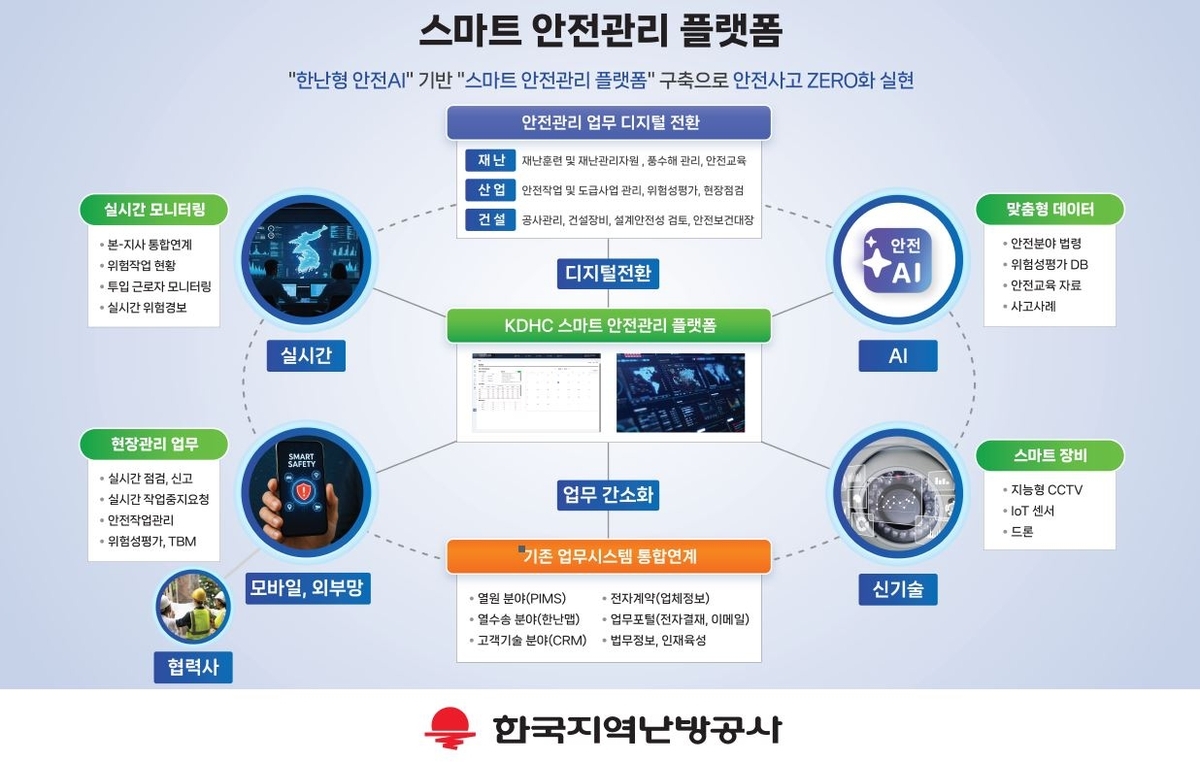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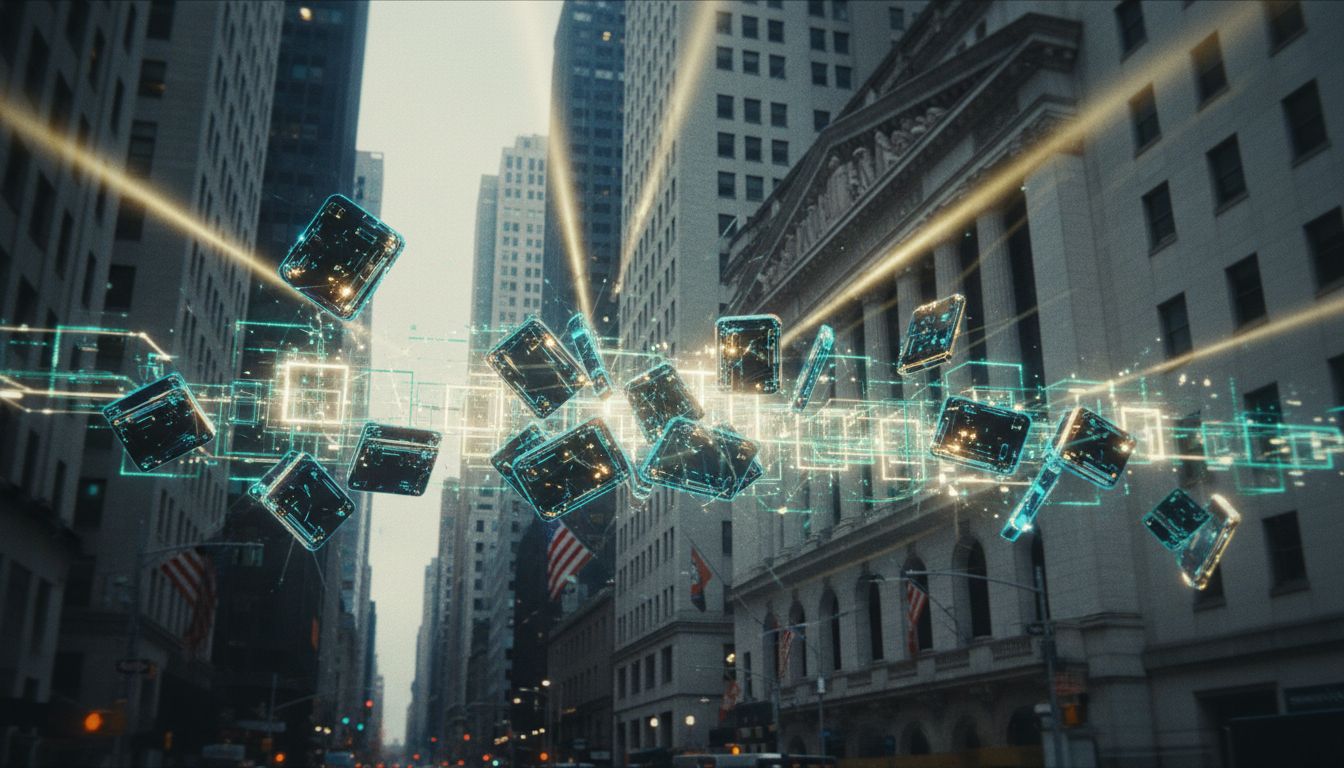


![[사설] AI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 '기술 유토피아'라는 거짓말](https://f1.tokenpost.kr/2026/02/14yprs41pu.jpg)


![[크립토 인사이트 #14]](https://f1.tokenpost.kr/2026/02/rv280t9a6v.jpg)

![[토큰분석]](https://f1.tokenpost.kr/2026/02/kce7ck698x.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