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미국 전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이 급증하면서, 일부 지역의 전기요금이 15% 넘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AI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한 전력 소비 확대가 지역별 에너지 인프라에 부담을 주고 있는 셈이다.
CNBC가 11월 16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에서 데이터센터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버지니아주는 666개 시설을 운영 중이며, 올해 8월 기준 전기요금이 전년 동기 대비 13% 상승했다. 같은 기간, 데이터센터 수가 각각 244곳, 193곳에 달하는 일리노이주와 오하이오주도 전기요금이 각각 15.8%, 12%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인 5.1%를 크게 웃돌았다.
이 같은 요금 인상은 AI 모델 운용에 막대한 연산 능력이 요구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결과다. 현재 AI 모델은 수백억 개 매개변수를 처리하는 수준이며, 이를 위해 대규모 행렬 연산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수 GW(기가와트)의 전기를 필요로 하는 초대형 데이터센터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1GW는 원전에 맞먹는 출력으로, 약 1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주민 불만도 커지고 있다. 버지니아주의 애비게일 스팬버거 주지사 당선인은 전기요금 인상의 배경으로 대형 기술기업들을 지목하며, 이들에게 비용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방 차원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백악관에 데이터센터 관련 전기요금 상승 원인을 따지는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모든 지역이 같은 양상을 보인 것은 아니다. 텍사스주는 409개 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전기요금 인상률이 3.8%에 그쳤고, 캘리포니아주도 321개 시설을 운영하면서도 인상률이 1.2%에 불과했다. 텍사스는 신재생 에너지 등을 포함한 전력 인프라 확충 속도가 빠른 반면, 캘리포니아는 산불 예방 비용을 요금에서 일반 재정으로 전환하면서 부담을 낮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데이터센터 확대가 암묵적으로 에너지 사용 증가를 수반하다 보니, 이와 관련한 사회적 반발도 점차 확산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테크래시’로 해석하며,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견제 심리가 정책이나 여론에서 점점 구체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AI 인프라 확장과 에너지 공급의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맞출지, 각 지역 정부의 대응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1
1












![[크립토 인사이트 EP.20] 비트코인 4만8천달러 시나리오 vs M2 재확장…공포 속 데이터는 무엇을 말하나](https://f1.tokenpost.kr/2026/02/we0wgyifi8.jpg)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40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s74dobfws9.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39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celz7zpk2n.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38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jxqkx5yb5c.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37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4twwawrak9.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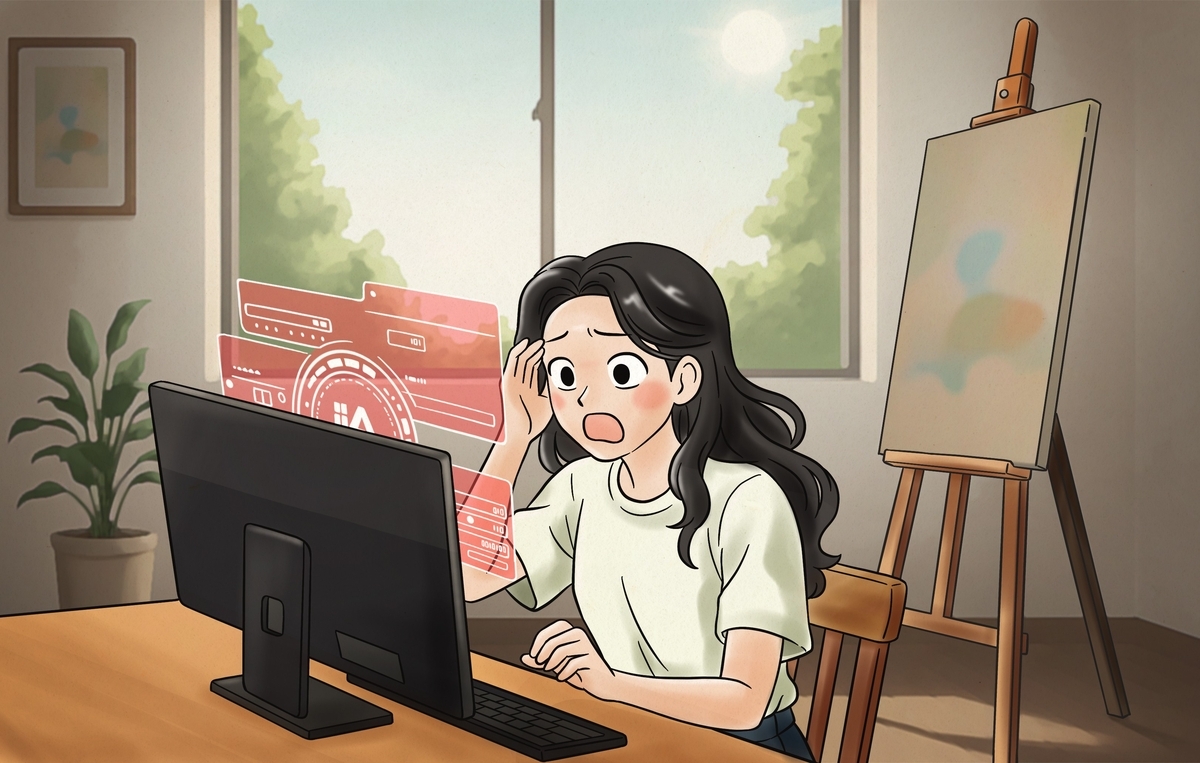











![[국제금융 브리핑] 미국 10% 글로벌 관세 발효…AI 기대 속 위험자산 선호 강화](https://f1.tokenpost.kr/2026/01/aj2ndkuaci.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