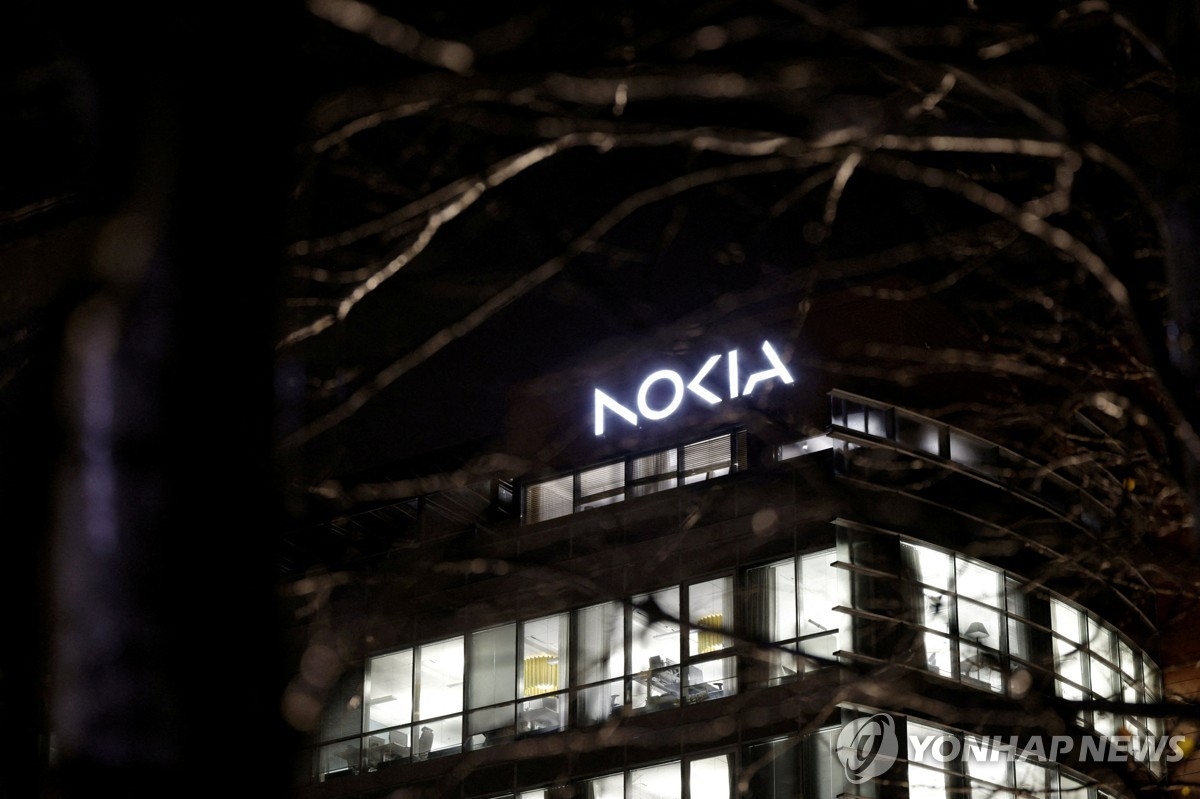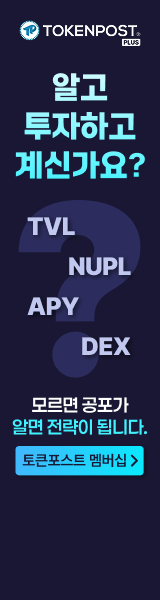한국 기업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첨단 제조 분야의 해외직접투자를 크게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타난 변화로, 미국 내 반도체 및 배터리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23일 맥킨지글로벌연구소(MGI)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해외직접투자(FDI) 중 그린필드(신규 건설 형태) 투자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410억 달러였으나, 최근 2022년부터 2025년 5월까지는 평균 630억 달러로 54%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평균 증가율은 24%였던 만큼, 한국의 투자 확대 속도는 두 배를 웃돌고 있다.
특히 투자지역 변화가 두드러진다. 팬데믹 이전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했던 중국에 대한 연간 투자액은 87억 5천만 달러에서 최근에는 6억 5천만 달러로 90% 넘게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북미 지역으로의 투자는 40억 달러대에서 270억 달러 규모로 570%나 급증했다. 그 결과, 전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서 45%로 올라섰고, 중국은 21%에서 1%까지 급격히 하락했다.
이러한 흐름의 이면에는 반도체와 배터리처럼 전략 기술로 분류되는 첨단 제조업의 중요성이 커진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한 각종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앞세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등에 현지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및 배터리 관련 북미 투자액은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약 11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도체 분야만 놓고 보면, 미국이 한국과 대만의 해외직접투자 중 약 90%를 유치하고 있으며, 한국의 미국 내 반도체 투자 규모는 30배, 대만은 100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맥킨지는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미국이 오는 2030년대 초에는 전 세계 첨단 반도체 생산의 2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미국, 유럽, 일본을 합친 전체 점유율도 2022년 10%에서 2030년엔 30%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직접투자는 코로나19 이전 110억 달러에서 최근 170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는 미국계 기술기업들의 데이터센터 확충 등 대형 프로젝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첨단 제조업을 둘러싼 글로벌 산업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기술 기반 산업에서 생산 역량의 지역 분산화가 본격화되며, 과거처럼 동아시아에 집중됐던 생산 허브 체계에도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기업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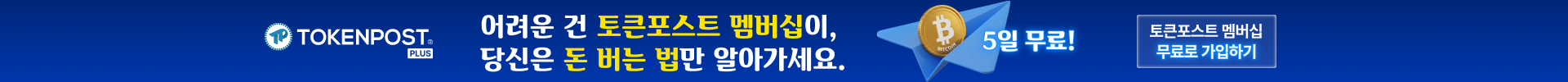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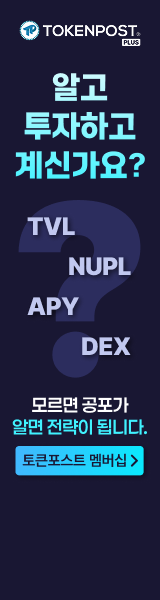










 0
0




![[토큰분석] 90% 빠진 토큰, 반등할까 사라질까… 5가지로 판별하는 법](https://f1.tokenpost.kr/2026/02/2bxkphkg67.jpg)
![[토큰포스트 칼럼] 주식시장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간다… '인터넷 자본시장' 시대가 온다](https://f1.tokenpost.kr/2026/02/egp7zm9d1p.jpg)

![[토큰캠프 #3]](https://f1.tokenpost.kr/2026/02/2nft0e2jww.png)
![[사설] 월가가 디파이 토큰을 사들이는 진짜 이유… '투기'가 아니라 '인프라 선점'이다](https://f1.tokenpost.kr/2026/02/d6yv1fi5l3.jpg)

![[토큰분석] 암호화폐 시장에서 '진짜 돈'이 빠지고 있다… USDT 시총이 보내는 경고 신호](https://f1.tokenpost.kr/2026/02/fnpcwelqa5.jpg)
![[마켓분석] 엔비디아, '어닝 서프라이즈' 넘어 '어닝 쇼크'… 매출 681억 달러·가이던스 780억 달러의 의미](https://f1.tokenpost.kr/2026/02/0etkh7qlwz.jpg)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41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g27ndxvfxv.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40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s74dobfws9.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39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celz7zpk2n.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38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jxqkx5yb5c.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