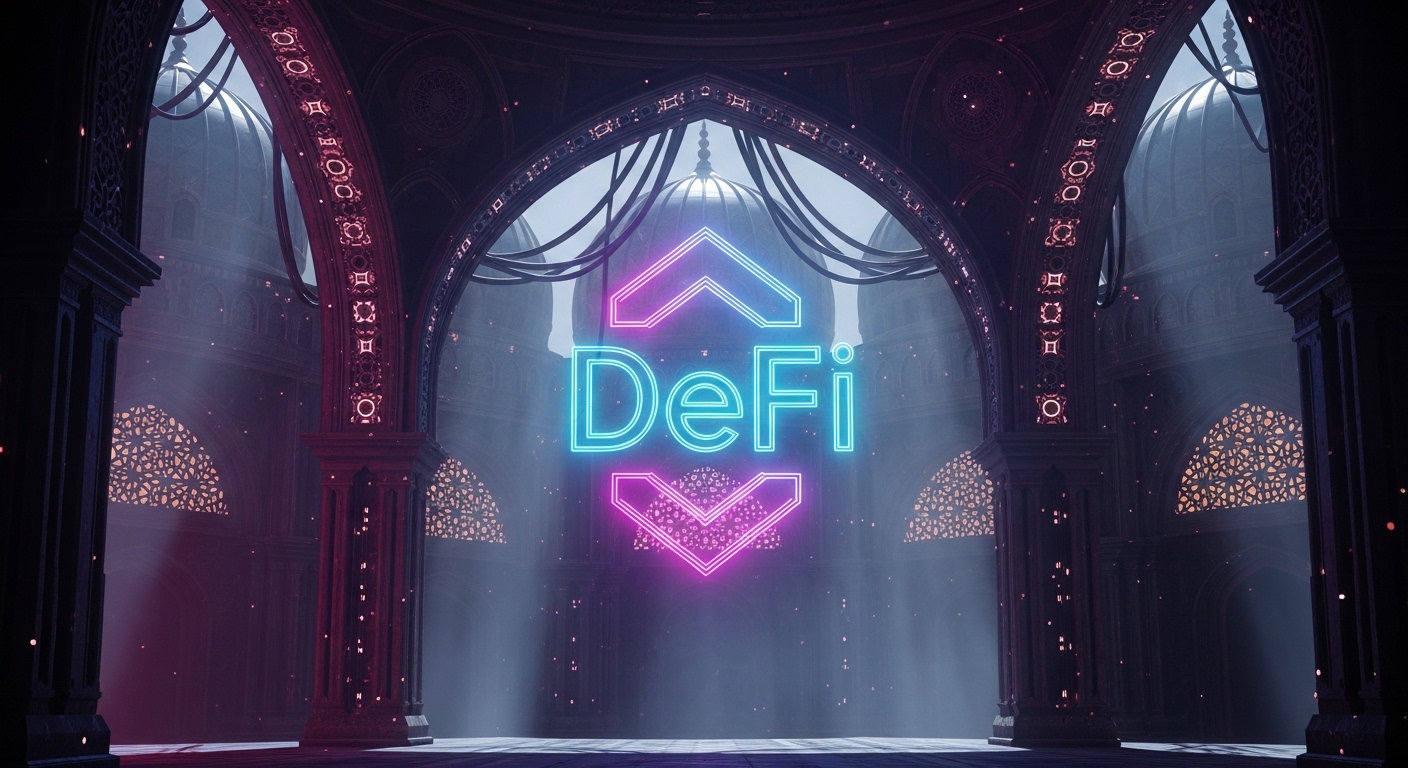인공지능을 통해 '가상 인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실존 인물이 아닌 '실제 인물처럼 보이는' 가상 이미지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번 이슈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불거졌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음란물이 '실제 인물처럼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을 포함할 경우에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이를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존에는 음란물의 대상이 실존 인물이어야만 처벌이 가능했지만, 이번 법안은 그 범위를 확장하려는 시도다.
개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전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민들의 관심을 크게 끌고 있다. 9월 26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동안 1만7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는데, 찬반 양측 모두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대 측은 표현의 자유 침해와 법적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며,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것이 형사 법체계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반면 찬성 측은 실제 인물이 아니더라도 이같은 콘텐츠가 사회 및 개인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으며, 특히 유사한 외모의 실제 인물에게 심리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의견도 엇갈린다. 박상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조항을 적용하면 충분히 제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조항을 둘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가상 인물'이라는 개념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이은의 변호사(성범죄 전문)는 AI 음란물 역시 딥페이크 성폭력처럼 실존 인물의 이미지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명확한 규제를 마련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보호받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이번 법안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히 음란물 규제를 넘어,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활용과 법적 한계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AI가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술적 가능성과,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맞물리면서 보다 정교한 입법과 기준 정립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가상 현실 기술과 생성형 인공지능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문제와 규범의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법제도는 지금의 논의를 계기로 기술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점도 함께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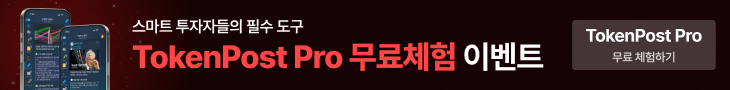







 1
1











![[KOL 인덱스] BASE 확장 기대감 속 IRYS 연속 상장 러시 주목 外](https://f1.tokenpost.kr/2025/11/9mjo5kppnz.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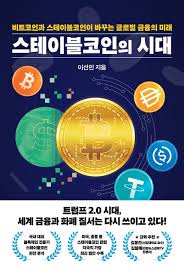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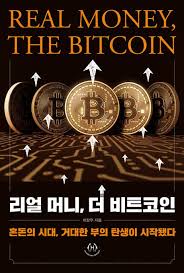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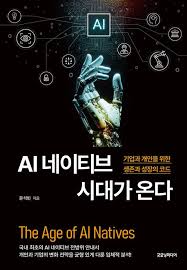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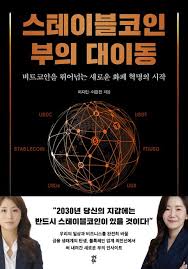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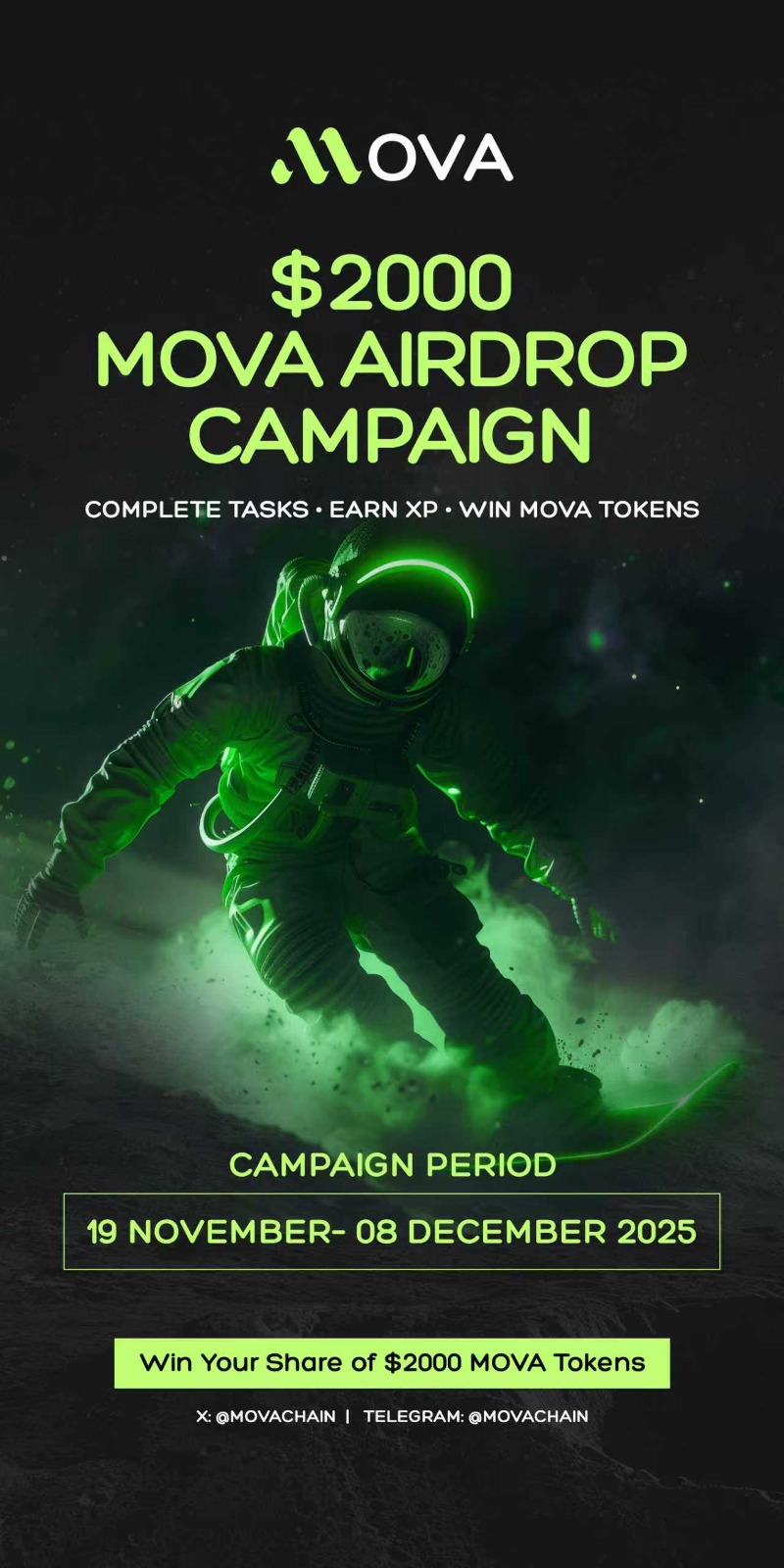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478회차](https://f1.tokenpost.kr/2025/11/x8aqgymoiz.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477회차](https://f1.tokenpost.kr/2025/11/iw60bv3ioy.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476회차](https://f1.tokenpost.kr/2025/11/jslqcvp3a5.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475회차](https://f1.tokenpost.kr/2025/11/2owsis2ezy.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