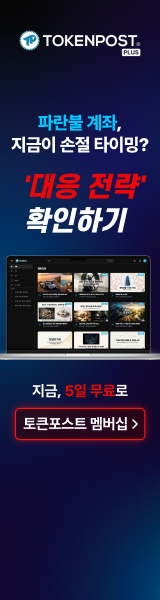이더리움(Ethereum) 생태계 내 독립 개발자 그룹이 새로운 레이어2(L2) 확장 솔루션 ‘이더리움 R1’을 공개했다. 눈에 띄는 점은 이 프로젝트가 자체 토큰을 발행하지 않으며, 벤처자금 유치 없이 전적으로 기부만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이더리움 R1은 이더리움 재단의 직접적 지원을 받지 않지만, 이더리움 네트워크 확장을 목표로 설계된 순수 롤업 기반 솔루션이다. 프로젝트 측은 5월 1일 X(구 트위터)를 통해 “범용 L2는 단순하고 대체 가능하며 중앙화된 통제나 위험한 거버넌스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이더리움 R1은 검증 가능한 중립성과 탈중앙성, 검열 저항성을 기반으로 한다”고 밝혔다.
개발진은 현재 대부분의 L2 프로젝트가 사실상 별도의 L1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전 배분된 토큰, 불투명한 구조, 중앙화된 지배력이 이런 경향을 나타내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많은 L2 플랫폼들이 민간 투자 유치와 토큰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거버넌스 구조 또한 일부 핵심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같은 발표는 최근 이더리움 커뮤니티 내부에서 커지고 있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L2 생태계가 이더리움 본연의 철학과 유산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러한 고민은 이더리움의 기술적 진화와도 맞물린다. 지난 3월 시행된 덴쿤(Dencun) 업그레이드를 통해 L2 네트워크의 수수료는 획기적으로 낮아졌고, 그 여파로 9월 기준 이더리움 베이스 레이어의 수익은 약 99% 가까이 급감했다. 수수료 수익이 급감한 이유는, 블록 공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2025년 4월 현재 기준 트랜잭션당 수수료가 약 0.16달러(약 230원)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수수료는 수요 및 트래픽 기반으로 형성된다. 다시 말해 높은 수요는 높은 수수료와 수익을 의미한다. 하지만 ‘L2 중심 구조’가 지속될 경우, 기존 베이스 레이어의 활용도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이런 구조가 장기적으로 네트워크 설계와 생태계 지속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이더리움 R1 프로젝트는 이러한 구조적 전환기에 등장한 실험적 접근으로, 탈중앙성 회복과 생태계 본연의 정체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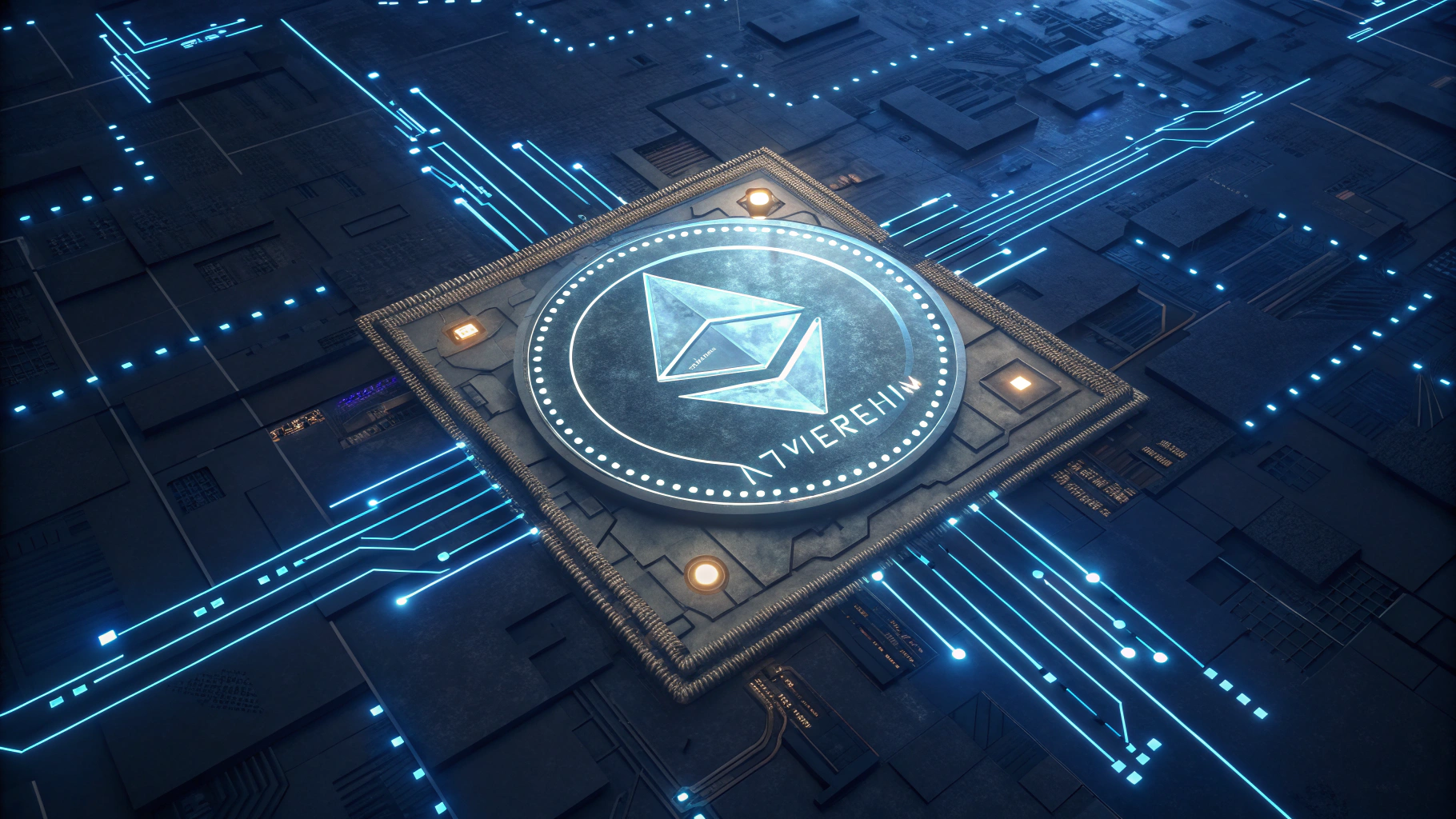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9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jnnmwwttwl.jpe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8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0l6qk9c4ub.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7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6ndj5dyz0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6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qhaxcpku8t.jpg)










![[KOL 인덱스] 빗썸 보상 공지에 쏠린 시선…커뮤니티 관심 이슈 부각 外](https://f1.tokenpost.kr/2025/11/9mjo5kppnz.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