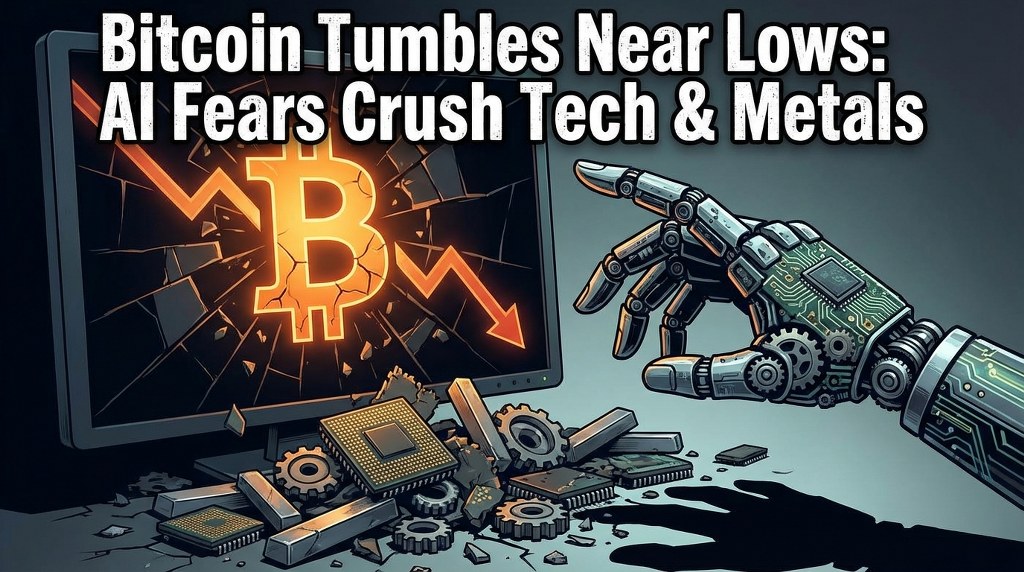지난 10년 동안 한국은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불과 2015년만 해도 약 200개에 불과하던 스케일업 스타트업 수는 2025년 현재 2,100곳을 넘어섰다. 이렇듯 드라마틱한 성장의 핵심 동력은 정부의 강력한 혁신 정책과 이에 따른 세부 KPI 설정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작한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다. 해당 프로젝트는 ‘베이비 유니콘’과 ‘프리 유니콘’이라는 체계적 단계 분류를 도입하며, 한국 스타트업의 성장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러한 전략은 한국이 중국과 인도를 제외하고 아시아 권역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술 창업 허브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스타트업 성장 지표에서도 한국의 약진은 두드러진다. 민간 싱크탱크 ‘마인드 더 브릿지(Mind the Bridge)’가 크런치베이스와 함께 발표한 ‘Tech Scaleup South Korea 2025’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총 스케일업 수에서 일본(2,268개)에 근접한 2,127개를 기록 중이며, 투자유치 총액에서는 이미 일본을 추월했다. 한국 스케일업이 유치한 누적 자금은 760억 달러(약 109조 4,000억 원)로, 일본의 460억 달러(약 66조 2,000억 원)를 크게 웃돈다.
일본이나 호주와 같은 주요 아시아태평양(APAC) 국가들과 비교해도 한국의 성장 속도는 단연 돋보인다. 10년 전만 해도 호주(281개)가 한국(228개)보다 더 많은 스케일업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35% 이상 앞서고 있다.
특이한 점은 서울 중심의 생태계를 넘어서 지역균형발전 모델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이 전체 스케일업의 73%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지만, 경기도, 대전, 부산, 인천 등에서도 독자적인 기술 창업 클러스터가 빠르게 성장 중이다. 대덕연구단지를 토대로 시작된 ‘연구개발특구’ 정책은 현재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대 권역과 14개 이노타운을 포괄하는 과학기술 혁신 허브로 확대되며 지역 생태계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글로벌기업의 관심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2025년 기준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중 38곳이 한국에 혁신센터나 R&D 거점을 운영 중이며, 이들은 로보틱스, 인공지능, 산업자동화 및 첨단 제조 분야에서의 한국의 기술적 깊이와 협업 중이다. 이탈리아 조선업체인 핀칸티에리(Fincantieri)를 비롯한 글로벌 선도 기업들도 최근 한국에 연구개발법인을 설립하며 첨단기술 협력에 나섰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따라잡고 있는 국가가 아니라, 전략적 국가 혁신 시스템으로 글로벌 벤치마크가 되는 사례로 부상했다. 전통적인 제조 강국에서 ‘딥테크 중심 창업국’으로의 전환은 이미 진행형이며,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정책, 자본, 인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적 생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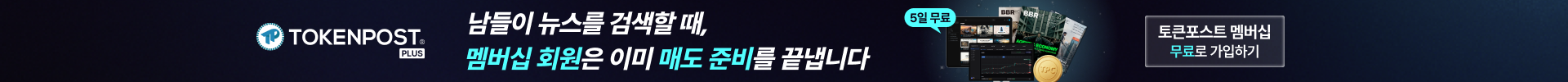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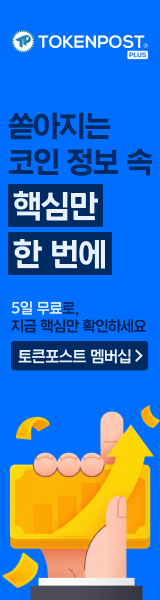










 2
2




![[KOL 인덱스] 비트코인 STH 원가 9만달러 하회에 커뮤니티 촉각 外](https://f1.tokenpost.kr/2025/11/9mjo5kppnz.jpg)
![[미래분석] 케임브리지:](https://f1.tokenpost.kr/2026/02/zplbo1pkhr.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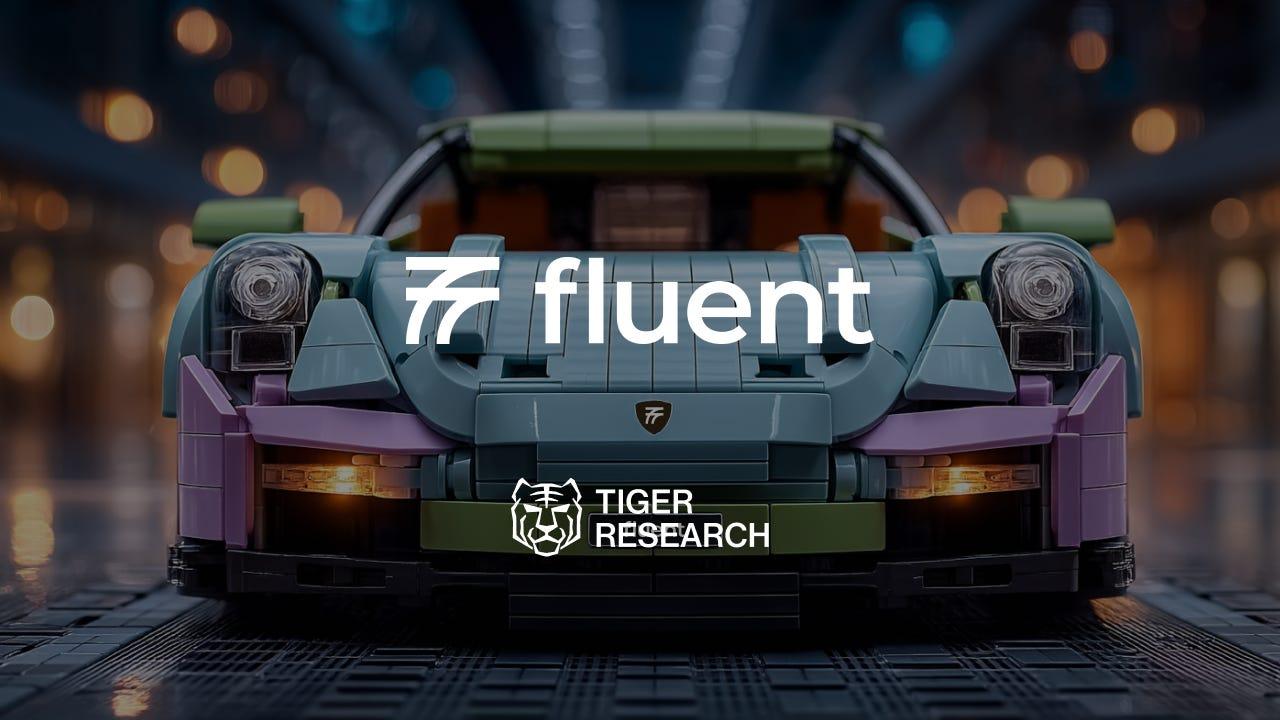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36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3zpnuqh8qh.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35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h11k1htgnt.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34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qetvwueue8.webp)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33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yxki8fbsgk.webp)



![[BTC 사이클 트래커] 비트코인 6만6000달러 사수…7만 달러 저항에 막힌 채 하락 채널 고착화](https://f1.tokenpost.kr/2025/09/3vz1g4s6wu.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