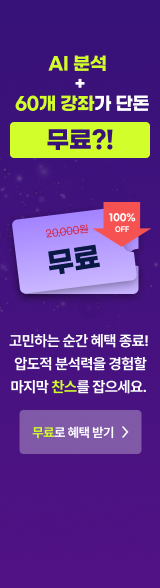구글 클라우드가 자체 레이어1 블록체인 Google Cloud Universal Ledger(GCUL) 을 발표하며 금융권 블록체인 전략을 본격화했다.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인 CME 그룹과 협력해 도매 결제 및 자산 토큰화 실험에 착수했으며, 올해 안에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직접 테스트를 진행하고,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연구가 아닌, 글로벌 금융 인프라 혁신을 겨냥한 본격적인 행보다.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동시에 겨냥한 구조
GCUL은 프라이빗·퍼미션드 네트워크 기반으로 설계돼 금융기관을 위한 폐쇄형 인프라처럼 보인다. 그러나 구글은 이미 이더리움·솔라나·아발란체 등 주요 퍼블릭 블록체인 노드를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모두 연결하는 이중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는 곧 전통 금융망과 개방형 Web3 네트워크를 잇는 글로벌 브리지 허브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스마트계약 언어로 Python을 선택한 점도 눈에 띈다. 금융권은 데이터 분석과 리스크 관리, 알고리즘 트레이딩에 이미 파이썬을 폭넓게 활용 중이다. Solidity 대신 Python을 지원하는 것은 곧 “금융기관이 별도의 블록체인 전문 인력 없이도 쉽게 진입할 수 있다”는 신호로, 대규모 도입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다.
CME 협업이 주는 의미
GCUL의 실험 파트너로 CME가 나선 것은 결정적이다. CME는 글로벌 파생상품 시장의 핵심 인프라를 장악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들이 직접 토큰화와 정산 실험에 참여한다는 것은 GCUL이 단순한 PoC(개념 검증)를 넘어 실제 금융 시스템 개선을 겨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글과 CME는 대차담보, 증거금, 정산, 수수료 지급 같은 기존 금융 프로세스를 DLT(분산원장기술) 기반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금융거래를 24/7 운영 가능한 인프라로 발전시킬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빅테크 금융 인프라 패권 경쟁
GCUL은 구글의 단독 플레이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곧 빅테크 간 금융 인프라 패권 경쟁의 서막이기도 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2023년 Azure Confidential Ledger를 공개하며 금융 블록체인 실험에 나섰고, 아마존 AWS 역시 글로벌 금융기관 고객을 기반으로 언제든 유사한 플랫폼을 내놓을 수 있다.
이 경쟁은 단순히 속도나 비용 문제가 아니라 규제 준수, 글로벌 확장성, 파트너 생태계를 좌우하는 싸움이다.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온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는 금융 인프라 운영권을 놓고 맞붙는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는 셈이다.
스테이블코인 논의의 확장
흥미로운 점은 스테이블코인 논의의 방향 전환이다. 지금까지는 “누가 발행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어떤 플랫폼에서 발행·운영되는가”가 더 중요한 질문으로 떠오를 수 있다. GCUL은 바로 이 새로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시할 수 있다.
구글의 GCUL은 단순히 금융기관 친화적인 블록체인 솔루션이 아니다. 이는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금융망을 아우르는 글로벌 허브를 구축하려는 중장기 전략이며, 동시에 MS·AWS와의 금융 인프라 경쟁을 불러올 빅테크 블록체인 전쟁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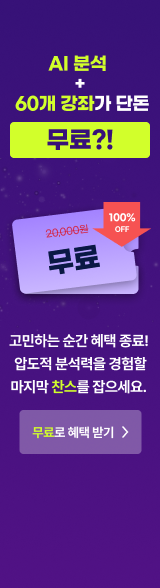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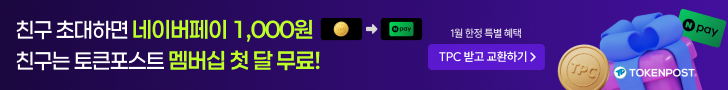








 7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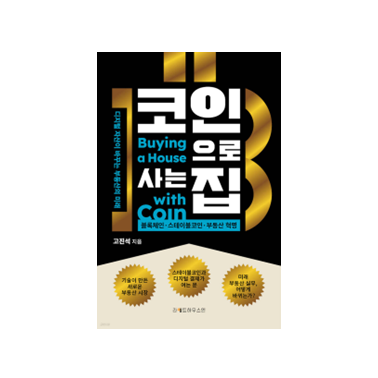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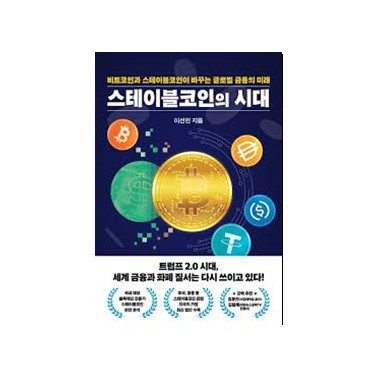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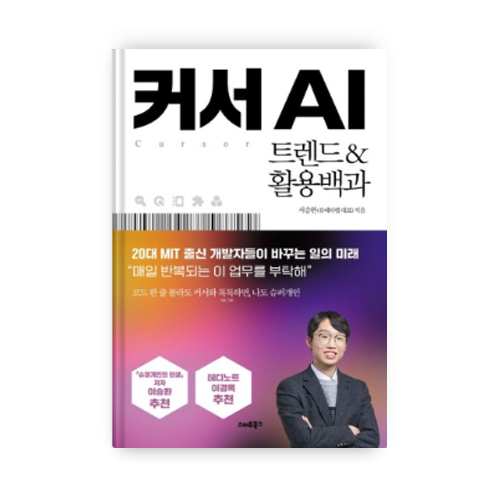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16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kdyt9nueaz.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15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xgxcvpw0z7.pn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14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p4u5wsszac.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13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1lhf5bppnp.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