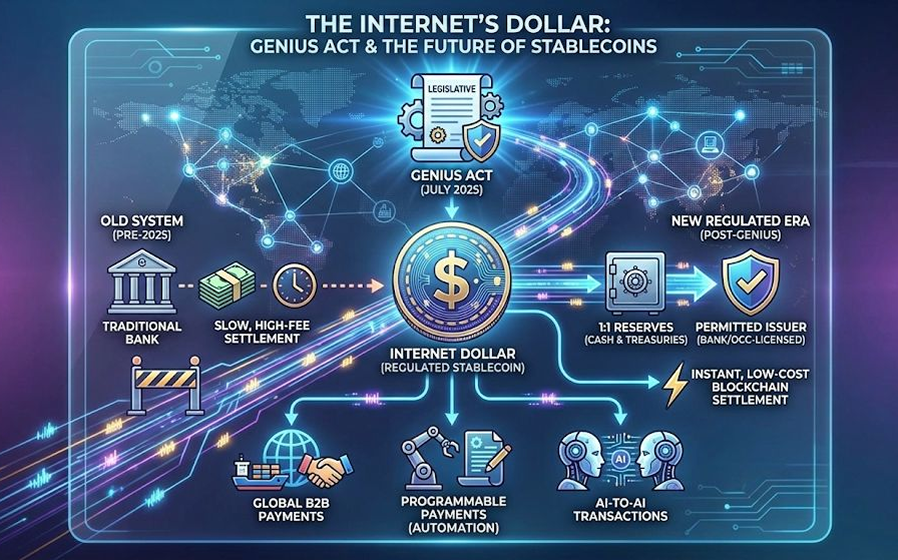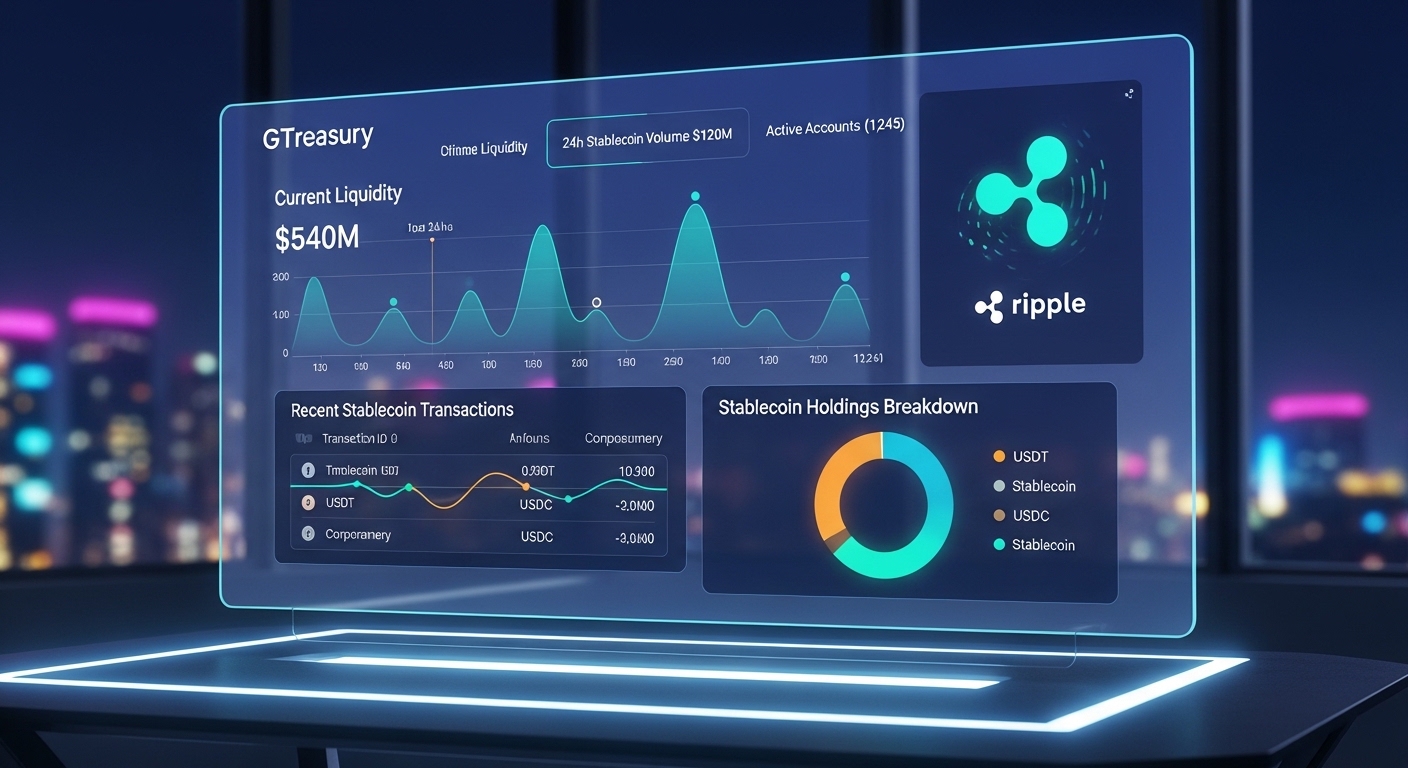100달러짜리 지폐 한 장이면 예전에는 저녁식사와 영화, 술 한잔까지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돈으로 식사조차 턱없이 부족하다. 미래는 어떨까? 10년 뒤에는 그 구매력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단순한 ‘운 나쁜 시대’의 문제가 아니다. 현대 화폐 시스템의 구조적 특징이자, 인플레이션이 일상화된 세상의 현실이다.
코인텔레그래프가 공개한 새로운 영상은 화폐의 구매력이 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지, 더 나아가 정부가 왜 이런 구조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지를 진단한다. 이야기의 시작은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 미국 달러는 금 1온스당 35달러에 고정됐고, 세계 통화 시스템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1971년 ‘닉슨 쇼크’로 금본위제는 폐지됐고, 달러는 정부 신뢰만을 바탕으로 한 법정화폐로 전환됐다.
이후 물가 상승과 함께 통화의 실질 가치도 꾸준히 하락했다. 1971년 1달러의 구매력을 회복하려면 오늘날 7달러(약 9,730원)가 필요하다. 단순한 통화 공급 증가 외에도 에너지 충격, 공급망 붕괴, 인건비 상승 등 다양한 요인이 물가를 끌어올렸다. 그럼에도 중앙은행은 연 2%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건전한 경제활동’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법정화폐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떨어지는 구조인 셈이다.
그렇다면 저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혹은 이런 법정화폐 시스템에 대안은 존재할까? 일부 전문가들은 금이나 비트코인(BTC)처럼 공급이 제한된 자산이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들은 희소성 덕분에 지속적인 구매력 유지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탄력적인 화폐 공급이 없어진다면 국가 경제는 부채에 짓눌려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제기된다.
영상은 인플레이션의 역사적 맥락과 위험성, 자산 보호를 위한 주요 전략까지 폭넓게 다뤘다. 화폐 가치의 하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통찰을 제공한다. 전체 영상은 코인텔레그래프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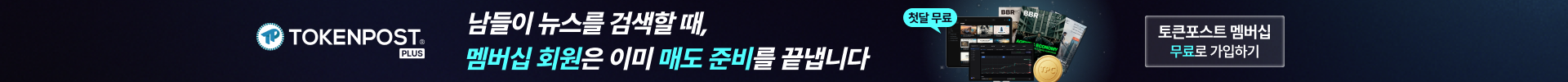


















 1
1






![[토큰분석] “상장만 하면 –80%”… 시장 탓 말고 ‘출구로 설계된 상장’부터 바꿔야 한다](https://f1.tokenpost.kr/2026/01/v8tqormszy.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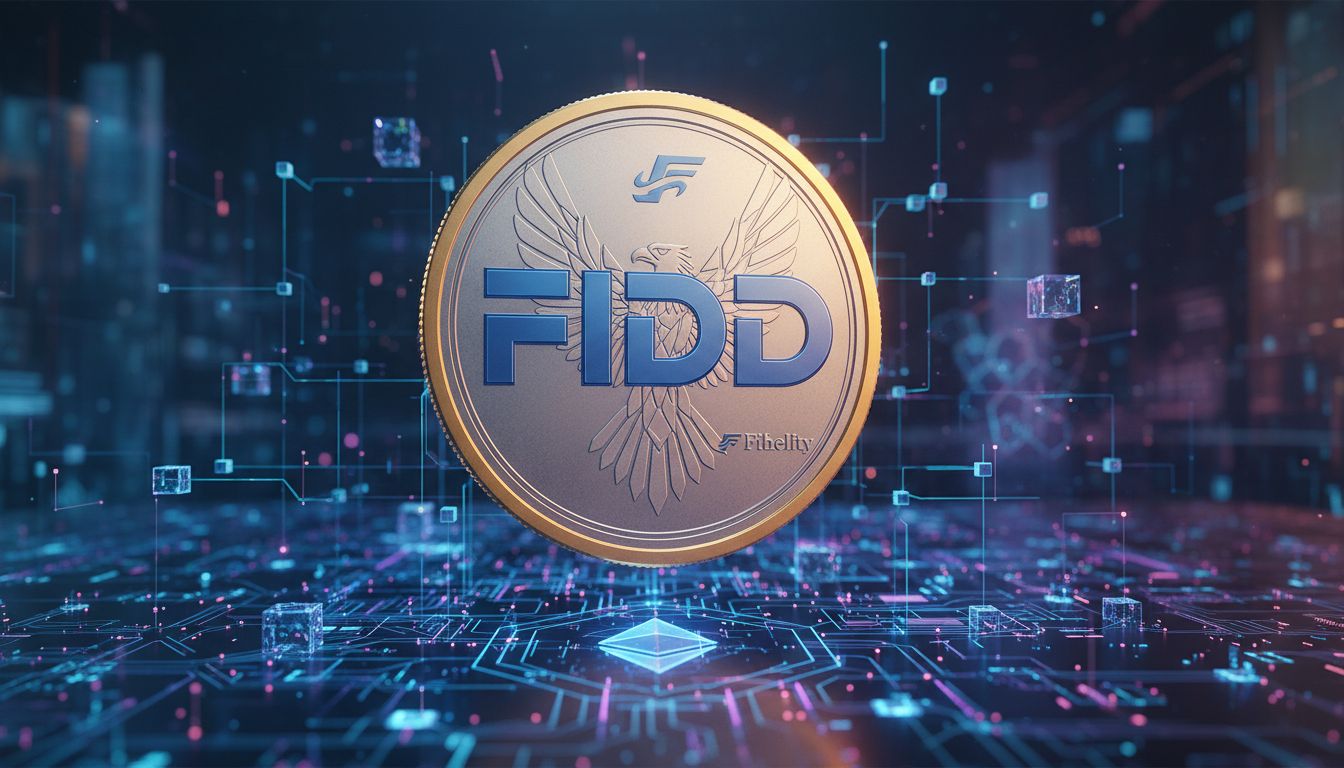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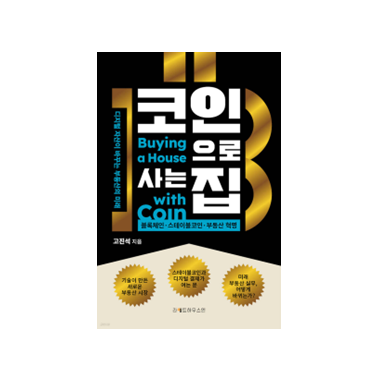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2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aims5420dh.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1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f2femcntpq.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0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y648ak216n.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19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k3bqfcj1o8.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