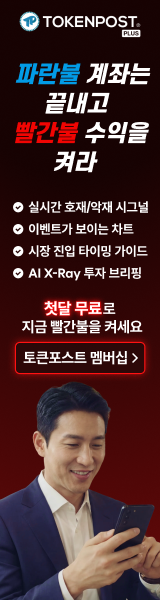투자자들의 수익형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이 흐름을 반영한 수익형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히 미 달러에 가치를 고정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보유만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는 점에서 기존 스테이블코인과 차별화된다. 최근 시장에서는 미국 국채 기반 모델부터 탈중앙화파이낸스(DeFi), 파생상품 연계형 등 다양한 방식의 수익형 토큰이 등장하고 있다.
기존에는 테더(USDT), USDC 등과 같은 스테이블코인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였지만, 이제는 국채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디파이 모듈에 예치해 금리를 받고, 파생상품 전략을 통해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까지 도입되고 있다. 예컨대 온도 파이낸스가 발행한 USDY는 단기 미 국채와 은행예금으로 뒷받침되는 구조로, 매일 잔액이 증가하는 리베이스 방식으로 수익을 배분한다. 디파이 기반인 sDAI는 다이(DAI)를 저장해두면 프로토콜에서 설정한 비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다.
하지만 이처럼 매력적인 구조에도 불구하고 법적 리스크와 규제의 벽은 여전히 높다. 미국과 유럽은 일정 기준 이상의 수익 지급을 증권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토큰의 민팅 및 거래가 지리적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 투자자 대상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예컨대 USDY는 미국 내로의 이동이 제한되고, Circle의 경우에는 승인된 기관 파트너만이 USDC를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수익형 스테이블코인의 수익 배분 방식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일부는 리베이스 형식으로 토큰 수량이 자동 증가하며, 또 어떤 모델은 토큰 수량은 그대로인 채 가치가 상승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 차이는 지역별 세법 적용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같은 수익이 지급 시점에 과세 소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수익 발생 시점과 규모를 정밀하게 기록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익형 스테이블코인을 추가 수익 수단으로 활용하는 투자자들도 있다. 디파이 대출 플랫폼이나 유동성 풀, 구조화 상품 등에서 투입해 더 높은 수익을 노리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전략은 수익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 변동성, 스마트 계약 취약점, 유동성 위험에 노출돼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수익형 스테이블코인이 단기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그 기반이 되는 법적 지위, 수익 배분 구조, 발행 프로토콜의 거버넌스 구조 등 복합적 요소들을 충분히 파악한 후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단순히 ‘수익이 난다’는 이유만으로 진입하기엔 고려할 사항이 많고, 잘못된 판단은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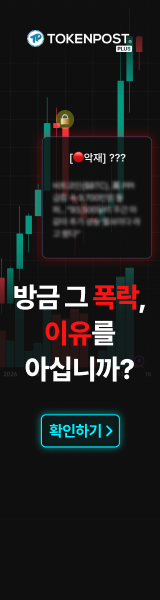










 2
2






![[KOL 인덱스] 美 셧다운 종료에 투심 회복 조짐… 바이낸스 '저점 매수'에 주목](https://f1.tokenpost.kr/2025/11/9mjo5kppnz.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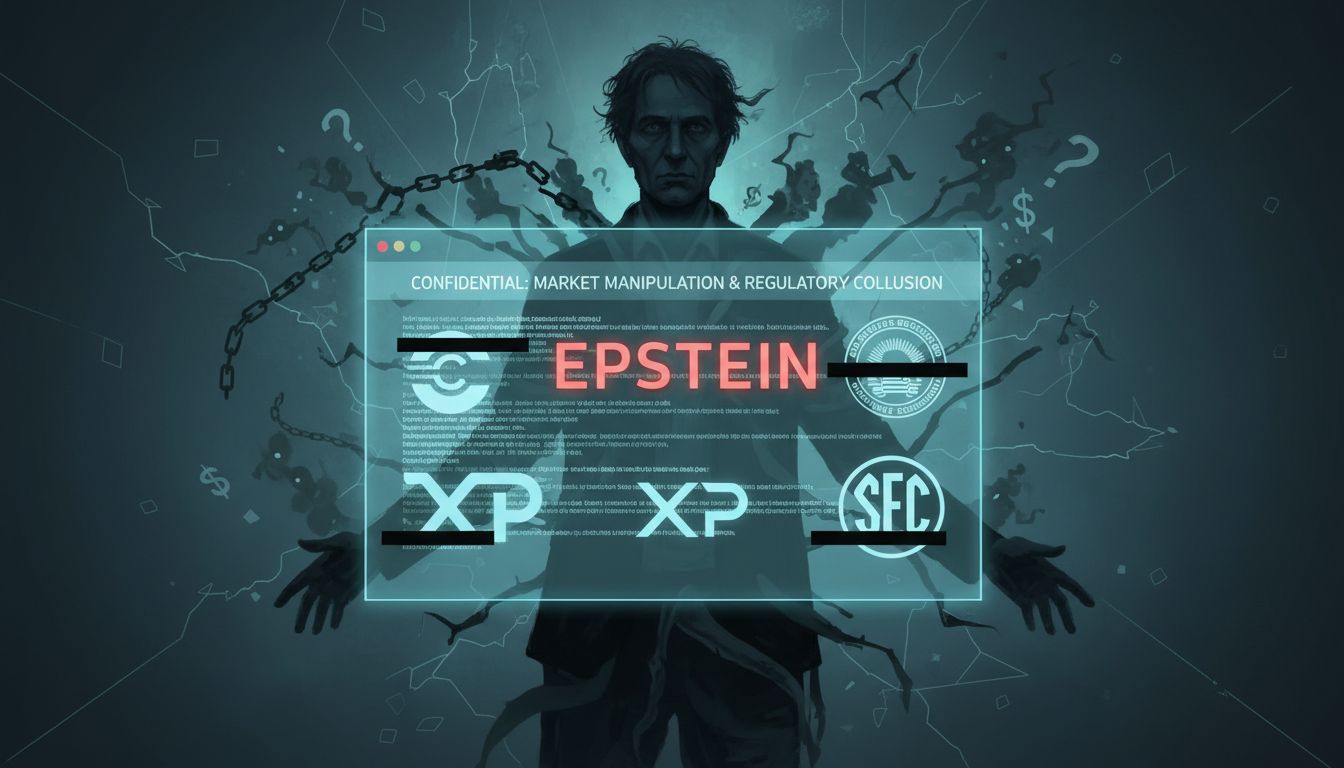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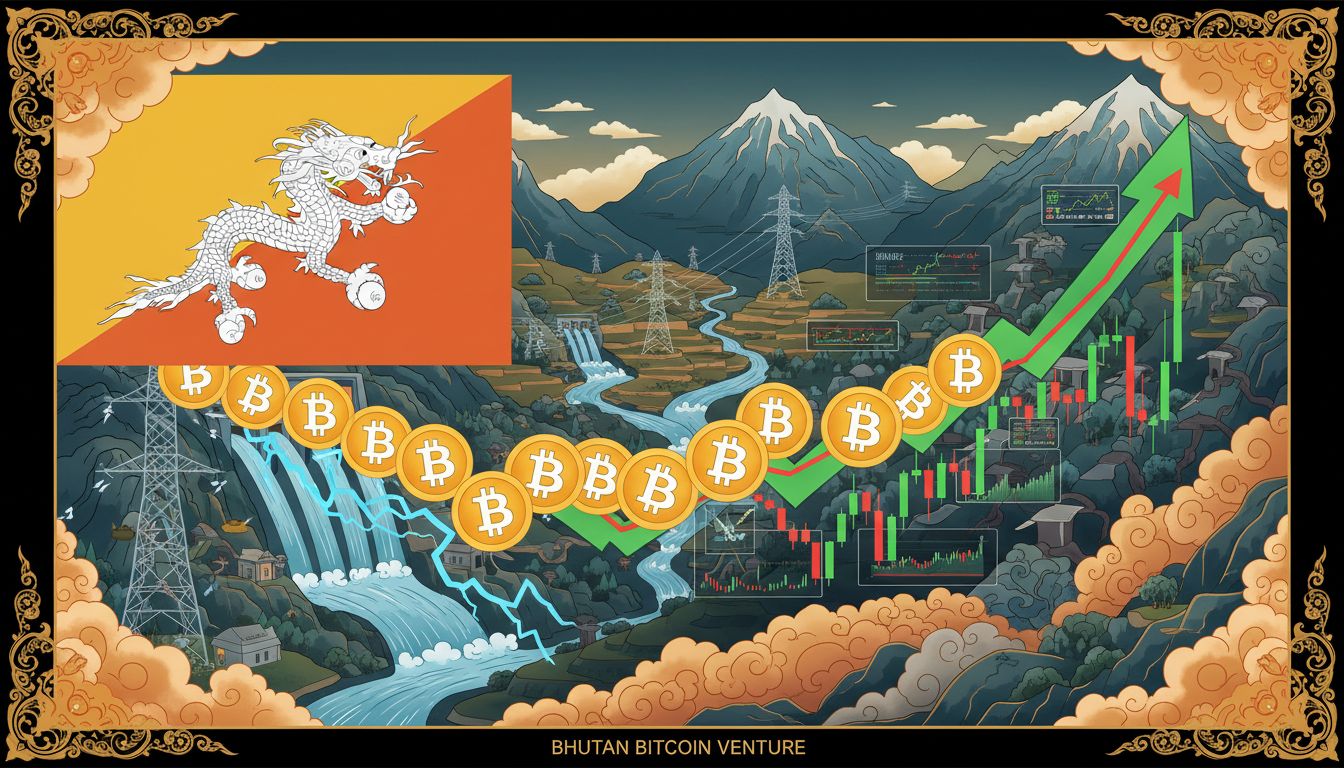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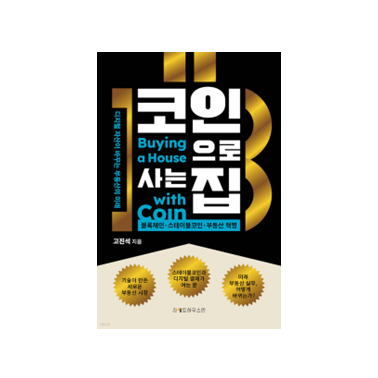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7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6ndj5dyz0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6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qhaxcpku8t.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5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rx65p108a9.jpe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4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2t5hhgg60k.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