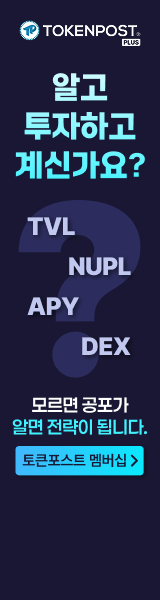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그 효과를 가늠할 주요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 실질소득은 임금을 물가상승률로 조정해 산출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제 구매력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수치다.
최근 백악관은 실질소득 지표가 상승했다고 강조하며, 노동자 친화적인 경제 상황을 입증하는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2025년 4월 기준 실질 평균 시간당 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물가 상승률이 억제된 가운데 임금이 꾸준히 오른 결과다. 이는 트럼프 경제의 초기 국면에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소폭 개선됐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다른 방식의 측정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만 16세 이상 전일제 근로자의 실질 주급 중앙값은 오히려 전 분기보다 주당 2달러 줄어들었다. 이는 실질주급이 1982~1984년 기준 달러로 환산됐기 때문이다. 당시 기준으로 1분기 평균 주급 1,194달러는 약 373달러의 구매력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실질소득 지표가 특히 지금처럼 인플레이션과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큰 시점에서 더욱 현실적인 경기 체감도를 반영한다고 분석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유지하고 있는 고율 관세 정책은 향후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경기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물가상승은 근로소득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실질소득 지표는 팬데믹 초기 조작된 통계 왜곡을 감안하면 현재가 오히려 경제 진단에 더 적절한 시기라는 평가도 있다. 2020~2021년 당시 저임금 노동자 대량 해고로 평균 임금이 인위적으로 오른 것처럼 보였던 데 반해, 지금은 고용 구조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서다.
미국 정부가 집계한 실질주급 통계는 1979년 이래 평균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왔다. 이 기간 미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성장하면서 인당 생산성도 향상돼, 임금대비 실질 구매력도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다만 현재 관세와 미중 무역 긴장 등 대외 리스크 요인들이 실질소득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관찰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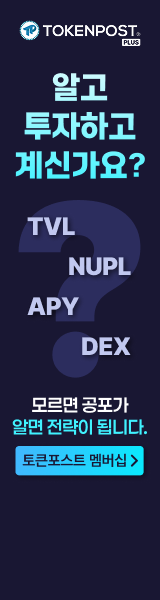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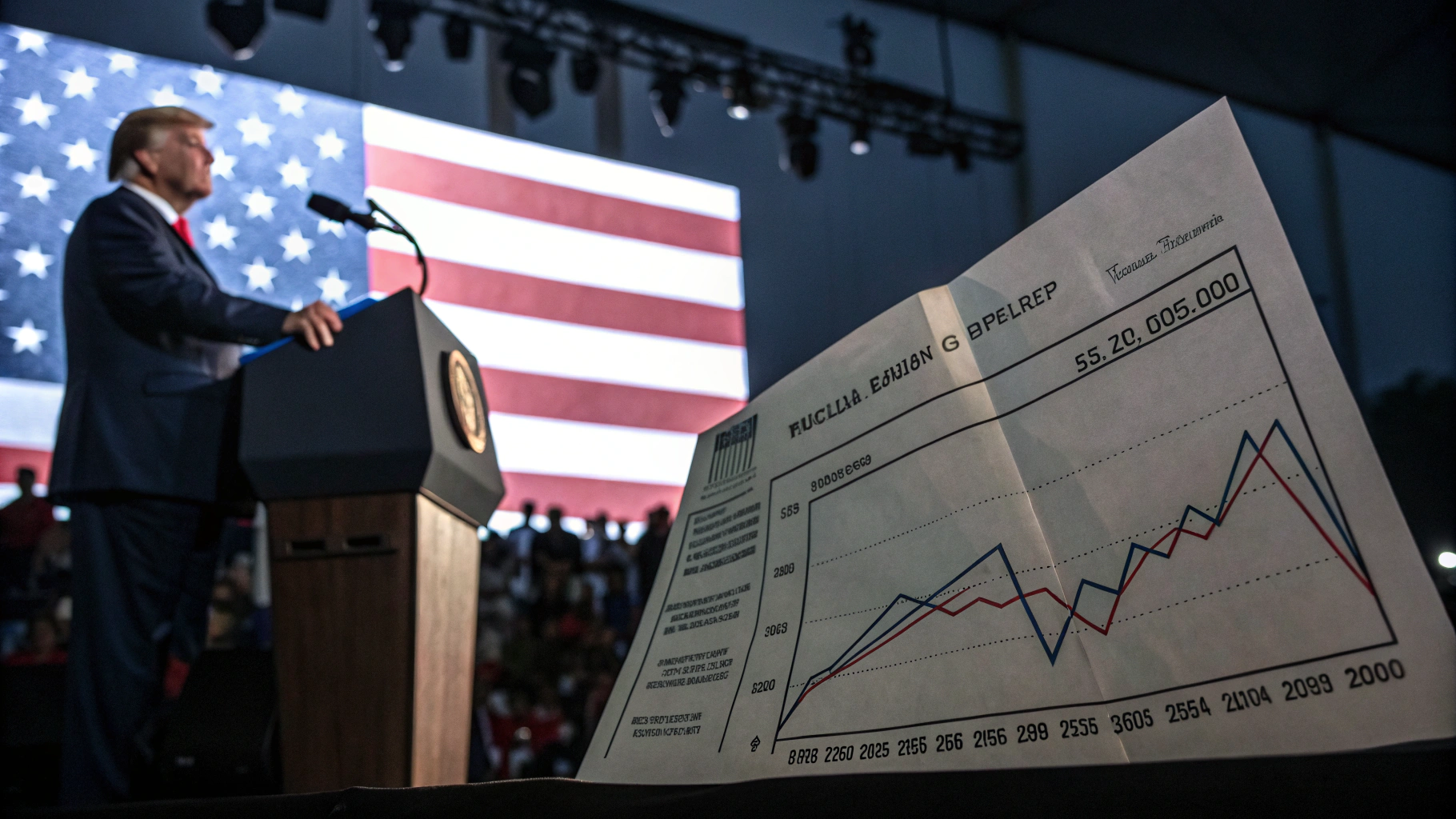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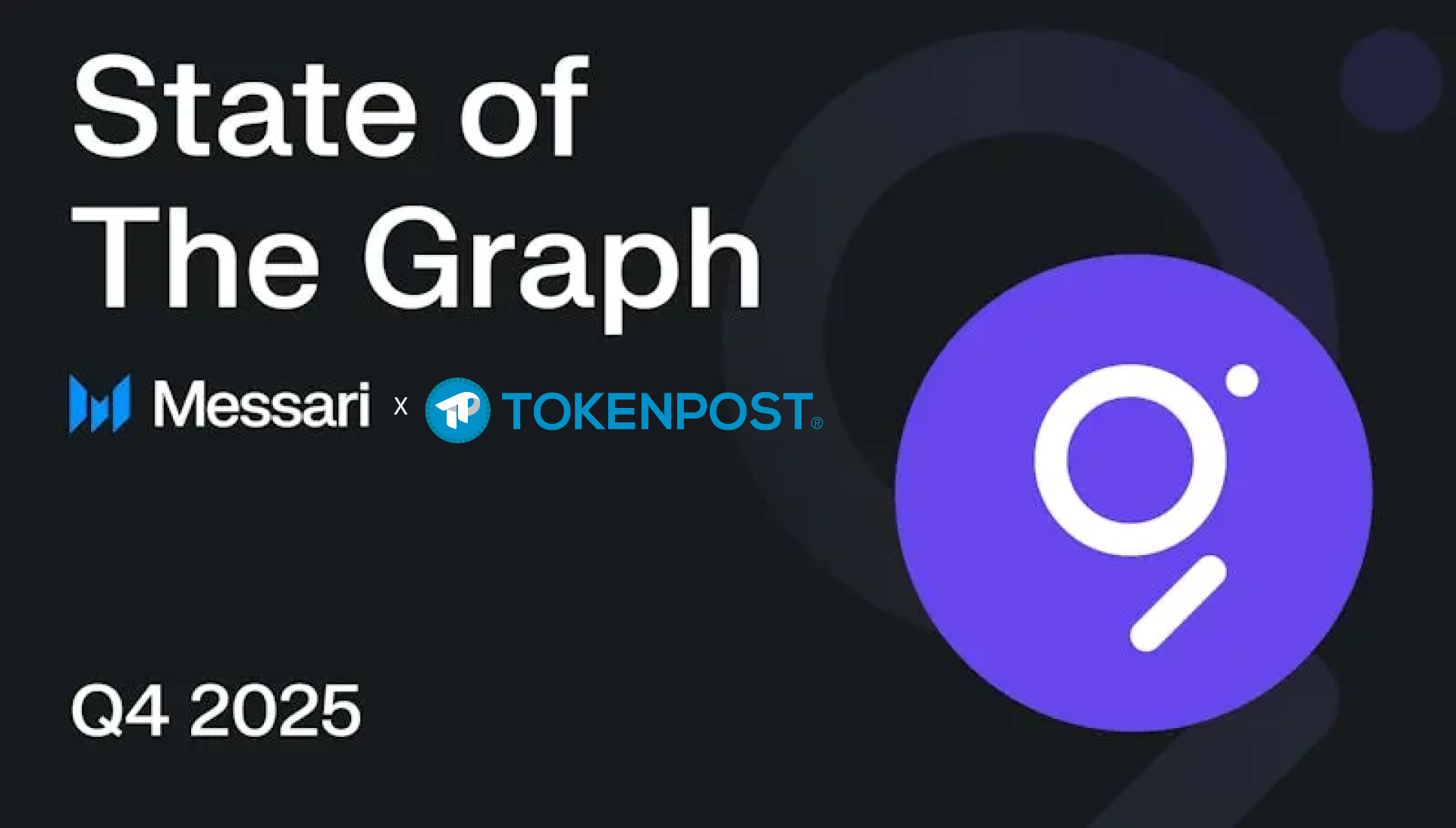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42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ybgphvyjr7.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41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g27ndxvfxv.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40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s74dobfws9.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39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celz7zpk2n.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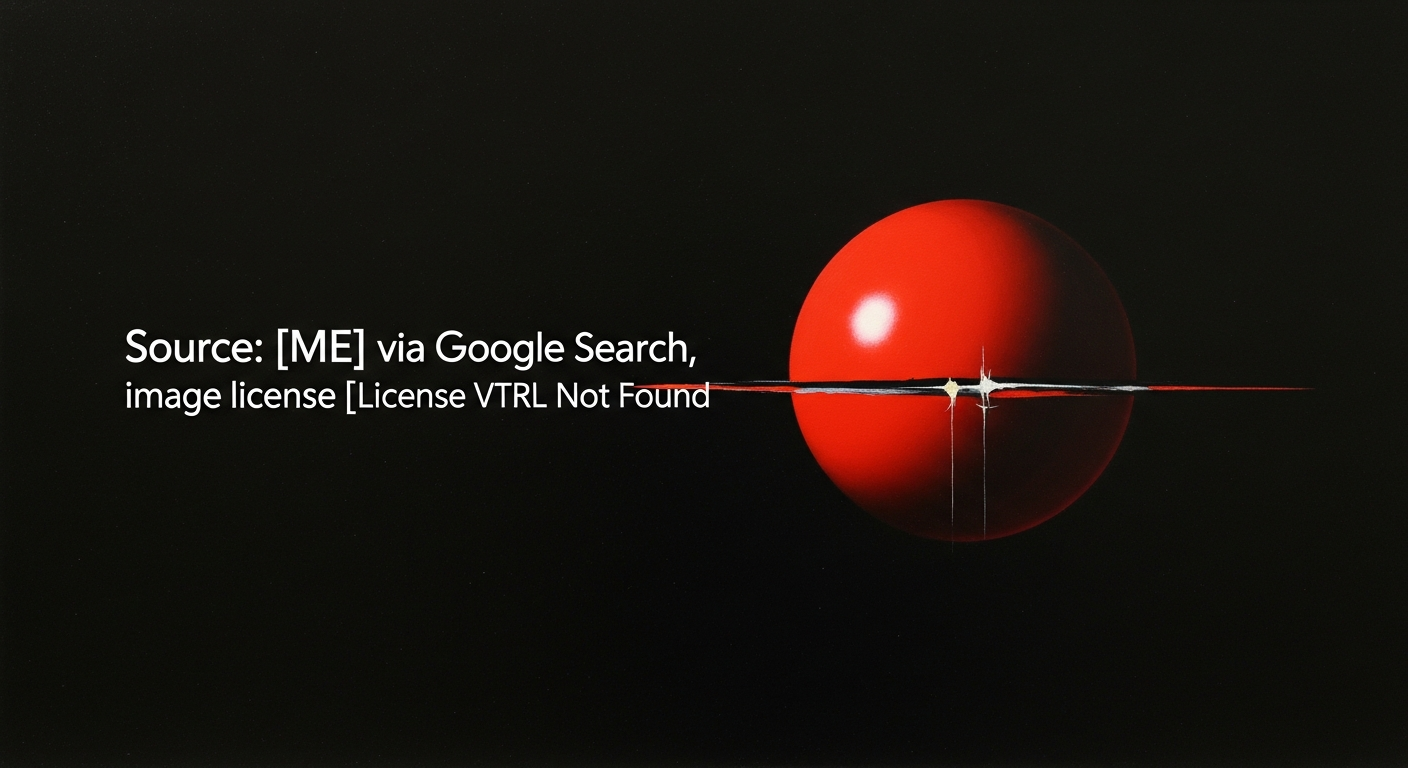
![[국제금융 브리핑] 미 고용 ‘저해고·저채용’ 확인…연준 4회 인하론 vs IMF 1회 전망](https://f1.tokenpost.kr/2026/01/aj2ndkuaci.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