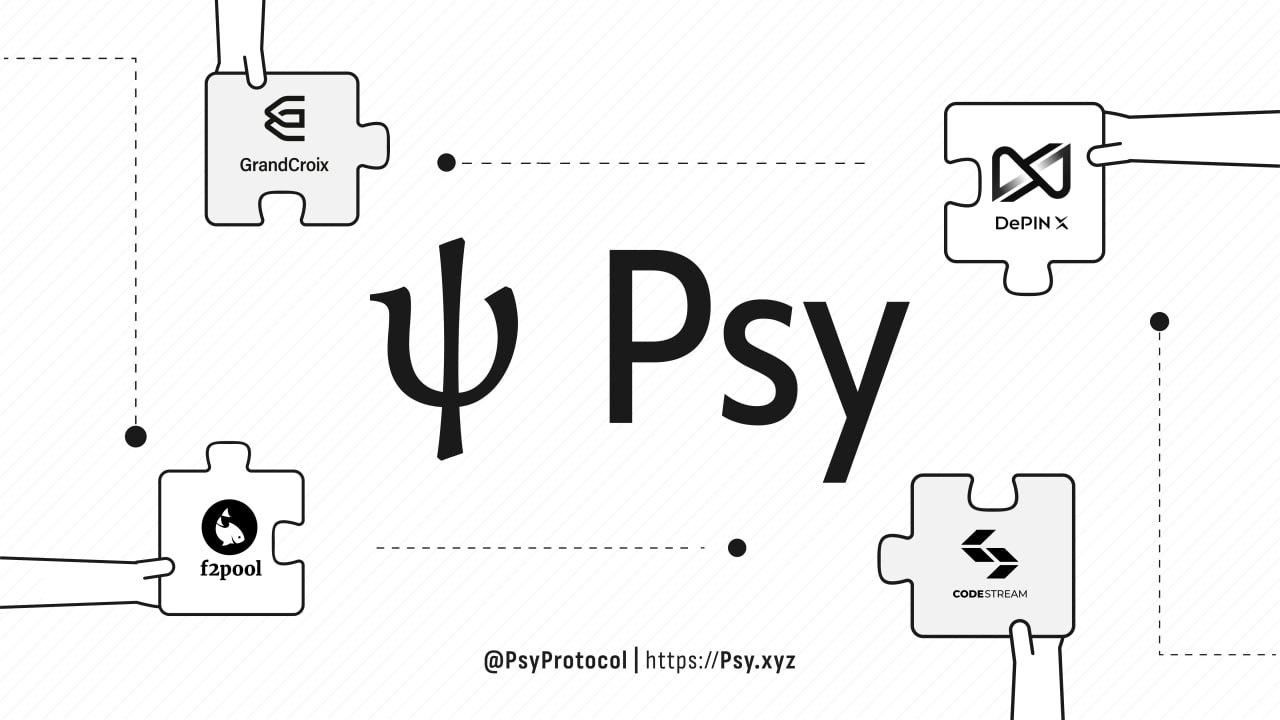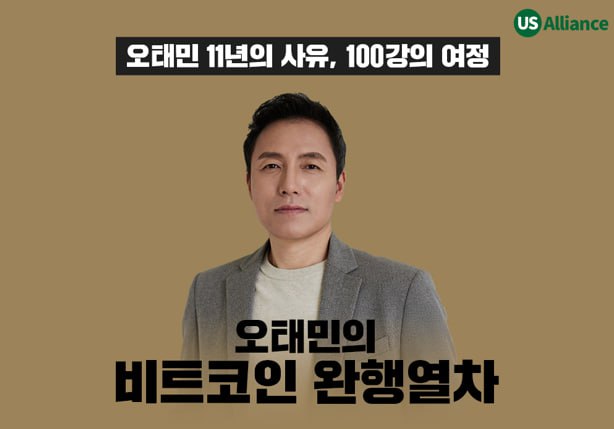인터넷 장애가 드러낸 중앙화 의존의 취약성
최근 X(트위터)를 비롯한 주요 웹사이트와 AI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접속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은 “인터넷이 통째로 멈춘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비스가 느려지거나 오류 메시지가 반복되면서 온라인에서는 “오늘 인터넷에 무슨 일이 생긴 거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조사 결과는 단순했다. 핵심 역할을 맡은 중앙화 인프라 업체 한 곳에서 발생한 단일 구성 오류가 전 세계적 서비스 장애로 번진 것이다. 트래픽이 몇몇 관문에 집중된 인터넷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MOVA는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이런 수준의 장애가 웹사이트가 아니라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서 발생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문제 의식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온라인 쇼핑이 멈추는 것과 금융 정산 레이어가 멈추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한다.
블록체인이 진짜 해결해야 할 문제… “속도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가”
MOVA CTO는 블록체인 기술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경험을 설명하며, 실제 금융기관이 블록체인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TPS(초당 거래 처리량)’이 아니라 ‘이 시스템이 어느 순간 중단되지 않을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퍼블릭체인은 △한 번 멈추면 전부 멈추는 선형 구조 △전파 시간이 예측되지 않는 가십 네트워크 △네트워크가 불안정할 때 흔들리는 파이널리티 △클라우드 인프라 의존으로 인한 단일 실패 지점 등 여러 구조적 제약을 가지고 있다.
MOVA는 기존 구조를 일부 개선하는 방식이 아닌, “금융 인프라라면 처음부터 어떻게 설계돼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에서 개발을 시작했다.
하이퍼큐브 기반 네트워크… “운에 맡기지 않는 전파 구조”
MOVA는 네트워크 단계부터 기존 체인과 다른 방식을 채택했다. 전통적인 퍼블릭체인은 무작위 가십을 통해 트랜잭션을 퍼뜨리는데, 이 방식은 평균값은 빠를 수 있어도 ‘최악의 시간’을 보장하기 어렵다.
MOVA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이퍼큐브(Hypercube) 구조를 도입했다. 이 방식은 △노드 수가 수백 개에서 수만 개로 늘어도 각 노드는 적은 수의 이웃만 연결하면 되고 △전체 전파 시간도 log N 수준에서 유지되며 △네트워크 전파 경로가 확률이 아닌 수학적 구조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CTO는 “금융 시스템은 대부분의 경우 빠른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전파가 어느 정도 시간을 넘지 않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하이퍼큐브는 그 상한선을 명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전파 과정 자체가 합의가 되는 HashCube HyperDAG
네트워크 위에는 MOVA 고유의 ‘HashCube HyperDAG’ 합의 구조가 적용된다. 다른 DAG 기반 체인들이 전파와 DAG 구축을 별도의 과정으로 다루는 것과 달리, MOVA는 두 과정을 하나로 설계했다.
트랜잭션은 하이퍼큐브 경로를 따라 확산되고, 노드는 이웃에게서 받은 트랜잭션을 자신의 트랜잭션과 함께 다시 전달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뒤집힌 트리 형태의 DAG가 만들어진다. 시간이 지나면 DAG는 특정 루트로 수렴하고, 그 루트가 해당 라운드의 최종 결과가 된다.
이 구조에서는 특정 리더를 뽑거나 블록 생성 경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 CTO는 “합의는 누가 이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트워크가 스스로 어떤 지점을 중심으로 수렴하느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Proof-of-Visibility… “누가 블록을 만들었나”가 아닌 “얼마나 많이 확인됐나”
MOVA의 파이널리티는 ‘가시성(visibility)’ 개념을 기준으로 확정된다. 트랜잭션이 충분히 많은 노드에서 확인되고, DAG 상에서 일정 깊이와 범위를 확보하면 파이널리티에 도달한다.
이를 통해 △PoW 같은 고비용 방식이 필요 없고 △다중 투표 라운드처럼 복잡한 BFT 과정도 생략되며 △네트워크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파이널리티가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특히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파이널리티 상한 시간’을 수학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MOVA는 “파이널리티가 거의 되돌려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파이널리티가 최대 몇 초 안에 확정된다”는 형태의 확답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합의 성능을 그대로 살리는 병렬 실행 구조
MOVA는 실행 레이어도 병목이 없도록 설계했다. 많은 체인이 합의는 높은 성능을 내지만, 실제 실행 단계에서는 단일 스레드 구조 때문에 체감 TPS가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MOVA는 △멀티코어 기반 병렬 트랜잭션 처리 △GPU를 활용한 대량 서명 검증 △트랜잭션 충돌 감지와 병합 스케줄링 등을 적용해 실행 단계에서도 합의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설계했다.
금융기관 요구 반영… Merkle이 아닌 Verkle Tree 채택
금융기관이나 결제업체가 블록체인을 사용할 때는 상태 검증이 잦고 비용도 적어야 한다. 기존 Merkle Tree는 증명 크기가 크고 라이트 클라이언트 성능이 낮아 금융급 환경에서는 한계가 있다.
MOVA는 처음부터 Verkle Tree를 채택해 △작은 증명 크기 △빠른 상태 동기화 △효율적인 감사 △크로스체인 증명 안정성 등을 확보했다.
글로벌 네트워크도 실제 지리 기반으로 재설계
많은 퍼블릭체인이 ‘전 세계에 노드를 분산했다’고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지역 간 지연을 고려하지 않아 성능 편차가 발생한다. MOVA는 지역을 구분한 이원적 네트워크 구조를 적용했다.
지역 내부는 10~50ms 수준의 하이퍼큐브 구조를 유지하고, 지역 간 통신은 해저 케이블 루트를 반영해 100~300ms의 예측 가능한 지연을 제공한다. 국경 간 결제나 글로벌 자산 거래를 염두에 둔 설계다.
MOVA는 L1에만 집중… “도로를 깔면, 차는 생태계가 만든다”
MOVA는 일부 프로젝트가 L1과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개발하는 것과 달리, 기반 레이어만 전문적으로 구축한다는 전략을 강조했다. CTO는 “우리는 정산을 위한 고속도로를 놓는 것이 목표이며, 그 위에서 어떤 서비스가 구축되는지는 개발자와 생태계가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목표는 ‘더 빠른 블록체인’이 아니라 ‘아키텍처적으로 옳은 블록체인’
CTO는 MOVA의 목표를 “단순히 TPS가 높은 체인”이 아니라 “오늘날 인터넷 인프라보다 고장나기 어려운 정산 레이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하이퍼큐브 네트워크 △HashCube HyperDAG △Proof-of-Visibility △병렬 실행 △Verkle Tree △예측 가능한 글로벌 레이턴시 설계 등 MOVA만의 구조를 채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장애는 앞으로도 반복되겠지만, 자산과 결제를 다루는 레이어만큼은 단일 장애 지점으로 흔들리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며 “MOVA는 그런 체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Mova 글로벌 커뮤니티 앰버서더 모집 프로그램 신청
👉 지금 신청하기 – Mova 글로벌 앰버서더 프로그램 https://forms.gle/t4QT5XFrkLBWaeiH6
심사 기간은 5–7 영업일이며, 결과는 이메일 또는 텔레그램 DM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총 상금 $2,000 규모의 MOVA 커뮤니티 스프린트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전용 Zealy(질리) 보드에서 커뮤니티 미션을 완료하고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퀘스트 시작하기: https://zealy.io/cw/movacommunity/questboard/spri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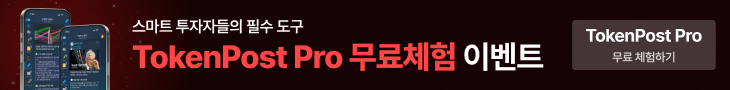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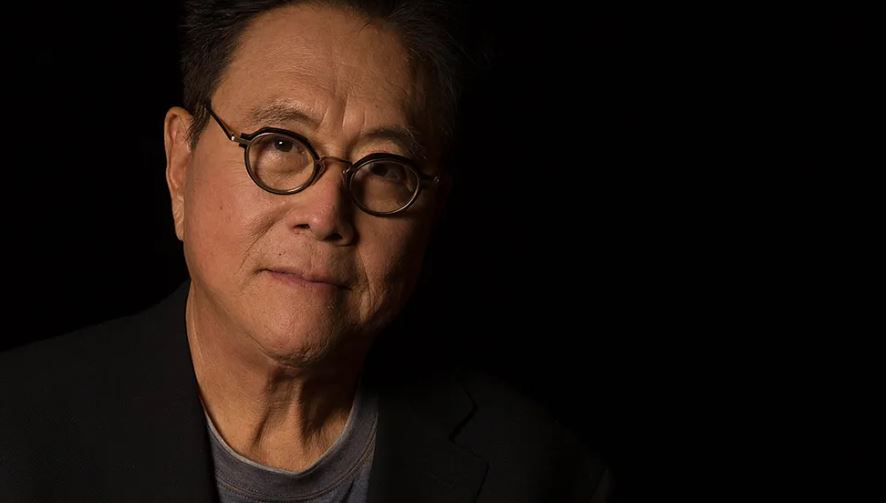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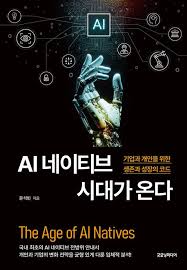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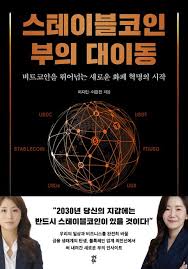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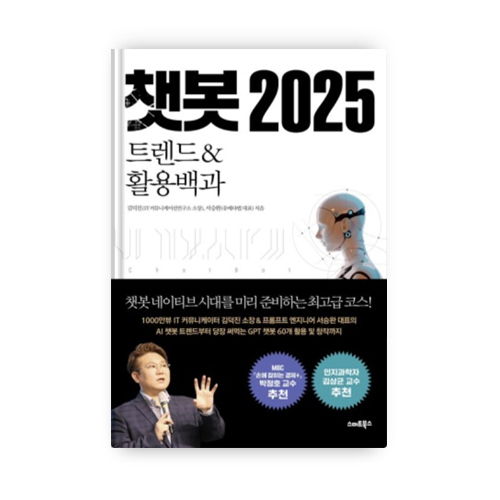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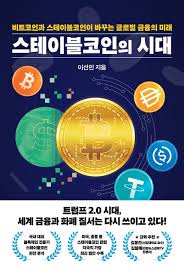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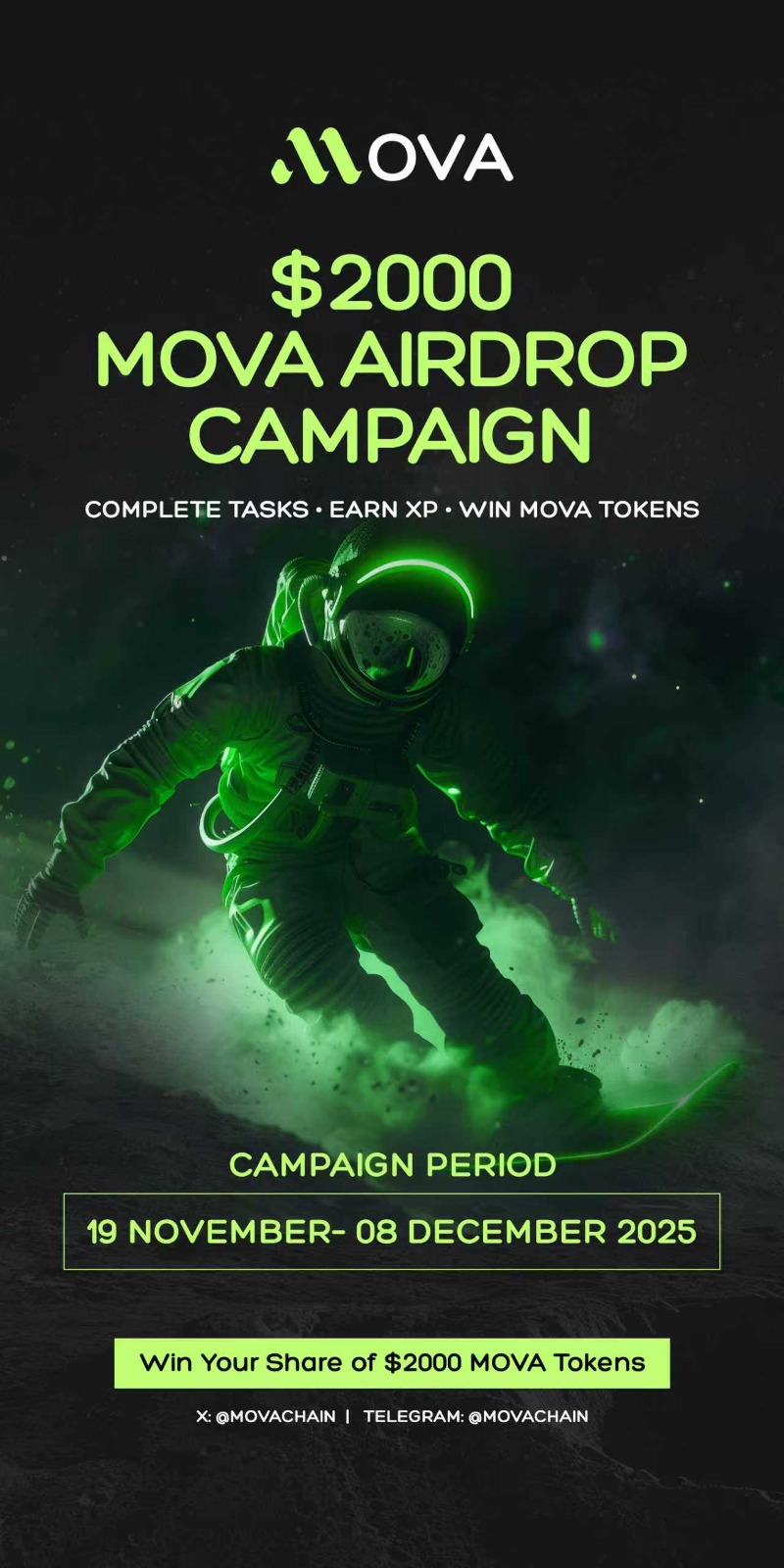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475회차](https://f1.tokenpost.kr/2025/11/2owsis2ezy.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474회차](https://f1.tokenpost.kr/2025/11/kkr71pp4vc.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473회차](https://f1.tokenpost.kr/2025/11/0o9f6lahsw.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472회차](https://f1.tokenpost.kr/2025/11/we5pg3atbe.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