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월가의 거인 리먼 브라더스는 ‘재담보(再擔保)’라는 이름의 금융 곡예를 하다 무너졌다. 고객 자산을 이리 빌려주고 저리 재활용하며 장부 위에만 쌓아올린 ‘종이 탑’은, 위기가 닥치자 속절없이 무너졌다.
그리고 17년이 지난 오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전 비서실장 아만다 피셔가 이 장면을 다시 꺼내 들었다. 대상은 다름 아닌 리퀴드 스테이킹(Liquid Staking).
피셔는 새로 발표된 SEC 지침에 따라, 위임형·자체 스테이킹은 ‘증권 아님’으로 면죄부를 받았지만, 리퀴드 스테이킹과 재스테이킹은 여전히 규제의 그물에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유는 명확하다. “고객의 예치 자산을 다시 담보로 돌려쓰는 구조, 바로 리먼 사태의 복사판”이라는 것이다.
이 장면은 마치 한 신문 만평 속 그림처럼 보인다. 왼편에는 철근만 앙상하게 드러난 채 먼지 속에서 기울어가는 2008년판 ‘Lehman Tower’가 있다. ‘Grand Opening Soon!’ 현수막은 찢겨 바람에 나부끼고, 바닥에는 결함이 찍힌 설계도가 나뒹군다. 오른편에는 은빛 유리 외벽이 번쩍이는 ‘Liquid Tower’가 서 있다. 첨단의 마케팅 간판에 ‘Future of Finance’라 적혀 있지만, 기초부에 붉은 표시와 함께 균열이 나 있고, 그 틈새로 물이 새어 바닥을 적신다. 두 건물 앞에는 같은 로고가 찍힌 설계도가 놓여 있어, 과거와 현재가 같은 도면 위에서 지어졌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세계적 운용사 VanEck의 매튜 시겔은 “SEC가 처음엔 스테이킹을 지지한다더니, 이제 와서 규제 사각지대를 운운하는 건 모순”이라고 쏘아붙였다. 헬리우스랩스의 창업자 매시 무타즈는 “피셔가 LST의 작동 원리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모른 척한다”고 직격했다.
정작 SEC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엇갈린다. ‘크립토 프렌들리’로 불리는 파이얼스 위원은 “LST는 구시대 금융의 문제를 블록체인 기술로 해결한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캐럴린 크렌쇼 위원은 “이게 우리가 약속한 규제 명확성인가”라며 고개를 저었다.
현재 리퀴드 스테이킹 시장 규모는 약 670억 달러(약 88조 원). 그중 절반 가까이를 리도(Lido)가 차지하고, 바이낸스만 해도 114억 달러 규모다. 규모가 커질수록, 그 구조와 리스크를 둘러싼 논쟁은 격렬해질 수밖에 없다.
2008년의 붕괴는, 너무 복잡해 아무도 위험을 정확히 보지 못하는 사이 찾아왔다. 오늘날 블록체인판 ‘리먼’이 같은 길을 걸을지, 아니면 기술의 투명성이 그 운명을 비켜가게 할지는 아직 모른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탑이 높아질수록, 그 그림자도 길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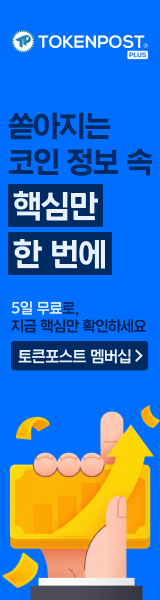









 3
3



![[토큰만평] ‘리퀴드 스테이킹’… 리먼 브라더스의 망령이 다시 온다?](https://f1.tokenpost.kr/2025/08/k5hrw2rk8w.jpg)

![[토큰분석] 90% 빠진 토큰, 반등할까 사라질까… 5가지로 판별하는 법](https://f1.tokenpost.kr/2026/02/2bxkphkg67.jpg)
![[토큰포스트 칼럼] 주식시장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간다… '인터넷 자본시장' 시대가 온다](https://f1.tokenpost.kr/2026/02/egp7zm9d1p.jpg)

![[토큰캠프 #3]](https://f1.tokenpost.kr/2026/02/2nft0e2jww.png)
![[사설] 월가가 디파이 토큰을 사들이는 진짜 이유… '투기'가 아니라 '인프라 선점'이다](https://f1.tokenpost.kr/2026/02/d6yv1fi5l3.jpg)

![[토큰분석] 암호화폐 시장에서 '진짜 돈'이 빠지고 있다… USDT 시총이 보내는 경고 신호](https://f1.tokenpost.kr/2026/02/fnpcwelqa5.jpg)
![[마켓분석] 엔비디아, '어닝 서프라이즈' 넘어 '어닝 쇼크'… 매출 681억 달러·가이던스 780억 달러의 의미](https://f1.tokenpost.kr/2026/02/0etkh7qlwz.jpg)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41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g27ndxvfxv.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40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s74dobfws9.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39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celz7zpk2n.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38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jxqkx5yb5c.jpg)
![[토큰만평] “좀비기업에 크립토 주사”… 기묘한 부활의 풍경](https://f1.tokenpost.kr/2025/07/0zxha0zz7u.jpg)
![[토큰만평] 최고가 찍은 비트코인, 그리고 다시 떠오른 질문… 사토시는 누구인가?](https://f1.tokenpost.kr/2025/07/qsllyqz62v.png)
![[토큰만평] 유동성은 흐른다… 이제는 스테이블코인의 차례다](https://f1.tokenpost.kr/2025/07/zp9yrimek1.jpg)
![[토큰만평] 규제라는 골목 어귀에 멈춘 미래](https://f1.tokenpost.kr/2025/04/n2u92kb372.png)
![[토큰만평] “I’M HUMAN”… AI가 설계한 세상, 인간은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https://f1.tokenpost.kr/2025/04/egehyz5cev.jpg)
![[토큰만평] 관세 '치킨게임'… 세계 경제를 건 치킨게임, 누가 먼저 멈출 것인가](https://f1.tokenpost.kr/2025/04/05t9qxn23t.png)
![[토큰만평] ‘The Trump Redemption’… 관세로 스스로를 가둔 미국 감옥 속의 해방극장](https://f1.tokenpost.kr/2025/04/nkdiziw7sd.png)


![[알트 현물 ETF] XRP·SOL ETF 동반 순유입…솔라나 3086만달러 11일 연속 자금 유입](https://f1.tokenpost.kr/2026/02/uvkfrmx2zy.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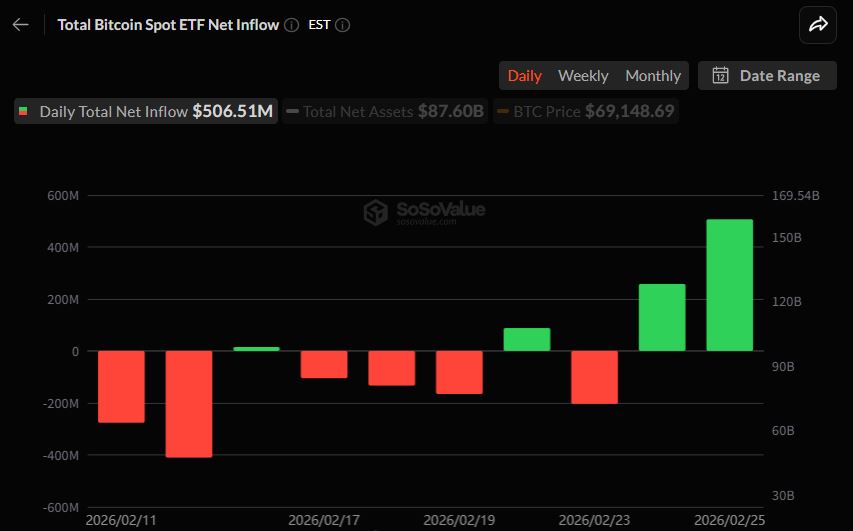

![[비트 옵션 데일리] 미결제약정 404억 달러로 9% 증가...7만·9만 달러 콜옵션에 거래 집중](https://f1.tokenpost.kr/2026/02/3xyl7oa10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