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돈은 넘치지만,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 방향을 잃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광의통화(M2)는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약 6% 증가에 그쳤다. 자산시장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M2 증가 기준선은 일반적으로 연 7~8%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의 유동성은 ‘팽창’이 아닌, ‘정체’ 국면에 가깝다.
이번 만평은 이 정체된 유동성의 행방을 묻는다.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암호화폐 등 주요 자산시장에는 이미 자금이 가득 차 있다. 공처럼 뜬 유동성은 더 이상 들어갈 틈조차 없는 컵 속을 맴돌 뿐이다. 반면, 한쪽에는 아직 자리에 놓이지도 못한 ‘스테이블코인’ 컵이 있다. 이는 국내 스테이블코인 인프라가 여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현실을 상징한다.
실제로 미국은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대표적 스테이블코인인 USDC와 USDT는 발행사가 확보한 달러 예치금을 바탕으로 미국 국채에 투자하고, 그 수익이 토큰 유통을 뒷받침하는 구조다. 블랙록 등 글로벌 기관투자자들도 이 구조에 직접 참여 중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단순한 디지털 결제 수단을 넘어, 국가 금융시스템의 후방 수요까지 떠받치는 핵심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된 희소 자산이다. 이 희소성은 코드로 설계돼 있으며, 채굴·유통·보유량 모두가 온체인에서 실시간으로 검증 가능하다. 덕분에 비트코인은 점차 ‘통화’가 아닌, 담보자산 혹은 디지털 금으로서의 위치를 굳혀가고 있다.
그렇다면, 통화의 역할은 누가 대신할 것인가? 그 해답은 바로 스테이블코인이다. 실물 자산과 1:1로 연결되고, 온체인에서 실시간으로 이동하며,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 통화.
이제는 한국도 준비해야 한다. 자금은 언제나 가장 빠르고 유연한 길을 택한다. 지금 스테이블코인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그 자금은 한국을 비켜가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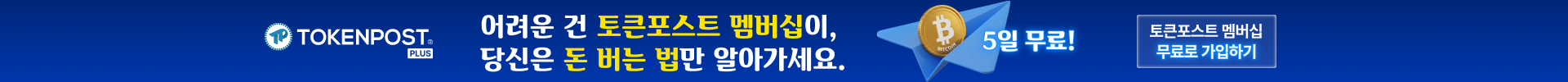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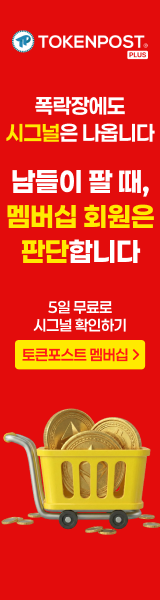









 8
8



![[토큰만평] 유동성은 흐른다… 이제는 스테이블코인의 차례다](https://f1.tokenpost.kr/2025/07/zp9yrimek1.jpg)

![[토큰분석] 90% 빠진 토큰, 반등할까 사라질까… 5가지로 판별하는 법](https://f1.tokenpost.kr/2026/02/2bxkphkg67.jpg)
![[토큰포스트 칼럼] 주식시장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간다… '인터넷 자본시장' 시대가 온다](https://f1.tokenpost.kr/2026/02/egp7zm9d1p.jpg)

![[토큰캠프 #3]](https://f1.tokenpost.kr/2026/02/2nft0e2jww.png)
![[사설] 월가가 디파이 토큰을 사들이는 진짜 이유… '투기'가 아니라 '인프라 선점'이다](https://f1.tokenpost.kr/2026/02/d6yv1fi5l3.jpg)

![[토큰분석] 암호화폐 시장에서 '진짜 돈'이 빠지고 있다… USDT 시총이 보내는 경고 신호](https://f1.tokenpost.kr/2026/02/fnpcwelqa5.jpg)
![[마켓분석] 엔비디아, '어닝 서프라이즈' 넘어 '어닝 쇼크'… 매출 681억 달러·가이던스 780억 달러의 의미](https://f1.tokenpost.kr/2026/02/0etkh7qlwz.jpg)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41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g27ndxvfxv.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40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s74dobfws9.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39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celz7zpk2n.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38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jxqkx5yb5c.jpg)
![[토큰만평] 규제라는 골목 어귀에 멈춘 미래](https://f1.tokenpost.kr/2025/04/n2u92kb372.png)
![[토큰만평] “I’M HUMAN”… AI가 설계한 세상, 인간은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https://f1.tokenpost.kr/2025/04/egehyz5cev.jpg)
![[토큰만평] ‘The Trump Redemption’… 관세로 스스로를 가둔 미국 감옥 속의 해방극장](https://f1.tokenpost.kr/2025/04/nkdiziw7sd.png)
![[토큰만평] ‘관세의 역설’… 미·중 갈등 속 비트코인은 웃는다](https://f1.tokenpost.kr/2025/04/vdi7j79ar4.png)
![[국제금융 브리핑] 트럼프 고관세 기조 재확인…엔비디아 실적 호조에 뉴욕증시 반등](https://f1.tokenpost.kr/2026/01/aj2ndkuaci.jpg)


![[월가 유동성 레이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플러스 전환…기관 거래 37% 급증](https://f1.tokenpost.kr/2025/09/gc2rcv5ndg.png)

![[암호화폐 개척자들] 여명의 시기 4화 ㅡ 유영석, 질문 하나로 인생이 바뀌다](https://f1.tokenpost.kr/2026/02/zgxu1gty49.png)



![[알트 현물 ETF] XRP·SOL ETF 동반 순유입…솔라나 3086만달러 11일 연속 자금 유입](https://f1.tokenpost.kr/2026/02/uvkfrmx2z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