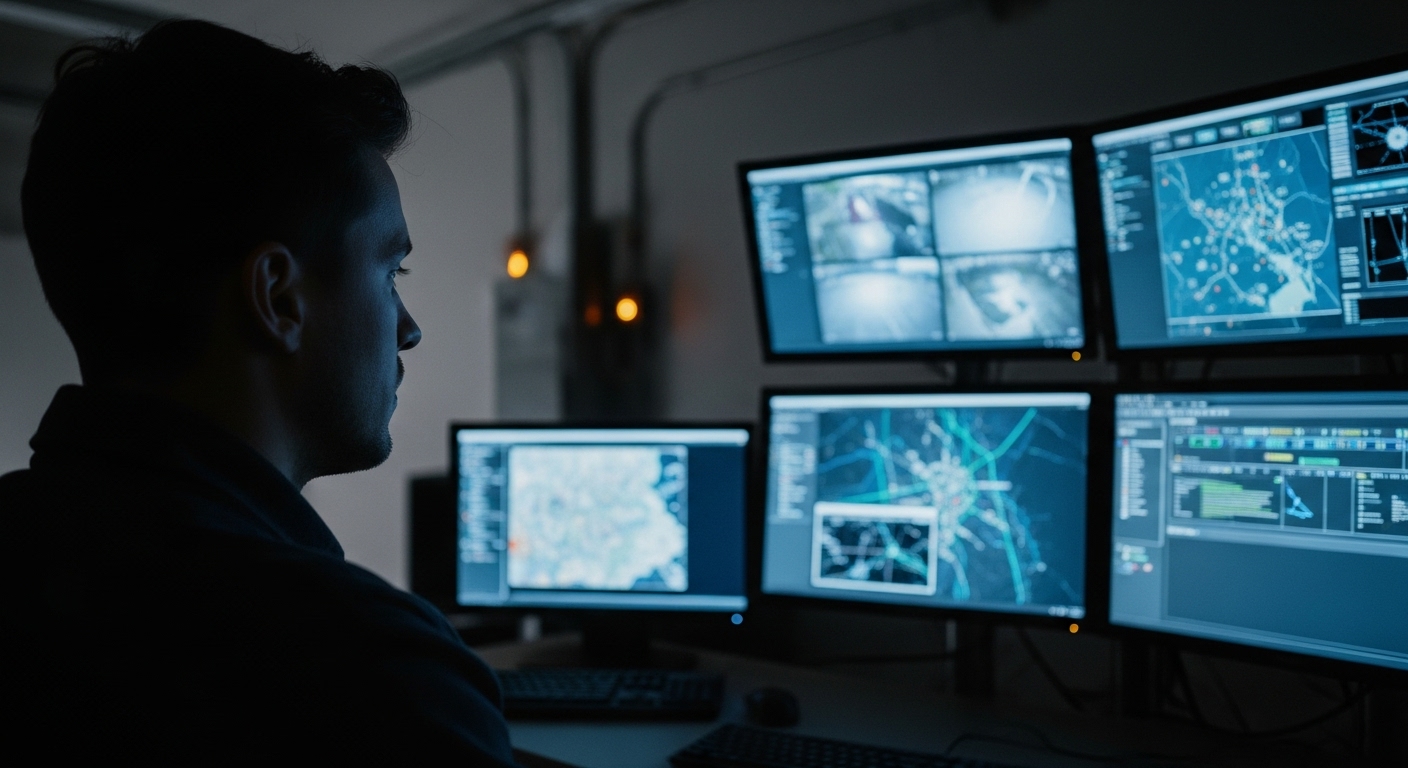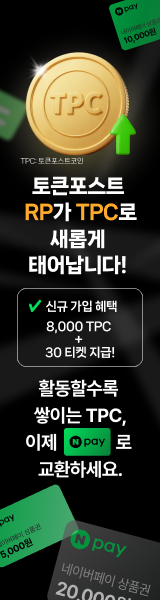일제강점기 시절 미국으로 반출됐던 한반도 자생식물들이 100여 년 만에 다시 국내로 돌아왔다. 이번 재도입은 단순한 식물 반환을 넘어, 한반도 생태계 복원과 생물 다양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025년 8월 10일, 만리화와 회양목을 비롯한 식물 15종이 삽수(식물의 가지 일부를 잘라 증식하는 방법)와 묘목, 종자 형태로 미국에서 국내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 중 만리화는 1917년 식물 탐험가 어니스트 헨리 윌슨이 금강산에서 채집해 미국 하버드대학교 산하 아놀드수목원으로 반출했던 식물이다. 당시 반출 이후 국내 금강산 지역에서는 해당 개체가 사라진 것으로 파악돼, 사실상 100년 만의 귀환이라 할 수 있다.
회양목의 경우 현재도 국내에서 정원수나 울타리용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지만, 이번에 돌아온 개체는 식물학적으로도 가치가 높다. 1919년 일본 식물학자가 국내에서 채집 후 아놀드수목원으로 보낸 개체로, 이후 국제 학계에서 회양목의 신종으로 처음 발표할 때 기준이 된 바로 그 표본이다. 식물학적 기준이 되는 표본은 학명에 그 기원이 반영되기 때문에, 생물 분류 연구나 식물 유전자원 보존 측면에서 중요한 자산이다.
이번 식물 반환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을 되찾는 데 그치지 않는다. 아놀드수목원이 지난 6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 식물원 교육총회 참석을 계기로 국립수목원과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면서 공동 연구와 식물 교류가 본격화됐다. 반환 목록 중에는 북한에서만 자생한다는 눈까치밥나무, 긴잎조팝나무도 포함돼 있어, 향후 남북 생태 협력 가능성까지 엿보인다.
한편 국립수목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윌슨이 남긴 식물 및 산림 사진과 함께 이번에 반환된 식물을 8월 17일까지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 식물의 역사적 가치와 생물 주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오래전 흩어진 식물 자원을 되찾아온 성과를 기념한다는 취지다.
국립수목원 측은 앞으로도 국외로 반출된 우리 식물 자료에 대한 추적·연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식물의 귀환을 계기로 국내 고유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복원 노력과 관련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흐름은 남북 생태 정보 교류는 물론, 세계 식물 유전자원 관리 협력에서도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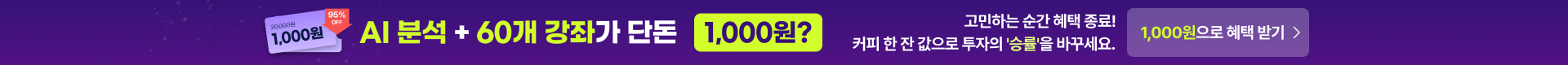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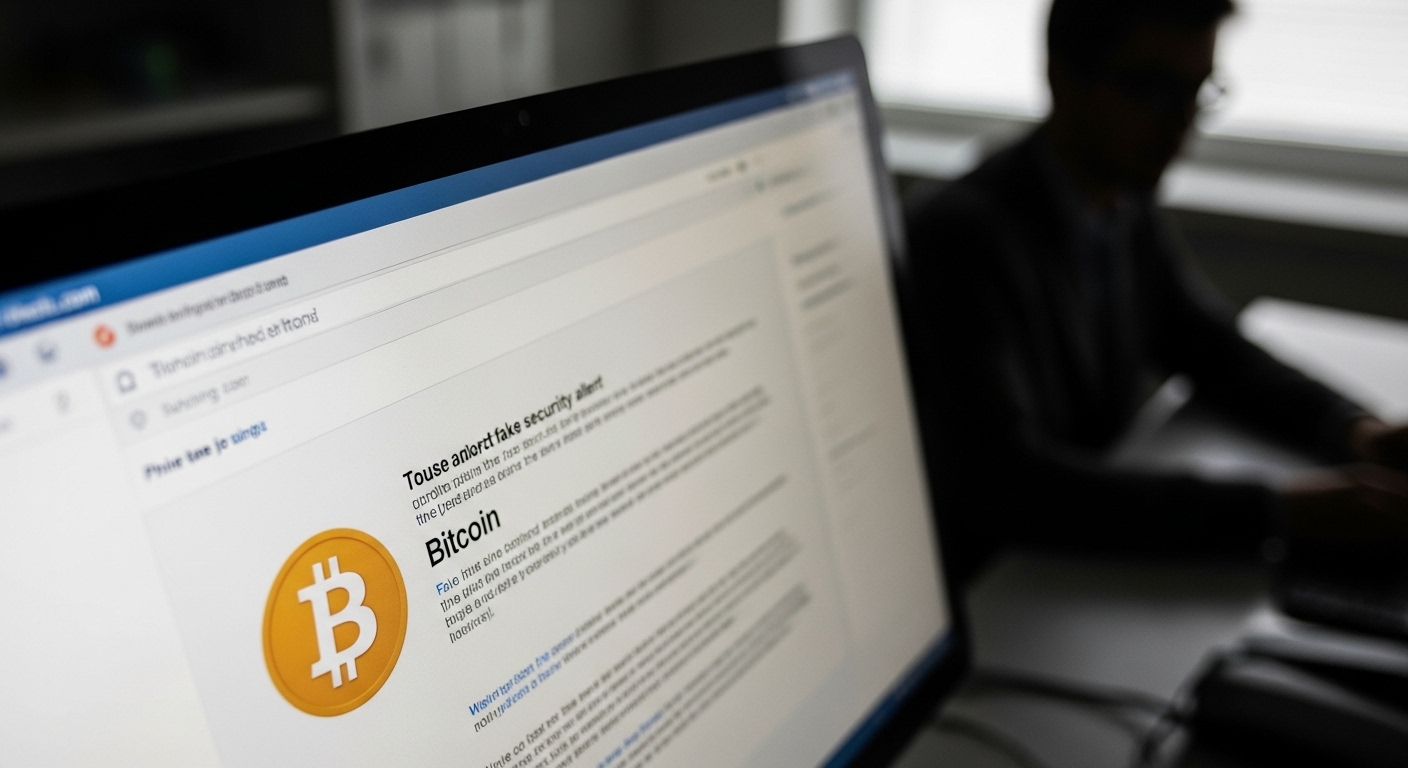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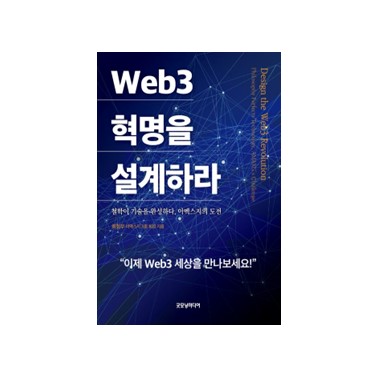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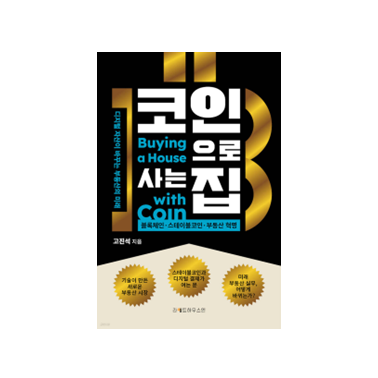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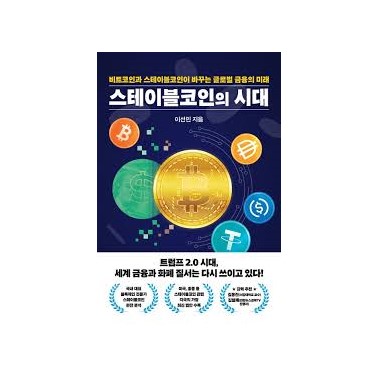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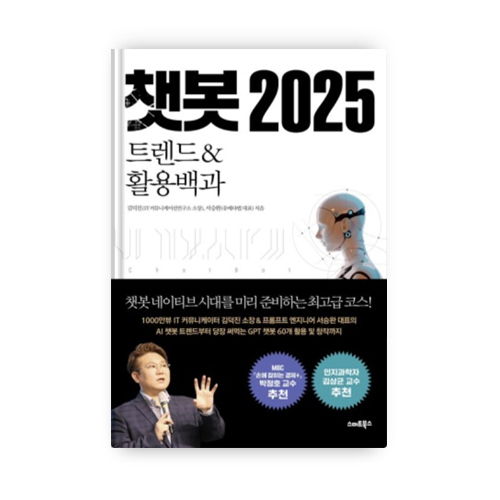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08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gw1dm61ji8.pn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07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xrxh0prwmk.jpe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06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6vamcvu8s9.jpe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05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b50rzae1cm.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