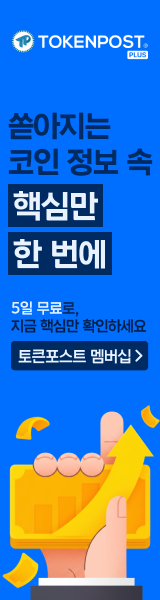자율주행택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기존 택시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관련 규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기술 발전 속도와 소비자 편익을 고려할 때 지금이 정책 전환의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25년 9월 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자율주행택시가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상용화돼 대중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기술이 제대로 실험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같은 기술 후진성은 향후 자동차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실제 택시 시장의 경쟁 구도를 보면, 뉴욕·런던·싱가포르 등에서는 승차 공유 서비스가 택시 시장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서울에서는 전통적인 택시가 94%를 차지하고 있어 새로운 서비스 진입이 사실상 막혀 있는 상황이다. 이는 기존 택시산업 보호 중심의 규제 구조 탓으로, 시장의 유연한 변화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특히 자율주행택시가 교통편의성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 자율주행택시 7천 대가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집중 운행할 경우, 택시 이용 건수가 하루 평균 3만7천800건 늘고, 연간 약 1천600억 원에 달하는 소비자 편익이 추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소비자 잉여(상품 이용 자체에서 느끼는 경제적 이익)가 커지는 점은 택시 서비스 개편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한국은행은 무작정 자율주행을 도입할 경우 택시 기사 등 기존 종사자들의 생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택시를 기존 택시와는 별도의 사업 유형으로 여객자동차법상 규정하고, 그에 맞는 면허를 별도로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기존 개인택시 면허를 정부가 매입하고, 일부 종사자에게는 자율주행 기업의 지분을 저렴하게 제공하자는 아이디어도 함께 제안됐다.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정부의 사례처럼 기존 면허 소유자에 대한 급여성 보상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이 먼저 이뤄진 뒤,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우버·타다 도입 시 경험한 사회적 갈등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부와 사회가 연착륙 비용을 분담하고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기존 산업과 신기술 간 균형 있는 전환이 자율주행 시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0
0




![[사장분석] 미 정부 셧다운 시한 임박… 시장은 왜 이렇게 태평한가](https://f1.tokenpost.kr/2026/02/j89t8rmwy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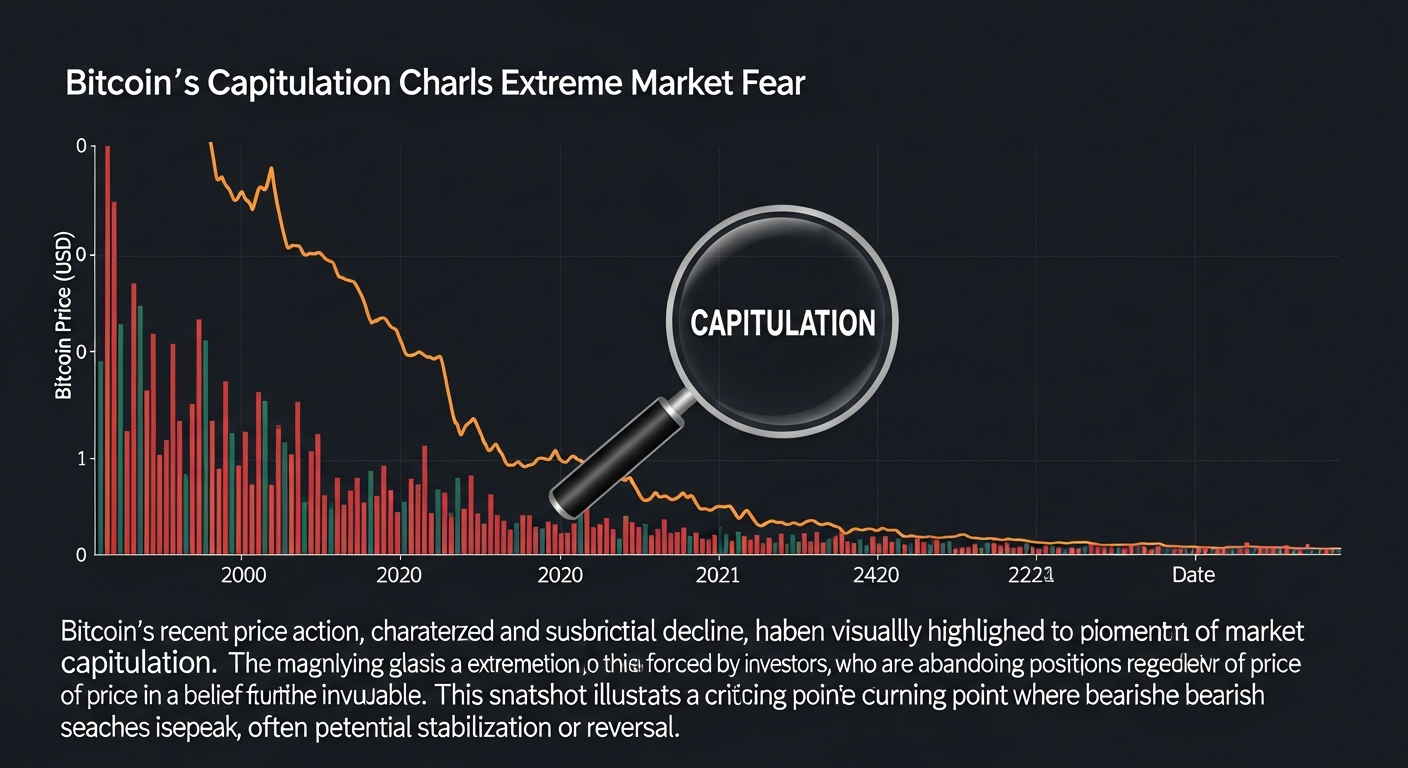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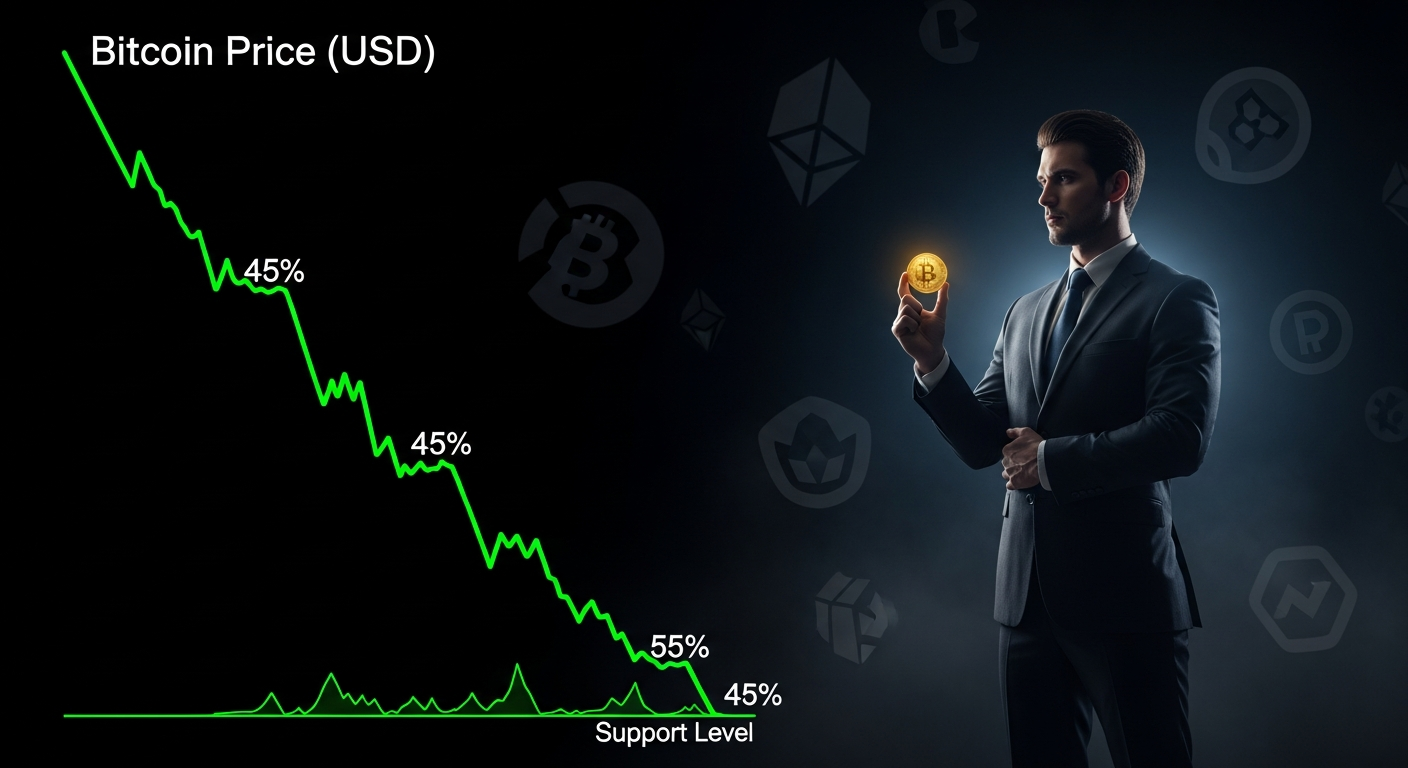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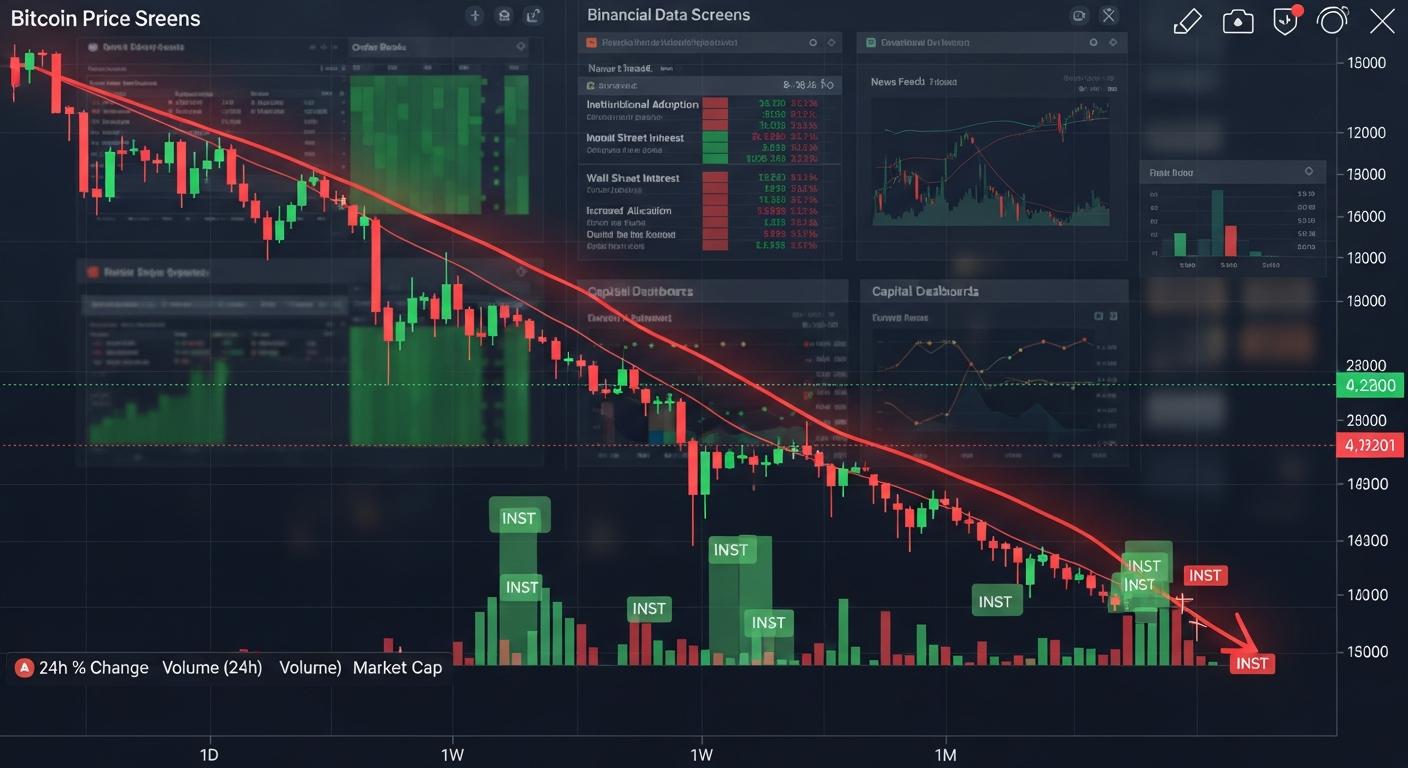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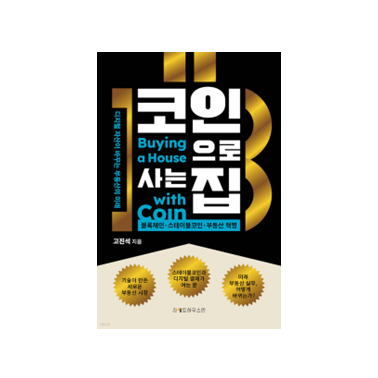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8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0l6qk9c4ub.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7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6ndj5dyz0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6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qhaxcpku8t.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5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rx65p108a9.jpeg)










![[마켓분석] 2조 달러의 질문: 소프트웨어 섹터, '떨어지는 칼날'인가 '튀어 오르는 용수철'인가?](https://f1.tokenpost.kr/2026/02/6m5vuilwal.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