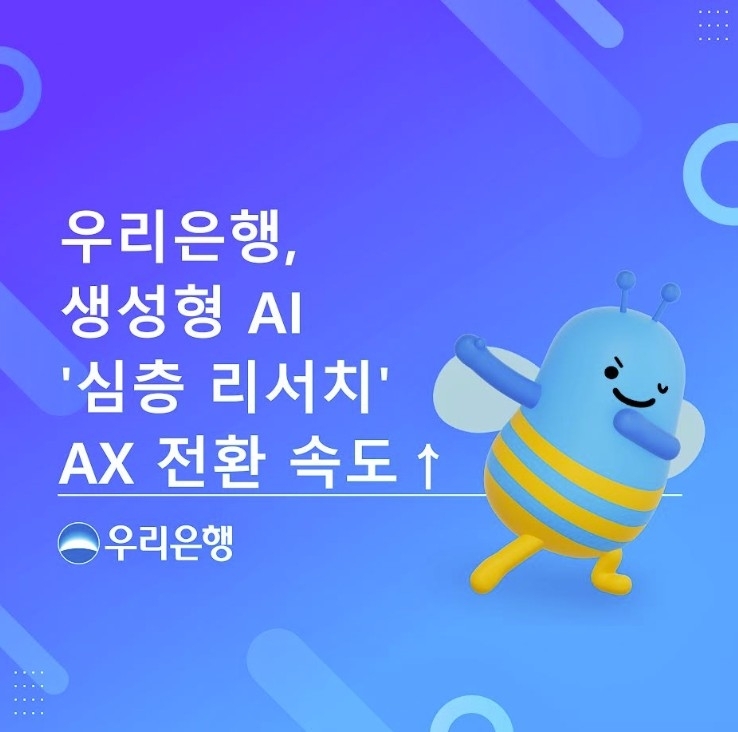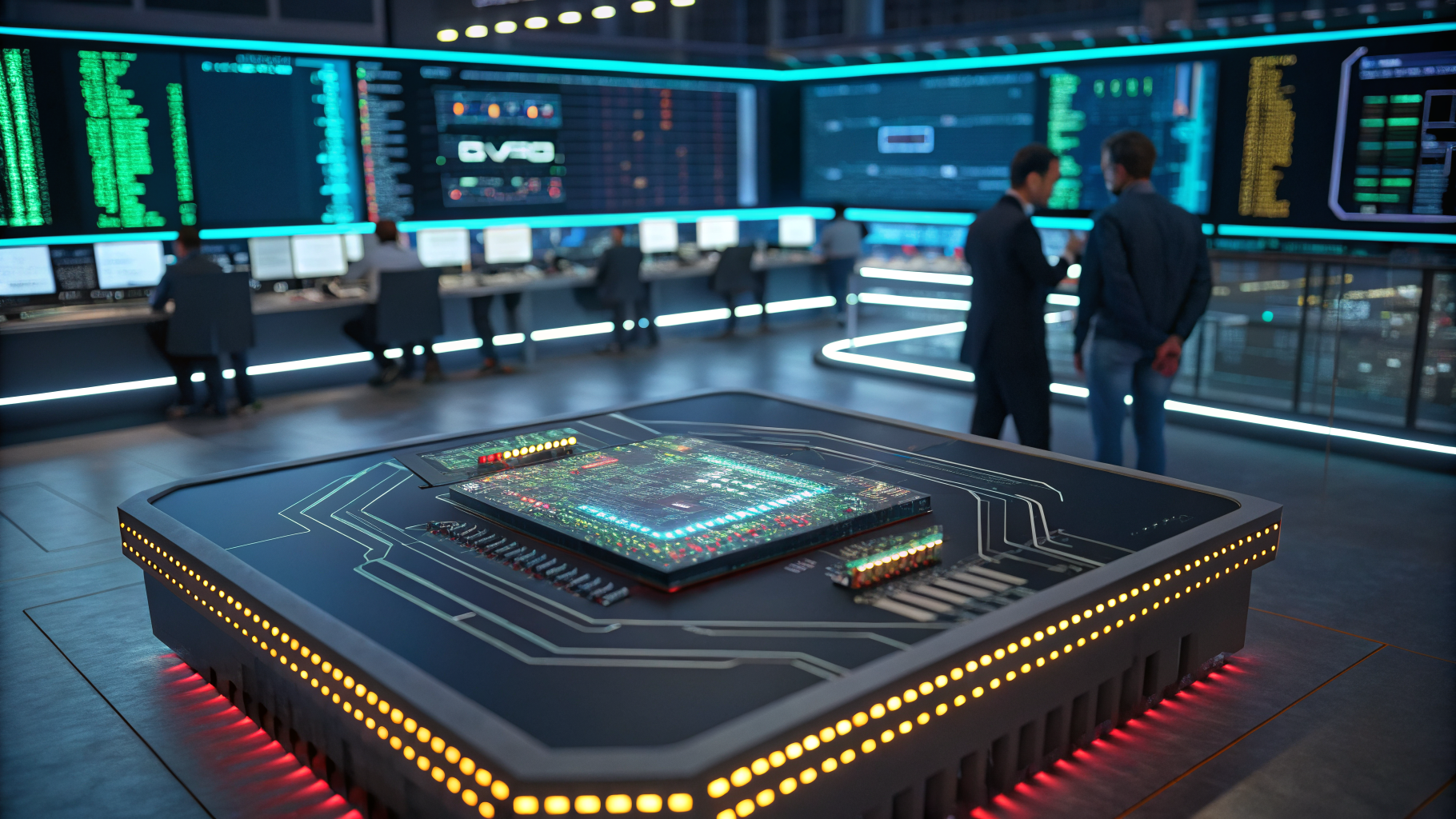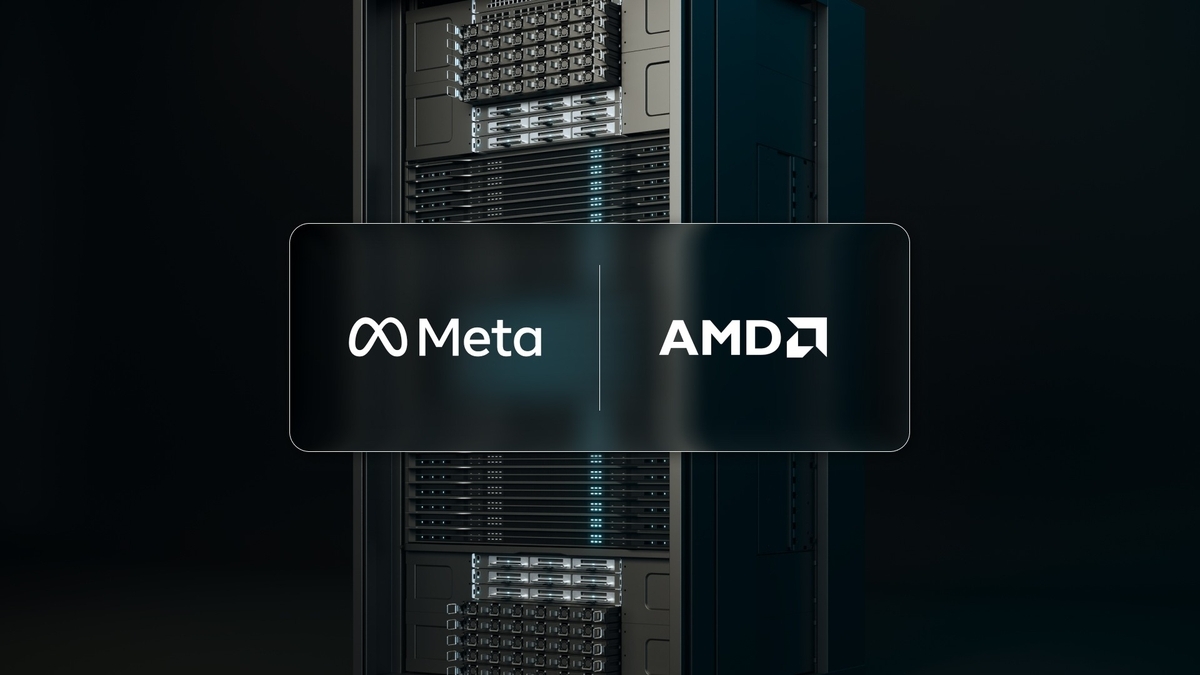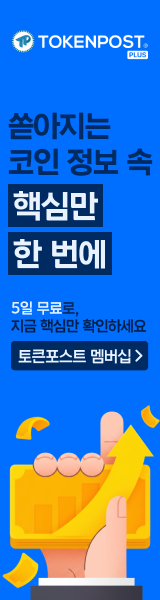미국 상공회의소가 한국 정부의 구글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보류 결정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이 사안은 한국 내 데이터 규제와 안보 우선 정책, 그리고 외국 기술기업과의 갈등 문제를 다시 떠올리게 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 2월, 한국의 1대5,000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겠다는 세 번째 요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지만, 정부는 11월 11일 이를 또다시 보류했다. 이로써 2007년과 2016년에 이은 세 번째 보류 결정이다. 고정밀 지도는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증강현실 등 여러 기술 분야에서 핵심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요 자산이지만, 정부는 국가 안보와 정보 보호 측면에서 해외 반출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구글 측에 안보시설을 가림 처리하고 좌표 노출을 금지하는 보완 조건을 내걸었으며, 구글이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공식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구체적인 문서 제출 여부는 정부 검토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절차 지연의 주된 배경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찰스 프리먼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총괄 선임부회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의 약속을 언급하며 한국이 지도 데이터 이전 승인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이 한국의 관광 활성화, 외국인 투자 확대, 중소기업의 혁신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차 한국 경주를 방문했을 때 미국 지도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히며, 글로벌 지도 서비스의 부재가 실질적인 불편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프리먼 부회장은 한국 디지털 규제가 세계적인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에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플랫폼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규제 기준에 맞춰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런 배경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이전 문제는 단순한 기업 간 거래가 아니라, 데이터 주권을 둘러싼 국가 정책과 글로벌 기술 경쟁, 자유무역 규범 간의 균형 문제로 풀이된다. 향후 정부가 구체적인 보완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때, 안보와 경제적 이해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디지털 규제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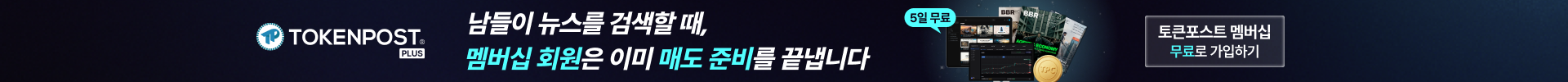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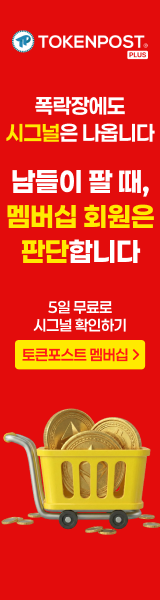










 1
1











![[크립토 인사이트 EP.20] 비트코인 4만8천달러 시나리오 vs M2 재확장…공포 속 데이터는 무엇을 말하나](https://f1.tokenpost.kr/2026/02/we0wgyifi8.jpg)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40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s74dobfws9.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39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celz7zpk2n.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38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jxqkx5yb5c.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37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4twwawrak9.jpg)

![[사설] 구글이 던진 조용한 경고… AI 패권의 룰이 다시 쓰인다](https://f1.tokenpost.kr/2025/11/la8e055ml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