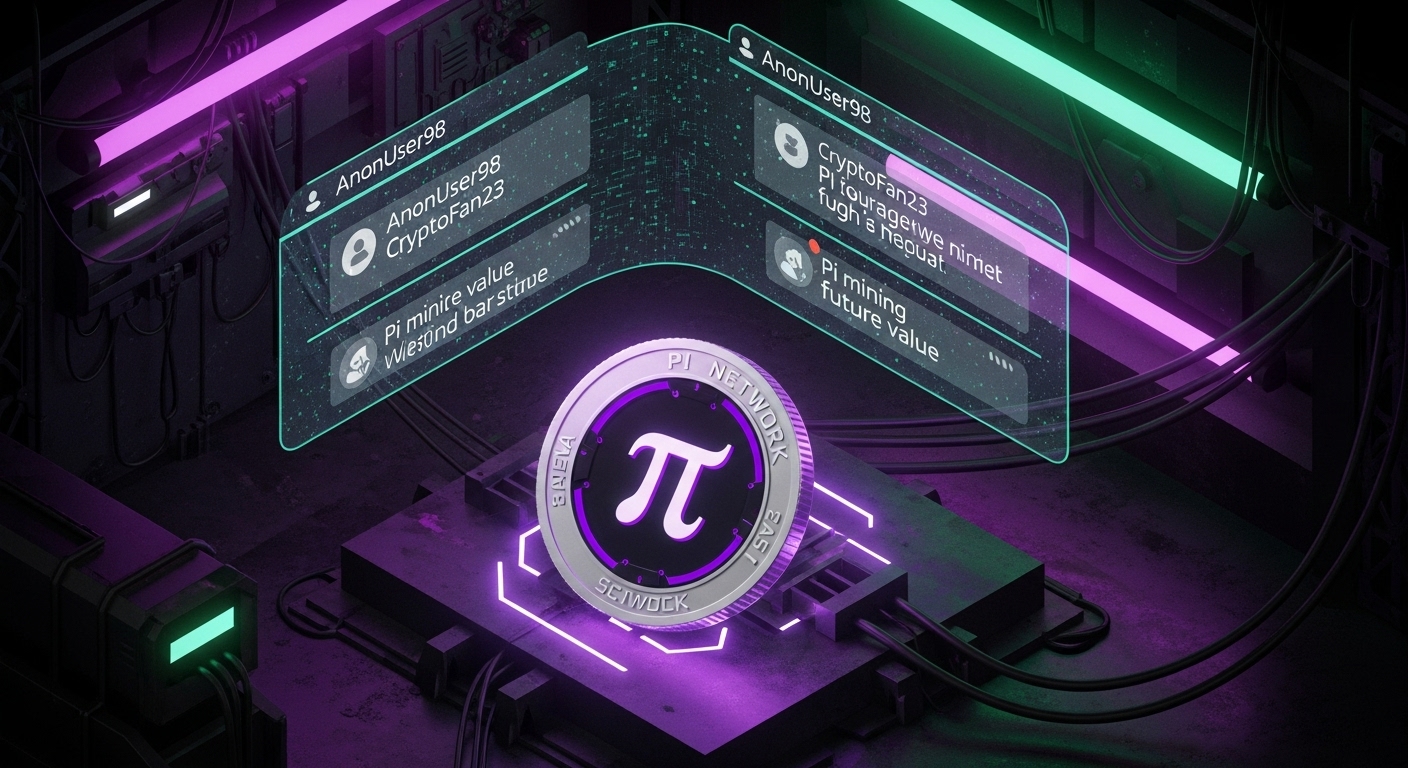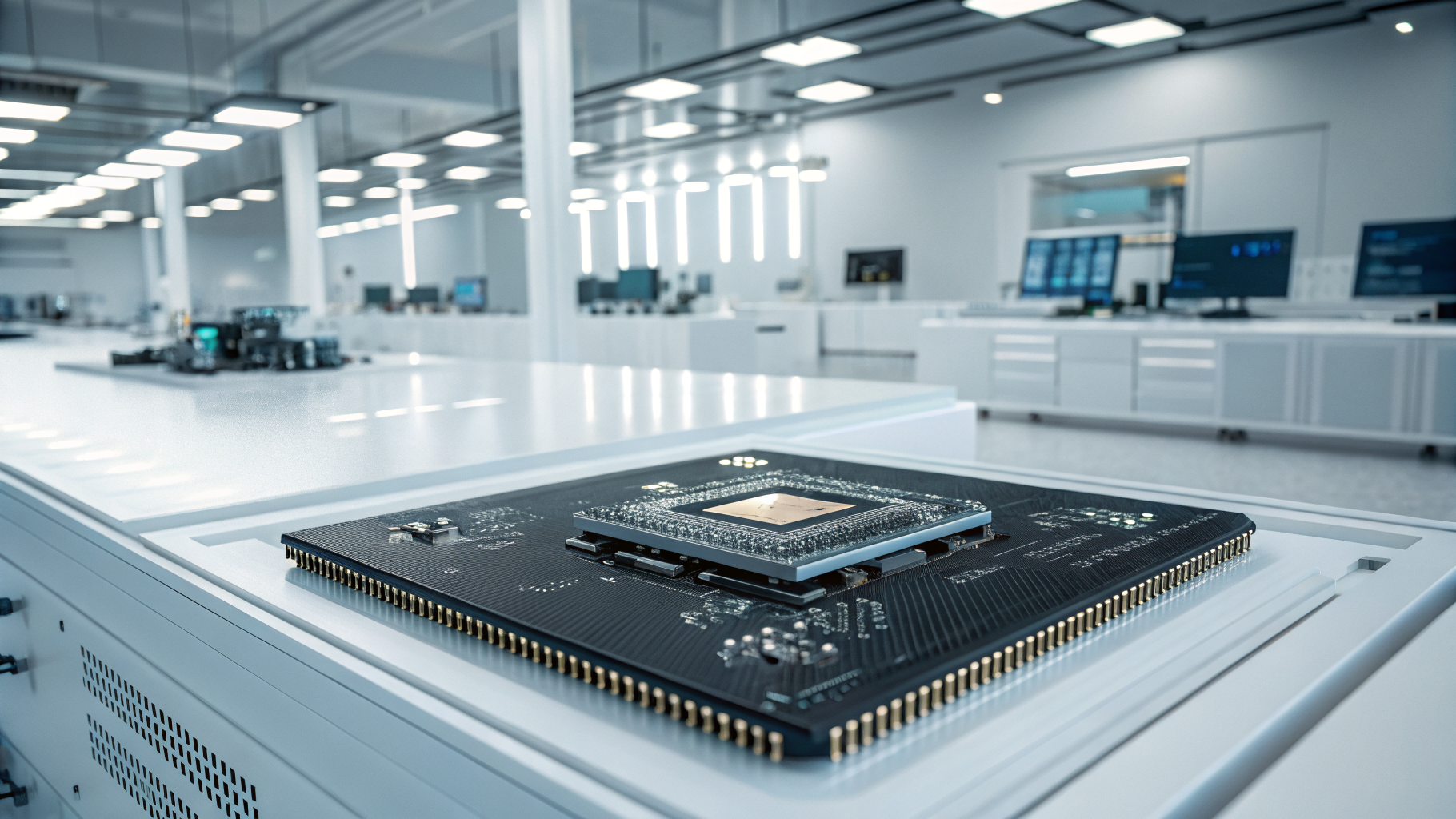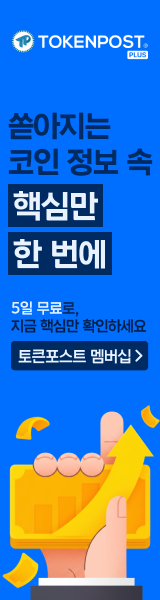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탈중앙화금융(DeFi)은 꾸준한 반등세를 보이며 주목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전통 금융자산 수천 조 원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는 확장성, 규제, 사용자 환경(UX) 등을 제약 요인으로 지칭하지만, 진짜 걸림돌은 따로 있다. 바로 기밀성 부족이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DeFi는 수천 조 원의 전통 금융자본을 흡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DeFi는 2021년 12월 기준 총예치금(총예치 자산 총액, TVL) 약 2,600억 달러(약 361조 4,000억 원) 수준까지 성장한 바 있다. 그러나 외환시장은 하루 약 7조 5,000억 달러(약 1경 417억 원)가 거래되고, 글로벌 채권시장은 130조 달러(약 1경 8,070조 원) 규모에 이른다. 이 같은 전통 금융 스케일과 비교하면 DeFi는 아직 ‘초입 단계’에 불과한 셈이다. DeFi 자체의 확장성은 충분하다는 시각도 있다. 문제는 기밀성이 결여된 ‘과도한 투명성’이라는 점이다.
기관과 고액자산가에게 기밀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일거수일투족이 퍼블릭 블록체인에 공개되는 구조는 이들에게 치명적인 부담이 된다. 이는 DeFi의 근본적 확산을 제약하는 핵심 요인이다. 이를 해결해 줄 기술로 최근 주목받는 것이 완전동형암호(Fully Homomorphic Encryption, FHE)다. 이는 데이터가 암호화된 상태로 계산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로, 실제 사용 중에도 중요한 정보가 항상 암호화된 상태로 유지된다.
이 기술이 도입되면, 예를 들어 KYC 또는 신용도 정보를 링킹할 때도 실제 값을 공개하지 않고 ‘신용 점수가 700점 이상인가?’ 같은 조건 검증만으로 대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승인되면 담보 없이 대출이 가능하고, 필요시 특정 정보를 해제해 오프체인 법적 조치까지 연계할 수 있다. 이는 기존 DeFi가 풀지 못했던 비담보 대출 시장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비담보 대출은 전통 금융권에서는 일상적이지만, DeFi에서는 리스크 관리 문제로 인해 과도한 담보 설정이 일반적이다. FHE가 이를 풀어낼 수 있다면, 구조 자체가 전면 재설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밀성 중심의 새로운 ERC-20 토큰, 암호화된 신용 점수, MEV(Minimal Extractable Value) 방지 설계 등이 결합된 프로토콜이 등장할 수 있고, 이는 단순 업그레이드가 아닌 신생 금융 인프라의 출현을 의미한다.
개인 투자자도 담보 없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프론트런이나 MEV 봇에 노출되는 리스크도 줄어든다. 기관은 고객 데이터 노출 없이 온체인 금융 거래에 참여할 수 있어, DeFi가 본격적인 제도권 금융과의 연결 고리를 갖추게 되는 셈이다.
퍼블릭 블록체인의 강점인 개방성과 상호운용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정보 보호 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FHE를 통해 퍼블릭 체인도 기관들이 요구하는 기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기술적 난제가 여전히 상당하다. 청산(liquidation) 처리, 암호화된 신용 시스템 구현, 법률적 정합성 확보, MEV 방어 구조 강화, 유동성 매칭 문제, 사용자 친화적인 지갑 인터페이스, FHE 호환 오라클 개발 등은 추가 연구가 필요한 과제다. 그러나 어떤 것도 불가능한 장애물은 아니다.
FHE 기술 발전 속도가 가파른 만큼, 이 모든 퍼즐이 해결되면 기존 전통 금융의 수천 조 원 자금이 DeFi로 유입되는 길이 열릴 수 있다. 공개 블록체인 기반에서 스위스 은행급 기밀성과 제도권 신용 기반의 대출 서비스를 동시에 구현하는 날이 멀지만은 않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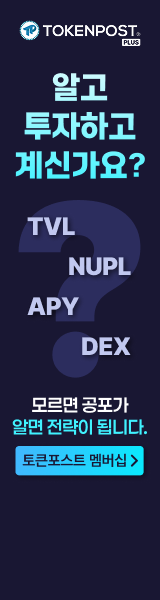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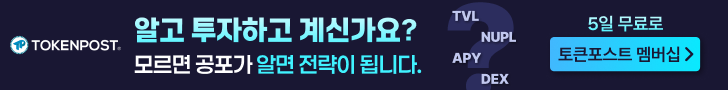









 2
2







![[크립토 인사이트 EP.20] 비트코인 4만8천달러 시나리오 vs M2 재확장…공포 속 데이터는 무엇을 말하나](https://f1.tokenpost.kr/2026/02/we0wgyifi8.jpg)
![[토큰분석] 90% 빠진 토큰, 반등할까 사라질까… 5가지로 판별하는 법](https://f1.tokenpost.kr/2026/02/2bxkphkg67.jpg)

![[토큰분석] 암호화폐 시장에서 '진짜 돈'이 빠지고 있다… USDT 시총이 보내는 경고 신호](https://f1.tokenpost.kr/2026/02/fnpcwelqa5.jpg)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41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g27ndxvfxv.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40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s74dobfws9.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39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celz7zpk2n.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38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jxqkx5yb5c.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