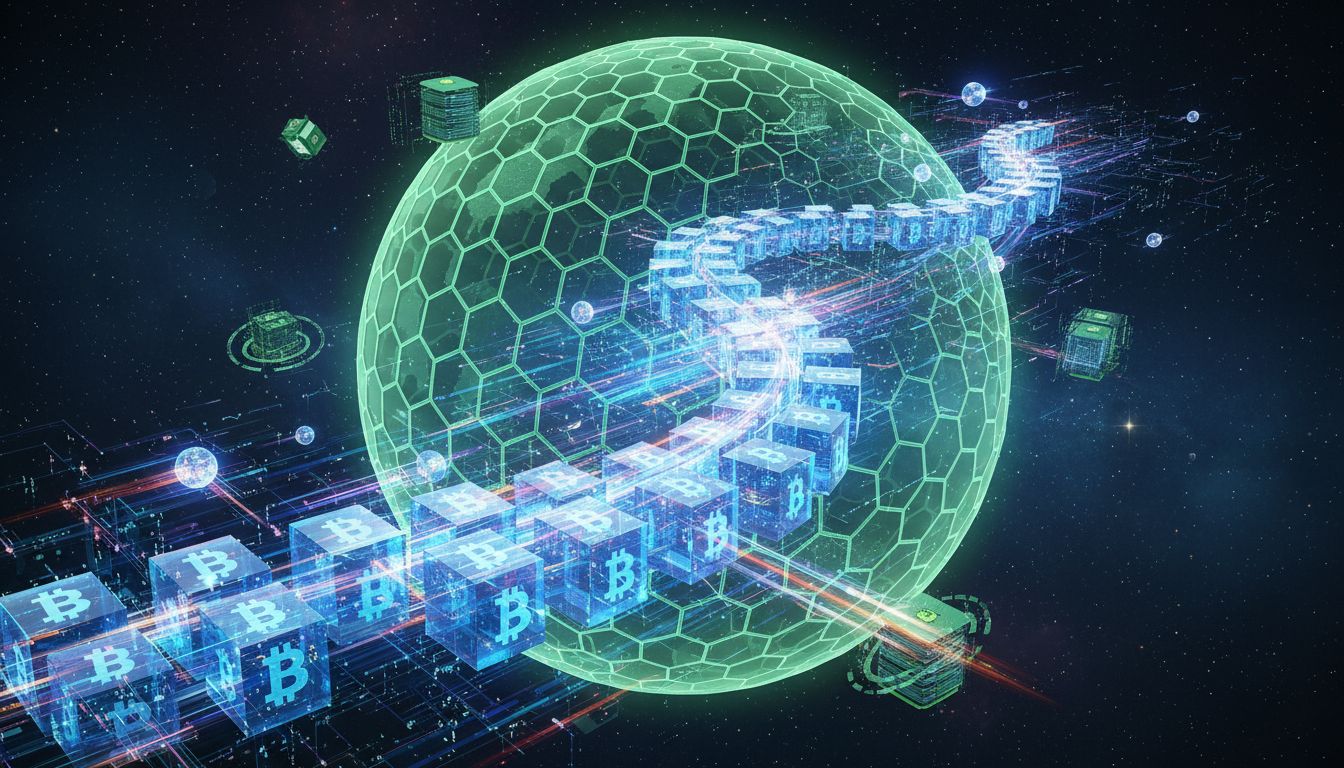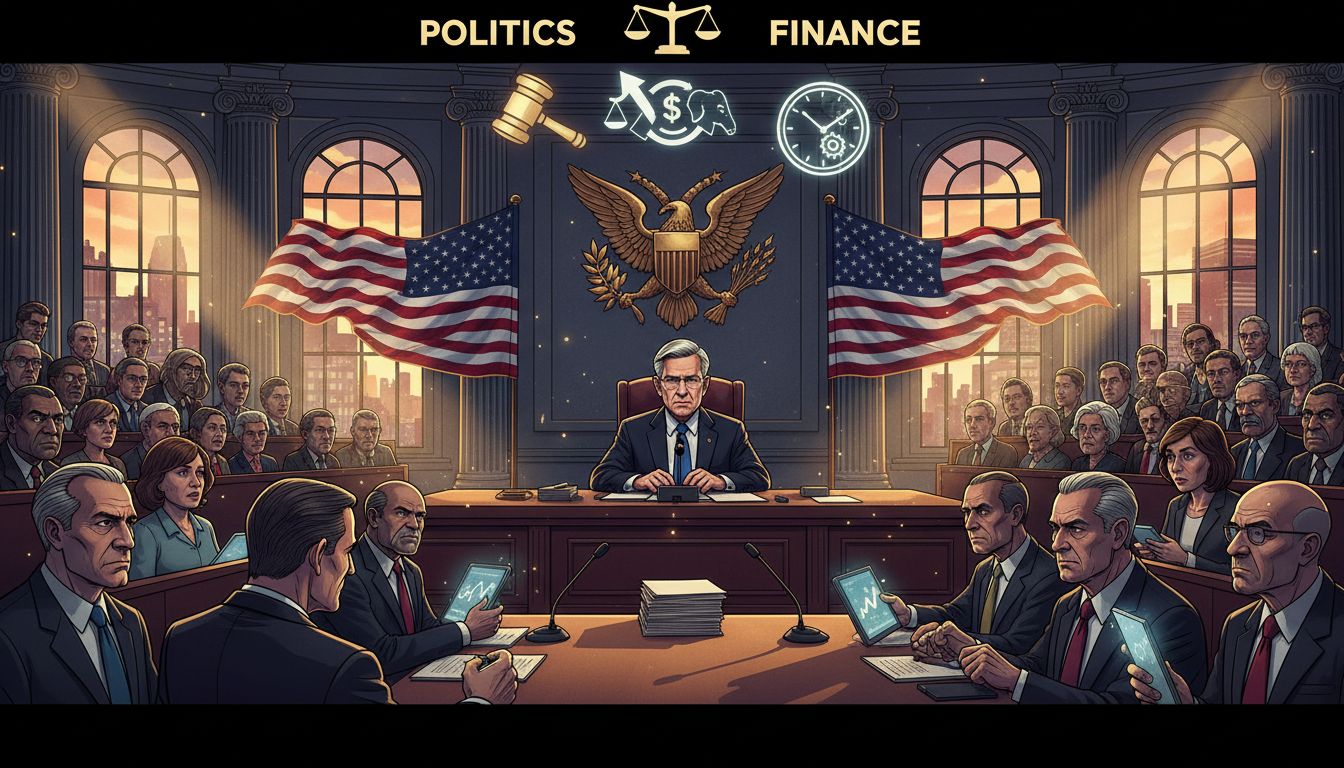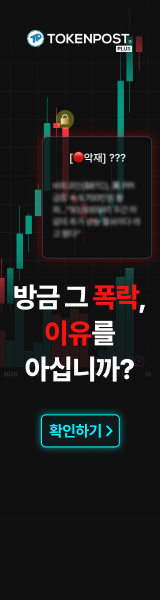정부가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부처 협의체를 통해 통합적인 사이버보안 강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각계 협업을 통해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이 이번 논의의 핵심이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9월 1일 ‘사이버안보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의 사이버침해 사고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향후 보안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오현주 안보3차장 주재로,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가 함께 참여했다.
회의의 주요 의제는 인공지능(AI)을 바탕으로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는 해킹과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AI 기반 공격, 소프트웨어(SW) 공급망 탈취 등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위협에 대처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민간과 공공의 핵심 인프라뿐 아니라 보안 취약성이 큰 중소기업의 보호 수준을 어떻게 높일지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기업과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책임자(CPO, CISO)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책임 범위를 강화하는 방안도 주요한 의제로 다뤄졌다. 이는 조직 내부에서 보안을 전담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격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다.
향후 국가는 가해자 추적이 어려운 배후 집단 해킹 문제에 대해 능동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하며, 관련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주요국과의 사이버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대응체계를 정비하는 데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회의를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관련 부처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보안 수준 향상과 정책 집행력을 담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관련 시스템의 보안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점도 강조됐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사이버위기 관리체계를 중장기적으로 고도화하고, 외부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사이버 복원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사이버 공격에도 사회 시스템이 본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정책적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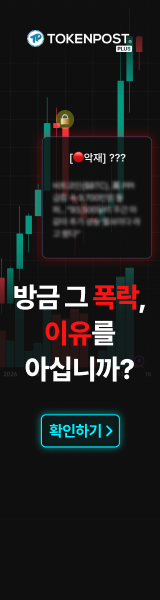










 2
2






![[토큰분석] “상장만 하면 –80%”… 시장 탓 말고 ‘출구로 설계된 상장’부터 바꿔야 한다](https://f1.tokenpost.kr/2026/01/v8tqormszy.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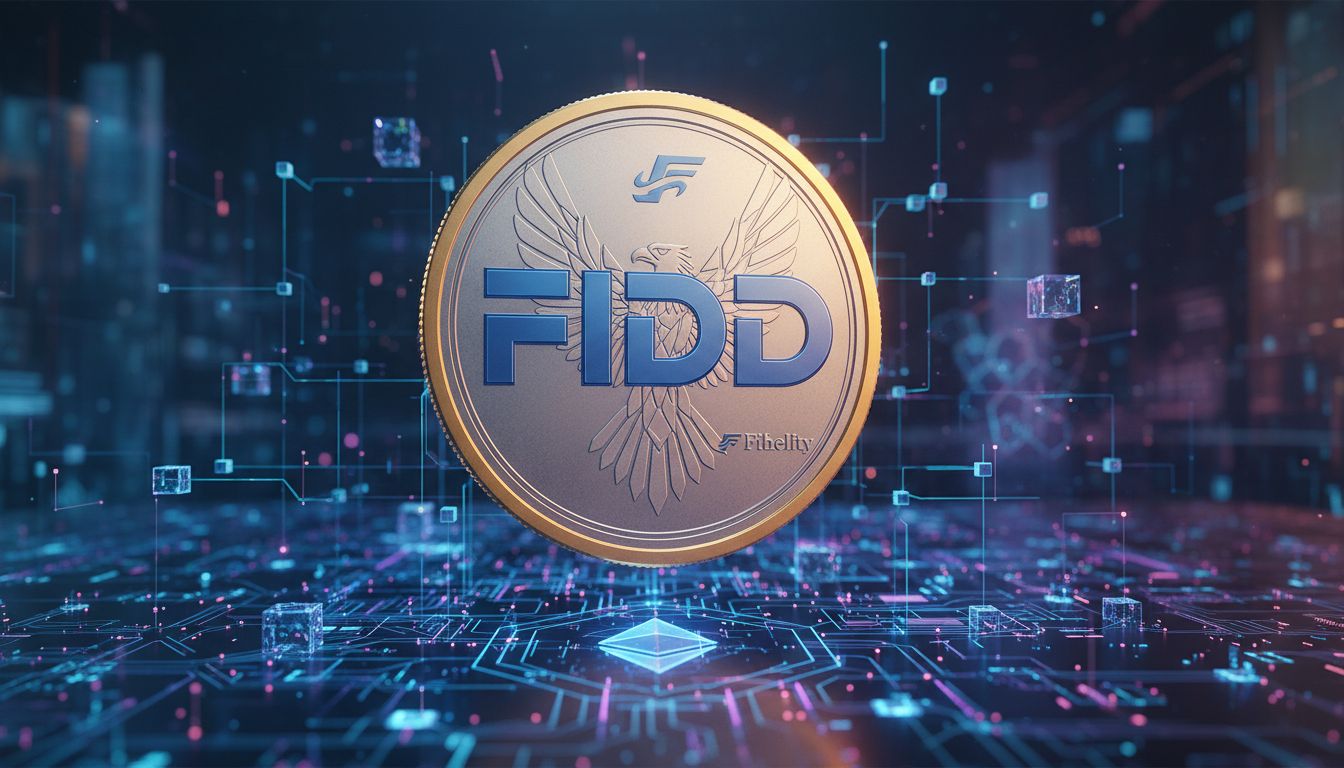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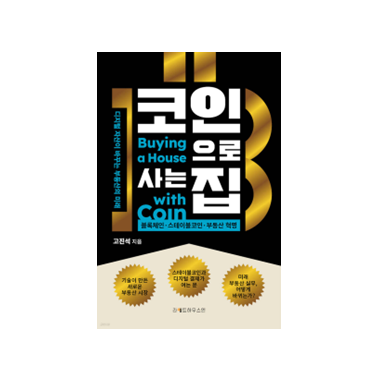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2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aims5420dh.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1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f2femcntpq.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0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y648ak216n.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19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k3bqfcj1o8.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