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위협이 정교해지고 인공지능(AI)이 보안의 새로운 무기가 되면서, 기업들의 데이터 보호 전략이 전면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델 테크놀로지스(Dell Technologies)가 제시한 '사이버 회복력(cyber resiliency)' 전략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 기업 전반의 디지털 생존 전략으로 떠올랐다. 이제 보안은 단순한 IT 과제가 아니라, 이사회 차원에서 다뤄야 할 핵심 경영 과제로 격상되고 있는 분위기다.
델은 보안, 백업, 복구, AI 자동화, 그리고 다양한 파트너십을 아우르는 통합 보안 전략을 통해 데이터를 전방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AI 기반 탐지 기술이 포함된 관리형 탐지 및 대응(MDR) 서비스를 백업 시스템까지 확장하며, 사이버 공격의 선제 대응 역량 강화를 노리고 있다. 미히르 마니아 델 부사장은 "백업 인프라가 위협의 사각지대였지만, 이제는 그곳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업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1분기 실시된 theCUBE 리서치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8%가 사이버 공격의 최대 피해로 '업무 중단'을, 33%는 '금전적 손해'를 꼽았다.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이 지난 1년간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협한 사고를 경험했으며, 민감 정보 유출(66%) 또는 영구적 데이터 삭제(46%)와 같은 심각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델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해,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owdStrike)와의 협력을 통해 차세대 보안 정보 이벤트 관리(SIEM) 플랫폼을 통합한 공동 탐지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백업 시스템 내의 이상 패턴 60가지를 '위협 지표'로 설정해 실시간 가시성과 침투 탐지 효율을 높였다. 로브 엠슬리 델 데이터보호 마케팅 디렉터는 "단순한 사이버 보안이 아닌, 기업 생존력의 연장선에서 사이버 회복력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도입 확산과 함께 보호 대상도 넓어지고 있다. AI 인프라의 보안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지 못하면 학습 모델 자체가 오염될 수 있다. 델은 기술 파트너인 테크놀로전트(Technologent)와 함께 자사 AI 팩토리 플랫폼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있다. 케네스 바크만 델 CTO는 "AI 보호에 대한 논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연구 기관 역시 회복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미국 국립과학재단이 후원하는 해양 관측 이니셔티브는 저장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델과 협력하여 5년간 280만 달러(약 40억 원) 규모의 데이터센터 설계를 진행했으며, 고속 복구를 위한 사이버 복제 금고와 고성능 스토리지 인프라까지 구축했다.
델은 최근 PowerStore와 PowerProtect 등 데이터 보호 장비의 성능까지 개선하며 탄탄한 하드웨어 기반의 회복력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례로 PowerProtect All-Flash 제품군은 이전보다 최대 4배 빠른 복구 속도와 2배의 복제 성능을 구현하면서도 공간과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회복력 구축을 위한 핵심 조건으로 기술 그 자체보다, 조직 전반의 전략적 실행 방식을 꼽는다. theCUBE 리서치의 로브 스트레치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조직 내에서 어떻게 통합되고 실행되는가"라며, 거시적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직이 회복력을 실현하려면 기술 채택 초기 단계부터 보안을 기본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인력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AI 기반 자동화와 서비스 외주 활용 또한 병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궁극적으로 델의 사이버 회복 전략은 기술이 아닌 생존을 위한 경영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기업이 AI로 혁신하는 만큼, 그 기반이 되는 데이터와 시스템의 내구성 또한 더욱 강화돼야 하는 시대에 접어든 셈이다.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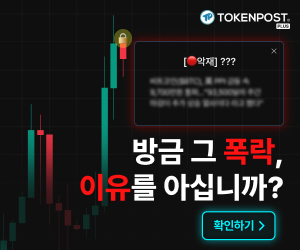

![[토큰분석] “상장만 하면 –80%”… 시장 탓 말고 ‘출구로 설계된 상장’부터 바꿔야 한다](https://f1.tokenpost.kr/2026/01/v8tqormszy.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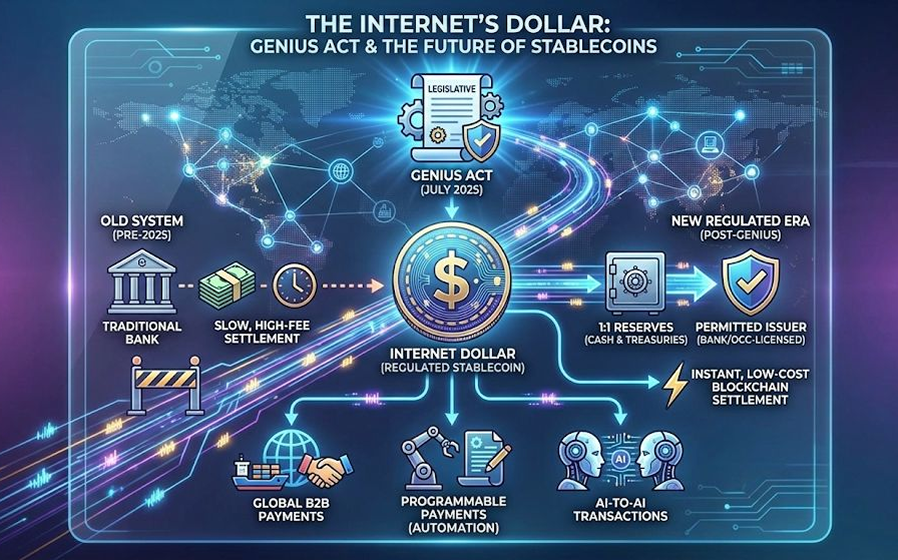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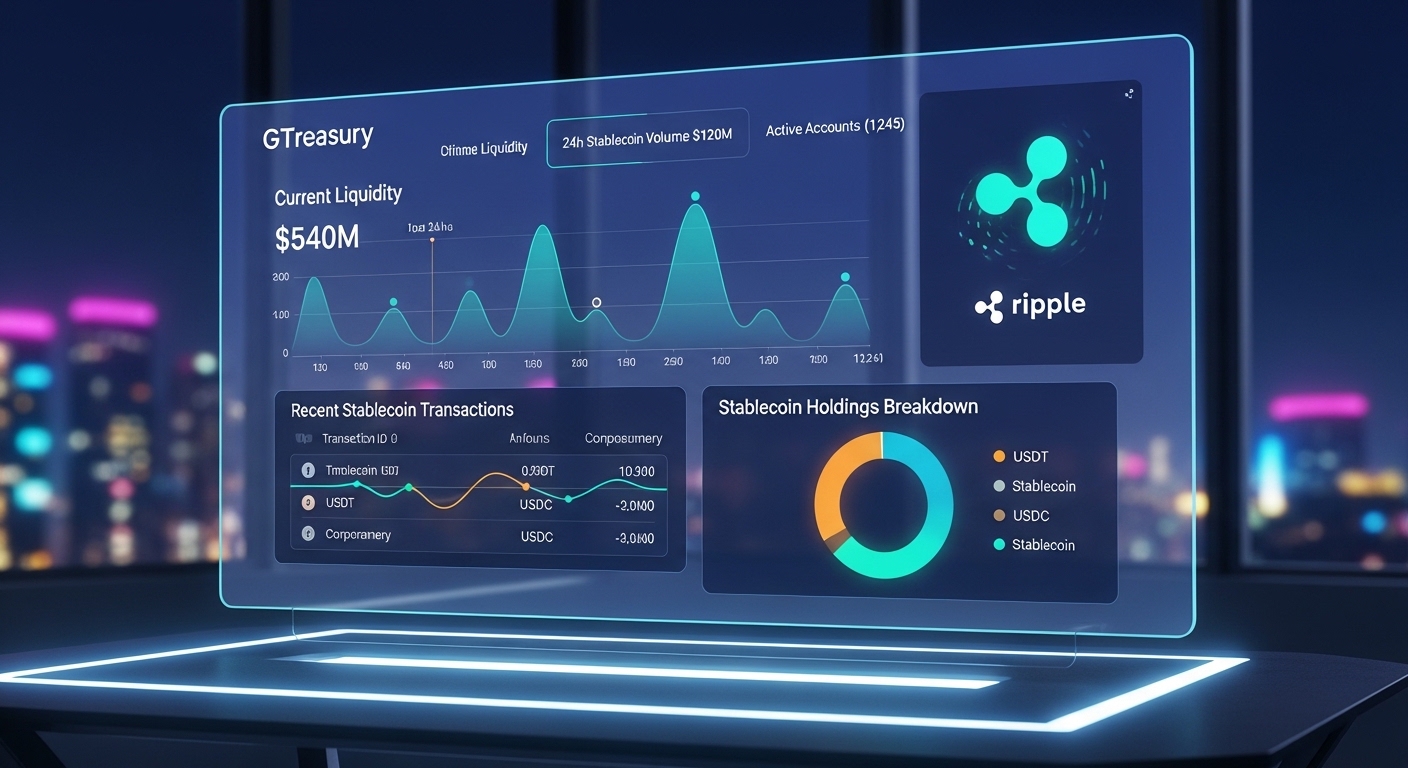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2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aims5420dh.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1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f2femcntpq.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0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y648ak216n.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19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k3bqfcj1o8.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