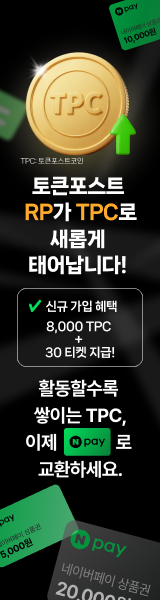2035년까지 실물자산(RWA) 시장 규모가 60조 달러(약 8경 3,400조 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린 RWA(녹색 실물자산)는 글로벌 온체인 혁신 흐름에서 중요한 하위 카테고리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선 토큰화된 그린 자산이 전체 기후 자산의 1%에도 못 미치며, 대다수는 국채 중심의 RWA에 불과하지만, 토큰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시장은 잠재력이 풍부한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엄격한 규제가 수년 내 글로벌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급격히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표준화된 토큰화 기준과 검증 체제의 부재로 병목 현상이 존재하지만, 프로그래머블 온체인 자산에 대한 수요가 뚜렷해지면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프라 구축이 이뤄지고 있다. 디미트라(Dimitra)의 사례는 그 대표적인 예다. 이 프로젝트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를 활용해 브라질 아마존 지역의 카카오 농장을 지원하고, 멕시코에선 탄소배출권 프로젝트 투자 수단으로 활용된다. 연 수익률은 10~30%로 추산돼 주목받고 있다.
전력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위한 리퀴드스타(Liquidstar)의 솔루션 또한 이목을 끌고 있다. 자체 웨이포인트 기지는 배터리 충전, 대기 중 수분 포집, 인터넷 연결, 데이터를 위한 소형 센터를 통합 운영하며, 오프그리드(Off-Grid) 지역에 지속가능한 전자 생태계를 제공한다.
이처럼 그린 RWA는 지속가능성과 수익성 간 균형을 도모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산군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때 '환경·사회·지배구조(ESG)’라는 모호한 프레임에 갇혀 외면받았던 그린 자산은,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를 통해 효율성을 확보하며 점차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스마트 계약과 투명한 검증 체계를 갖춘 블록체인은 이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순화시켜준다.
탄소배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탄소배출권은 1990년대 키오토의정서에 따라 시작됐고, 이후 EU 배출권거래제도와 같은 규제를 통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어 왔다. 2010년대 들어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늘며 자발적 탄소시장(VCM)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현재 시장 규모는 17억 달러(약 2조 3,630억 원)로 추산되며 향후 10년간 연평균 25% 성장이 예상된다. 탄소 제거(CDR) 시장은 2050년까지 1조 2,000억 달러(약 1,668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SG 채권 중 하나인 ‘기후 채권’의 누적 발행액도 2024년 말 기준 3조 5,000억 달러(약 4,865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카본후드(CarbonHood)가 진행 중인 700억 달러(약 97조 3,000억 원) 규모 탄소배출권 토큰화 프로젝트는 전체 탄소 자산(약 2조 달러)의 3.5%에 불과하지만, 높은 기대치를 반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이 중요한 시점일까?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은 2028년부터 보다 엄격한 기후 규제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으며, 관련 조항인 6.4항에 따라 글로벌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이 완성될 예정이다. 이는 국가나 기업이 서로 탄소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게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탄력적으로 달성하게 한다. 중국은 2030년까지 배출 정점을 예고했고, 인도도 같은 해까지 탄소집약도 4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 시장을 활용할 동기가 확실하다.
EU 또한 1990년 대비 55% 감축이라는 2030 기후 로드맵을 추진 중이며, 2026~2028년 도입될 탄소 국경세(CBAM)는 고탄소 수입품에 대한 종합적 과세 체계를 예고하며 탄소비용의 글로벌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단순한 채권이나 탄소 ETF와 같은 기후 자산도 급성장할 수 있고, 블록체인을 통한 토큰화 및 검증 시스템은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중동 지역도 그린 RWA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전기차 도입과 태양광 인프라 확대, 블록체인 기반 탄소 등록 시스템 등을 통해 관련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두바이는 2027년까지 친환경 택시 100% 전환, 2050년까지 전기차 비율 50%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50 탄소 중립’ 계획에 따라 검증 가능한 플랫폼 구축에 힘쓰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전기차 배터리 원료 생산공장과 연계된 녹색 인프라 사업을 추진해 수요 기반을 확장 중이며, 두바이의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 태양광 발전소는 현재 3.86기가와트(GW) 생산 능력을 확보했고, 2030년까지 7.26GW 달성이 목표다. 이 모든 흐름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고도화되고 있으며, 그린 RWA가 글로벌 탄소 경제의 중심축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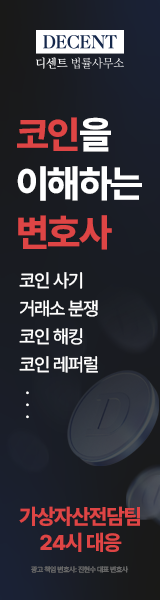








 3
3




![[토큰포스트 펄스 #13] 2027년 가상자산 과세 본격화, 글로벌 투명성 인프라 대전환 시작](https://f1.tokenpost.kr/2026/01/c2edw1j79c.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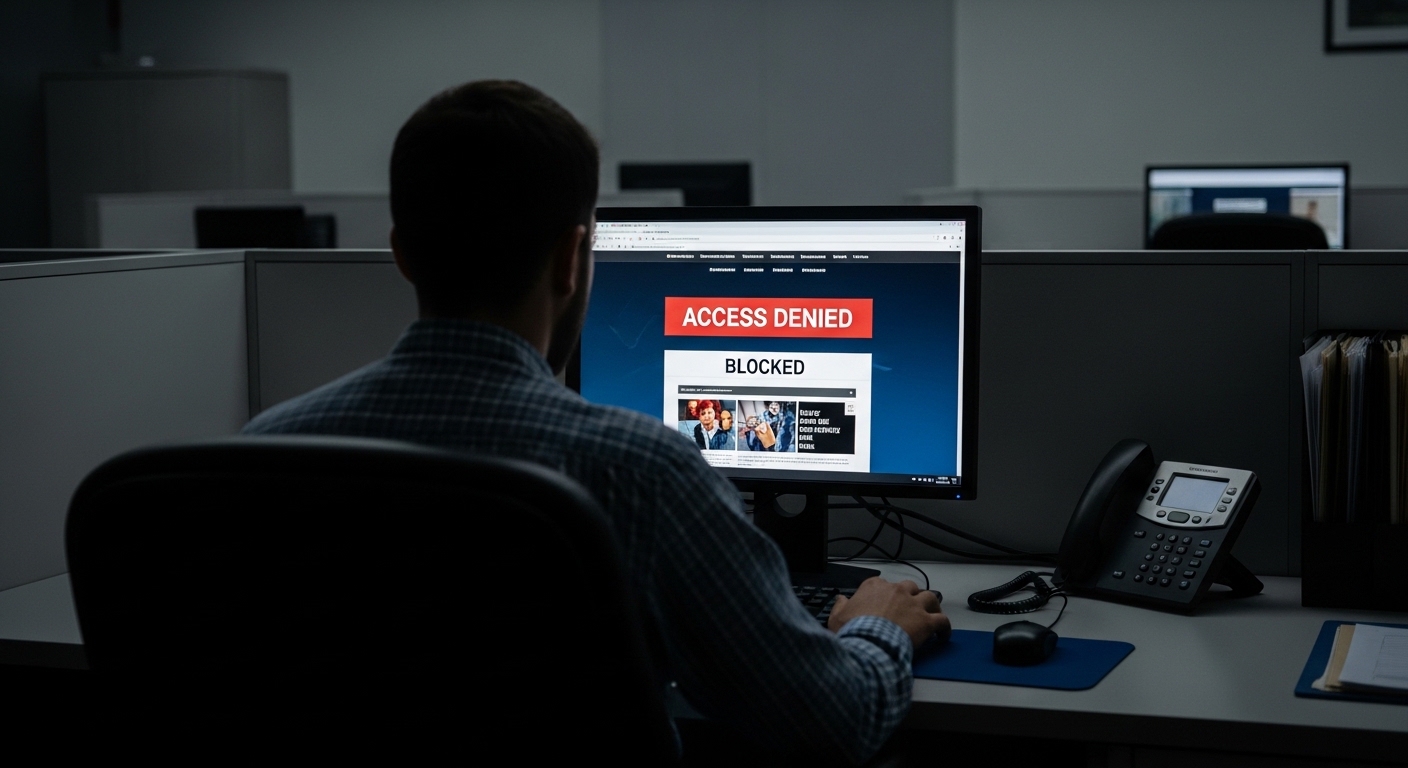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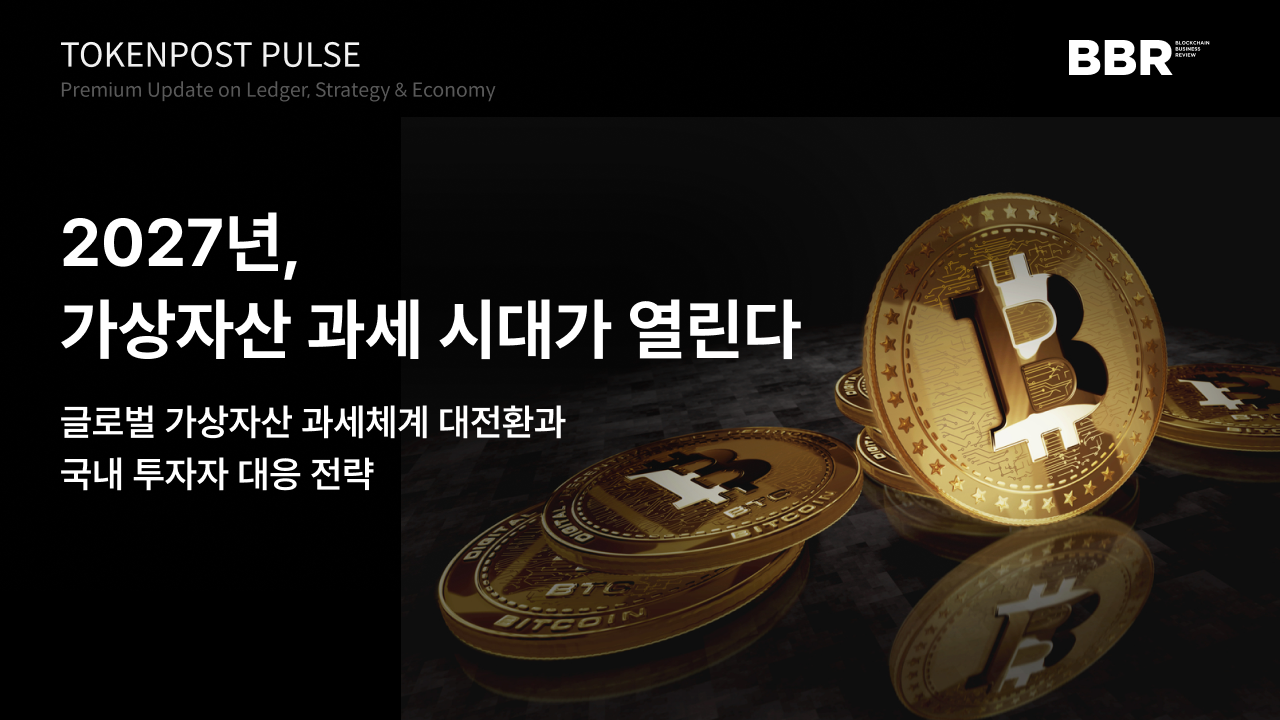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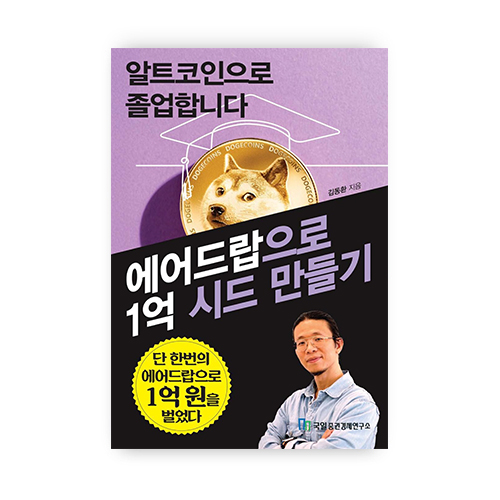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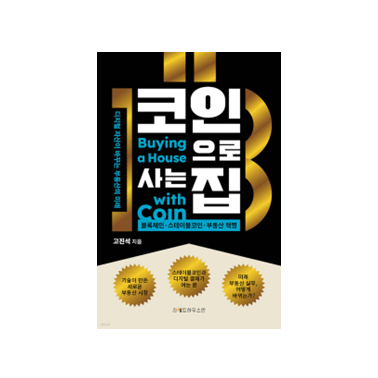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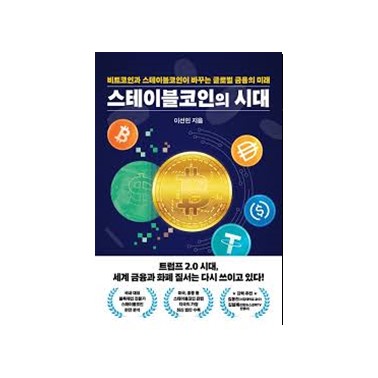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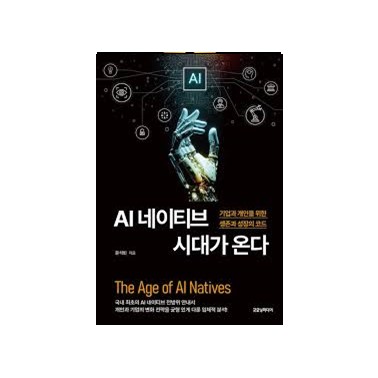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11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fv9w3v1x7g.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10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z06dizl1jg.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08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gw1dm61ji8.pn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07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xrxh0prwmk.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