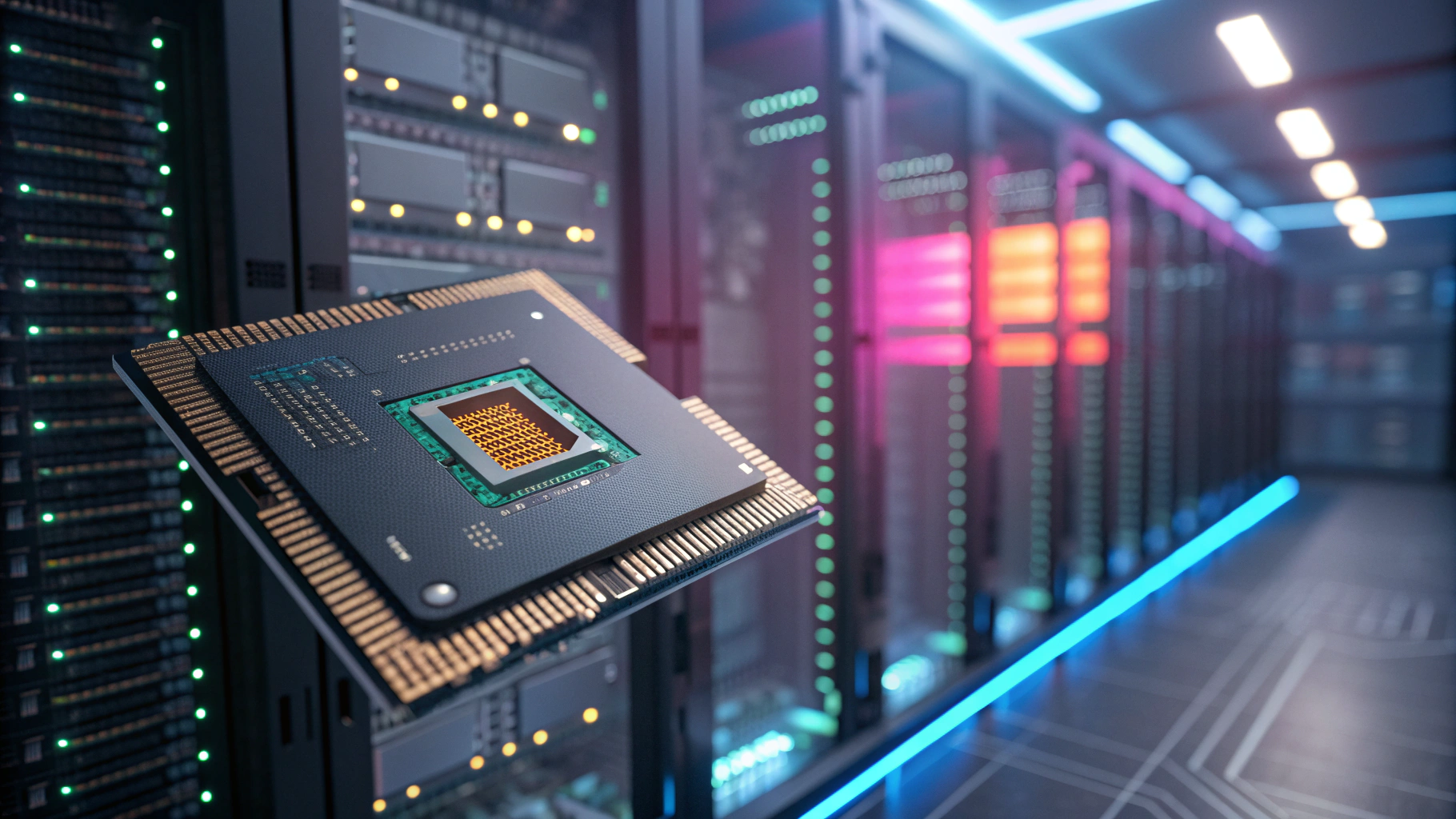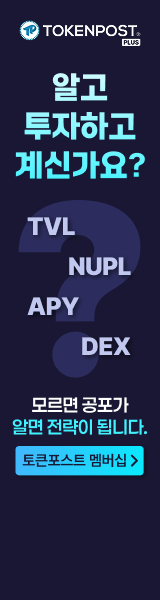코스피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벤처캐피탈 업계는 여전히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벤처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아직 견고하게 자리 잡지 못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2025년 11월 20일 공동 발표한 ‘벤처캐피탈 투자 애로요인 및 정책과제 조사’에 따르면, 응답에 참여한 국내 벤처캐피탈 113개사 중 62.8%가 지난 1년간 투자재원 조달이 과거보다 힘들어졌다고 밝혔다. 투자금 회수 여건 역시 악화돼, 같은 기간 내 투자 회수가 더 어려워졌다는 응답은 71.7%에 달했다. 이는 코스닥시장 침체와 상장·인수합병(M&A) 시장 부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처럼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많은 벤처캐피탈이 정책금융을 통해 부족한 투자재원을 메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태펀드, 성장금융, 산업은행 등 공공 성격의 출자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75.2%에 달했다. 그러나 정책금융의 자금만으로는 펀드 결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실제로 이들 중 91.8%는 민간자금 매칭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으며, 이는 정책펀드가 통상 출자금의 최대 60%를 담당하고, 나머지 40%를 민간에서 유치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업계는 벤처 자금시장 활성화를 위한 해법으로 여러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항목은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보완으로, 전체 응답 비중의 69.0%를 차지했다. 현재 기술특례상장은 상장 심사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으며, 이에 따라 평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다음으로는 세컨더리 펀드 활성화(68.1%)가 언급됐다. 이는 기존 펀드가 투자한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조기 회수를 유도하는 펀드로, 투자 회수 통로를 넓히는 보완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외에도 산업 자본과 금융 자본이 함께 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공동 운용사(GP) 기준을 완화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현재는 신기술금융회사 등 일부를 제외하면 일반 지주회사는 GP로 참여할 수 없지만, 이를 허용할 경우 산업계 전문성과 금융 운용 능력이 결합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응답은 전체의 61.6%를 차지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는 수도권 중심의 투자 집중 현상도 함께 지적됐다. 응답 기업의 80.5%가 벤처투자 대상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고 답한 가운데, 비수도권의 비중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10.7%에 그쳤다. 이에 따라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한 대안으로는 모태펀드 내 권역별 펀드 신설(25.7%), 지방 스타트업 클러스터 확대(23.9%), 지자체의 직접 출자 확대(23.0%) 등이 제시됐다.
향후 벤처투자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온기가 실물 창업 및 벤처 생태계로 연결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금 회수통로 강화, 지역 투자 활성화는 물론이고, 기업과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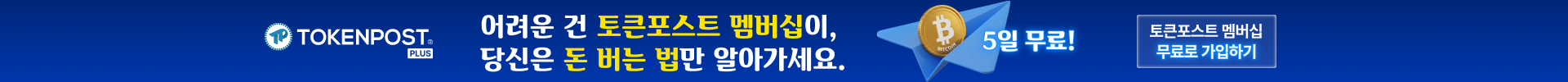


















 1
1




![[KOL 인덱스] 비트코인 4만8000~5만2000달러 하단 가능성 제기 外](https://f1.tokenpost.kr/2025/11/9mjo5kppnz.jpg)


![[오후 뉴스브리핑] 트럼프 대통령, 관세 수입으로 소득세 대체 방안 언급 外](https://f1.tokenpost.kr/2026/02/1st7d5im1s.jpg)

![[알트 현물 ETF] XRP·SOL 순유입 지속…HBAR·AVAX 유입 전환](https://f1.tokenpost.kr/2026/02/07wak9k45j.jpg)


![[오후 시세브리핑] 암호화폐 시장 혼조세… 비트코인 65,913달러, 이더리움 1,921달러](https://f1.tokenpost.kr/2026/02/d0kfbnb9g4.jpg)
![[선물 고수 PICK] 비트코인·이더리움 롱 비중 동반 둔화…코인마진 편중 심화, 변동성 확대 신호](https://f1.tokenpost.kr/2025/08/l6yy2mf75g.jpg)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40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s74dobfws9.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39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celz7zpk2n.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38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jxqkx5yb5c.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37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4twwawrak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