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암호화폐 리서치 전문 미디어 코인이지(CoinEasy)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 성장의 핵심 요인으로 ‘블록체인 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꼽았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혁신과 금융 포용을 주도하는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안전한 체인 연동 구조 없이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세는 눈에 띈다.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총 발행량이 63% 증가한 2,250억 달러에 달했으며, 활성 지갑 수는 3,000만 개로 전년 대비 53% 확대됐다. 같은 기간 월간 전송량은 2.2배 성장한 4조1,000억 달러에 육박했으며, 전체 거래의 60% 이상이 기관 중심으로 이뤄졌다. 코인이지 리서치에 따르면,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기업의 외환 헤지나 해외 인보이스 결제 등 실질적인 금융 도구로 채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같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코인의 절대 다수는 달러 기반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2025년 2월 기준, 전체 스테이블코인의 99.7%가 미국 달러에 연동되어 있으나, 최근 유로, 디르함, 싱가포르 달러 등 지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부상하면서 ‘통화 주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늘고 있다. 특히 중동에서는 테더의 디르함 스테이블코인이, 유럽에서는 MiCA 규제에 따라 유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2억8,000만 달러 규모로 성장 중이다.
아시아 각국의 스테이블코인 전략은 저마다 상이하다. 싱가포르는 100% 준비금을 요구하는 MAS의 규제를 바탕으로 XSGD 등 성공적인 통화 스테이블코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준비금 관리를 맡아 시장 신뢰를 높이고 있다. 홍콩은 CBDC와 상호운용되는 UDPN 프로젝트를 실험하고 있고, 한국은 테라 사태 이후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이어가고 있으나 이미 USDT가 전체 거래의 8.3%를 차지, 소매 확산 속도는 가파르다. 반면 중국과 인도는 각각 디지털 위안(DCEP)과 디지털 루피 중심의 폐쇄적 정책을 고수하며 민간 스테이블코인 도입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발행’만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다. 코인이지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 311개의 레이어1(L1) 블록체인과 56개의 레이어2(L2)가 존재하면서 유동성 분절과 사용자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2023~24년 동안 발생한 해킹 손실액은 25억 달러를 초과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상호운용성 확보 전략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대표적인 접근법으로는 LayerZero가 개발한 OFT(Omnichain Fungible Token) 표준이 있다. Lock & Mint 구조를 통해 서로 다른 체인 간 유동성 분산 문제를 해소하고, Wrapped 토큰 사용에 따른 혼란을 줄이며 개발자 친화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실제로 상위 20개 스테이블코인의 절반 이상이 이 인프라를 채택하고 있다. 이를 활용한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으로는 USDT0, USDe(Ethena), PayPal PYUSD, 와이오밍 주 발행 WYST 등이 있다.
또한 각종 체인 간 전용 연결 솔루션도 활성화되고 있다. MakerDAO의 Teleport와 Frax의 Frax Ferry는 체인마다 독립적인 전송 경로를 제공하며, Ondo와 Tether는 탈중앙 검증 네트워크(DVN)를 통해 Axelar 또는 Google Cloud와 함께 안전한 검증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불법 자금 흐름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2024년 기준 스테이블코인 연관 불법 거래가 전체의 63%에 달한다는 통계는 향후 트랜잭션 모니터링 및 규제 준수 도구의 필수성을 시사한다.
아시아가 이 상호운용성의 과제를 선도할 새 기회지대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힘을 얻고 있다. 동남아에서 우버를 제치고 승기를 잡은 그랩(Grab)의 사례처럼, 기술적 확신이 따를 경우 아시아 지역은 빠른 속도로 전환에 나설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발행 중심에서 실사용 중심으로 전략 전환, 상호운용성 우선 구축, 그리고 규제·기술·기관 간 통합 협력이 스테이블코인 대중화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인이지는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의 미래이며, 상호운용성은 그 미래의 필수 조건"이라고 결론지었다. 아시아가 기술 표준화와 실제 활용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다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뉴 리더’로 부상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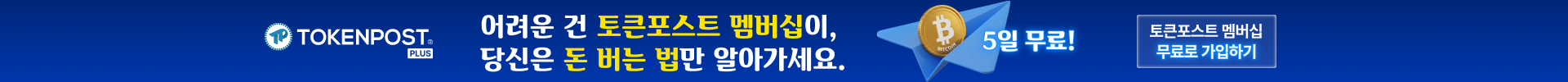


















 6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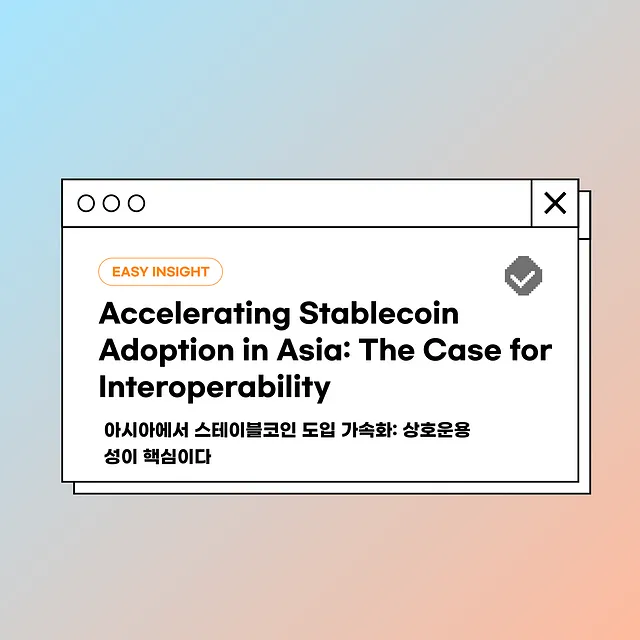



![[크립토 인사이트 EP.21] 비트코인 11% 폭등·엔비디아 어닝 쇼크…단기 반등과 구조적 경고가 동시에 켜졌다](https://f1.tokenpost.kr/2026/02/zf6q3cseq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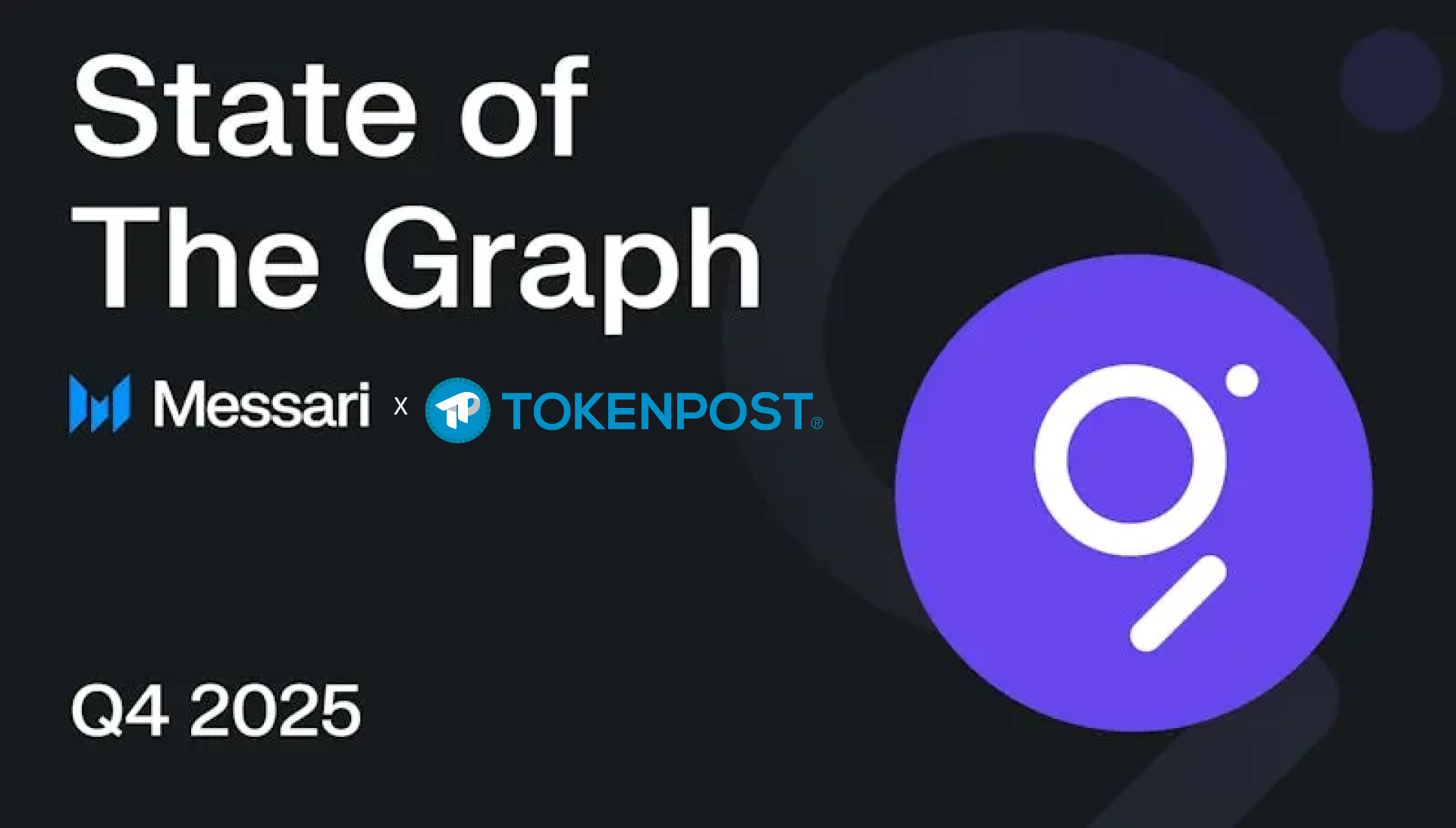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41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g27ndxvfxv.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40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s74dobfws9.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39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celz7zpk2n.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38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jxqkx5yb5c.jpg)

![[저녁 뉴스브리핑] 민주당, 가상자산 전담기구 '디지털자산청' 신설 검토 外](https://f1.tokenpost.kr/2025/05/jpwgkmeiyz.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