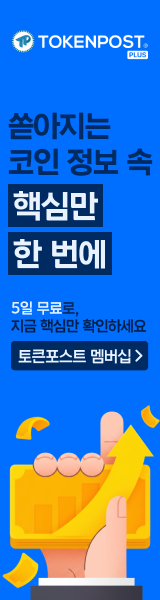비트코인이 단 하루 만에 2.5% 하락하자, 18억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다. 37만 명 넘는 투자자가 쓸려나갔고, 이더리움에서만 5억 달러 넘는 포지션이 사라졌다. 비트코인 청산액도 약 3억 달러에 달했다. 시가총액은 하루 새 1,500억 달러가 증발했고, 비트코인은 11만 2,000달러 아래로 밀렸다.
이것은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다. 시장의 얇은 유동성과 과열된 레버리지가 동시에 터지자 순식간에 ‘퍼펙트 스톰’이 발생했다. 호가 간격은 벌어지고, 유동성 공급자는 발을 뺐다. 시장 구조가 얼마나 허약한지, 또 얼마나 위험한지 여실히 드러났다.
수치에 잡히지 않는 진짜 위험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수치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코인글래스 지표에는 중앙화거래소(CeFi)의 내부 마진콜, 장외 레포, 디파이 레버리지 청산이 포함되지 않는다. 시장 내부에서는 이번 청산 규모가 실제로는 25억~30억 달러에 달했을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겨우 2.5% 조정에서 이 정도라면, 10% 급락이나 매크로 충격이 닥칠 경우 시장이 어떻게 버틸지 상상해보라.
더구나 연준은 지난주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해 4~4.25%로 내렸지만, 이 완화 정책마저 시장을 지탱하지 못했다. 파산한 FTX가 9월 30일 16억 달러를 3차 배분하겠다고 밝힌 것도 심리를 짓눌렀다. 레버리지로 얽힌 구조는 외부 충격에 이처럼 취약하다.
축제장 열기와 시장 냉기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시기 서울에서는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KBW)가 열렸다. 본지는 취재와 패널 좌장을 맡으며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체감했다. 줄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행사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러나 시장은 정반대의 풍경을 보였다. 며칠 전 대규모 청산으로 수십만 명이 계좌를 잃었다. 더구나 최근 해킹과 대규모 토큰 발행 사고로 70% 가까이 폭락해 일부 거래소에서 ‘거래 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특정 토큰이 메인 스폰서로 행사장 입구를 장식했다. 화려한 부스는 잠시 눈을 속였지만, 그 뒤에 있는 것은 혁신이 아니라 구조적 불안이었다. 행사장의 줄은 끝이 없었지만, 투자자의 퇴로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구조적 취약성 외면 말라
이번 ‘레버리지 피바다’는 암호화폐 시장의 본질을 다시 확인시켰다. 거래소는 마진거래를 부추기고, 프로젝트는 담보를 반복 활용해 대출을 일으킨다. 투자자는 레버리지를 쌓고 또 쌓는다. 결국 작은 흔들림에도 시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다음 황소장만 기다리면 된다”는 말은 현실을 외면하는 자기 위안일 뿐이다. KBW의 화려한 무대와 레버리지 청산의 참혹한 현실을 동시에 목격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냉정한 성찰이다. 혁신은 거품이 아니라 건전한 구조 위에서만 가능하다.
이번 사태는 묻는다. 당신은 청산 이후 어떤 전략을 세웠는가. 위험을 줄이고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레버리지의 유혹에 휘둘릴 것인가. 선택하지 않는 자를 대신해 시장은 언제든 냉혹하게 답할 것이다.


















 14
14






![[사장분석] 미 정부 셧다운 시한 임박… 시장은 왜 이렇게 태평한가](https://f1.tokenpost.kr/2026/02/j89t8rmwy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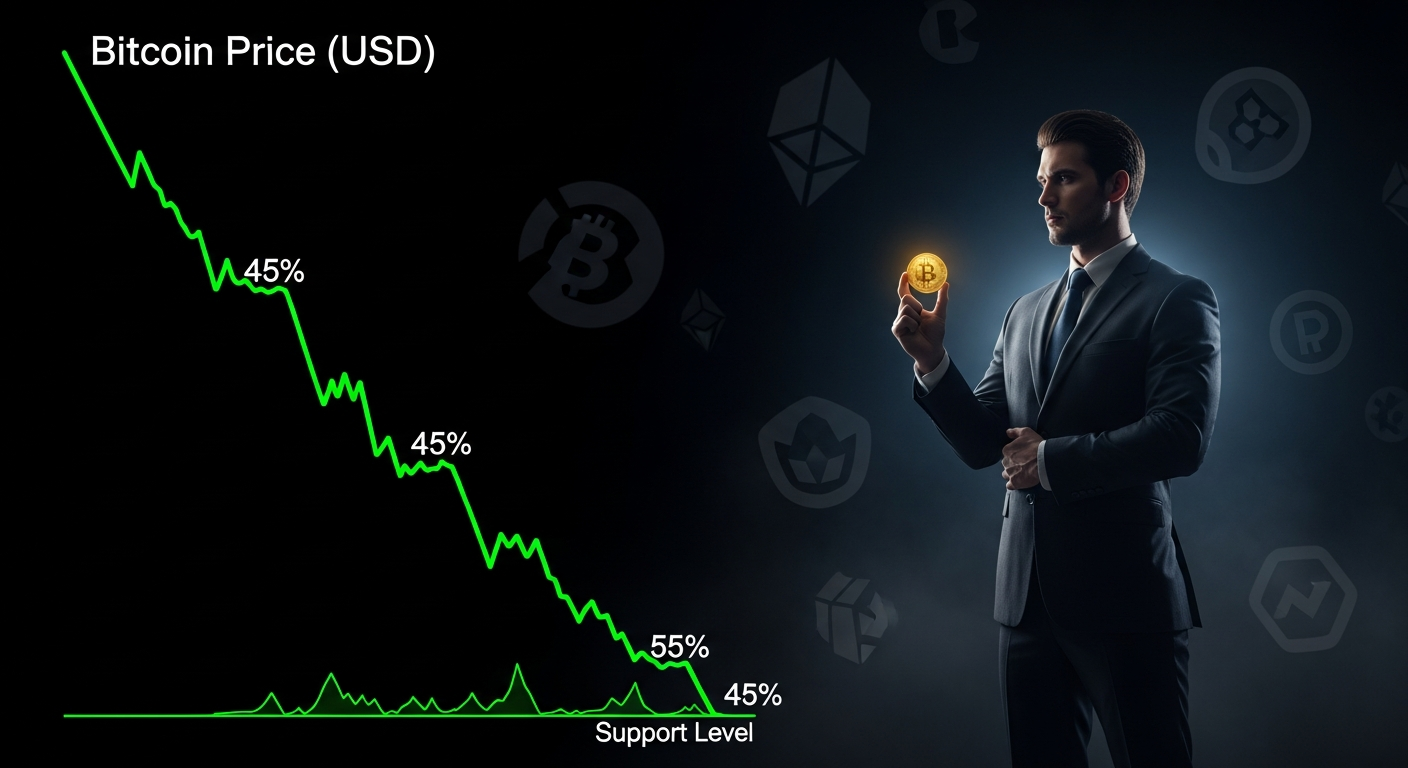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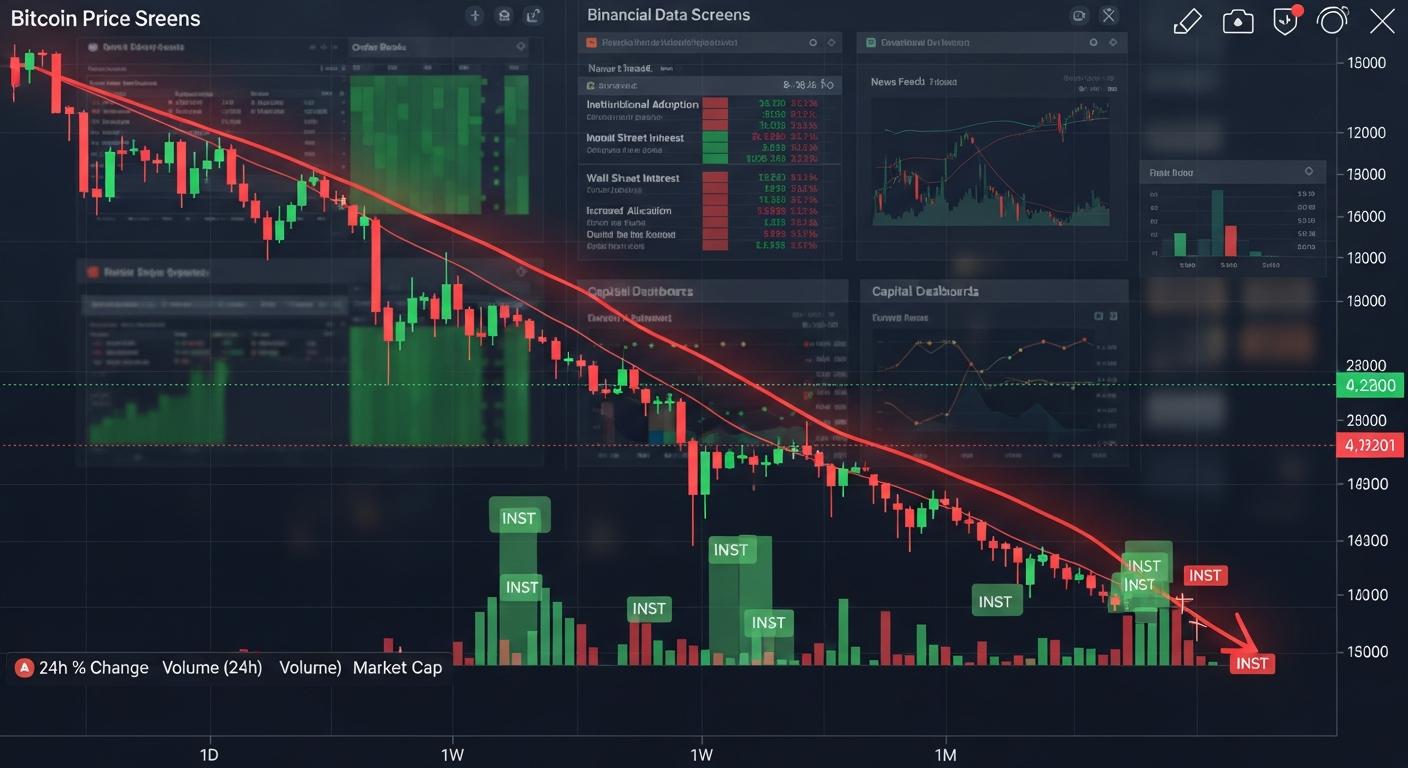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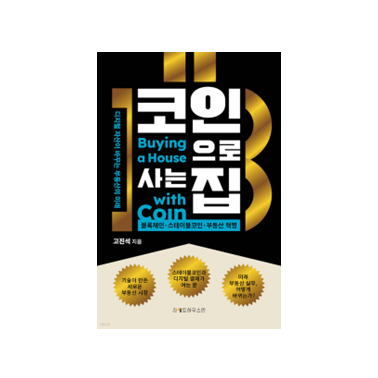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8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0l6qk9c4ub.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7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6ndj5dyz0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6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qhaxcpku8t.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5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rx65p108a9.jpeg)
![[사설] 한국만 스테이블코인이 금기어인가](https://f1.tokenpost.kr/2025/09/1qybcq267u.png)
![[사설] 디지털자산 트레저리, 신기루가 걷히고 있다](https://f1.tokenpost.kr/2025/09/i11oewx07p.jpg)
![[사설] 홍콩, 세계 첫 위안화 디지털 채권…달러 패권만 더 키울 수 있는 역설](https://f1.tokenpost.kr/2025/07/658nl2764r.webp)
![[사설] 권력이 자산이 되는 시대, ‘트럼프 코인’이 여는 지각변동](https://f1.tokenpost.kr/2025/09/sox7d58ozx.jpg)
![[사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략 없이 뛰면 ‘돈만 태운다’](https://f1.tokenpost.kr/2025/06/6rft2x39z7.webp)
![[사설] 스테이블코인, 조용히 인플레이션의 문을 두드리다](https://f1.tokenpost.kr/2025/08/scvpcdulxi.jpg)

![[토큰분석] 비트코인 조정장서 28% 급등…‘온체인 월스트리트’ 향하는 하이퍼리퀴드](https://f1.tokenpost.kr/2026/02/3yd576cwh1.jpg)
![[시장분석]](https://f1.tokenpost.kr/2026/02/clv21vw4sc.jpg)


![[마켓분석] 비트코인 바닥, 가격만 보면 놓친다... 고수들이 기다리는 결정적 '변수'는?](https://f1.tokenpost.kr/2026/02/3f0krn151k.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