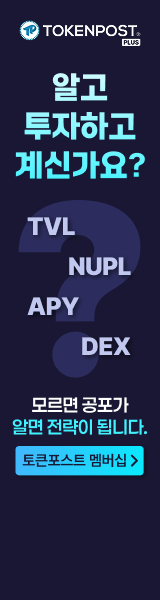블록체인 대중화의 최대 난제였던 속도·수수료·복잡성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프로젝트로 오아시스(Oasys)가 주목받고 있다. 게임 산업에 최적화된 구조로 출발했지만 최근에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실물자산(RWA) 분야까지 확장하며 생태계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웹2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블록체인 환경에서 구현하려는 이 프로젝트는 실질적인 시장 수요에 맞춘 설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아시스가 기존 퍼블릭 블록체인의 한계를 넘기 위해 선택한 방식은 ‘허브(Hub)–버스(Bus)’라는 두 개의 층으로 이뤄진 구조다. L1에 해당하는 허브 레이어는 보안과 데이터 가용성을 담당하고, 각 게임이나 서비스는 독립적인 L2 버스를 이용해 초당 수많은 상호작용을 처리한다. 이 구조 덕분에 다른 서비스의 트래픽이 영향을 주지 않으며, 대규모 게임 운영에 필요한 속도와 확장성이 확보된다.
오아시스의 가장 강력한 차별점은 ‘가스비 제로 경험’과 ‘즉각적 거래 확정’이다. 실질적으로 수수료는 존재하지만 사용자가 아닌 개발자가 부담하는 구조여서 일반 이용자는 블록체인이 동작한다는 사실을 체감하지 않는다. 더불어 옵티미스틱 롤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최대 7일의 이의 제기 기간을 우회하는 ‘즉시 검증인(Instant Verifier)’ 구조를 적용해 거래 확정 시간을 웹2 수준으로 낮췄다.
이 같은 안정성·속도·통제성은 게임뿐 아니라 금융기관에도 매력적이다. 실제로 오아시스는 일본의 게이츠잉크와 협력해 약 7,500만 달러 규모의 도쿄 부동산을 토큰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RWA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콩·싱가포르 등 우호적 규제 환경을 갖춘 아시아 시장에서 실물자산 토큰화 사례가 증가하는 흐름과도 맞물려 성장 가능성이 크다.
생태계의 핵심인 OAS 토큰은 네트워크 내에서 명확한 유틸리티를 가진다. 허브에 기록하는 가스비, 새로운 버스 구축을 위한 예치금, 검증인 스테이킹, 거버넌스 참여 등 기능적 수요가 구조적으로 발생한다. 여기에 넥슨·스퀘어에닉스 같은 대형 기업이 초기 후원자로 참여한 점도 생태계 신뢰성을 높인다. 블록체인 대중화의 현실적 모델을 찾는 시장에서 오아시스는 완전한 개방성보다는 ‘큐레이션된 고품질 생태계’가 효율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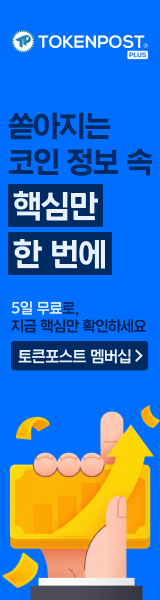









 1
1








![[토큰분석] 90% 빠진 토큰, 반등할까 사라질까… 5가지로 판별하는 법](https://f1.tokenpost.kr/2026/02/2bxkphkg67.jpg)
![[토큰분석] 암호화폐 시장에서 '진짜 돈'이 빠지고 있다… USDT 시총이 보내는 경고 신호](https://f1.tokenpost.kr/2026/02/fnpcwelqa5.jpg)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41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g27ndxvfxv.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40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s74dobfws9.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39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celz7zpk2n.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38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jxqkx5yb5c.jpg)






![[스테이킹 랭킹] 이더리움·솔라나 스테이킹 반등…BNB체인 연간 보상 56% 급증](https://f1.tokenpost.kr/2026/02/01zgcn98ud.png)
![[토큰포스트 칼럼] 주식시장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간다… '인터넷 자본시장' 시대가 온다](https://f1.tokenpost.kr/2026/02/egp7zm9d1p.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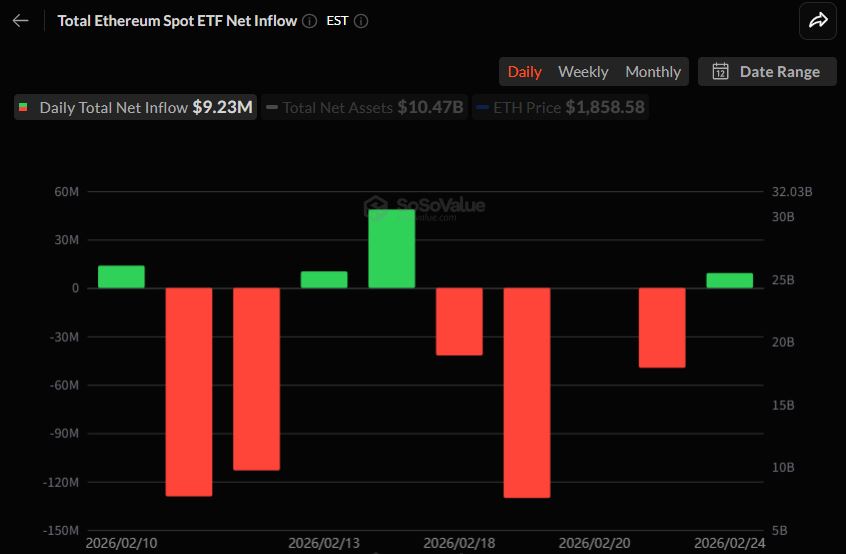
![[사설] 월가가 디파이 토큰을 사들이는 진짜 이유… '투기'가 아니라 '인프라 선점'이다](https://f1.tokenpost.kr/2026/02/d6yv1fi5l3.jpg)

![[코인 갱신 일지] 슈퍼포지션 저점 대비 219% 급등 속 신고가 근접…BVT는 신저가 추락](https://f1.tokenpost.kr/2025/08/2r5bify2q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