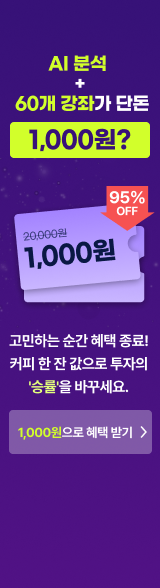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지난 7월 말 폐지됐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휴대전화 구매 지원금은 크게 오르지 않아 제도 폐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이 사라진 뒤인 지난 9월 기준 이동통신사들이 소비자에게 지급한 평균 단말기 지원금은 75만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 2월 평균치 66만 9천 원보다 약 8만 원 늘어난 수준이지만, 제도 폐지로 인한 시장 경쟁 촉진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특히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경쟁이 격화됐던 지난 6월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후 평균 지원금은 73만 원대까지 오른 바 있다. 그러나 법 폐지를 계기로 경쟁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됐던 것과 달리, 이후 두 달간 지원금 상승폭은 오히려 둔화된 양상을 보였다. 7월에는 75만 8천 원까지 올랐지만, 8월과 9월은 각각 74만 7천 원, 75만 원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것이다.
지원금 차이는 지역과 통신사, 기종에 따라도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평균 지원금 격차는 단통법 폐지 전 6만 원 가까이 났지만, 현재는 각각 75만 원, 74만 원 수준으로 간극이 줄었다. 한편, 통신사별로는 LG유플러스가 75만 7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 KT 75만 5천 원, SK텔레콤은 73만 9천 원 순이었다. 기종별로는 아이폰이 평균 84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프리미엄 갤럭시 모델은 74만 원, 중저가 갤럭시 모델은 42만 원으로 나타나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제정돼 이동통신 시장에서 과열된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통신사의 보조금 공시를 의무화하고, 공시 지원금 대비 15% 이내로 추가 지원금 제한을 두었던 이 법은, 보조금 격차를 줄이면서도 소비자 혜택은 제한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올 7월 22일부로 폐지되면서 보조금 상한제도와 공시 의무조항이 사라졌고, 이를 통해 시장 자율 경쟁 체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는 통신사 간 실질적 경쟁이 크게 강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대해 최수진 의원은 통신사들이 보조금 경쟁보다는 요금제에서의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시장 유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많은 소비자가 복잡한 유통구조와 불투명한 할인 혜택에 혼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제도적 장치 없이 자율 경쟁 체계가 소비자 편익 증대로 이어지려면 보다 정교한 감독과 공정경쟁 유도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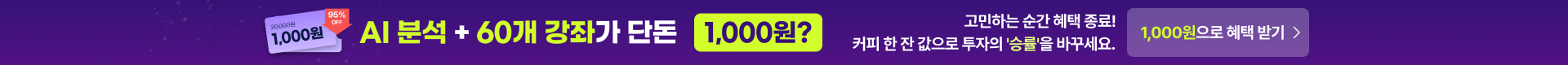















 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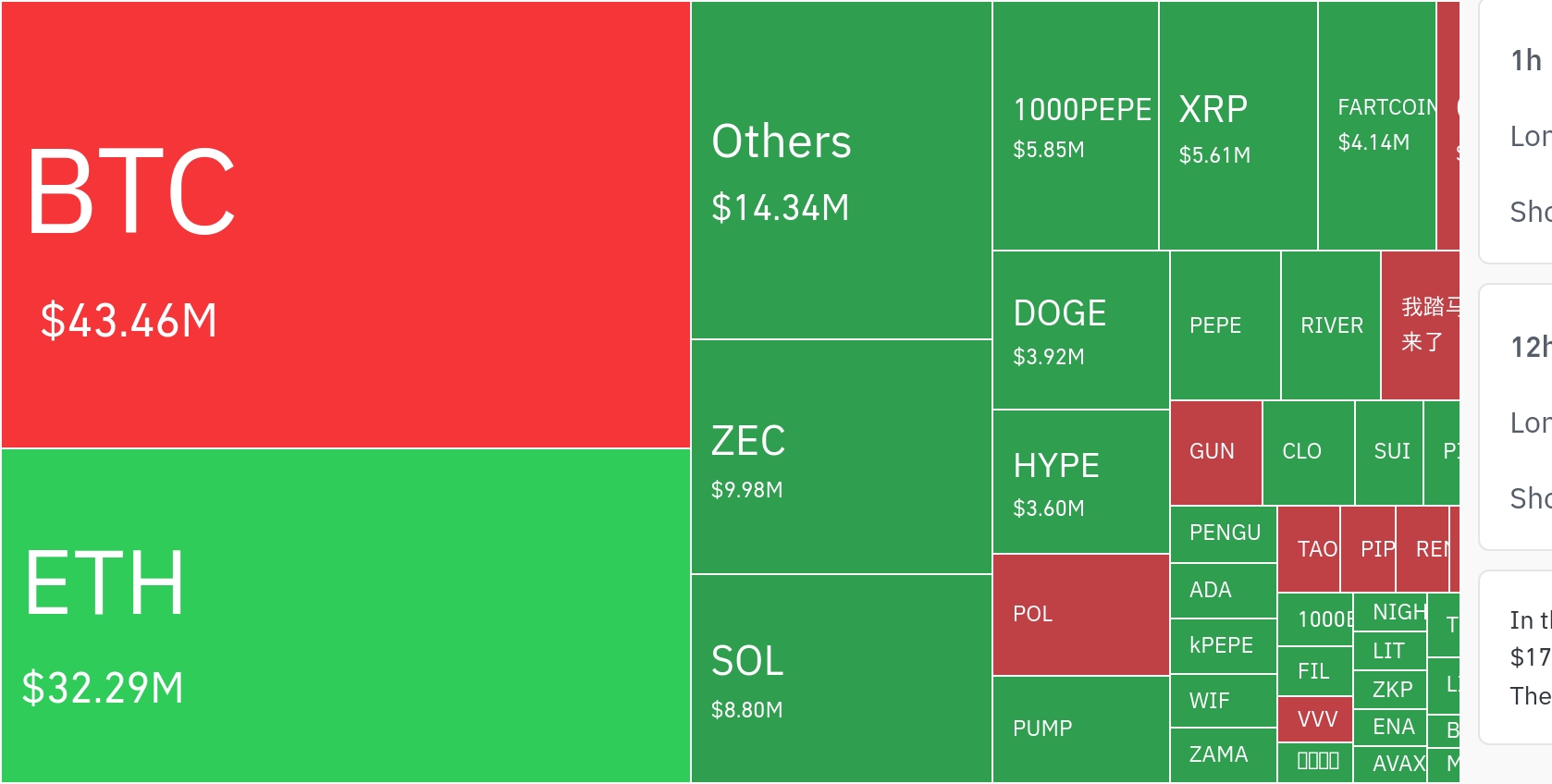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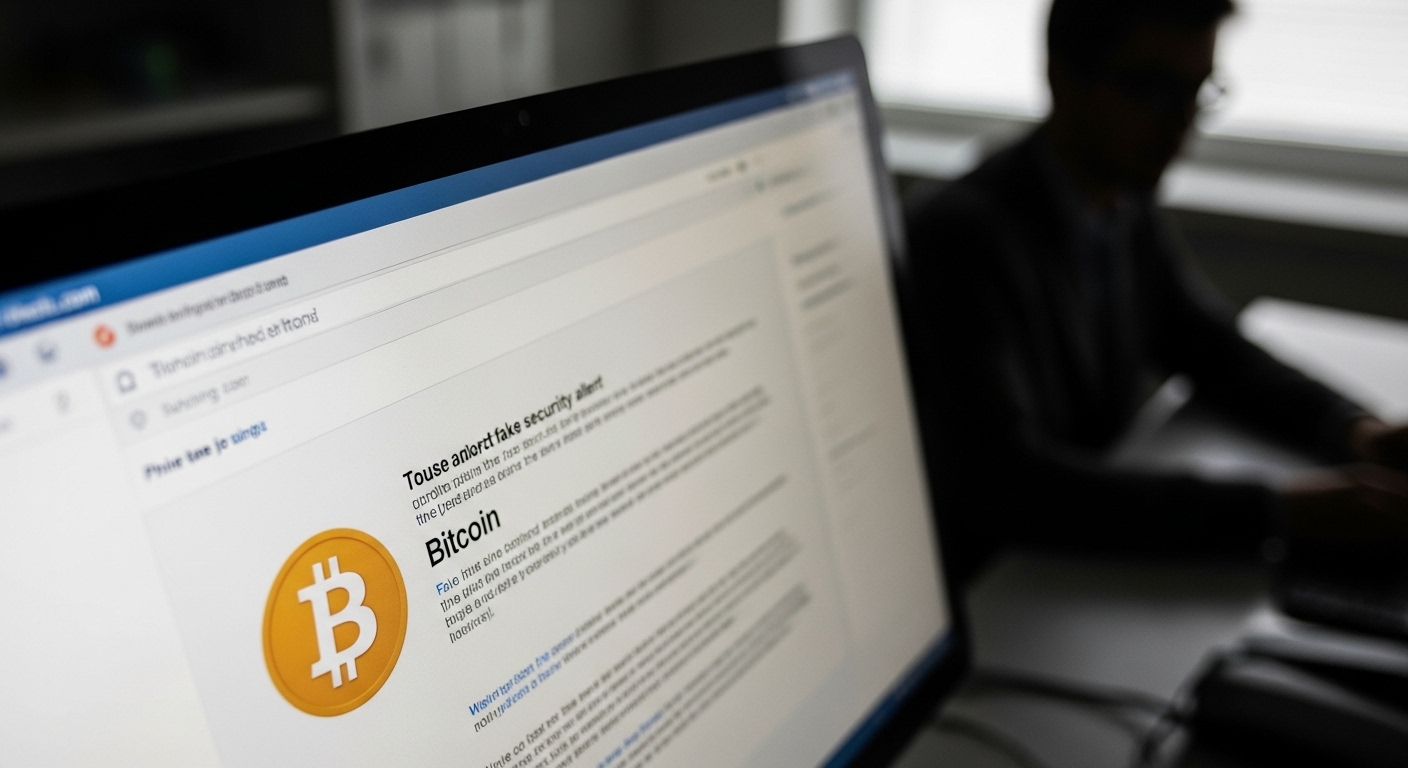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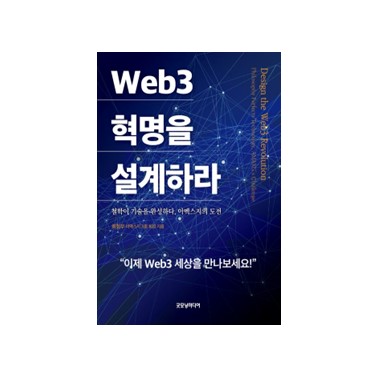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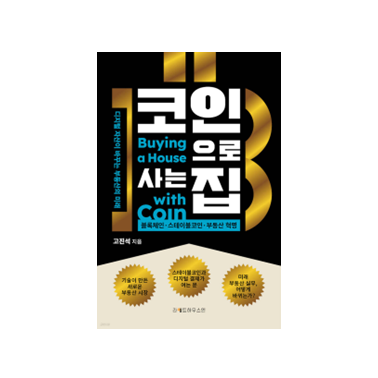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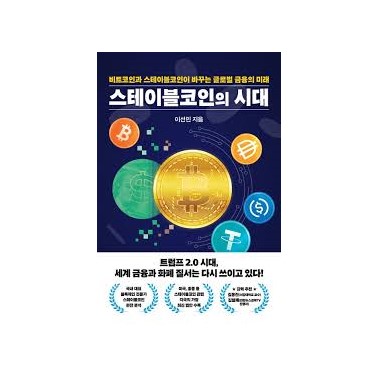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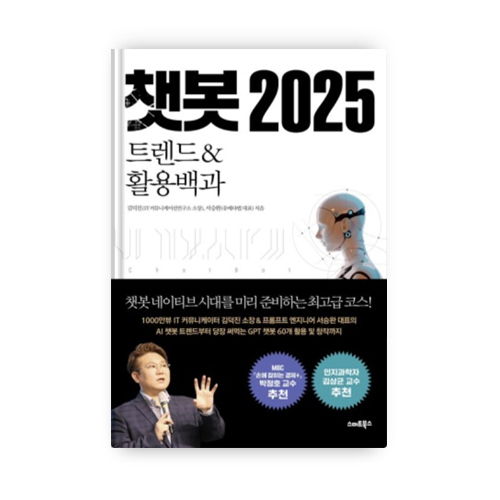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08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gw1dm61ji8.pn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07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xrxh0prwmk.jpe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06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6vamcvu8s9.jpe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05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b50rzae1cm.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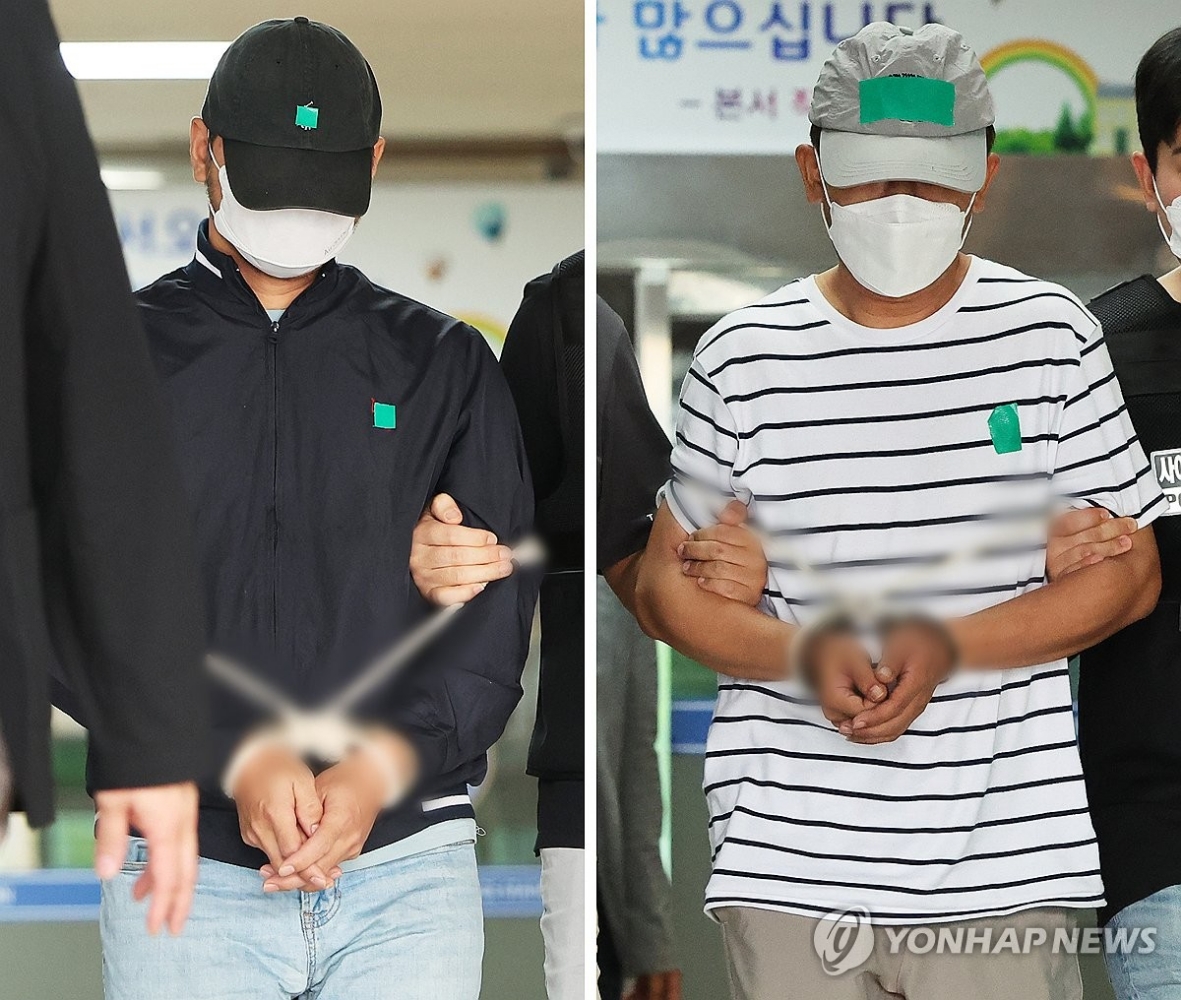


![[사장분석] 운명의 금요일: 미 대법원 관세 판결 임박, 시나리오별 시장 대응 전략](https://f1.tokenpost.kr/2026/01/lqqni70v8n.webp)



![[기획연재①] 2026 크립토 시장 대전망: 거시 환경과 규제의 대전환](https://f1.tokenpost.kr/2026/01/2ye3a96t8f.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