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을 앞둔 8월 초, 국내 태극기 생산업체들이 심각한 수요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값싼 중국산 태극기 물량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국산 태극기의 생산과 판매가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50년 넘게 태극기와 각종 깃발을 제작해온 삼우플래그의 송이랑 대표는 올해 들어 광복절 특수도 찾아볼 수 없다고 호소했다. 예년 같으면 7월 중순부터 전국 납품을 위한 출고 작업으로 사무실 앞 공간이 태극기 상자로 가득 찼지만, 올해는 8월이 되도록 주문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상황은 경기 포천에서 태극기 업체를 운영하는 양동열 대표도 마찬가지였다. 2000년대에는 한 달에 15만 세트가 팔리던 태극기가 요즘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한다.
업계가 꼽는 가장 큰 어려움은 중국 제품과의 가격 차이다. 국내에서 생산한 소형 태극기(수기)의 경우 개당 생산원가가 수백 원대에 이르지만,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중국산은 크기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10개에 1,000원 이하로도 판매된다. 중국산 태극기가 이처럼 원가 절감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넓히다 보니, 국내 업체들은 원자재와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단가 경쟁에서 완전히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가격뿐만 아니라 태극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자체가 예전 같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때는 국경일마다 공동현관에 태극기를 내걸거나 단체 구매 수요도 많았으나, 최근에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태극기를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집회 이미지와 연결되며 태극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했고, 이는 일반 소비자 수요 위축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정부도 이러한 하락세를 인지하고, 계절성 수요에 맞춰 홍보에 나서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포털, 방송, 편의점 등을 통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국산 태극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유통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태극기 게양은 개인 선택에 맡겨지는 사안이므로, 실질적인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같은 흐름은 단순한 계절 상품의 부진을 넘어 국기(國旗)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애착의 약화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세가 계속된다면 소규모 태극기 제작업체들의 도산 우려도 커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상징물 분야의 자립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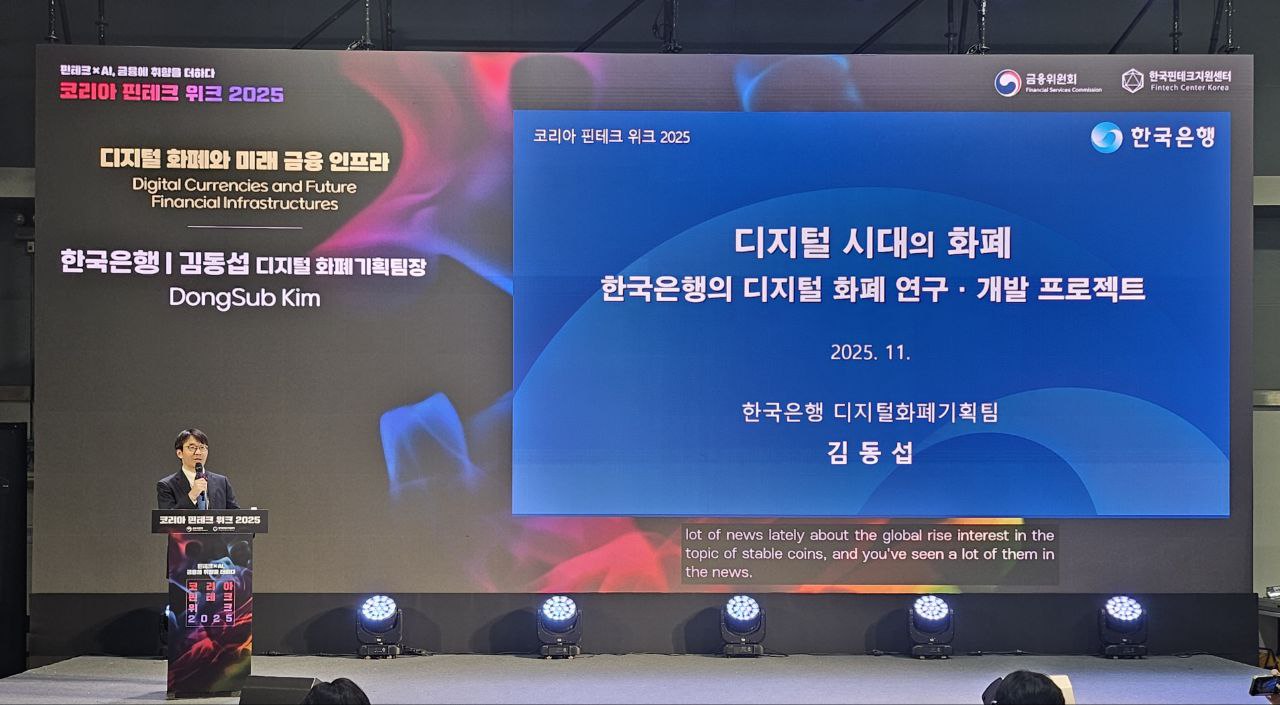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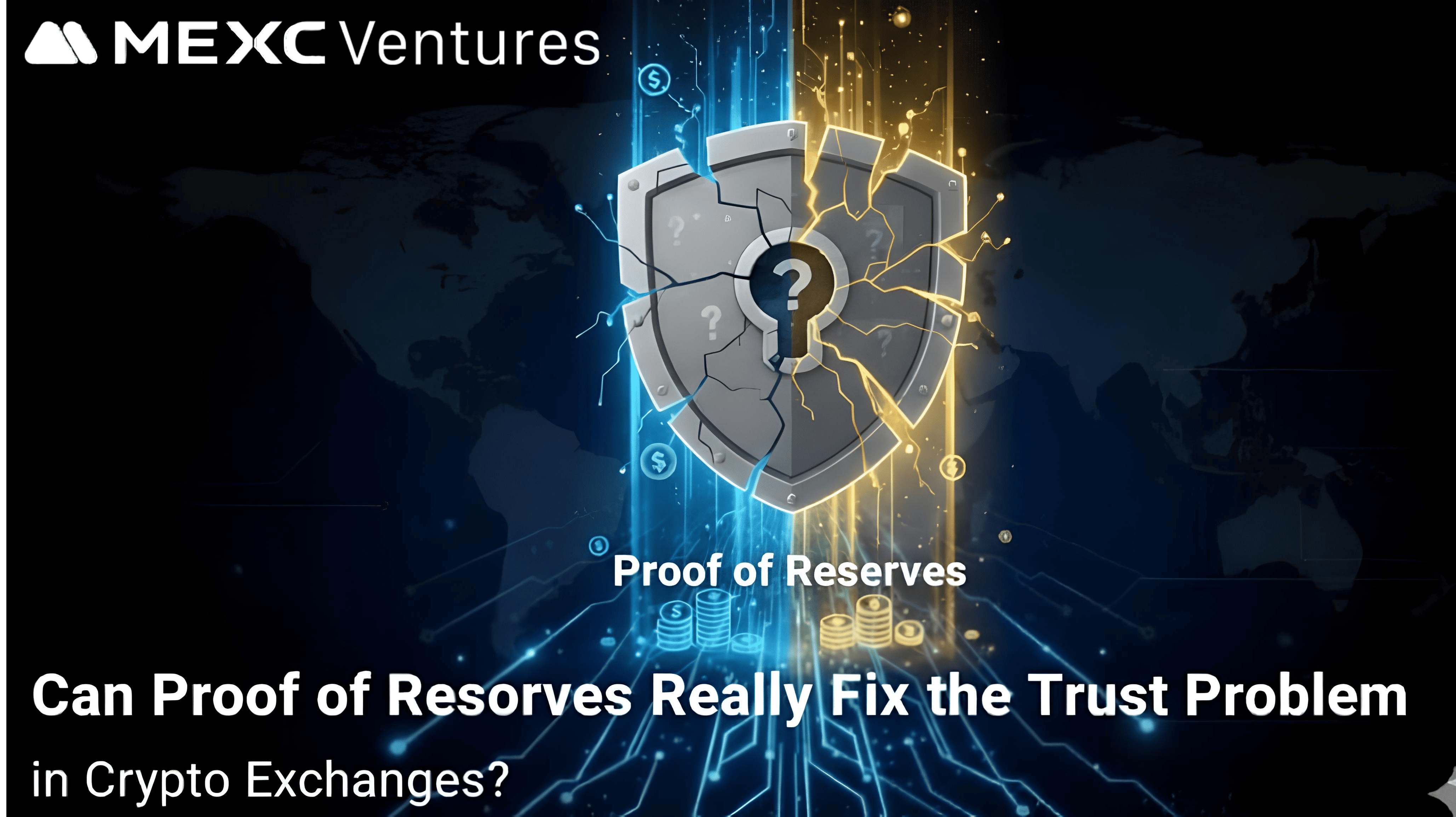





![[오후 뉴스브리핑] 업비트 445억원 해킹에 당국 “북한 라자루스 유력 검토” 外](https://f1.tokenpost.kr/2025/11/307qvb207v.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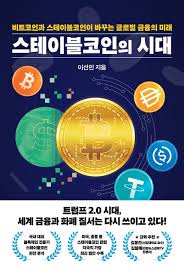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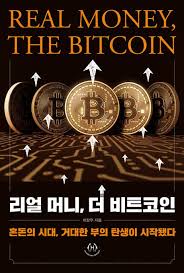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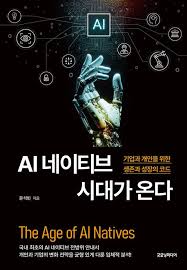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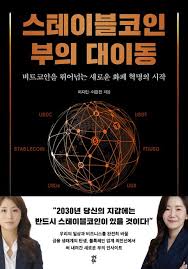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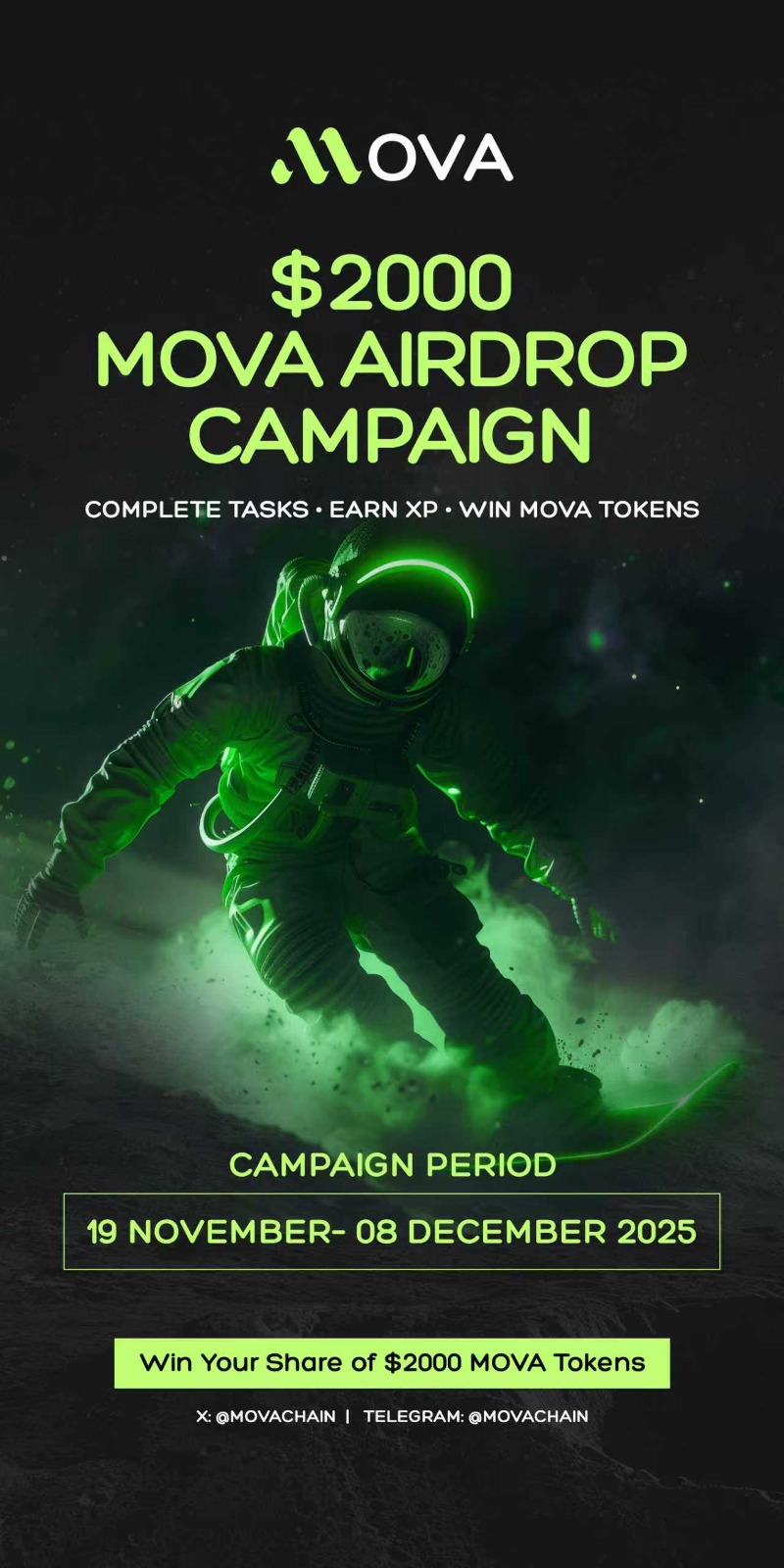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480회차](https://f1.tokenpost.kr/2025/11/lgyaryar95.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479회차](https://f1.tokenpost.kr/2025/11/cgpvxw9gxo.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478회차](https://f1.tokenpost.kr/2025/11/x8aqgymoiz.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477회차](https://f1.tokenpost.kr/2025/11/iw60bv3io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