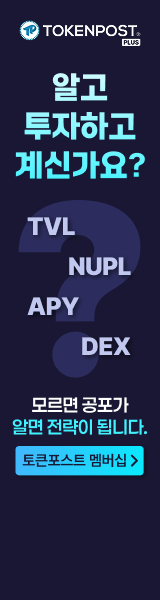코인이지(CoinEasy)는 최근 리서치를 통해 린 올든(Lyn Alden)의 분석을 기반으로 미국의 재정적자가 구조적으로 멈출 수 없는 흐름에 접어들었다고 경고했다. 이는 단기적 정책이나 경기변동의 결과가 아닌, 제도와 문화 전반에 내재된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며, 이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BTC)과 같은 희소 자산이 핵심 자산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강하게 시사한다.
린 올든이 밝힌 첫 번째 핵심은 ‘재정적자와 실업률의 디커플링’이다. 과거에는 경제가 침체되면 재정적자가 증가하고, 회복기에 줄어드는 경기순응적(Countercyclical) 구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고용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음에도 적자가 줄지 않고 오히려 확고히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미국 재정적자가 더 이상 일시적이지 않고, 구조적 문제로 전환됐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자산시장의 변화는 이러한 구조적 위기를 선반영하고 있다. 금은 실질금리의 움직임과의 상관관계를 상실한 채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비트코인 또한 고금리 환경 속에서도 뚜렷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이 단기 금리보다 장기적 화폐가치의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는 해석으로 연결된다. 코인이지 리서치는 이를 ‘재정지배(fiscal dominance)’의 결과로 바라본다.
세 번째 논점은 금리 정책의 무력화다.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연방 정부의 부채 증가율은 민간 부문을 압도하고 있다. 이는 높은 금리가 오히려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는 딜레마를 만들어낸다. 높은 이자비용이 정부 지출을 가속화시켜 재정적자를 더 키우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올든은 금리를 올릴수록 재정 압박이 커지는, 소위 ‘역설적 효과’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이 고착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높은 부채와 금리는 폭발적인 이자지출을 유발하며, 둘째,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적 위기는 2035년경 ‘기금 고갈’이라는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셋째, 법정화폐 시스템은 팽창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구조를 띤다. 지속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한 현재의 통화 시스템은 총 부채 감소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과거의 유사 사례로는 1940년대 미국을 들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미국처럼, 현재도 고부채 시대, 수익률 통제, 인플레이션 유도로의 유사한 조합이 반복되고 있으며, 자산시장 억제와 부채축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 억압이 다시 펼쳐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코인이지는 전체 리서치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 또한 재정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유권자의 요구와 정치인의 대응 방식이 ‘지출 증대와 부채 의존’이라는 방식에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지출 삭감이나 증세는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는 재정적자가 단순 정책 실패가 아닌 제도적 속성이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이 같은 배경에서 비트코인은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서 주목받는다.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는 비트코인은 공급의 절대적 희소성을 가진다. 투명성과 검열불가성, 중앙통제 부재 등은 법정화폐 체계와는 정반대의 속성을 지니며, 재정위기 시대의 믿을만한 대안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다.
향후 10년간 미국 재정적자는 현재보다도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금, 비트코인을 비롯한 희소자산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코인이지는 이번 리서치를 통해 “이 흐름을 무시한 투자자는 구조적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Nothing Stops This Train’이라는 메시지는 단순한 비관이 아닌 현실 인식이다. 이 기차를 멈출 수 없다면, 이제는 선로 방향을 바꿔야 할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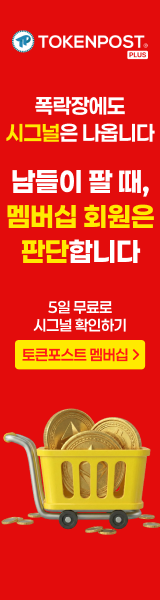










 4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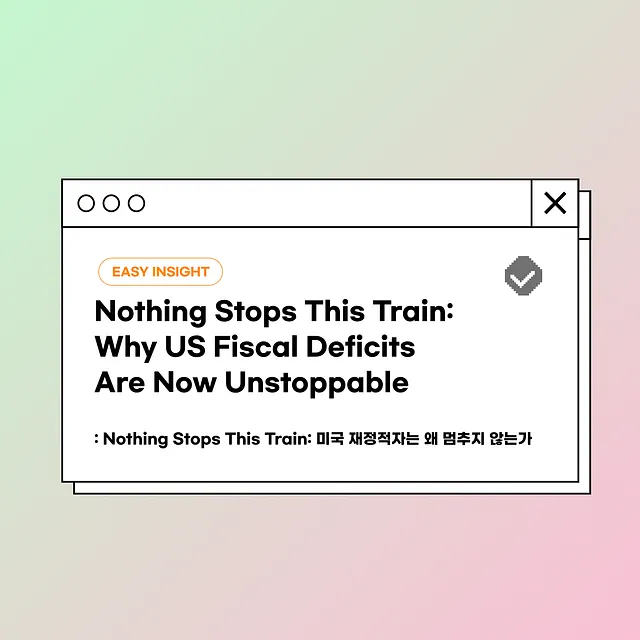

![[토큰분석] 90% 빠진 토큰, 반등할까 사라질까… 5가지로 판별하는 법](https://f1.tokenpost.kr/2026/02/2bxkphkg67.jpg)
![[토큰포스트 칼럼] 주식시장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간다… '인터넷 자본시장' 시대가 온다](https://f1.tokenpost.kr/2026/02/egp7zm9d1p.jpg)

![[토큰분석] 암호화폐 시장에서 '진짜 돈'이 빠지고 있다… USDT 시총이 보내는 경고 신호](https://f1.tokenpost.kr/2026/02/fnpcwelqa5.jpg)

![[마켓분석] 엔비디아, '어닝 서프라이즈' 넘어 '어닝 쇼크'… 매출 681억 달러·가이던스 780억 달러의 의미](https://f1.tokenpost.kr/2026/02/0etkh7qlwz.jpg)
![[토큰캠프 #3]](https://f1.tokenpost.kr/2026/02/2nft0e2jww.png)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41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g27ndxvfxv.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40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s74dobfws9.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39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celz7zpk2n.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38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jxqkx5yb5c.jpg)











![[사설] 월가가 디파이 토큰을 사들이는 진짜 이유… '투기'가 아니라 '인프라 선점'이다](https://f1.tokenpost.kr/2026/02/d6yv1fi5l3.jpg)

![[BTC 사이클 트래커] “7만 달러는 여전히 벽”…비트코인 6만7000달러대 반등, 추세 전환은 미확인](https://f1.tokenpost.kr/2025/09/3vz1g4s6wu.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