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에 내걸린 태극기의 괘 위치가 뒤바뀐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 제작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에 대해 새삼 주목이 쏠리고 있다.
문제가 된 ‘남상락 자수 태극기’는 독립운동가 남상락 선생이 1919년 충남 당진에서 만세운동을 준비하며 부인과 함께 손바느질로 만든 태극기다. TV 보도를 통해 해당 태극기의 괘 배열이 현재 국기와 다르다는 점을 본 시민들이 “태극기가 잘못 그려졌다”는 지적을 했지만, 이 같은 모습은 당시 시대적 한계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실제로 감괘(물을 뜻하는 괘)와 이괘(불을 뜻하는 괘)가 바뀌어 있는 것을 눈여겨본 일부 시민들은 “태극기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런 예는 비단 이번에 발견된 태극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제강점기에는 태극기의 정확한 제작법이 공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태극기를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주로 기억에 의존해 태극기를 그릴 수밖에 없었다. 괘의 방향이나 색상 배열이 일정하지 않은 여러 유형의 태극기들이 존재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의병장 고광순이 만든 ‘불원복 태극기’는 괘 전체가 뒤집혀 있으며, 안중근 의사가 만든 혈서 태극기에는 4괘 대신 ‘대한독립’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태극기는 1883년 조선의 국기로 최초 제정됐지만, 구체적인 제작 규정이 마련된 것은 해방 이후인 1949년이다. 국기제작법이 명문화되기 전까지 60여 동안 태극기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존재했다. 일본 외교사절 박영효가 처음으로 그린 태극기 도안을 고종이 채택하면서 국기의 틀이 만들어졌지만, 당시에는 괘의 정확한 배열이나 색상 규정이 없어 수많은 변형이 발생했다. 가장 오래된 태극기로 알려진 ‘데니 태극기’만 보더라도 지금과는 다른 디자인 요소가 담겨 있는 등 이러한 양상은 국내외에 걸쳐 확인된다.
해방 직후 태극기를 다시 국기로 채택할 당시에도 논란이 없던 것은 아니다. 새로운 국가를 세우려는 움직임 속에서 일부는 태극기를 ‘망국의 상징’으로 인식하며 반대했지만, 독립운동과 함께한 상징성 덕분에 태극기는 끝내 대한민국의 국기로 다시 쓰이게 됐다. 태극기가 독립운동 현장 곳곳에서 쓰였고, 항일 의지를 담아 제작된 역사적 배경 덕분이었다.
이처럼 오늘날의 표준화된 형태와는 다른 태극기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실은 태극기가 단순한 국기 그 이상으로, 억압 속에서 자유를 갈망했던 민중들의 염원을 담은 정신적 상징임을 보여준다. 광복절을 맞아 거리 곳곳에 휘날리는 태극기들이 그 기원과 제작 과정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태극기 그 자체를 넘어, 민족 정체성과 주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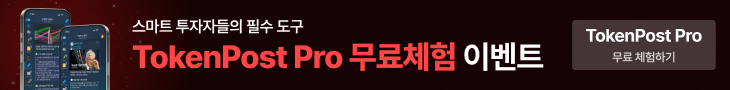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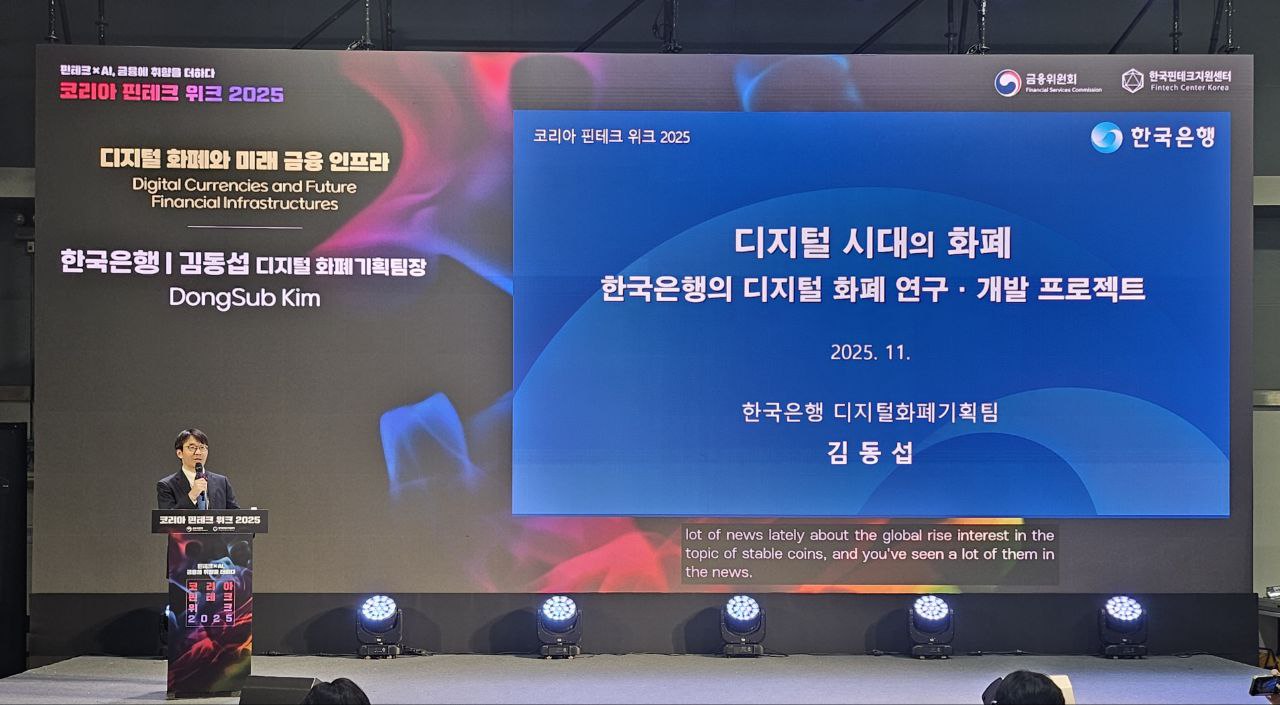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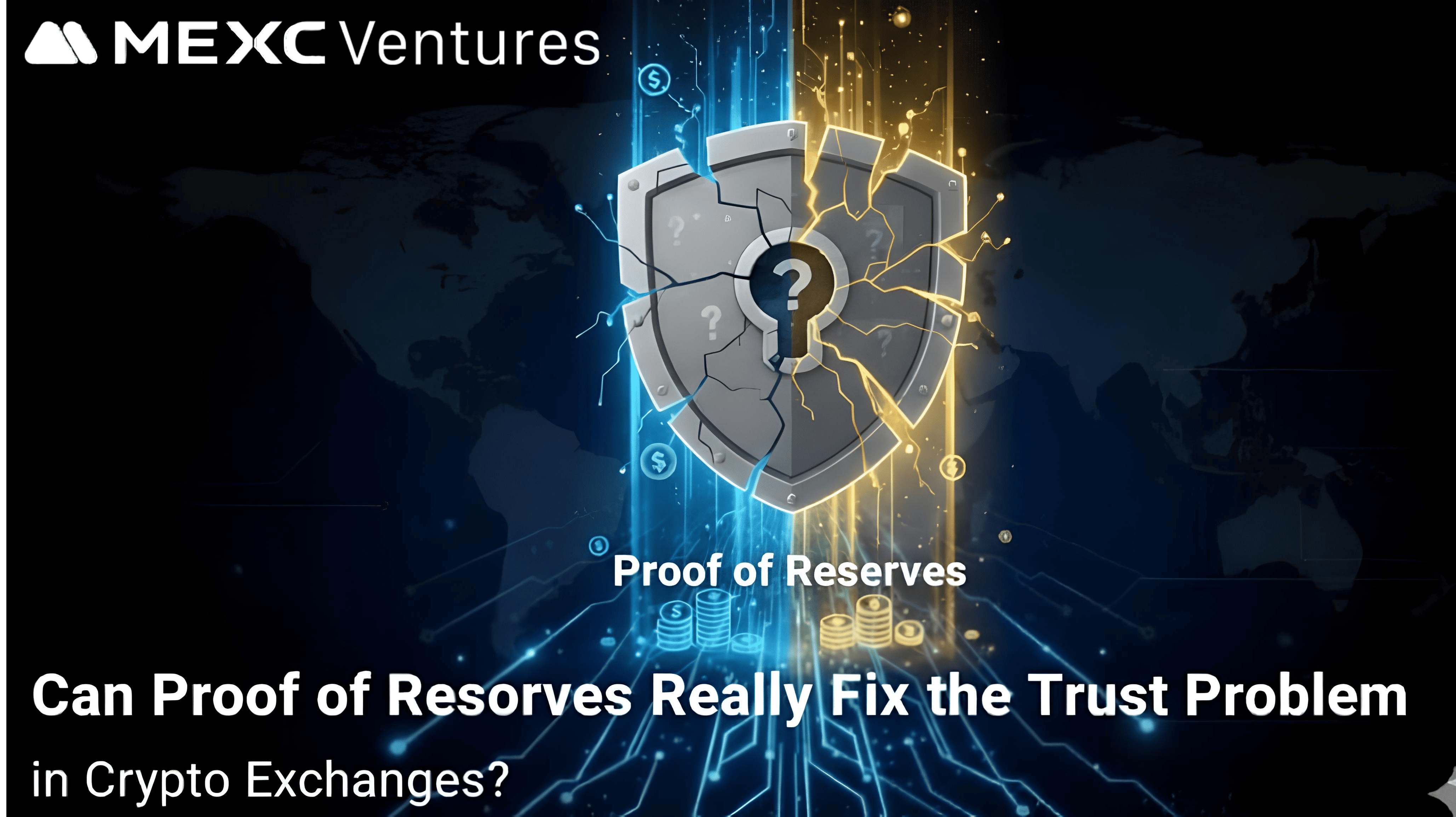





![[오후 뉴스브리핑] 업비트 445억원 해킹에 당국 “북한 라자루스 유력 검토” 外](https://f1.tokenpost.kr/2025/11/307qvb207v.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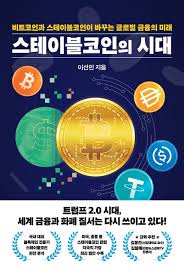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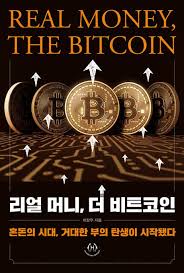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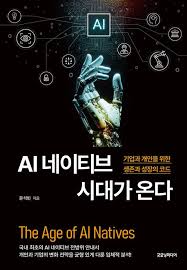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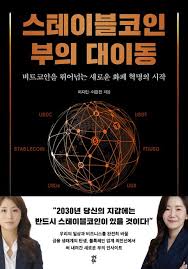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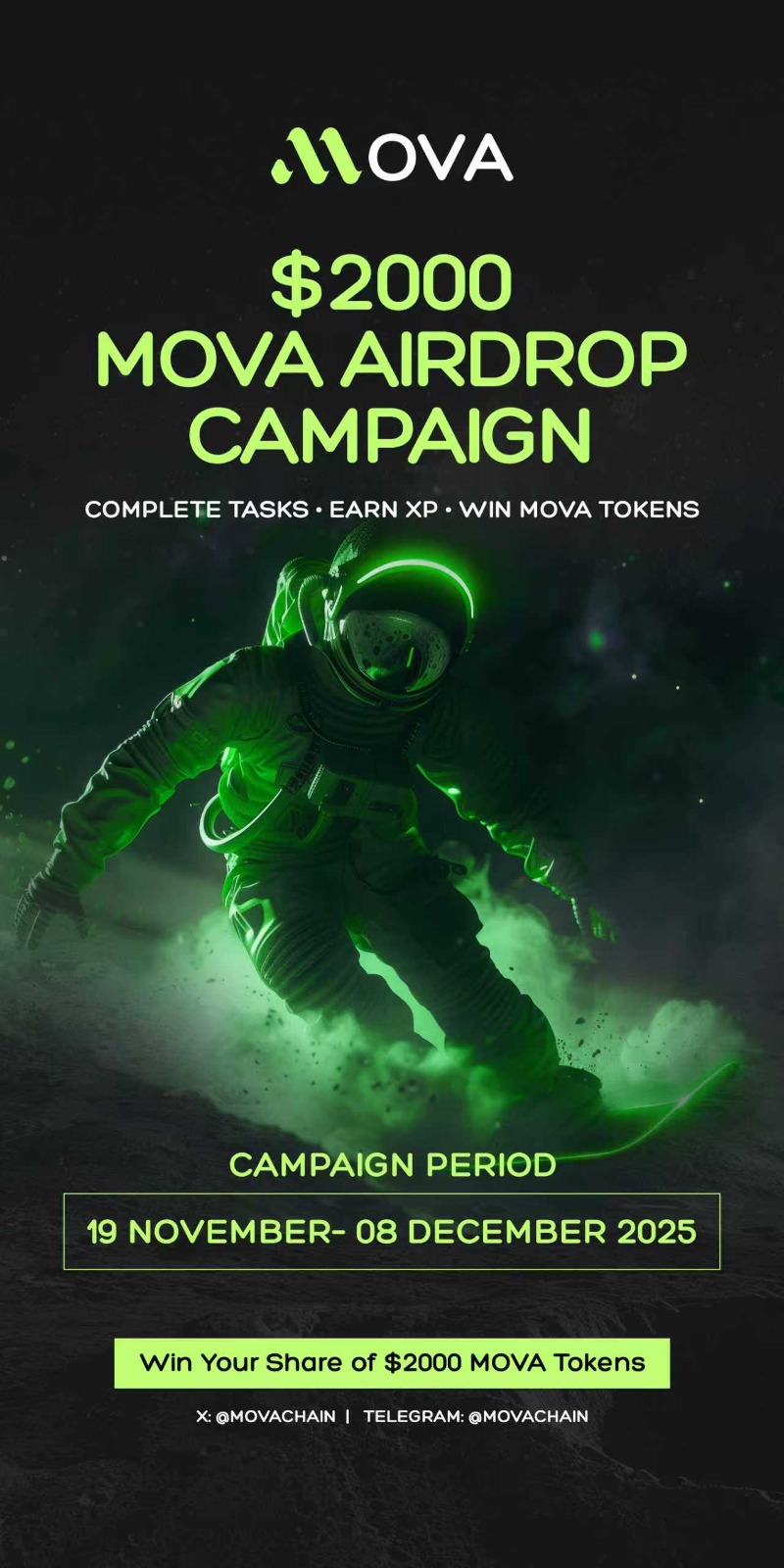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480회차](https://f1.tokenpost.kr/2025/11/lgyaryar95.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479회차](https://f1.tokenpost.kr/2025/11/cgpvxw9gxo.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478회차](https://f1.tokenpost.kr/2025/11/x8aqgymoiz.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477회차](https://f1.tokenpost.kr/2025/11/iw60bv3io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