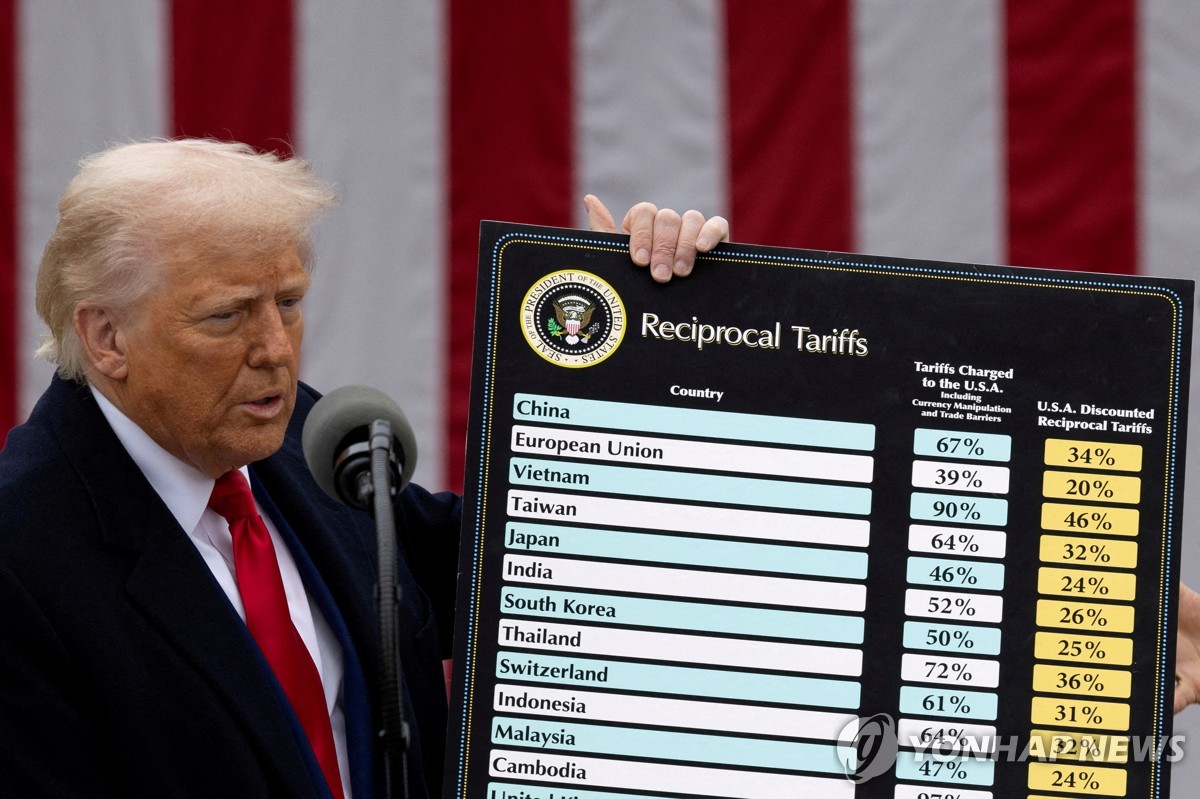토큰화된 주식과 비상장 지분은 법적 권리 해석에 있어 회색지대에 놓여 있어, 기존 자산 보유자와 동일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실물 기반 자산(RWA)을 블록체인 상에서 토큰화하는 구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과 법률 전문가의 공통된 시각이다.
핀테크 기업 B2브로커(B2BROKER)의 최고사업책임자(CBO) 존 무릴로(John Murillo)는 최근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투자자들은 토큰화된 권리의 구조를 명확히 이해해야 하며, 해당 토큰이 배당금, 수익 공유 구조를 포함하고 있는지, 단순히 자본 가치 증가에 의존하는지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무릴로는 이어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투자자들이 실제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인 중개 기관이 발행한 토큰을 보유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구조는 기초 자산, 예를 들어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매각될 경우 일정 수익 배분을 받을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간접 권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투자자는 기업의 자산에 대한 직접 청구권은 물론, 의결권이나 재무정보에 접근할 권리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투명성과 권리 보장이 미흡한 상황에서 토큰화 실물자산은 전통 금융과의 법적 절충점 없이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토큰화 기술은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지만, 그에 상응하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규제 당국은 이러한 RWA 기반 토큰 구조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제도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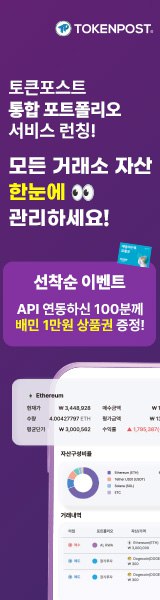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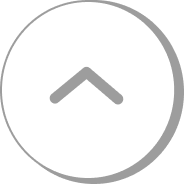



 3
3



![[분석] “이젠 주식도 온체인 시대” 로빈후드, 증권의 경계를 허물다](https://f1.tokenpost.kr/2025/07/879dcisiy5.jpg)




![[김프 리포트] 해외-국내 차익 거래 기회 급증…CTC·H·VIRTUAL 상위 포트폴리오 분석](https://f1.tokenpost.kr/2025/07/9f39qv4q7c.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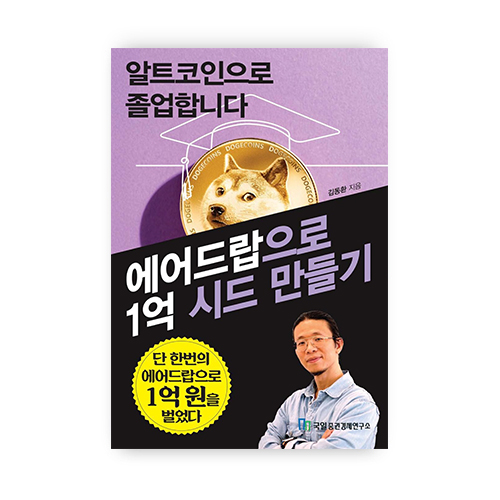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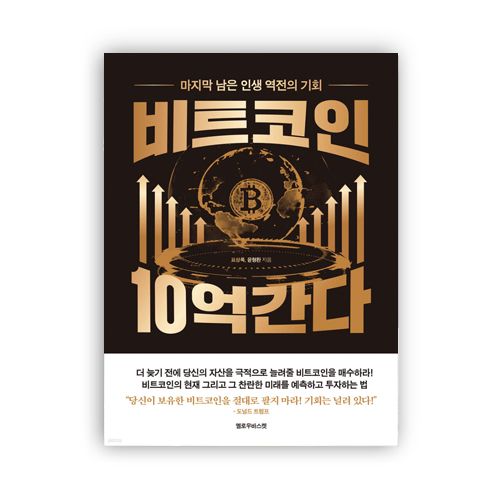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366회차](https://f1.tokenpost.kr/2025/07/9omc0gwnag.pn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365회차](https://f1.tokenpost.kr/2025/07/379dvx2hr1.pn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364회차](https://f1.tokenpost.kr/2025/07/pprq3mndp6.pn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363회차](https://f1.tokenpost.kr/2025/07/ibl5phlavp.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