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BIS)이 토큰화 머니마켓펀드(MMF)의 금융 리스크에 대한 경고를 내놨다. BIS는 앞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보고서에서와 마찬가지로 리스크 진단에 무게를 두되, 해결책 제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최근 BIS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토큰화된 MMF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유동성 불일치'다. MMF는 일반적으로 일 단위 상환이 가능하지만, 그 기초자산 대부분은 미국 채권처럼 T+1(결제일 기준 1영업일 후)로 결제되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클 경우 상환 수요를 실시간으로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다양한 기술 기반 솔루션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 핀테크 기업 브로드리지는 분산원장 기반의 리포 거래 플랫폼 ‘DLR(Distributed Ledger Repo)’를 운영 중이다. 이 플랫폼은 토큰화된 미국 국채를 같은 날 내에 매도·매입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이를 통해 펀드운용사가 T+1 결제를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유동화할 수 있어 유동성 불일치를 기술로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DLR의 경우, 단순한 국채 토큰화 및 전송에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운용 시나리오에 적용 여지가 있다. 이는 특히 국채 중심으로 구성된 MMF 운용사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토큰화 머니마켓펀드는 자산운용 산업의 미래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위험 요소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BIS의 경고는 의미를 갖는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BIS의 경고는 암호화폐 기반 토큰화 금융 상품이 본격 확산되기 전에 제도권 규제 및 유동성 해소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MMF와 같은 단기 자산이 실시간 상환 구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전략 포인트
DLR처럼 이미 상용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유동성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술과 금융 인프라를 결합한 운용 전략 수립이 핵심 과제로 떠오른다.
📘 용어정리
- MMF(Money Market Fund): 단기 국채와 같은 저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로, 고정 수익과 높은 유동성을 제공
- T+1: 거래가 체결된 날로부터 하루 후에 결제가 완료되는 시스템
- DLR(Distributed Ledger Repo): 브로드리지가 운영하는 분산원장 기반 당일 환매조건부증권 거래 플랫폼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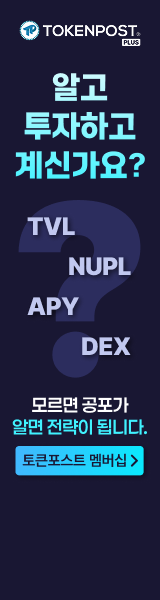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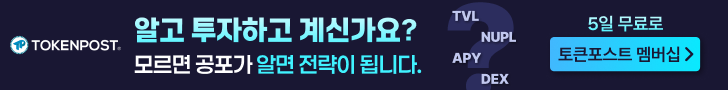









 0
0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42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ybgphvyjr7.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41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g27ndxvfxv.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40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s74dobfws9.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39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celz7zpk2n.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