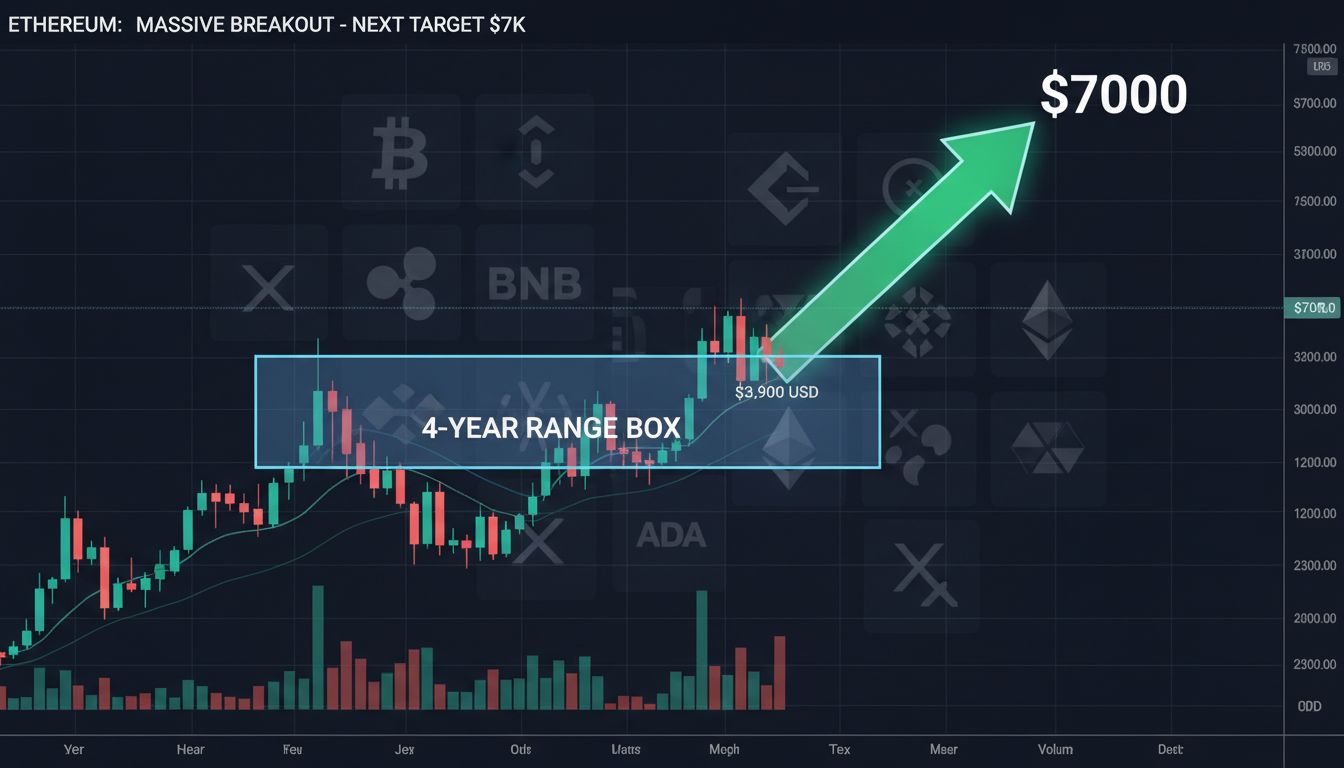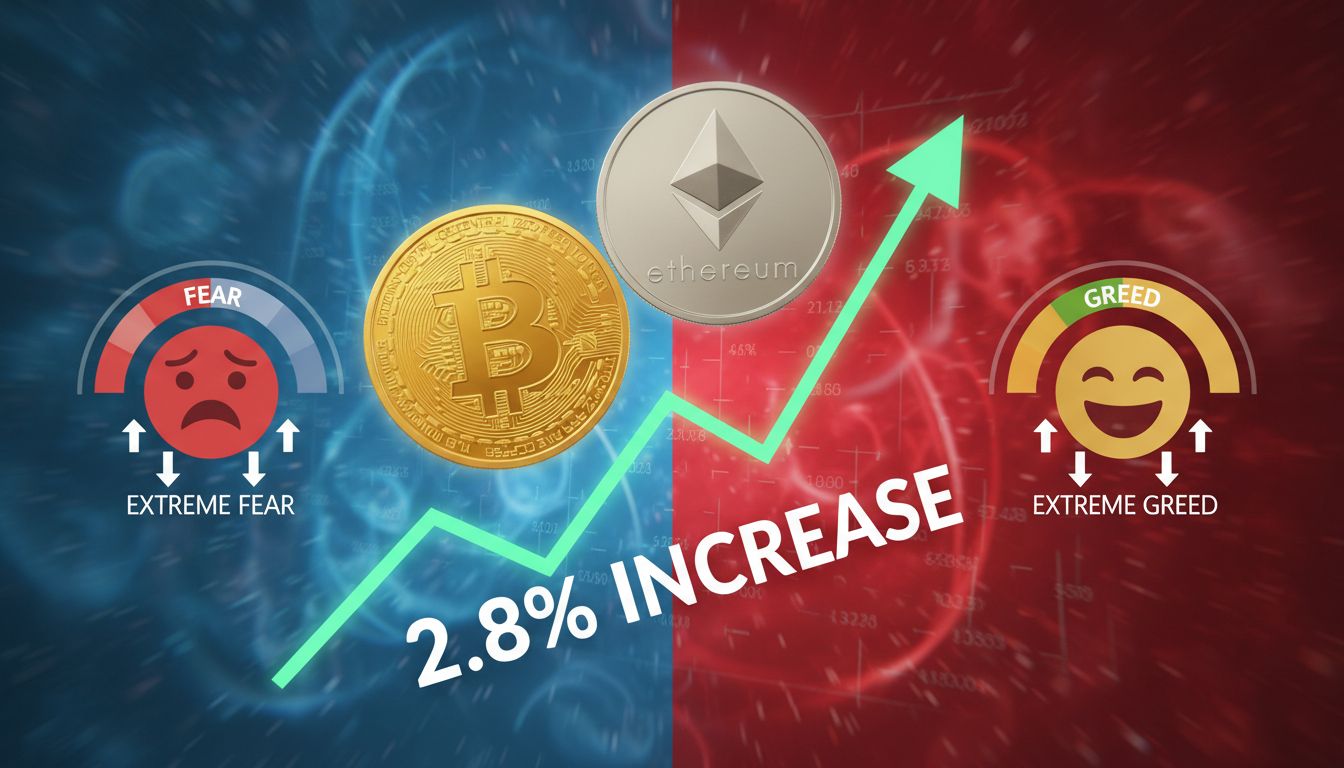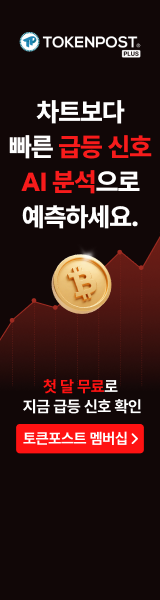역대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청산 사태가 또다시 업계의 민낯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발표 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시장 전반이 급락하면서 190억 달러(약 25조 원) 이상의 롱 포지션이 청산된 가운데, 발표 직전 하이퍼리퀴드(Hyperliquid)에 걸린 대규모 숏 포지션은 ‘내부자 거래’ 의혹을 낳고 있다.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에 나서기 불과 30분 전, 한 트레이더가 하이퍼리퀴드에 대규모 숏 베팅을 걸었다. 이후 이 포지션은 시장 급락과 함께 1억 6,000만 달러(약 2,160억 원)의 수익을 거뒀고, 일각에서는 이 거래의 배후가 ‘대통령 측근’일 수도 있다는 논란까지 제기됐다.
이 같은 논란은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적인 허점과 맞닿아 있다. 토큰 출시와 상장 방식이 벤처 자본을 위한 설계로 고착됐고, 거래소나 프로젝트 내부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불균형한 채 방치되며 ‘암호화폐판 서부 개척시대’라는 꼬리표를 벗지 못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지닌 투명성과는 별개로, 기존 자본시장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탐욕은 여전히 시스템을 우회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통 금융시장 또한 예외는 아니다. 리먼브라더스 임원들이 회사 붕괴 전 자사주를 대거 매도한 사례처럼, 명백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법적 처벌은 어려웠다. 법 적용 범위가 좁고,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특히 2009~2012년 그리스 국채 위기 당시 신용파생상품(CDS)의 내부자 거래 의혹 등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50건이 넘는 조사를 벌였음에도 단 한 건의 유죄 판결을 얻지 못했다. 그 배경에는 법령이 파생상품, 특히 부채 관련 거래를 포괄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1934년 도입된 미국 증권거래법은 거의 한 세기 동안 개정이 미미하거나 시대착오적인 방향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0년 도입된 ‘10b5-1 규정’이다. 원래는 내부자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오히려 사전 매각 계획을 등록하면 내부 사정을 알고도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빠져나갈 구멍’이 된 셈이다. 2016년부터 진행된 ‘SEC vs. 파누왓' 사건도 8년 만에 유죄 판결이 내려질 만큼, 법적 해석이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최근 미법원은 파누왓이 속한 바이오 기업의 인수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에 콜 옵션을 매수해 10만 달러(약 1억 3,5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챙긴 것이 ‘섀도우 트레이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지만, 이 역시 법률로 명문화되지 않았다.
현행 법 체계로는 고도화된 시장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평가다. 파생상품, 디지털 자산과 같은 다양한 투자 수단은 물론 정책 브리핑, 정부 채널 같은 사전 정보까지 모두 내부자 정보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직자 및 보좌진에 대한 사전 공시 의무와 쿨링오프 기간 강화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내부자 거래에 대한 규제는 더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 수년간 이어지는 소송과 수사로는 억 단위가 아닌 조 단위의 거래 환경을 방어하기 어렵다. 암호화폐 시장 역시 예외가 아니다. 토큰 출시, 상장, 재무 파트너십 등이 과연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정보를 알고 움직인 흔적은 없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업계의 ‘건전한 참여자’들이라면 이런 조사를 반길 것이다.
다만, 이 문제를 암호화폐라는 한정된 영역에만 끼워넣는 것은 실책이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내부자는 언제든 규제의 사각지대를 노릴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투자자 신뢰는 계속 훼손될 것이다. 결국 시스템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야 게임의 룰이 바뀐다. 기존 금융이든, 디지털 자산 시장이든 마찬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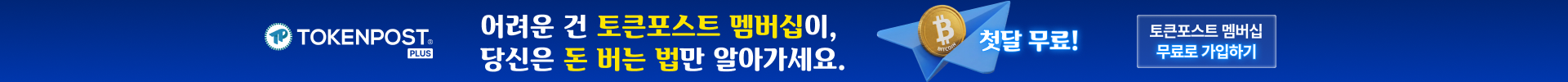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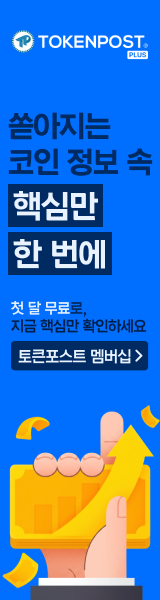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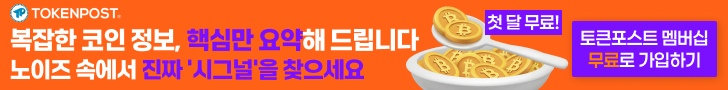









 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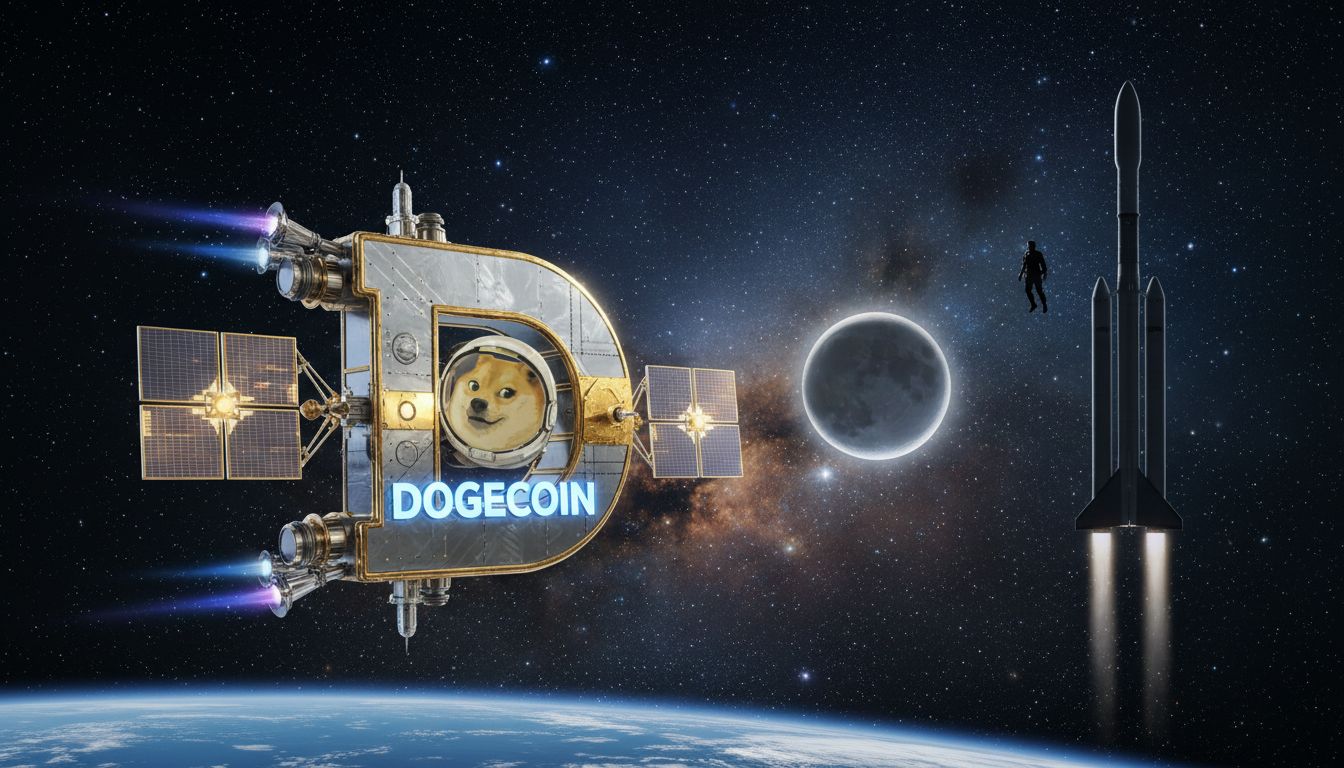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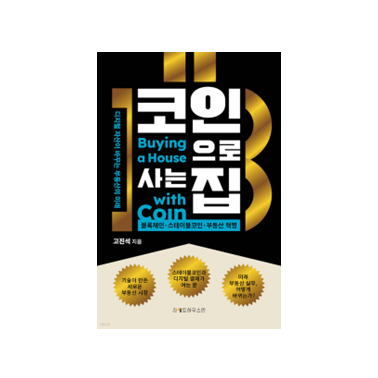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5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rx65p108a9.jpe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4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2t5hhgg60k.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3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qokpmpceok.pn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2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aims5420dh.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