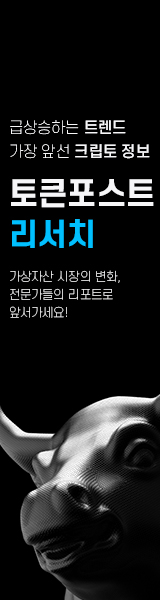“산속에서 절벽을 뛰어내릴 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착지에 실패하면 얼어죽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풀센드(full send)’를 선택합니다. 왜냐면, 그게 너무 재밌으니까요.”
30일 열린 글로벌 블록체인 행사 ‘TOKEN2049’에서 비트멕스(BitMEX) 공동창업자 아서 헤이즈는 도발적이면서도 직관적인 비유로 키노트를 시작했다. 그는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암호화폐에 ‘올인’할 이유를 설파하며, 현재의 글로벌 경제 환경과 암호화폐 시장의 연결고리를 풀어냈다.
2022년의 데자뷔, 두려움 속에서 시작된 강세장
헤이즈는 2022년 3분기 상황을 되짚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며 긴축정책에 돌입했고, 미국 국채는 1812년 이후 최악의 성과를 기록했다. 시장은 공포에 휩싸였고, 비트코인조차 1만5000달러 수준으로 급락했다.
그러나 그는 이 시점을 “절호의 매수 기회”였다고 회상한다. “당시 시장은 무너졌지만, 실상은 유동성의 재편이 시작된 시기였다”고 강조하며, 이 같은 흐름이 현재와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무브 지수 140’이 말해주는 것: 유동성의 문이 열릴 때
키노트의 핵심 키워드는 ‘MOVE 지수’였다. 채권시장 변동성을 측정하는 이 지수가 140을 넘어서면, 정책 당국은 즉각 개입해 시장 안정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를 “유동성 공급의 트리거”라고 정의했다.
“2022년 MOVE 지수가 140을 찍자마자, 재무부는 2.5조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역RP 시장에서 회수하면서 시장에 유입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트코인의 6배 상승을 이끌었죠.”
그는 이 지표가 2025년 4월 2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발표 이후 다시 172까지 급등했으며, 곧바로 시장이 반응했다고 강조했다. “이건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인과관계입니다.”
바이백, 새로운 유동성 공급 메커니즘
이번 헤이즈의 발표에서 가장 인상 깊은 대목 중 하나는 ‘바이백(Buybacks)’에 대한 설명이다. 그는 바이백을 "기술적으로는 양적완화(QE)가 아니지만, 사실상 같은 효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그 구조는 이렇다. 재무부는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구형 채권을 매입한다. 이를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주입하고, 상대가치 트레이더(RV Hedge Funds)의 레버리지 기반을 넓혀준다. 이들이 다시 채권 시장에 참여하면서, 미 국채의 수요 기반이 유지된다.
헤이즈는 “재무부는 이들 트레이더가 옥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바이백을 활용하고 있다”며 “이는 유동성 확장과 같은 2차 효과를 불러와 결국 자산 시장을 부양한다”고 분석했다.
"통화긴축은 끝났다…정치적 유인에 주목하라"
헤이즈는 현재의 재정 상황이 유동성 공급을 더욱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본다. 그는 “미국은 올해 7.4조 달러를 지출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은 22% 증가했다”고 밝혔다. 세수 역시 줄어드는 추세로, 특히 자본이득세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람들이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지 못하면 세금을 덜 낸다. 세수 감소는 곧 재정 부족을 의미하고, 이는 곧바로 국채 발행 확대와 유동성 공급 압력으로 연결된다.”
정치적 유인도 언급했다. 헤이즈는 “양적완화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해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며, “따라서 ‘바이백’ 같은 대체 수단이 앞으로 더 빈번히 사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암호화폐, 이제는 구조적 상승의 길로
전체 발표의 결론은 명확했다. “지금이야말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기타 주요 암호화폐를 매수할 시점이다.”
헤이즈는 “금리 인하나 양적완화라는 전통적인 정책 수단이 아니더라도, 시장에는 유동성이 다시 흐르고 있다”며 “이는 암호화폐와 같은 무정부 통화에 구조적 상승 압력을 가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청중에게 이렇게 외쳤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스마트폰을 켜서 지금 당장 비트코인을 사야 한다. 여러분은 부자가 될 수 있다.”
‘풀센드’를 외친 헤이즈, 투자자에게 묻다
아서 헤이즈의 이번 키노트는 단순한 낙관론이 아니다. 그는 수치와 사례, 정책 변화의 맥락을 통해 현재의 시장 상황을 분석하며, ‘왜 지금인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했다. ‘풀센드’라는 표현은 그저 자극적인 외침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을 읽은 자의 결단이었다.
과연 투자자들은 그의 조언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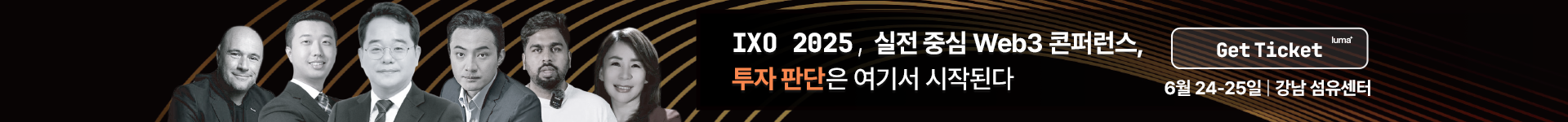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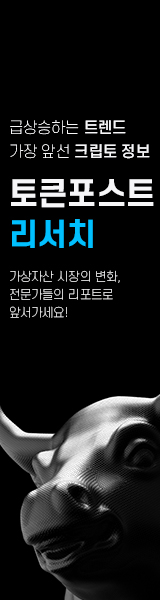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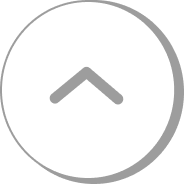



 10
10




![[김프 리포트] 해외-국내 차익거래 기회 급증 SIGN·STMX·RDNT 프리미엄 주목](https://f1.tokenpost.kr/2025/06/20026srmkn.jpg)
![[모닝 시세브리핑] 암호화폐 시장 하락세… 비트코인 102,729달러, 이더리움 2,400달러](https://f1.tokenpost.kr/2025/06/9iqvzdfx89.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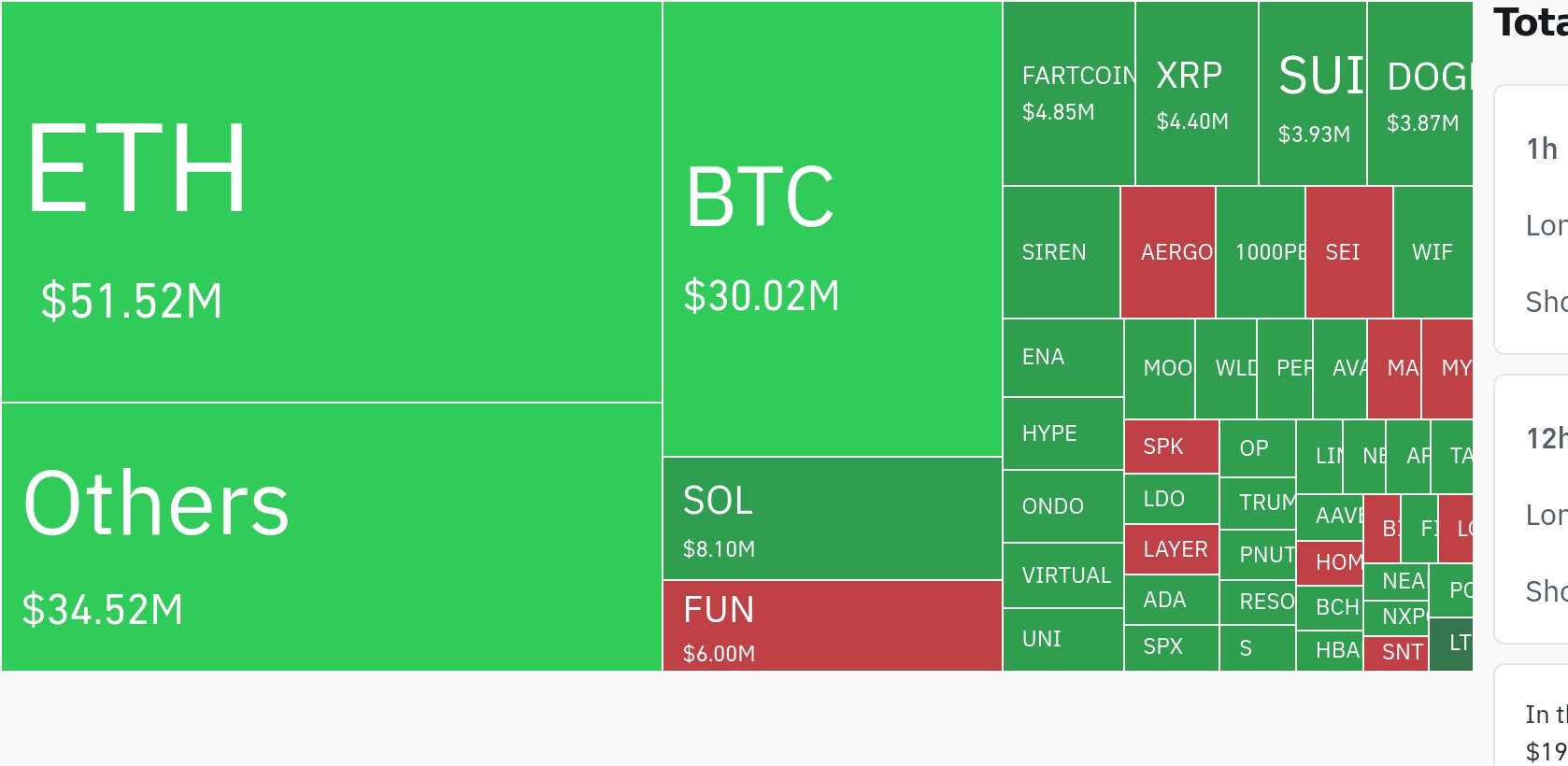



![[코인 TOP 10 주간동향] 세이·아르고 강세 지속… 옵저버 BTC마켓 100% 급등, 아캄 체결강도 500%](https://f1.tokenpost.kr/2025/06/df2ju8hmp9.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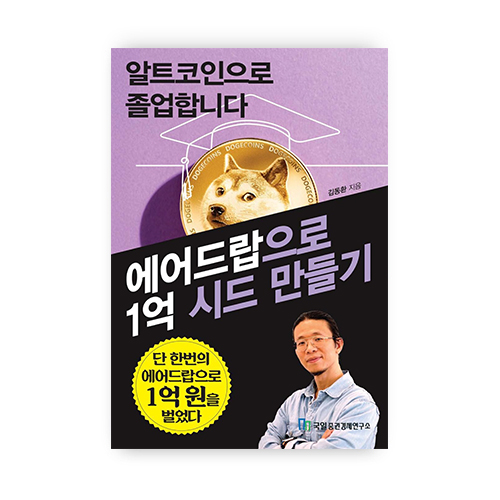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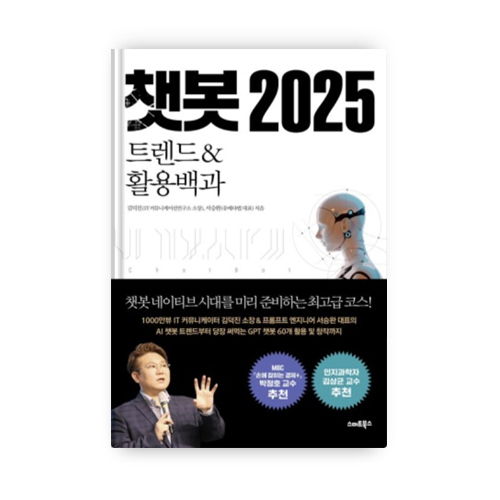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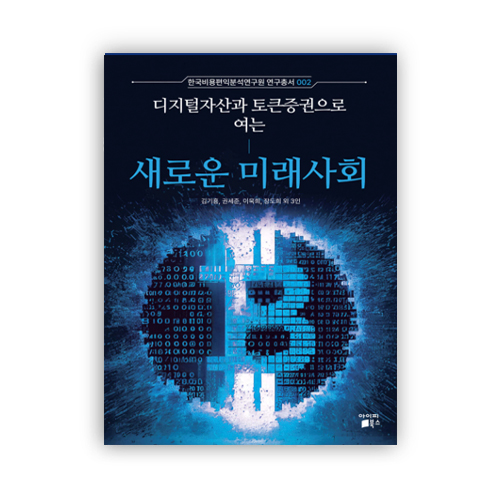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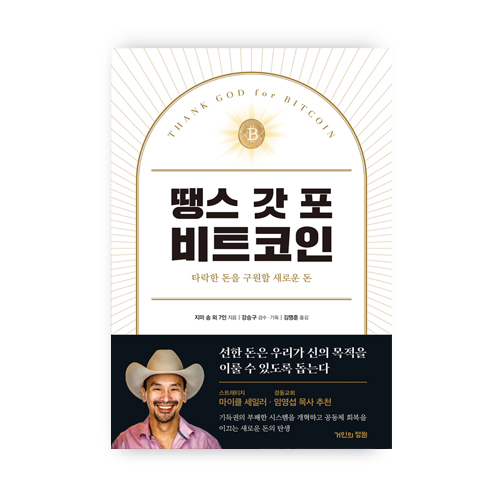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356회차](https://f1.tokenpost.kr/2025/06/qna7o1sny7.pn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355회차](https://f1.tokenpost.kr/2025/06/dthui4ln1a.pn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354회차](https://f1.tokenpost.kr/2025/06/b976h1ls10.webp)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353회차](https://f1.tokenpost.kr/2025/06/0r76rajiiv.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