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개발 현장을 급속히 변화시키는 가운데, 여전히 2021년식 기준으로 개발자를 채용하고 있다면 이미 한참 뒤처진 셈이다. 이제는 코드를 얼마나 잘 쓰는지가 아닌, AI 도구를 얼마나 능숙하게 활용하느냐가 엔지니어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 트렌드를 넘어 일의 방식 자체를 재정의하는 지각 변동이다.
AI 혁신은 이제 과장이 아닌 현실이 됐다. 생성형 AI 도구가 주류로 편입되며, 빠르게 진화하는 업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5인 규모의 'AI 네이티브' 스타트업에게도 추월당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엔지니어 채용 방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전통적인 기술 면접이나 알고리즘 테스트는 이제 큰 의미가 없다. 그보다는 AI 도구를 활용해 실제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하는지를 봐야 한다. 예컨대, 코드 작성 없이 챗GPT나 클로드 같은 AI 비서를 활용해 기능을 구현하거나 버그를 수정하는 과정을 관찰함으로써, 후보자의 AI 활용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이제 가장 필요한 개발자 유형은 'AI 오케스트레이터'다. 이들은 모든 코드를 손수 작성하지 않는다. 대신 AI의 코드를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다듬으며, 언제 기계에 맡기고 언제 직접 개입해야 하는지를 아는 감각을 지녔다. 특히 중요한 역량은 다음 세 가지다: 시스템을 통찰하는 아키텍처 설계 능력, 상황에 맞는 도구를 택하는 비판적 사고, 그리고 AI에게 명확히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다.
AI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맥락 파악과 기업 고유의 복잡한 요건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단순히 AI를 잘 활용하는 것 이상으로, 그 결과물이 실제 과제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현장에서 관찰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경력자보다 신입 개발자들이 AI로부터 더 큰 생산성 향상을 보고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들은 AI의 오류를 간파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반면, 경력자들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강해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더디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경력 수준에 맞는 교육 방안을 도입했다. 신입은 속도를 늦추고 검증력을 키우고, 경력자는 AI를 통제하는 법을 익히는 방식이다.
결국 핵심은, 이 흐름을 위협이 아닌 '기회'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 엔지니어를 단순히 개인 역량이 아닌 기계와 얼마나 잘 협력하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줄 안다면 미래를 앞서 나갈 수 있다. 앞으로 인재 시장의 경쟁자는 사람이 아니라 ‘AI와 협업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에 맞는 채용과 훈련 방식을 고민할 타이밍이다.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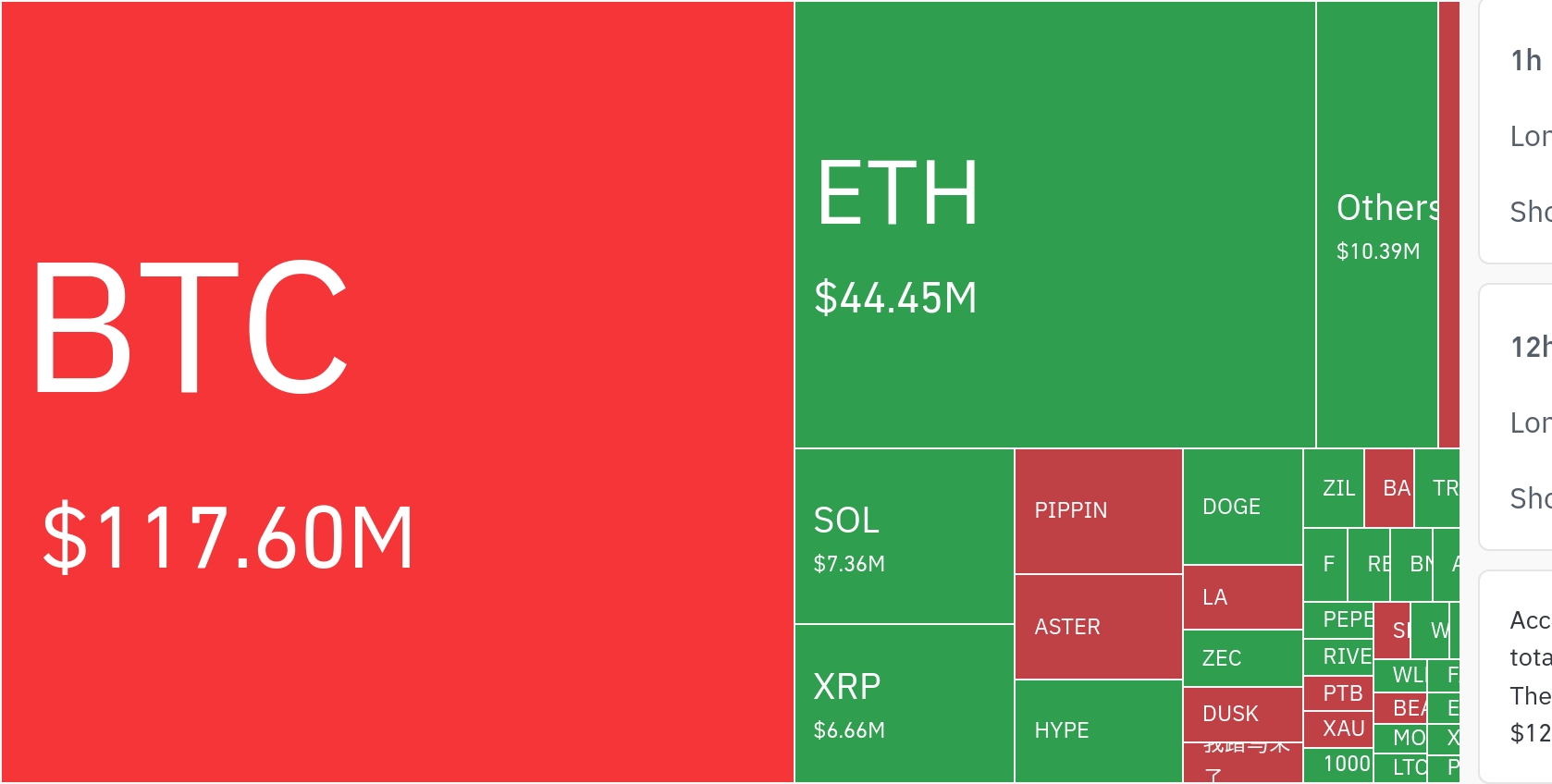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8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0l6qk9c4ub.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7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6ndj5dyz0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6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qhaxcpku8t.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5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rx65p108a9.jpeg)









![[토큰포스트 칼럼] 바이브 코딩 이후, 에이전트 경제는 어디로 가나](https://f1.tokenpost.kr/2026/02/f101gij83w.jpg)
![[토큰캠프 #2] 폭락장에서도 살아남는 법...](https://f1.tokenpost.kr/2026/02/82w7a5pn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