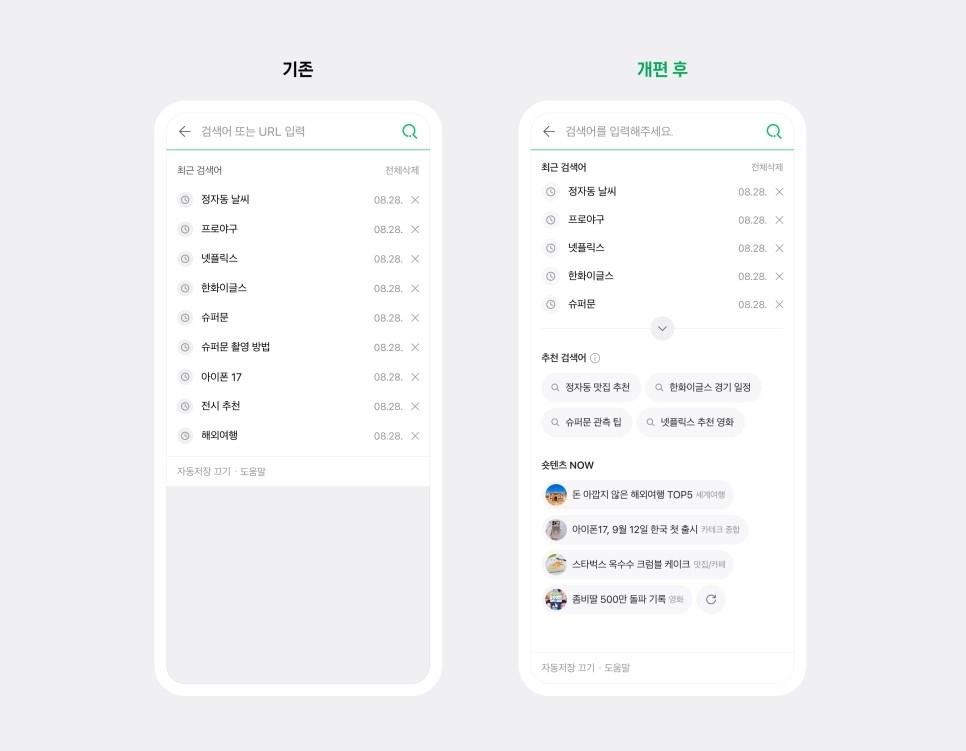남성과 여성 간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비율에 뚜렷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여성은 AI 도구 사용이 직장 내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활용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버드대학교와 버클리대학교 연구진이 공동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전 세계 약 13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18개 연구를 분석한 결과 남성이 생성형 AI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생성형 AI란 사람이 입력한 텍스트나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기술로, 챗GPT, 클로드, 퍼플렉시티와 같은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이용 패턴을 살펴보면, 2022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챗GPT 월별 사용자 2억 명 가운데 남성은 58%, 여성은 42%였다. 또,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 통계에서는 이 격차가 더욱 두드러졌다. 2023년 5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챗GPT 앱 다운로드 중 여성 비율은 27.2%에 불과했으며, 클로드와 퍼플렉시티 앱 다운로드에서도 여성 비율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추세는 선진국뿐 아니라 중·저소득 국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북미와 일본은 물론, 인도와 브라질, 케냐 등에서도 남성이 AI를 더 활발히 사용하는 경향이 확인됐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아울러 전문적인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AI 도구 3천800여 개의 이용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여성 사용자 비중은 고작 34% 정도였다. 이는 AI 기술 확산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접근성과 수용성이 다르다는 점을 시사한다.
여성들이 AI 사용을 망설이는 이유도 주목할 만하다. 일부 연구에서는 여성 참가자들이 AI 활용이 직장에서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거나 역으로 역량 부족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해졌다. AI 도입이 능률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여성들은 보이지 않는 편견과 불이익을 걱정하고 있는 셈이다.
연구를 이끈 코닝 하버드대 교수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생성형 AI를 활용해야 기술이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특정 성별의 사용자 데이터만으로 AI가 학습될 경우, 기존 사회의 편향이나 고정관념이 기술을 통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업무 환경, 교육, 혁신 분야 전반에서 AI 기술 격차가 성별 간 불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정책 차원에서 여성의 AI 접근성을 높이고, 사용에 대한 불안 해소와 인식 개선을 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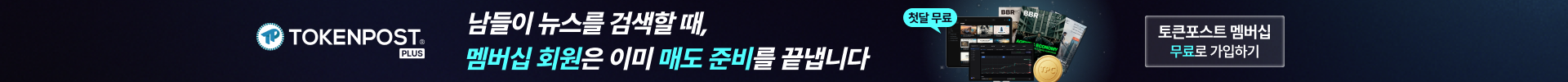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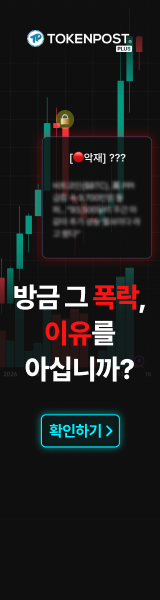










 1
1





![[토큰분석] “상장만 하면 –80%”… 시장 탓 말고 ‘출구로 설계된 상장’부터 바꿔야 한다](https://f1.tokenpost.kr/2026/01/v8tqormszy.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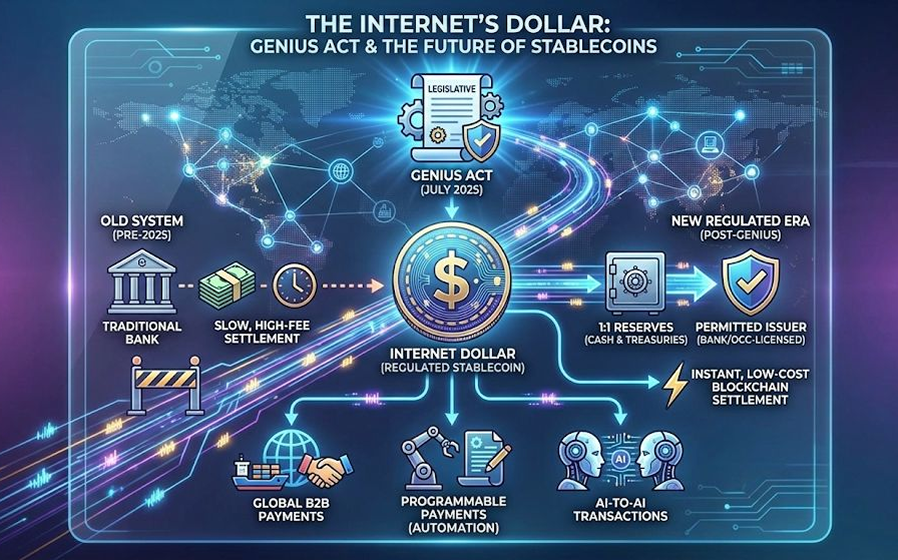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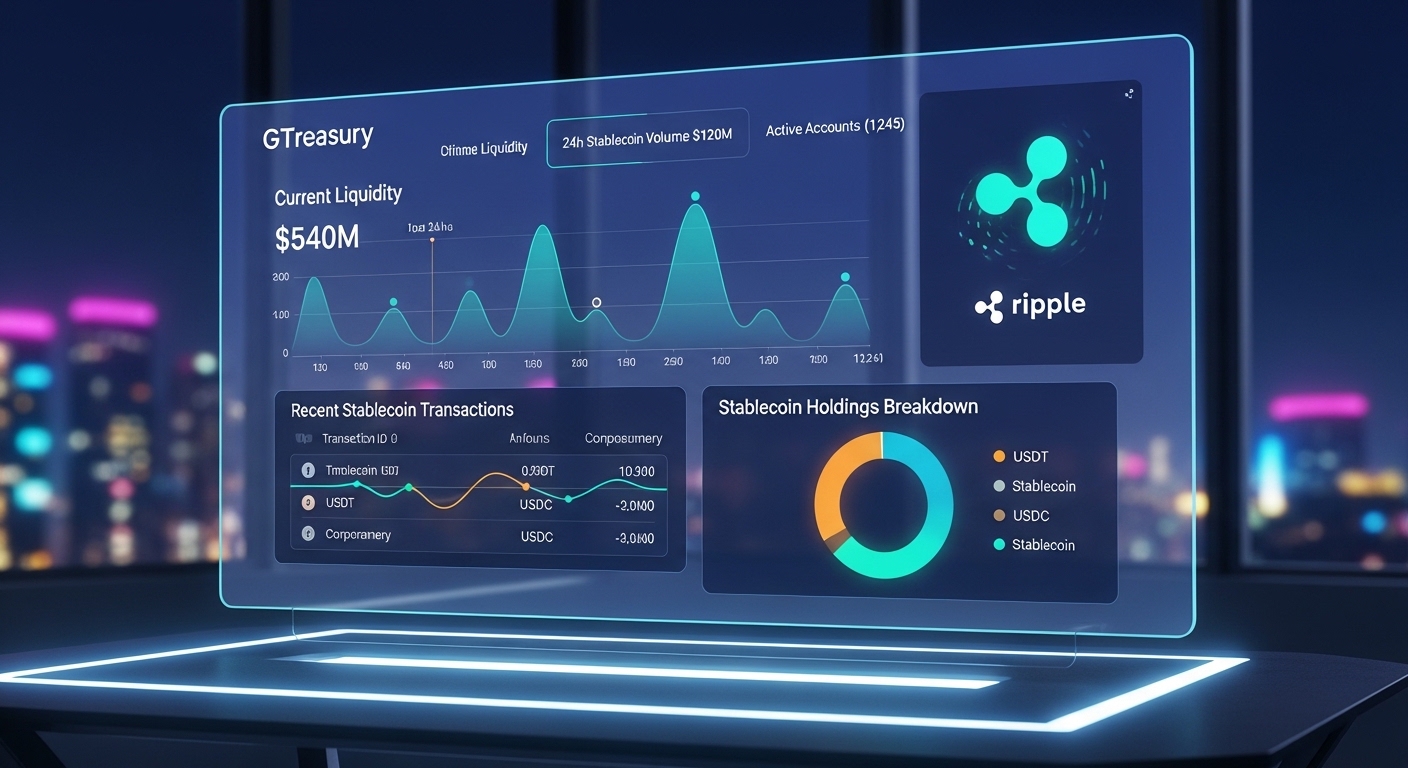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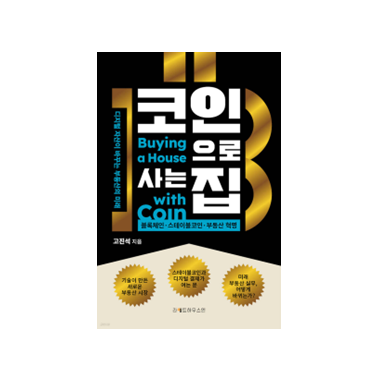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2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aims5420dh.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1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f2femcntpq.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0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y648ak216n.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19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k3bqfcj1o8.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