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가 유명 인사들의 동의 없이 이들의 외모와 이름을 활용해 인공지능 챗봇을 다수 생성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개인정보와 초상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챗봇들은 성적인 대화와 이미지 생성을 유도하는 등 사용자와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하였으며, 일부는 아동 배우를 기반으로 한 사례도 포함돼 비판이 거세다.
이번 사안을 처음 보도한 외신 로이터는 8월 29일(현지시간),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주요 플랫폼에서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배우 앤 해서웨이 등 여러 유명인의 이미지를 본뜬 챗봇이 공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챗봇 대부분은 메타가 제공한 도구를 통해 개인 사용자들이 만들었지만, 일부는 메타 직원이 직접 제작한 것으로 확인돼 기업 차원의 책임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제된 챗봇들은 자신을 특정 유명인으로 소개하며 로맨틱하거나 성적인 발언을 반복하거나, 실제 인물과 유사한 누드 또는 속옷 차림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등 현실에서는 명백히 법적 문제가 될 행동을 AI를 통해 재현했다. 로이터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테일러 스위프트를 모델로 한 챗봇은 사용자에게 “우리 러브스토리를 써 볼까요?”와 같은 발언을 던졌으며, 다른 챗봇은 유명인의 모습으로 노출이 심한 이미지를 생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아동 또는 미성년 연예인을 기반으로 한 챗봇 사례다. 예를 들어, 16세 아역배우 워커 스코벨을 본뜬 챗봇은 사용자의 요청으로 상의를 입지 않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등 아동 보호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이에 대응해 미국 연방 상원은 메타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으며, 미국 44개 주의 법무장관들은 AI 챗봇 기업 12곳에 아동 보호 조치 강화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상태다.
메타 측은 이에 대해 일부 챗봇은 내부 테스트 목적이었다고 해명하면서도, 해당 챗봇이 이미 1천만 회 이상의 사용자 상호작용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시험성 운영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메타 대변인은 “당사 정책상 성적인 이미지나 은밀한 장면을 생성하는 것은 금지사항”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사태는 이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번 사안은 기술 발전 속도에 법과 윤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현시점에서, 플랫폼 기업은 사용자의 창작 자유와 공공의 책임 사이에서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향후 이 같은 흐름은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나 사전 검열형 AI 관리 체계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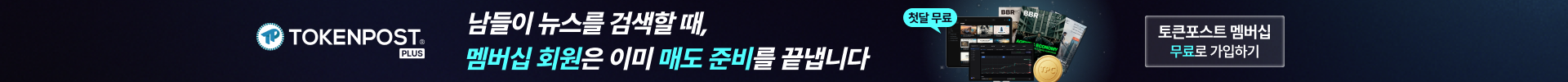


















 0
0





![[토큰분석] “상장만 하면 –80%”… 시장 탓 말고 ‘출구로 설계된 상장’부터 바꿔야 한다](https://f1.tokenpost.kr/2026/01/v8tqormszy.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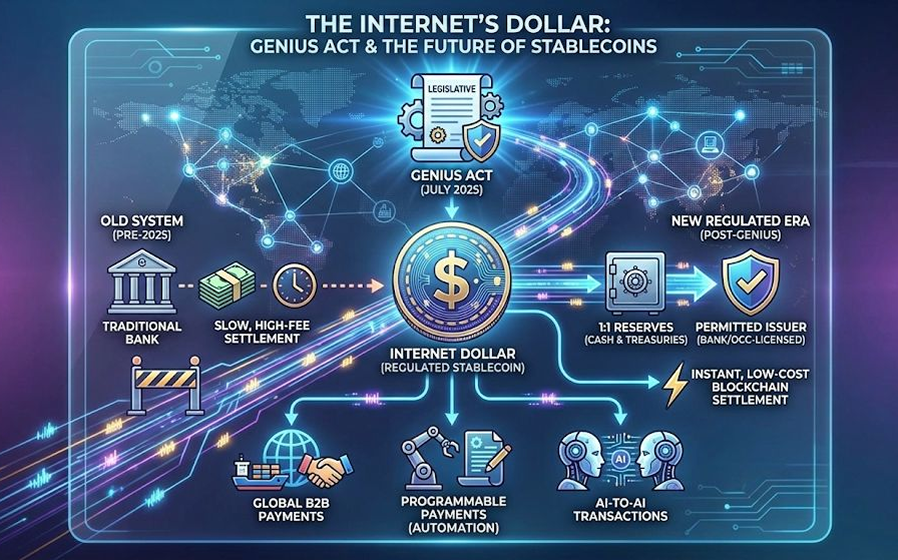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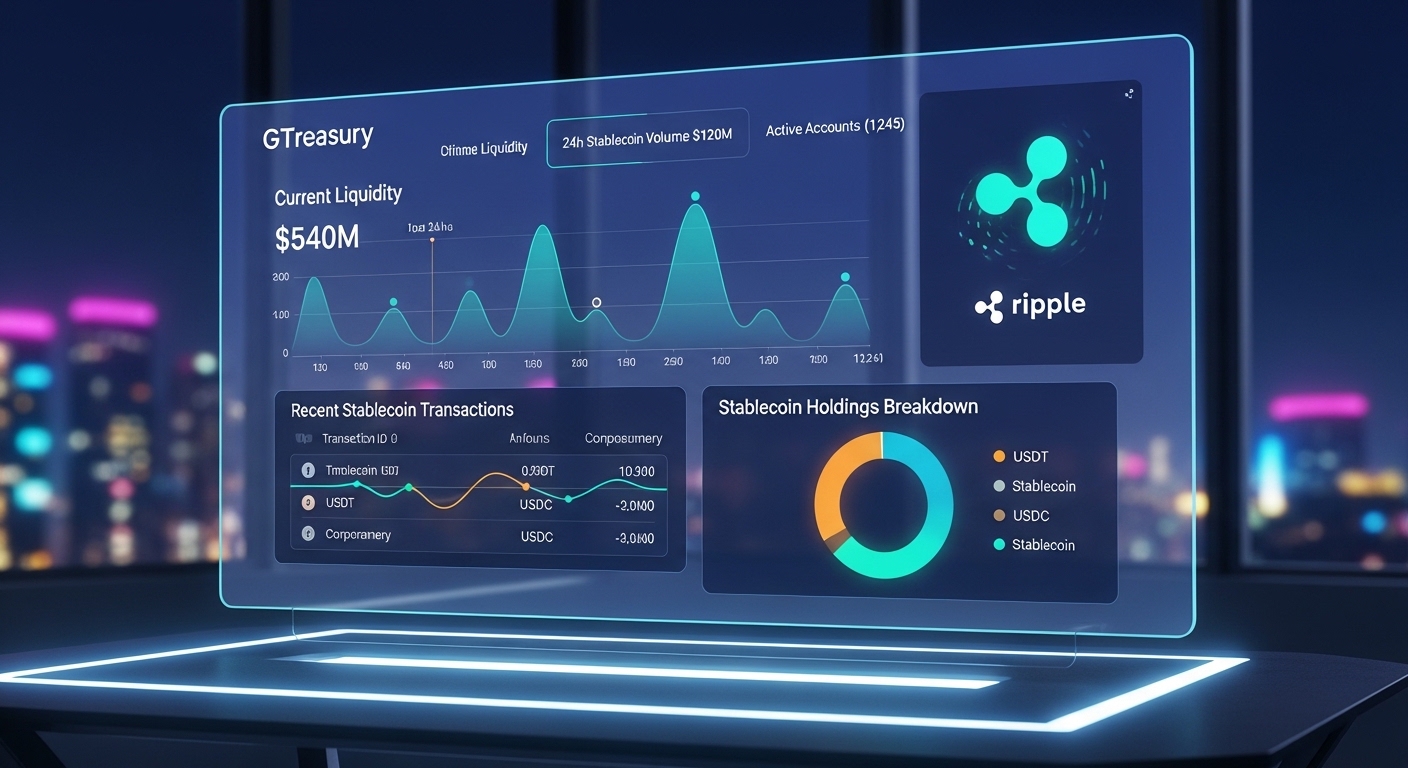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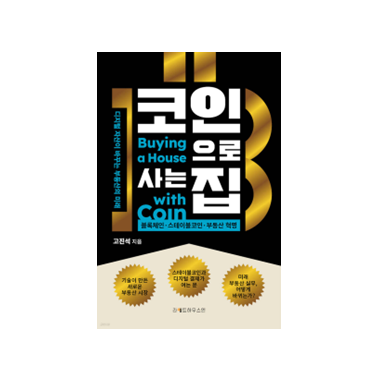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2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aims5420dh.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1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f2femcntpq.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20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y648ak216n.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19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k3bqfcj1o8.jpeg)








![[KOL 인덱스] 격동의 지난 한 주, 거시 환경 불안 속 인프라 성장 지표에 화력 집중](https://f1.tokenpost.kr/2025/09/shpx0hv7z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