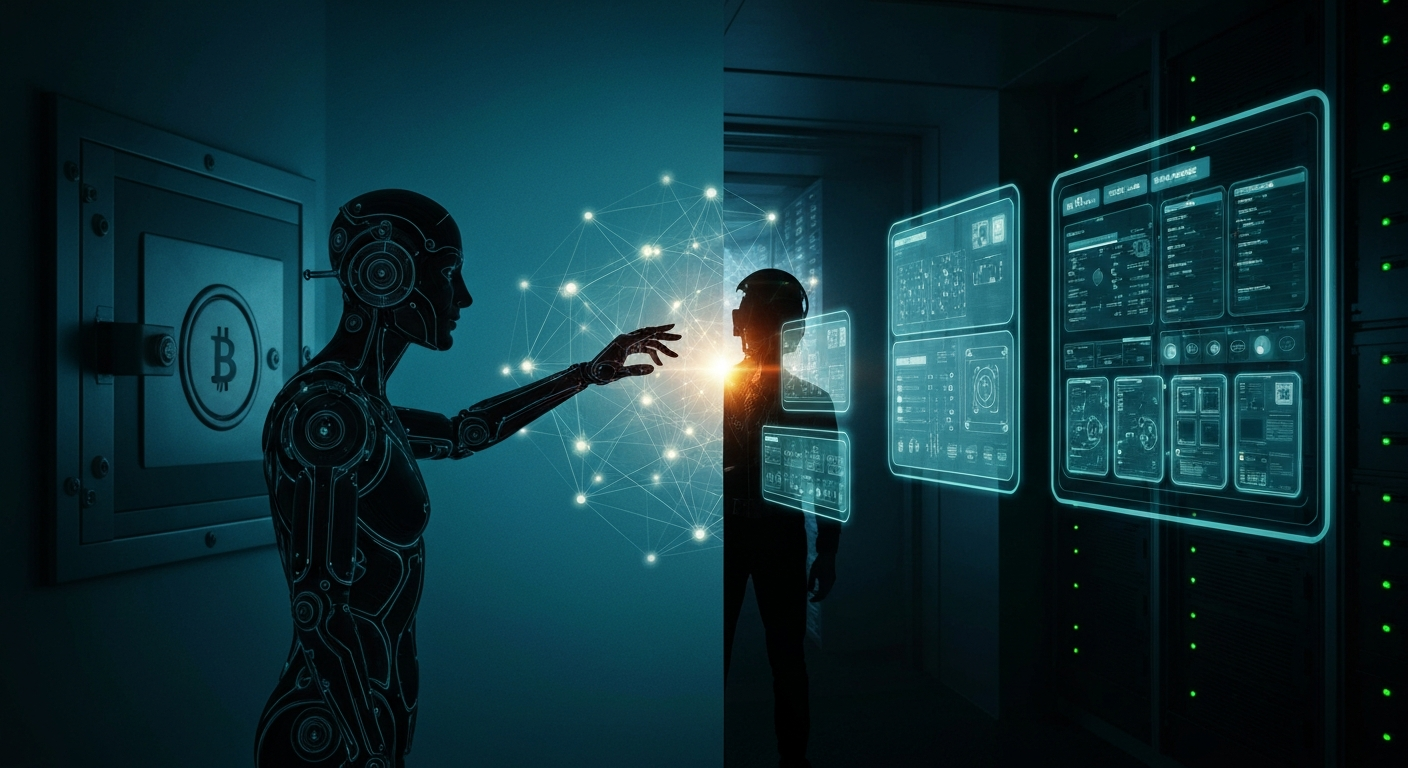최근 인공지능(AI)이 빠르게 일상과 업무 전반에 스며들고 있지만, 많은 이들이 여전히 이 변화에 선뜻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 AI 기술이 가속화될수록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동시에 혼란, 회의, 가치 변화에 대한 저항이 겹치며 ‘인지적 이주(cognitive migration)’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AI를 둘러싼 대화는 겉보기엔 흥미롭지만, 실제론 불편한 침묵과 갈등이 내포돼 있다. 한 대기업 코칭 마스터클래스에서 AI의 활용 가능성이 논의되자, 일부 참석자는 철학적 회의를 드러냈다. 존 설(John Searle)의 ‘중국어 방’ 사고 실험을 근거로, AI는 인간의 방식으로 이해하거나 코치할 수 없다는 주장이 이어지며 대화가 더는 진행되지 못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논쟁을 넘어, 인간성과 연결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던진다.
의료현장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AI 도입이 문서작업, 진단 등 다양한 업무 효율화를 이끌고 있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도구를 활용하는 인력은 극히 일부다. AI는 이미 기업 솔루션으로 통합되고 있으나, 일선 직원들은 여전히 낯설어 한다. 이처럼 ‘이해를 뛰어넘는’ 채택 속도는 불신을 낳고, 일부는 이를 기술이 아닌 정체성의 문제로 받아들이게 된다.
AI 도입은 단순한 도구 교체를 넘어, 인류의 역할과 업무의 의미 자체를 재구성한다. 기존 기술 혁신과는 다른 점도 뚜렷하다. 첫째, AI는 단순 반복 작업이 아닌 판단, 언어, 창의성처럼 인간 고유의 ‘인지 영역’을 흡수한다. 둘째, 이해에 앞서 사용이 확산된다. 많은 이들이 AI를 매일 사용하면서도 실제 그 작동 방식이나 신뢰에 대한 확신은 없다. 셋째, AI는 인간의 경험 자체를 재편한다. 생성형 기술은 개인화된 응답을 통해 공동의 지식과 현실 인식을 분절시키며, 문화와 기관이 공유하던 가치 기준을 흐리게 만든다.
문제는 이 ‘인지적 이주’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어떤 이는 자발적으로 AI를 활용하며 변화를 선도하고, 다른 이는 산업 압력에 따라 억지로 적응한다. 또 일부는 본질적 저항을 표하며 AI가 담지 못하는 인간적 가치를 지키려 한다. 특히 교육, 상담, 의료 등 인간의 세심한 판단과 관계가 핵심인 직종들에서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다.
AI 기술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현장 노동자 계층이나 디지털 접근성이 부족한 계층은 이 이주 자체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정보 격차와 기술 접근의 부재는 AI 시대의 새로운 불평등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AI 채택의 시간차는 곧 사회적 위계와 직업적 격차로 이어진다. 초기 수용자들은 기술의 잠재력을 즐기며 부가가치를 창출하지만, 적응을 미루거나 기회를 박탈당한 이들은 노동 시장에서 점차 소외될 위험이 크다. 실제로 앤스로픽(Dario Amodei)과 오픈AI의 CEO인 샘 알트먼(Sam Altman)은 AI 도입으로 인해 향후 수년 내 백오피스와 고객지원 등 화이트칼라 일자리의 절반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실업률이 최대 2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내놨다.
AI가 업무 도구에서 인간 능력의 대체제로 전환되는 이 흐름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명료성이다. AI와 공존하며 인류 고유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정책적 대응과 제도 구축이 시급하다. 재교육과 사회안전망은 기존과 다른 기준, 즉 ‘인지적 displacement’를 고려해야 하며, 인간 고유의 감성적·윤리적 기여가 평가받는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 AI는 단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재정의하려 하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이주가 공동체와 개인에 미칠 파장은 불균형 그 자체보다 훨씬 위협적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하나다. 이 변화의 모양을 우리가 주도하느냐, 아니면 그 모양에 휘둘리느냐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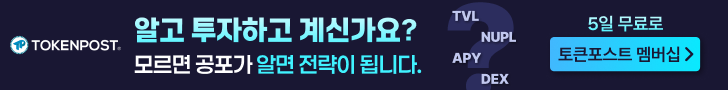









 0
0








![[토큰캠프 #4]](https://f1.tokenpost.kr/2026/03/h24xcbco2u.jpg)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45회차](https://f1.tokenpost.kr/2026/03/yzt2egy26e.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44회차](https://f1.tokenpost.kr/2026/03/vljjplabhq.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43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u4blgenuev.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42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ybgphvyjr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