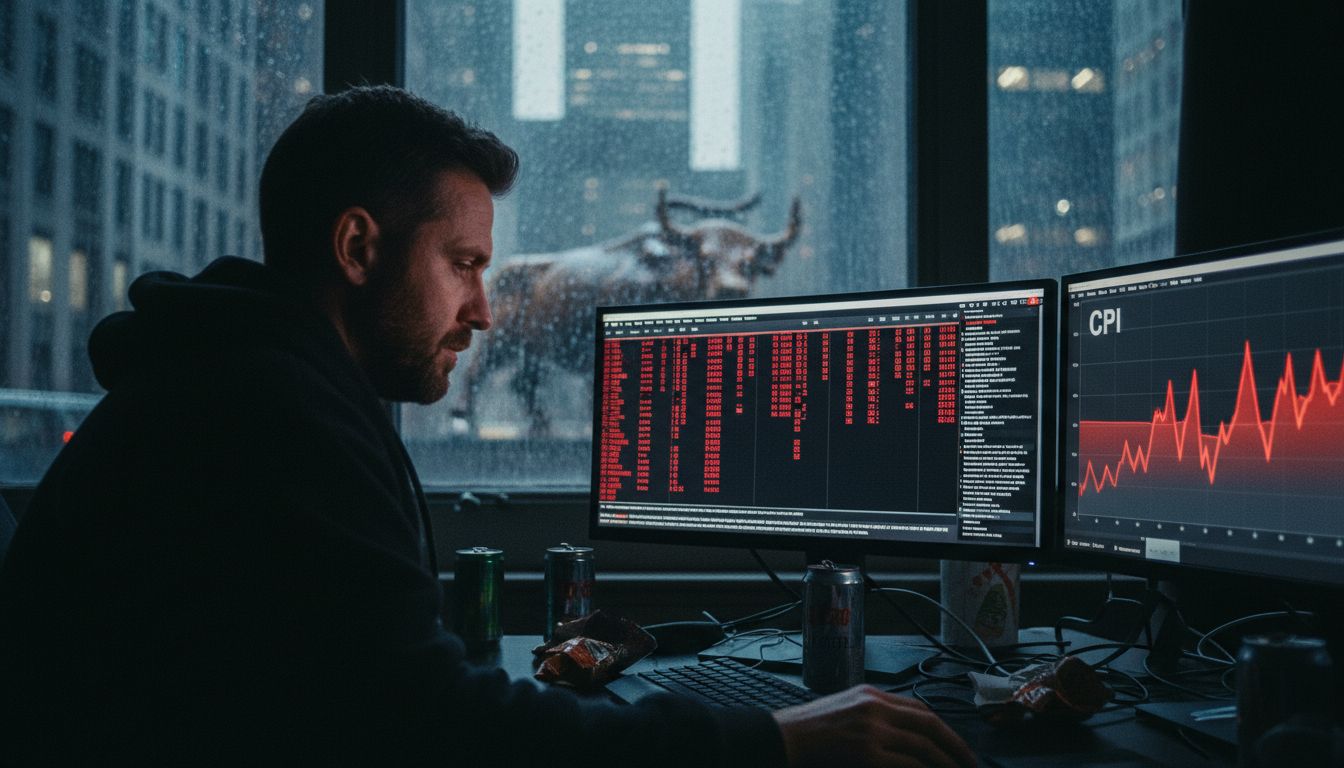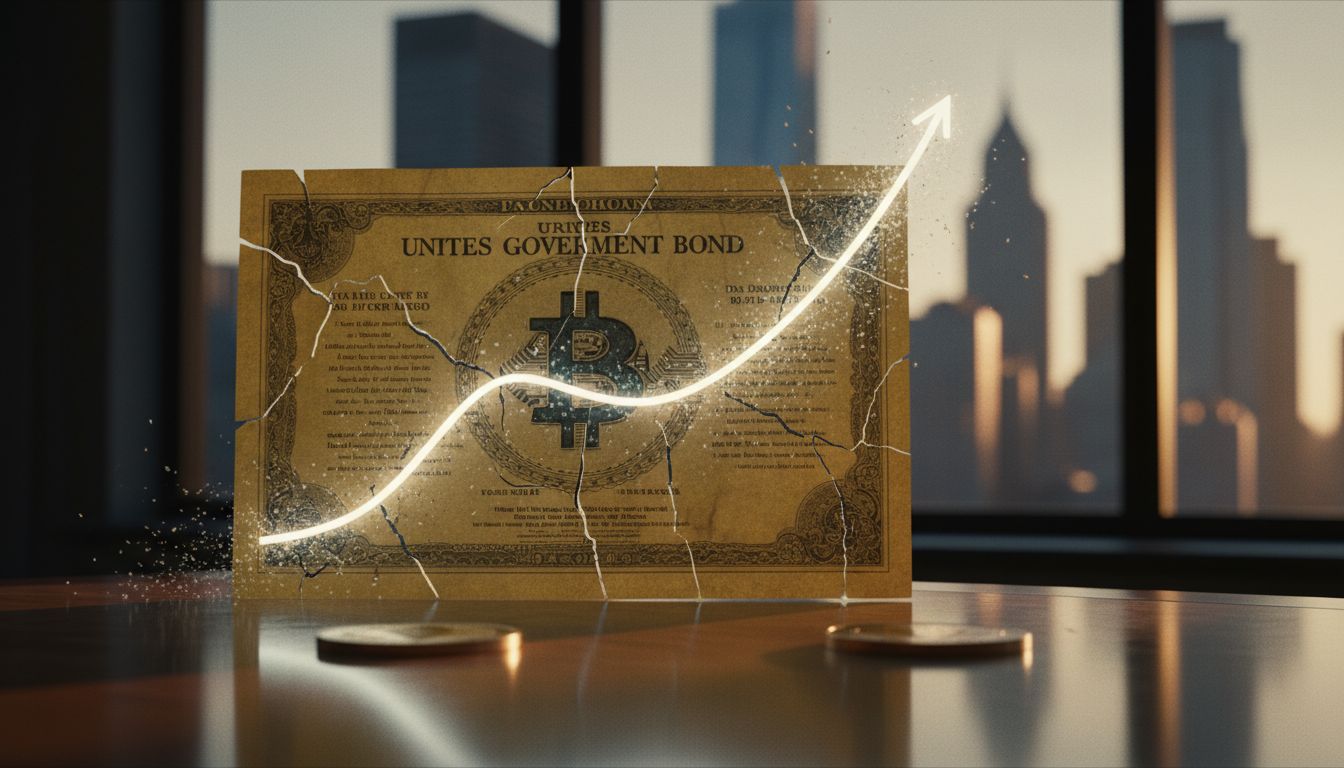미국 경제가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이번 주 발표 예정인 고용보고서의 중요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제조업 부문에서는 인력 감축이 본격화되는 징후까지 나타나면서, 고용시장 부담이 연준 정책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다우존스가 진행한 전문가 설문에 따르면, 4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13만 3,000명으로, 전달의 22만 8,000명 대비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된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지난 1분기에 0.8%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온 상황에서 이 같은 고용 부진이 현실화될 경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LPL 파이낸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프리 로치는 “경제 성장의 방향은 고용시장에 달려 있다”며 “금요일 고용지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노동시장이 더 냉각되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번 경고의 중심에는 제조업 둔화가 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은 관세 부담 증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력 구조조정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티머시 피오레 ISM 위원장은 “많은 기업들이 감원, 결원 미충원, 채용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해고가 인력 조정의 주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은 머지않아 위기감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한 관세 조치들은 설비 산업 보호를 목표로 하지만, 현실에서는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제조업 공급망 전반에 타격을 주며, 고용 안정성까지 흔드는 양상이다. 더 나아가 고용 악화가 금리와 소비심리에 영향을 줄 경우, 현재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해석도 설득력을 얻는다.
연준은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라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지만, 최근처럼 실업률이 상승하는 조짐이 뚜렷해진다면 고용을 우선하며 금리 인하 카드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고용 감소는 대출금리 전반을 낮추고 기업 활동을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 당국으로서도 민감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결국 이번 주 발표될 4월 고용보고서는 단순한 지표를 넘어, 미국 경기의 중장기 흐름과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할 핵심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 하단 위험이 구체화되는 상황에서 고용지표가 그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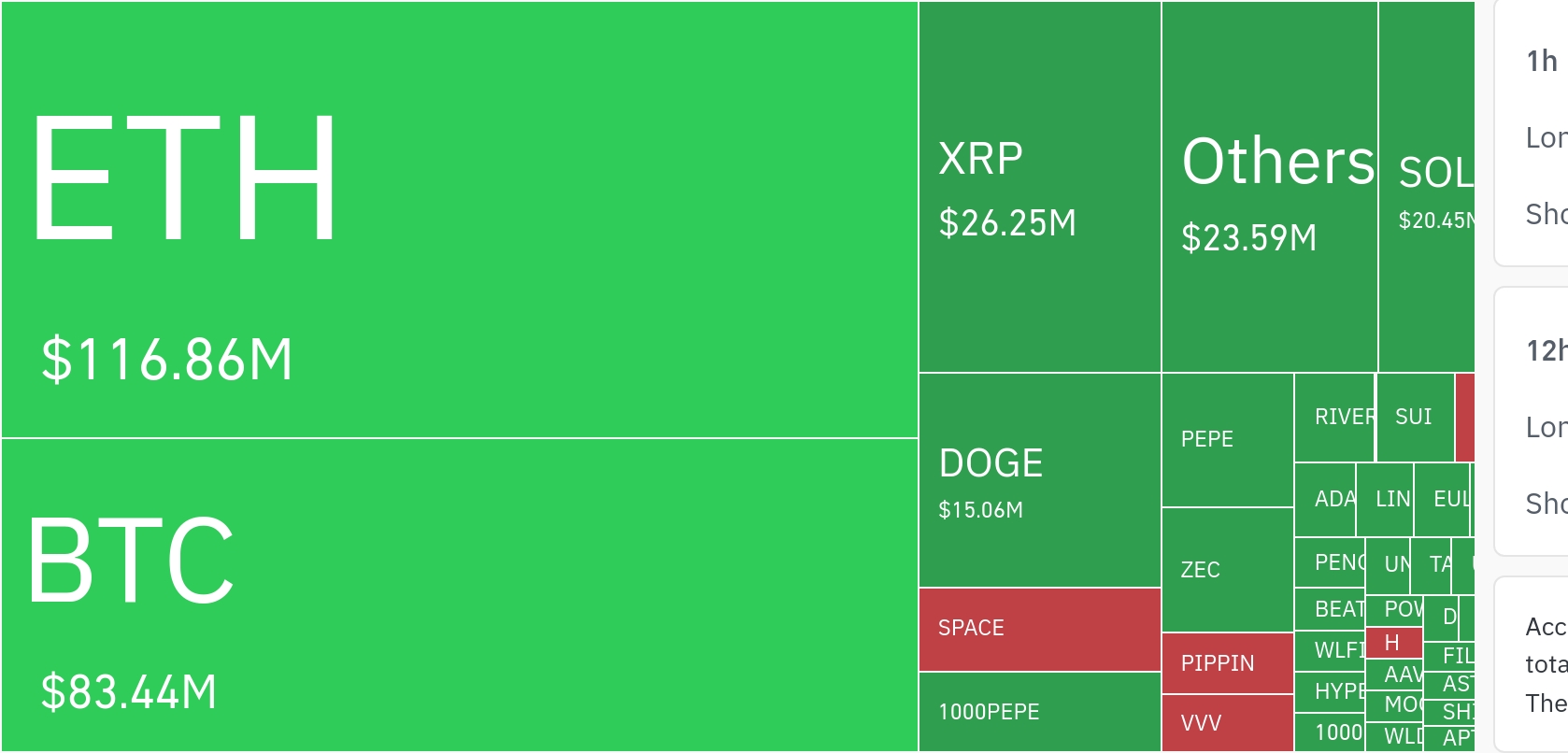
![[시장분석]](https://f1.tokenpost.kr/2026/02/e2wfj5ckgp.png)

![[모닝 시세브리핑] 암호화폐 시장 하락세… 비트코인 68,320달러, 이더리움 1,944달러](https://f1.tokenpost.kr/2026/02/ugvp1orxo9.jpg)
![[모닝 뉴스브리핑] 블랙록 “기관투자자, 비트코인 조정 중에도 매수 지속” 外](https://f1.tokenpost.kr/2026/02/i21jg1xjqv.jpg)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35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h11k1htgnt.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34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qetvwueue8.webp)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33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yxki8fbsgk.webp)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32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geibni8f8j.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