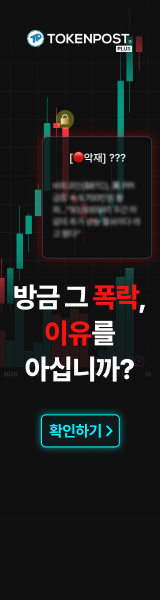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관세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세계 무역 시장에 파장이 일고 있다. 그의 대외 무역 전략을 상징하는 관세가 올해 들어 대대적으로 확대되면서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산업 전반에 불확실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이 관세들은 단기적으로 미국 정부의 세수를 늘리는 데 일조하고 있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우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들어 멕시코와 캐나다를 비롯한 북미 국가들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최대 35%까지 인상하겠다고 경고했고, 유럽연합과 브라질에는 30~50%에 달하는 고관세 부과 계획을 공개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전쟁도 재점화돼, 한때 45%까지 치솟았던 양국 간 관세는 스위스에서의 회담 이후 잠정적으로 30%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으며, 중국 역시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로 완화하기로 했다.
관세의 규모와 적용 범위는 특정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석유를 주요 수출품으로 삼는 베네수엘라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해당 국가의 원유를 수입하는 제3국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해 파급 범위가 크게 확산됐다. 이에 따라 인도, 러시아, 스페인 등 여러국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종별로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50%라는 초고율 관세가 적용되며, 자동차와 부품, 구리, 제약, 목재, 스마트폰 등 핵심 산업군 전반에도 높은 수입세가 연이어 발표됐다. 특히 구리에 대해서는 오는 8월 1일부터 50%의 관세가 부과되며, 아이폰은 미국 외 지역에서 제조될 경우 최소 25%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이 미국 내 생산 유인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 관세는 대부분 대통령 행정명령 또는 소셜미디어 발표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 발표 시점과 시행일, 대상 범위가 자주 변경되고 있어 시장과 기업들은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9일 '상호주의 관세(Reciprocal Tariffs)' 적용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힌 뒤 90일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가, 최근 이 기한을 8월 1일로 연장한다고 선언했다.
이처럼 트럼프식 '관세 외교'는 단순한 무역 장벽을 넘어, 외교적 압박 수단이자 정치적 레버리지로 확장되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브라질에 대해 전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에 대한 사법처리가 중단되지 않으면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점도 이를 방증한다. 이에 대해 브라질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며 맞대응 관세를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정책이 단기적 정치 효과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치르게 될 대가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무역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주저하고 있으며,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비용 전가가 시작되면서 소비재 중심으로 가격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략이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미국 내 노동 비용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은 제조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기보다는 고율의 관세를 감수하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관세라는 ‘무역의 벽’이 과연 미국 산업을 보호할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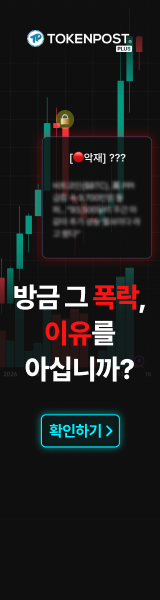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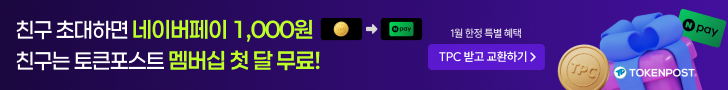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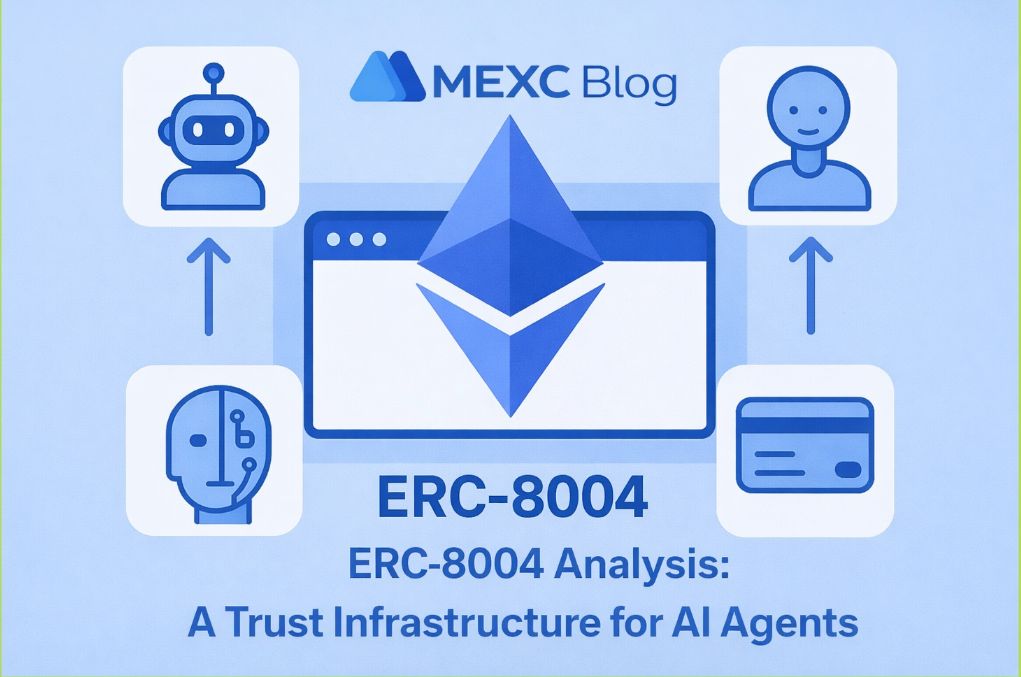

![[DePIN 진퇴양난] ③ 심층 진단 - 왜](https://f1.tokenpost.kr/2026/01/tmoacig13o.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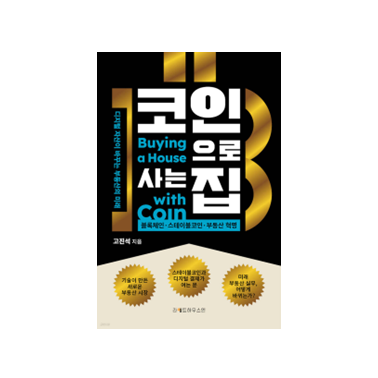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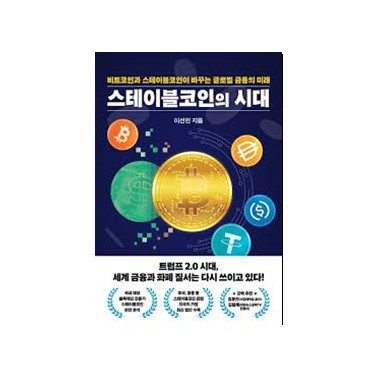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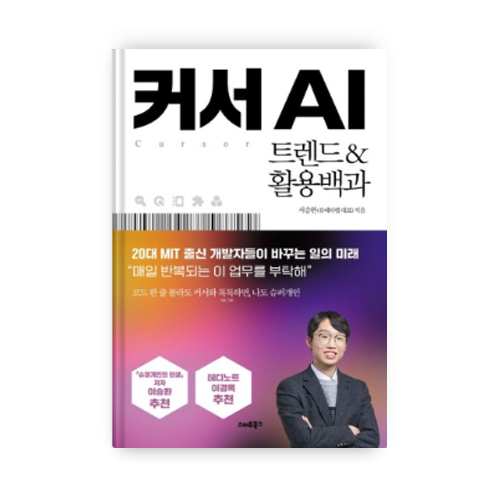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14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p4u5wsszac.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13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1lhf5bppnp.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12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0up9gmz27d.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11회차](https://f1.tokenpost.kr/2026/01/fv9w3v1x7g.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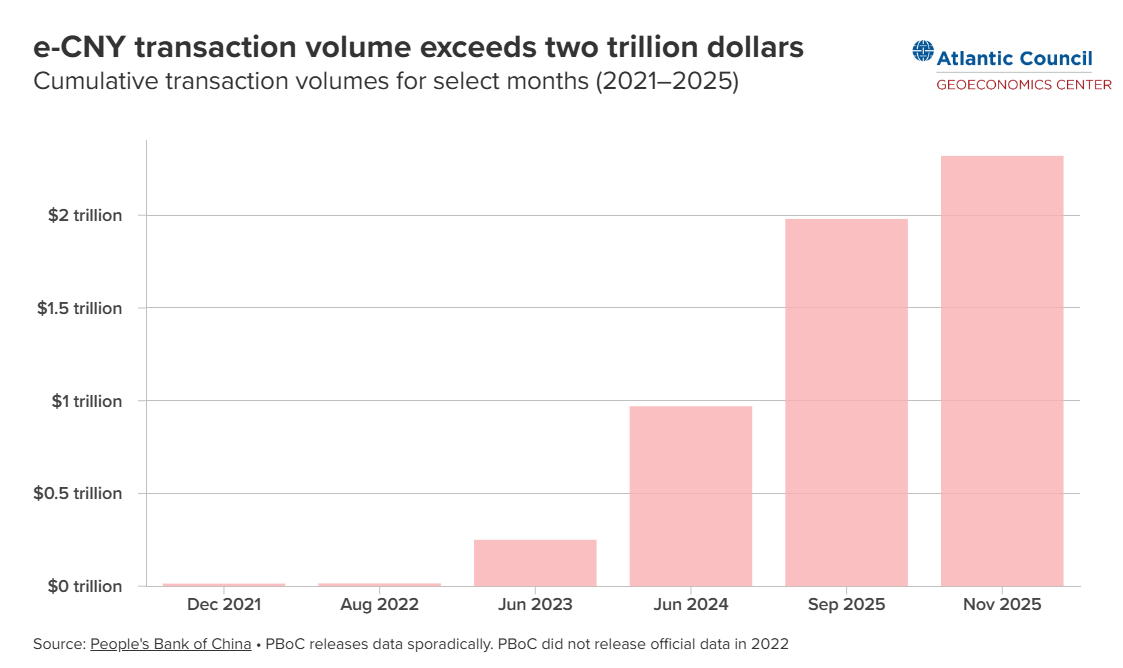
![[국제금융 브리핑] 미·EU 무역갈등 재점화, 인플레 압력과 금리 동결 전망 속 글로벌 시장 변동성 확대](https://f1.tokenpost.kr/2026/01/aj2ndkuaci.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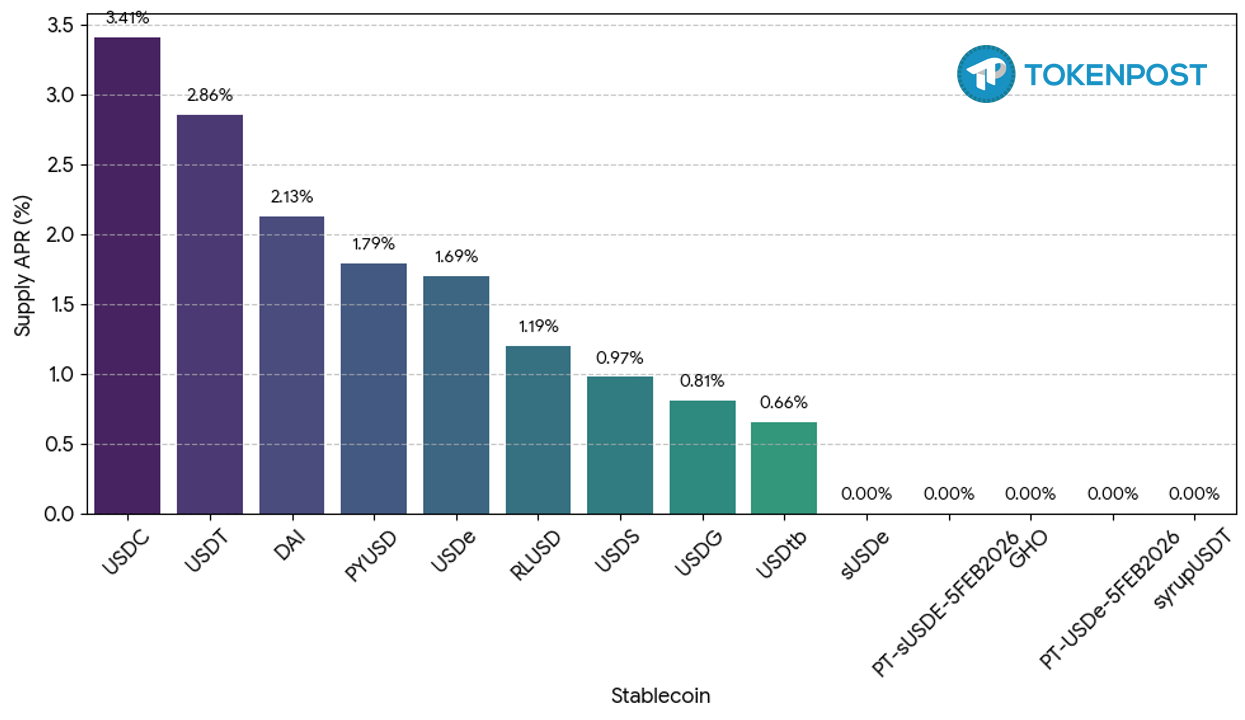


![[시장분석] 베네수엘라 사태의 이면… '달러 패권' 수호를 위한 미국의 고육지책인가](https://f1.tokenpost.kr/2026/01/skkqirld2k.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