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을 복지와 돌봄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접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담 기구가 새롭게 출범했다. 이는 고령화 심화와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움직임의 일환으로,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8일,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기반의 복지정책 설계와 현장 적용을 위한 로드맵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오는 2026년까지 단계별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범사업 과제도 선정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로봇, 위기 감지 시스템, 챗봇 상담 등 다양한 디지털 및 AI 기반 복지 실험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서비스 간 연계 부족, 기술 활용의 편차, 수요자 맞춤형 대응의 한계 등이 꾸준히 지적돼 왔고, 이번 추진단은 이러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뒤 효율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진단에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주요 연구기관들이 대거 참여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정보원과 보건산업진흥원, 중앙사회서비스원 등 관련 기관들이 공동으로 로드맵 설계와 정책 실행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종합적인 AI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스란 차관은 “현행 사회안전망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안전매트’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인공지능 활용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는 기술 도입을 단순한 효율성 제고에 한정하지 않고, 포용성과 형평성까지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복지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일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장기요양, 독거노인 대상 돌봄 분야에서 AI 기술이 서비스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기술 의존도가 커질수록 개인정보 보호, 기술 배제 계층에 대한 접근성 보장 등 새로운 과제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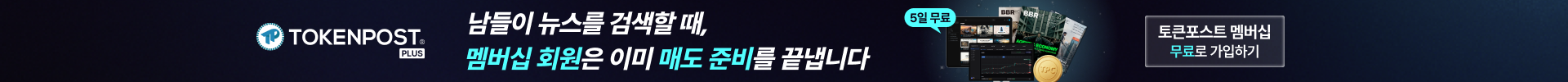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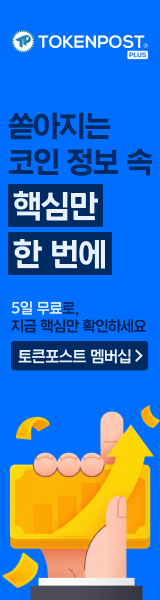










 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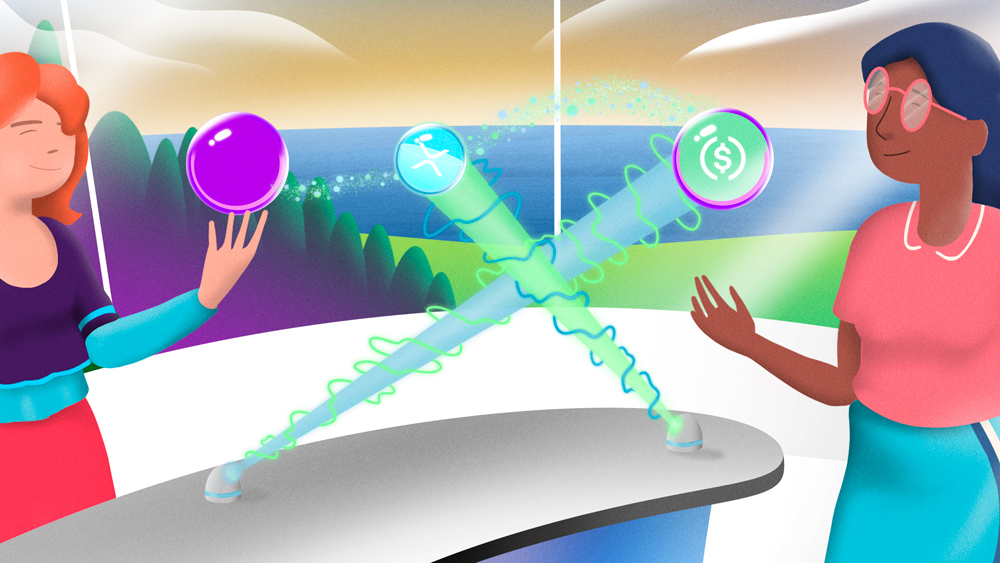




![[토큰분석] 1000조 달러의 큰 그림…그 안에서 드러나는 비트코인의 ‘가격 왜곡’](https://f1.tokenpost.kr/2026/02/qyco1pnm70.jpg)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Episode 6] 아트테크 하고,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3/08/3b7hm5n6wf.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35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h11k1htgnt.jp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34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qetvwueue8.webp)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33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yxki8fbsgk.webp)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32회차](https://f1.tokenpost.kr/2026/02/geibni8f8j.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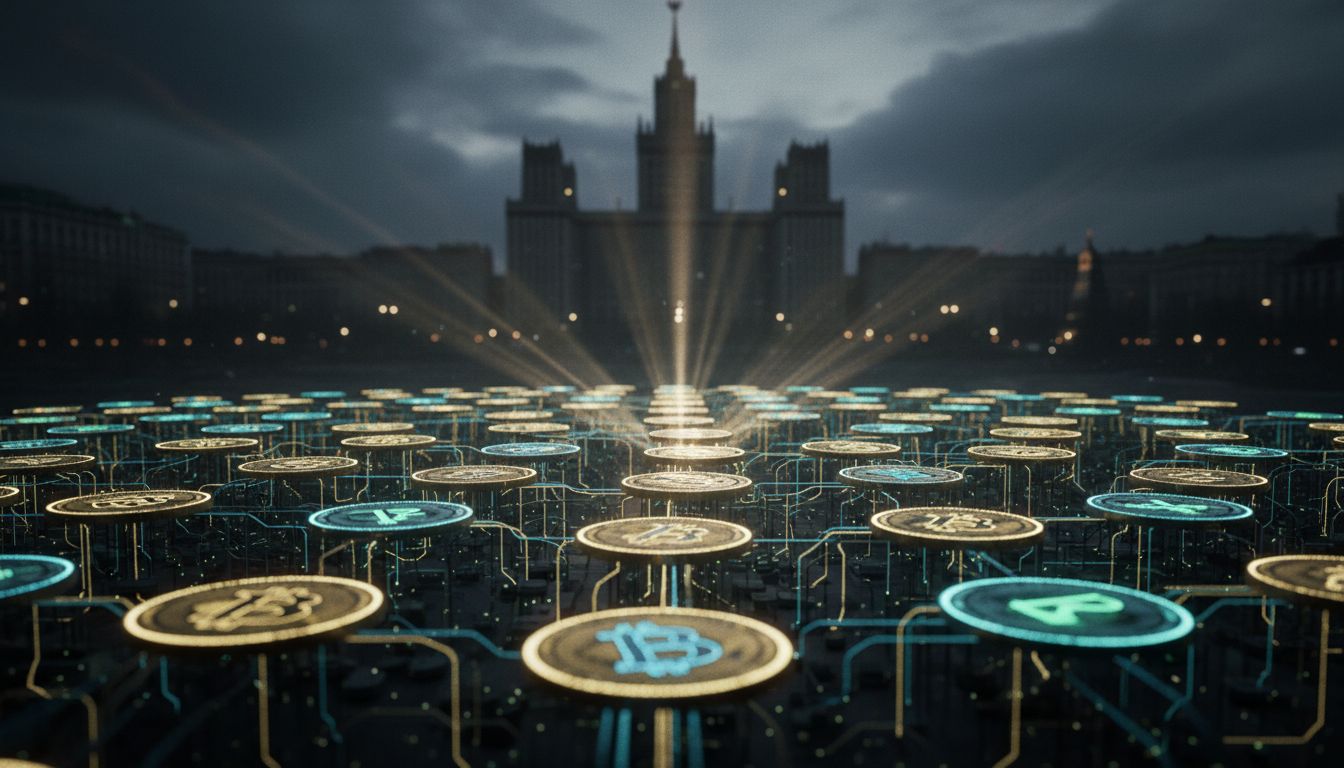
![[크립토 인사이트 #14]](https://f1.tokenpost.kr/2026/02/rv280t9a6v.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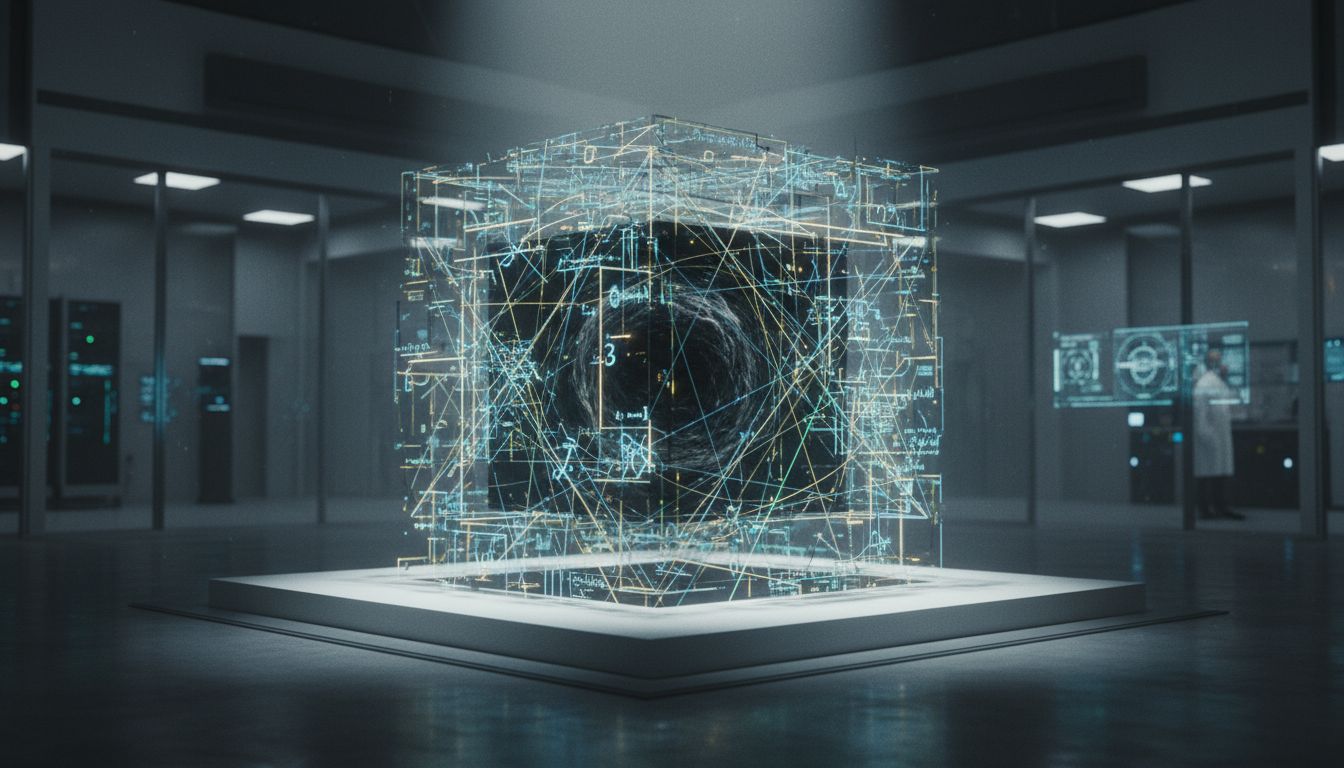


![[시장분석] AI 거품 붕괴 임박? 가짜 돈으로 쌓아올린 세계 최대 투자 테마의 균열](https://f1.tokenpost.kr/2026/02/02qfjpsea0.png)












